<이상한 요일들>, 대망의 한 해를 시작하며 호기롭게 나섰다. 필진들 앞세워 한 해의 반을 무사히 건넜다. 글 몇 개 발행하고, 필진들 글 챙긴다는 허울좋은 핑계에 숨어 계속 글쓰기를 미뤘다. 두려웠던 걸까. 딱히 그게 이유라고 말하기엔 면이 안 서긴 하지만 내 맘은 정작 그랬던 모양이다. 밖으로 나가길 주저했던 걸 보면.
몸에 맞고 익숙해서 즐거운 읽기만 줄곧 했다. 정작 쓰기가 어렵다며 어려운 고백을 전하는 이들에겐 뻔뻔하게 조언이랍시고 '일단 써보세요' 라며 뇌까리던 스스로가 쉬이 고개 들기 힘들 정도로 부끄럽다. 꼭 자기가 못하면서 함부로 쉬이 내뱉는 작자들이 더러 있다. 나였다. 고백하니 속은 시원하지만 많이 부끄럽다.
쓰기는 어렵다. 뱉으면 대기 중으로 낱낱이 사라지는, 나조차도 기억하기 어려운 말과는 달리 쓰기는 남기 때문이다. 아니다. 하고 보니 말도 마음에 남는구나. 종이에 기록으로 남아 숱한 세월, 조롱과 비난으로 고통받아 어려운 글과 대기 중에 허하게 날려보냈지만, 정작 가서 안착할 아무개 씨의 맘에 상흔으로 (혹여나) 남을 아픈 말은 피장파장, 어렵긴 마찬가지 아닌가 싶다. 읽는 이 없음에도 혼자서 제 스스로 낮아지는 누추한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간질거리며 '써봐, 써야지'라며 채근하는 맘의 정체와 이윤 뭘까. 뭘 그렇게 밖으로 나서지 못해서 발정 난 뭣마냥 이렇게 대문 밖을 그리워하는 걸까. 대문 안 누가 들어올까 걸어 잠그고 안전지대랍시고 고요히 앉아 고요하게 지낼 법도 하다가 이내 맘을 동동대는 그 심정은 또 뭔지 모르겠다. 정체만 궁금해하다간 발정난 호기심에 내 속이 터지지 싶어 그냥 또 내질렀다. 실은 내질러진 셈이 되었다.
운영해오던 독서모임은 7, 8월 정규적으로 방학을 공식화했다. 방학 동안 할 일을 달리 계획하고 있었지만 함께 책 읽는 즐거움을 온전히 놓기는 쉽지 않았다. 게다가 두 달을. 혼자서라도 읽어야지 하던 참에 "우리 여름에도 읽어요"라는 단 한 마디 말에 기대어 번외 모임을 만들었다. 어딜 가든 귀를 열고 맘을 열고 있노라면 고마운 이들의 음성이 들린다. 압도적 양과 질에 한꺼번에 눌려 미뤘던 리스트들을 들추다 마침 눈에 띈 허먼 멜빌의 <모비 딕>. 언젠가 아는 이가 모비 딕을 모티브로 창작 뮤지컬을 만들었단 소식만 전해 들었다. 대체 어찌 만들었을까, 어떻게 구성했을까, 그가 모비 딕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 10년이 흐른 후 겨우 뒤쫓아 읽어볼 엄두를 내본다. 느닷없이 소환된 그 지인 놀랠라. ㅎㅎ 이 책이 선정된 이유엔 '대체 고래 이야기를 이렇게 두텁고 길게 오랜 시간 사람들에게 읽히는 이유가 뭘까?'란 궁금증도 한몫했지만 여름이니까 바다가 끌렸던 이유가 크다. '심플한 게 인생 최고의 진리다'라던 엄마의 말이 실은 나머지 몫 다 했다.
매일 한 두 장씩 야금야금 읽고 인증하자 했다. 처음엔 두 명, 마지막에 합류한 한 명, 모두 네 명이 여름 내내 고래 한 마리와 긴 여행을 떠나보자 했다. 사는 동네가 다들 제각각(한국, 프랑스, 영국)이라 서로의 안정된 숙면을 위해 인증 시간만 제한해 두고 나머진 모두 각자 원하는 방식에 맡기는 걸로 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천천히 혼자서 읽노라면 속내에서 잊힌 많은 것들이 그물망에 엉키고 설켜 다소 거추장스럽게 올라온다. 두서없어 내어 보이긴 귀 벌게질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라도 엉켜올라 온 것들로 문안에서 빼꼼히 서있는 날 일으키고픈 맘이 생겨버렸다. 고래 한 마리가 날 일으켜 세울지 다시 주저앉힐지 알 순 없으나 다시 문지방을 나서보기로 했다. 허먼 멜빌 스스로도 고백한 그의 '사악한' 책 한 권을 이렇게 사귀어보기로 했다, 이 긴 여름 동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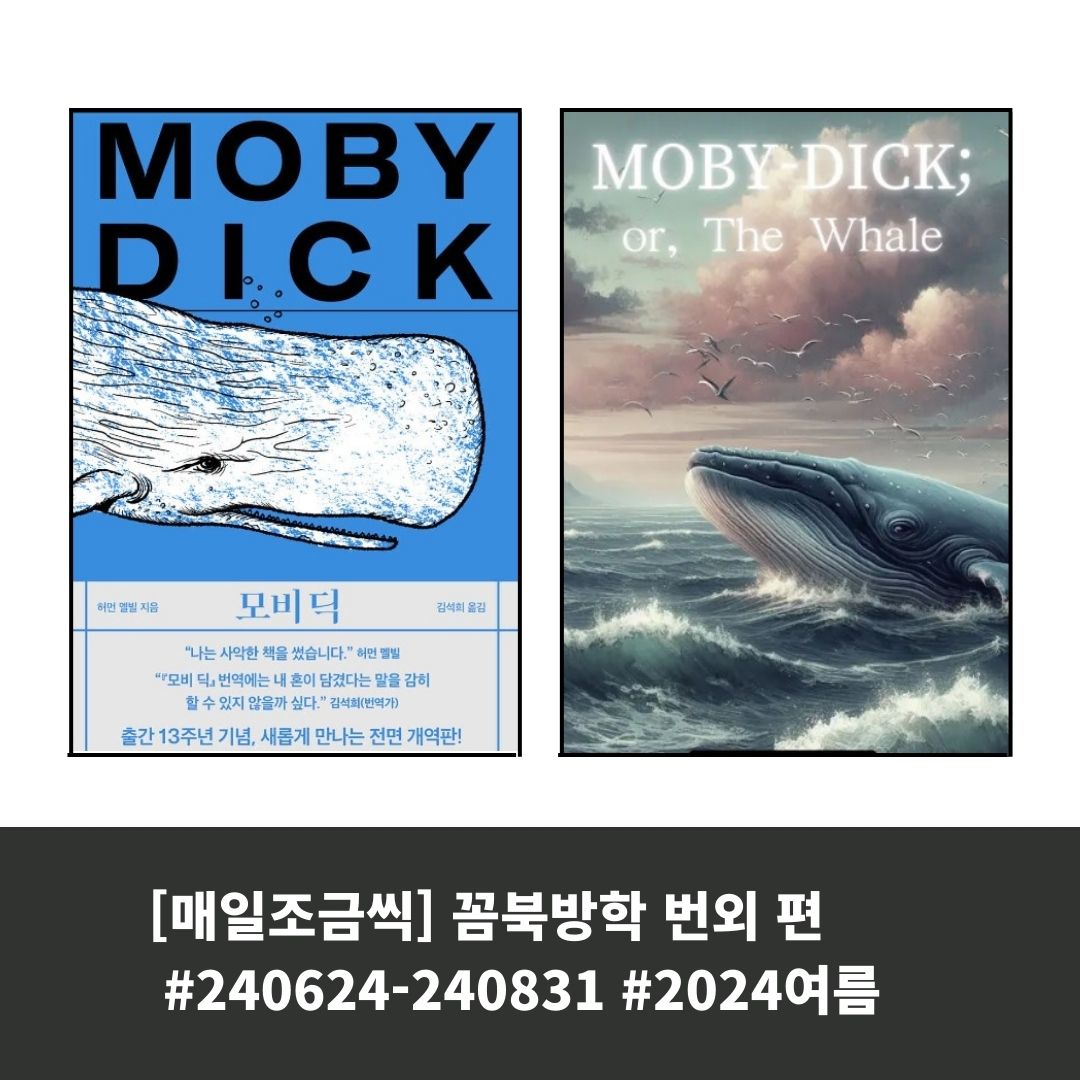

![[월요지기] 쎄묘입니다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508gknb6beu85jnupjbg79j6tolg)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