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전화를 한 통 받았다. 독자 한 분이 《아주 정상적인 아픈 사람들》을 쓴 폴 김 선생님의 연락처를 물은 것이다. 폴 김 선생님은 미국에 거주하셔서 연락 닿기가 힘들다고, 메일을 보내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메일 보내기를 어려워하시는 것 같았다. 대신 그분은 내게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다.
딸이 조현병이라고 했다. 회사를 다니다 말다 하는데, 지금은 좀 나아져서 약국에서 근무한다고 했다. 자기 남편은 서울과 전주에서 유명한 깡패였는데, 결혼을 안 해주면 죽겠다고 쫓아오기를 한세월, 결국 포기하고 그 남자와 결혼했단다. 집에 가져오는 돈이 없어 밥벌이라도 하러 나갈라치면(그분은 간호사로 일한다) 따귀를 올려붙였다. 의처증이 심해서 교회도 못 다니게 했다. 엄마가 아버지한테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을 보고 자라온 딸은, 부모에게서 사랑받은 경험이 없다고 어린 시절을 기억한다. 엄마는 아직도 딸에게 미안하다고, 너도 알지 않니,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을, 미안하다, 미안하다, 틈만 나면 사죄한다. 어머니는 지난 세월을 몽땅 내게 털어놓았다.
“선생님은 결혼은 하셨어요?”
“저는 아직….”
“아이고, 잘하셨어요. 나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결혼 절대 안 하려고 했지. 우리 딸이 그래요. 엄마는 도대체 왜 아빠랑 결혼했느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내가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 아저씨는 하늘나라에 있어요. 암에 걸려서 진작 저세상 사람이 됐지. 그래도 우리 딸은 지 신랑이랑 1년에 한 번 꼬박꼬박 산소에 가요. 나는 절대 가기 싫다, 갈 생각도 없다, 너도 가지 마라, 하면 딸이 그래요. 엄마는 무슨… 그래도 아빤데… 해요. 책에 나온 말이 맞아요. 그런 병은 착한 사람들만 걸려요. 우리 딸이 진짜 착해요. 엄마는 나를 왜 이렇게 착하게 낳아놓았느냐고 그래요, 우리 딸이….”
나는 중간중간 “에고, 힘드셨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하며 맞장구를 쳐드렸는데, 그게 그분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렸나보다. 나는 그 어머니와 47분간을 통화했다.

책을 만들고 나면 여러 가지 반응을 접하게 된다. 대개는 좋았던 부분, 바뀐 생각들에 대한 감상이지만, 이 책은 조금 달랐다. 갖가지 정신질환에 대한 묘사가 너무 생생해서 무서웠다는 독자도 있고, 나도 혹은 나의 가족도 그렇다며 쉽지 않은 고백의 자리가 이어지기도 했다. 책을 만들면서 편집자인 나도 참 어려웠을 것 같다고, 내 마음까지 짚어주신 분도 있었다. 맞다. 책을 만들면서 쉽지 않았다. 책에 나오는 어느 사연에서는 내 모습이 겹쳐 보이기도 했고, 또 어떤 사연에서는 우리 아빠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했다.
우리 아빠는 IMF 즈음에 명예퇴직을 하고 서울에 있는 중소 규모의 건설업체 회계 담당 이사로 이직을 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아빠도 병에 걸렸다. 그게 조현병이었다. 엄마도 힘들었을 테지만, 나도 오빠도 힘들었다. 우리는 그때 고2, 고3이었는데 전학 수속까지 마쳐놓고 다시 취소했다. 서울로 전학을 가지 못하게 됐다. 오빠는 담임선생님 앞에서 펑펑 울어버렸다는 소리를 엄마한테 전해 들었고, 나는 그때 이후로 희망이라는 걸 믿지 않게 되었다. 이게 끝이겠지, 끝이겠지, 하면 또다시 절망이 찾아왔다. 나는 아주 지쳐버렸다.
우리 아빠는 다행히 병원에 입원해서 몇 달 후에 완치되었는데, 그 이후의 삶은 엉망이 되었다. 아빠는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전과 같은 사회적 지위 같은 것은 잃어버렸다. 병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병을 몰고 온 것인지는 모르겠다. 내가 그때 어른이었더라면 아빠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었을까.

책을 만드는 일은 결국 나를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다. 《아주 정상적인 아픈 사람들》이란 제목을 지으면서 사실은 나를 떠올렸다. 나는 아주 정상인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아픈 사람인 것도 같다. 이런저런 기억의 응어리를 풀지 못한 채 가슴에 담아두고 살아간다. 퇴근할 때면 어김없이 덮쳐오던 무기력감, 그야말로 집채만 한 허무와 우울감에 뜬금없이 눈물 흘리기도 했다. 그냥, 그냥 눈물이 났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다기엔 내가 내 증상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울감을 달고 살았다. 이것이 그저 누적된 삶의 찌꺼기들이려니 했고, 다들 그런 감정 하나씩은 품고 살아간다고 믿었다. 이것이, 이 감정이 치료해야 할 병이란 걸 이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어느 날 문득, 햇볕이 환한 날에, 또다시 맥락도 없이 눈물을 쏟아내면서 내가 아프다는 걸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그것이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처음으로 결심한 날이다.
아픔은 치료의 시작이라고 한다. 증상을 드러내고 표현해야 비로소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한다. 독자의 전화 한 통을 받으면서, 나도 내 이야기를 꺼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가 꺼내놓는 이야기에 끝도 없이 고개를 주억거리며, 나도 내 이야기를 마냥 담아두고 있을 수만은 없겠다고 생각했다. 그건 너 비겁하달까. 나는 안 아픈 척, 괜찮은 척하는 것은. 나 또한 아주 정상적인 아픈 사람들 중 하나니까. 이 책은 내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오늘은 가만히, 내 이야기를 꺼내어본다.
*글쓴이 - 고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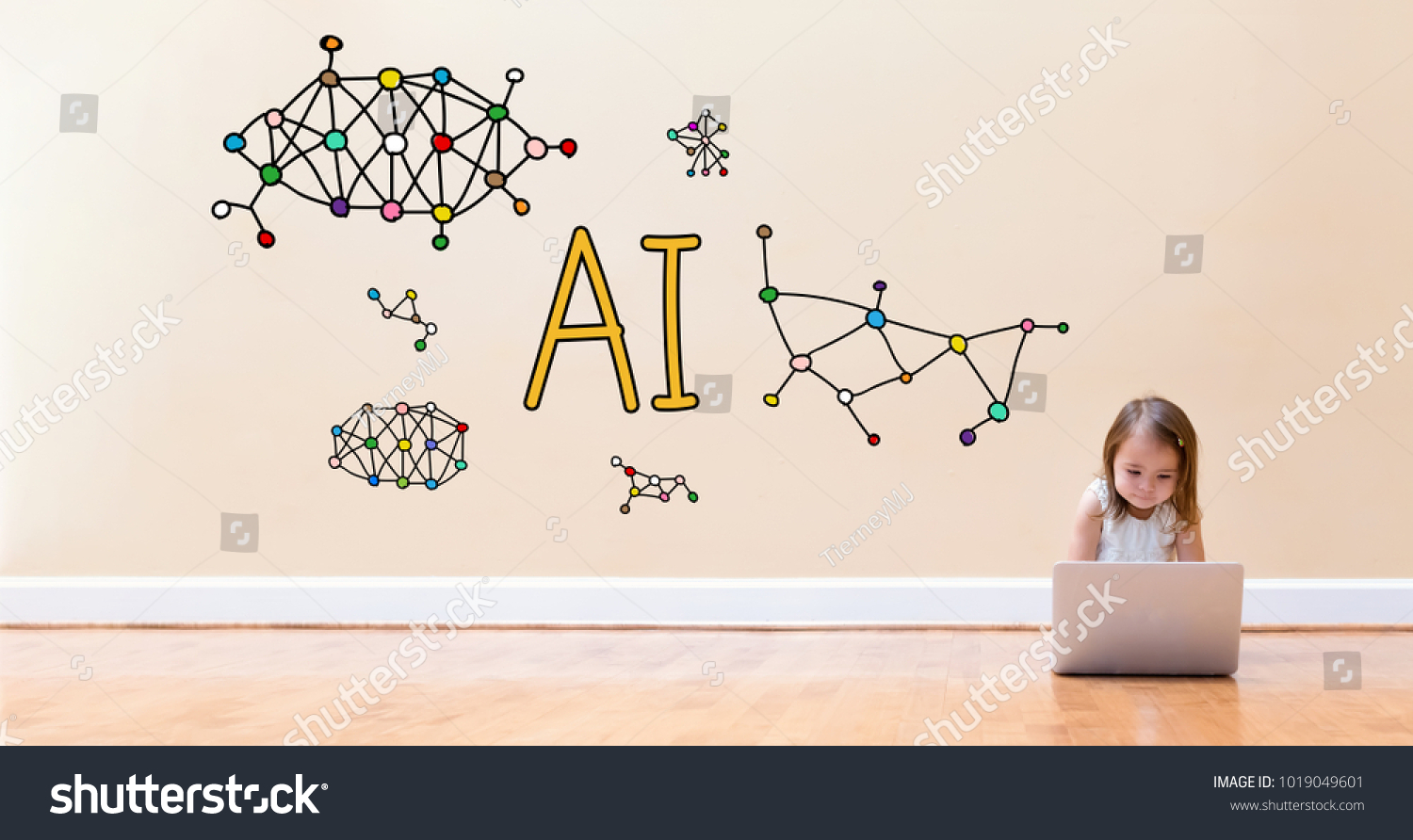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