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만났더니 대뜸 하는 소리가 아무개가 죽었단다. 평생을 잊고 살았던 그 이름이, 얼굴이 친구의 말과 함께 확 떠올랐다. 아무개가 머릿속에 빙빙 맴도는 것 같았다. 어지럽거나 매슥거리는 건 아니고, 그냥 어쩌다 죽게 되었는지를 기억의 파편 속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며 생긴 소용돌이였다. 글쎄, 죽을만한 이유라도 있었나 보지? 츄리닝을 박박 긁으며 물어보니 자살이란다. 아직 서른 해도 넘기지 못했는데 죽었어야 했나? 생각이 듦과 동시에 나도 확 죽어 버릴까 잠시 고민이 되었다.
내가 기억하던 아무개는 왕따였다. 대놓고 왕따는 아니고 은은한 왕따 정도. 편부 가정에서 자랐다고 들었다. 아이들이 흉을 보며 말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여름에 하복을 입을 때면 가슴이 교복 밖으로 비쳤다.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스스로도 이상한 걸 몰랐던 것 같다. 나는 세상만사 중요한 일엔 관심이 없었지만, 상황을 살피는 걸 좋아해 아무개와 아이들의 관계를 지켜보곤 했다. 아무개는 그런 나의 눈빛에서 조금은 안도감을 느끼는 것 같았고 나를 친구로 여기는 듯했다. 나는 나를 상황을 내려다보는 하나의 작가처럼 느껴졌기에 아무개와 아이들의 관계에 조금도 관여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개는 시도 때도 없이 내 하복 밑단을 잡아끌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아무개는 집에서도 왕따였다. 고민을 말할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고 울상을 짓는 아무개에게 나는 능청스럽게 말하라며 대충 조언을 해줬다. 너무 힘들다고 진지하게 말고 지나가는 어투로 말해보라고 최대한 안 힘든 듯이.
아무개는 힘들다고 말했다. 부모는 아무개의 말에 자신이 더 힘들다며 자신이 힘들었던 이야기를 줄줄이 늘어놓았고 아무개의 가슴에는 힘든 삶을 사는 부모가 덧칠해져 더 어두워져 버렸다. 아무개가 나를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게…. 좀 쉽지 않더라. 나는 가볍게 아무개를 비웃으며 아무개를 무시했다.
사실상 항우울제를 먹은 지 벌써 544일이 지났다. 쿠에티아핀, 렉사프로 듣기만 해도 어려웠던 이름들을 이젠 줄줄이 외며 공책에 먹은 알약 개수를 모두 써 내려 갔다. 아무도 모른다. 나는 적당히 잘 버티는 편이다.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걷다 눈물이 터져 나왔다. 조금 전까지도 면접장에 앉아 쪽 찐 머리를 하고 생글생글 웃었는데, 그 이질감이 드는 나를, 당당하던 나를 잘 내보였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왔다. 면접을 망쳐서, 기분이 안 좋아서가 아닌 복합적인 기분이었다. 죽어버리고 싶었다. 알약의 개수가 565개가 되었을 때 나는 옅은 미소를 띠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되었다. 아무개가 옅은 그 작은 미소를 짓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힘들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데 얼마나 고민을 했을지, 나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았다.
아무개가 죽었다는데 보고 싶었다. 그저 어떻게 컸는지가 궁금했고 그 영정 안에서는 옅은 미소라도 띠고 있을지 궁금했다. 돈이 없었다. 반지하에 살며 여름마다 파란 바케스로 빗물을 받아내는 내겐 아무개를 보러 갈 그 오만 원조차 너무 아까웠다. 나 자신이 너무 사람답지 못해 한심했다. 차라리 인간답지 못할 바엔 죽는 게 낫지 않냐, 스스로 되물었다.
웃기게도 전염병이 돌자 나는 마스크를 끼고 손 소독제를 챙겨 다니며 외출을 했다. 죽음이 곳곳에 창궐하자 나는 하고 싶은 것들이 생겼다. 글을 쓰고 싶었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으며 사랑을 해보고 싶었고 단 한 번 내 집을 가져 보고 싶었다. 죽음이 코앞까지 마중을 왔다는 생각에 나는 기뻐하긴커녕 젊다는 것에 감사하고 마스크가 있다는 것에 안도했으며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내심 자랑스러워졌다.
모두가 알고 있겠지만 아픈 이들은, 특히나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애정이 결핍되어있는 이들의 경우 무엇인가 중독되기 쉽다. 가벼운 섹스나 번잡한 이성 관계, 도박, 알코올 따위의 부정적인 것들. 612개의 알약을 삼키면서 나는 쇼핑에 중독되어 있었다. 하루는 택배 상자가 10개도 넘게 배달이 오는 바람에 거실 바닥에 자리가 없었다. 검은 옷들만 사는 날도 있었고 빨간색 네일 팁만 사는 날도 있었다. 누군가 나에게 미쳤다고 했다. 하지만 이게 내 세상이었고 이게 내 전부였고 이게 내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판단이었다. 살고 싶었다. 살고 싶어 미친 듯이 먹었고 미친 듯이 돈을 썼고 하염없이 옥상에 앉아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아무개가 목을 맸다. 나는 아무개의 텅 빈 동공을, 턱까지 내려온 혀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쩐지 옅은 미소를 띠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다. 아무개를 안았다. 따스했다. 내가 아무개를 안고 있는 동안 중학생이 된 아무개가 내 어깨에 기대 숨을 죽이고 울었다. 꺼이꺼이 울었다. 고작 그 한 뼘 어깨를 빌려주는 게 어려워 열 번이 넘는 해를 넘겼다.
일어나보니 침대 머리 언저리가 축축했다. 꿈에서 나는 언제나 <나>였던 적이 없다. 어쩌면 아무개의 생에 내가 연관이 없다고 오만을 떨었었다면 실은 나 또한 그렇게 아무개의 파편이었던 걸까 고민했다.
돈이 없었다고 한다. 직장에는 자리가 없었고 아무개는 꿈도 없었다. 잔잔한 시비가 끊이지 않는 아무개네 거실은 아무개의 능청이 먹히지 않았다. 유서에는 살고 싶었다고 한다. 살고 싶었지만, 사람답게 살지 못해 간다고. 대체 사람답게 사는 건 뭘까? 나는 생각했다. 코로나로부터 악착같이 살아남고자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죽고자 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과연 내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건 무엇인가.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였던 아무개의 발걸음이 영혼이 여전히 지천을 떠돌고 있다.
*
특별기고 글쓴이 - 함승현
에세이 집 <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날에> 를 출판하였습니다.
늘 이별하고 싶은 것들과 함께 살아가며 위트 있는 하루를 보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주로 미디어아트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삶과 재능을 찾아주는 부업을 하며, 우리를 위해 글을 씁니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thecuteoys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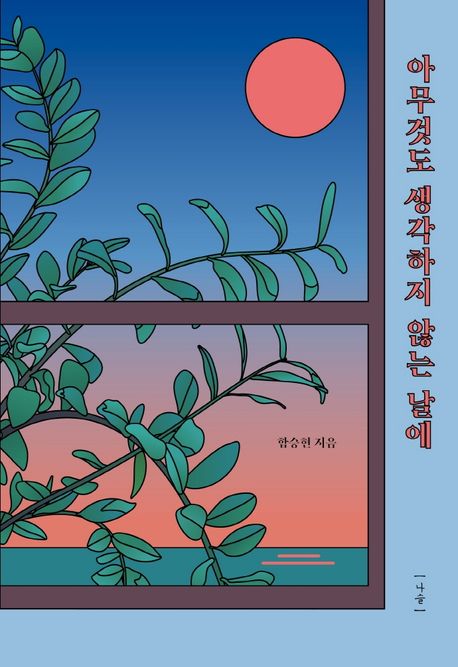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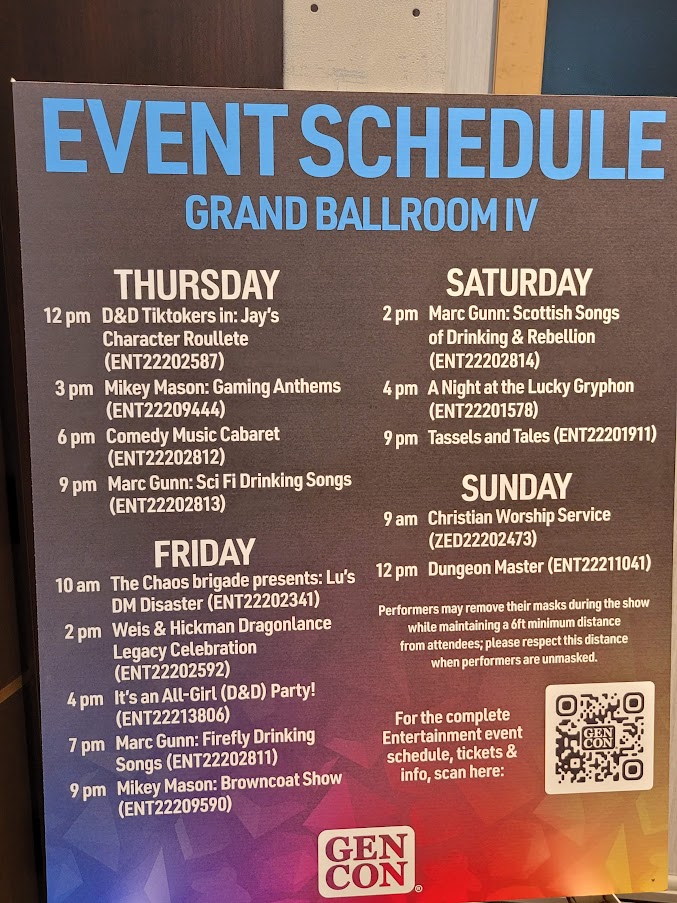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