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 든다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듯하다. 하나는 온전한 방향으로 성장한다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어린 시절의 무언가를 잃어간다는 의미이다. 달리 말하면, 철이 드는 것이 언제나 '좋은 일'은 아닐 수 있다. 철이 드는 건 무언가를 얻으면서 잃는 일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철이 든다는 건 어린 시절의 낭만이나 열정을 어느 정도 잃는 것이기도 하다. 철 없이 사랑하고, 철 없이 꿈을 좇던 일들은 현실을 아는 어른이 되어갈수록 '자제'해야할 것이 된다. 그보다는 현실을 고려하면서 어떻게 책임 있는 어른이 될지 고민해야 하고, 자신의 한계들을 알고 받아들이기도 해야 한다.
이렇게 신체의 일부를 몇 개 자르듯이 자제와 한계를 알면서 우리는 성숙에 이르고, 동시에 책임과 인정에 이르면서 철이 든다. 그런데 그렇게 철이 든다는 건 동시에 그만큼 '현실과 타협'한다는 뜻도 된다. 때론 현실의 한계 뿐만 아니라 각종 부조리도 용인하고, 어릴 적의 무한한 정의와 신념 보다는 사회적 생활에 필요한 지점들을 받아들인다.
그렇기에 '철이 드는 일'은 제제가 마냥 훌륭한 존재로 성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라임오렌지나무'를 잃는 일이기도 한 것이다. 자기만의 기준, 상상력, 정의, 감성, 꿈, 낭만 같은 것들을 현실 앞에서 가위질 하는 게 철이 드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한 인간이 성숙한 어른으로 철이 들어간다는 건 점점 자신의 위치에 밝아진다는 뜻이다(마치 '밝을 철'이라는 한자어처럼).
흔히 말하는 철이 안든 어른들, 사고 치고 다니고, 자신이 아직 아이인 줄 알고, 책임감 없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어른들은 여러모로 '꼴볼견'이라고 여겨진다. 아마 어른이라면, 그런 철없음을 극복하고 이 사회에서 온전하게 관계맺고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되어가야 하는 게 맞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저마다 자기 안에 '철들지 않은 영역' 하나 쯤은 몰래 간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하다. 철이 드는 것도 좋지만, 몰래 나의 뒷뜰에 있는 라임오렌지나무와는 여전히 인사하는 사이여도 괜찮을 것이다. 이 세상에 맞게 나의 꿈들을 다 잘라버리는 것보다는, 이적의 노래 '뿔'처럼 머리 위에 돋아난 뿔 하나 숨겨놓고 사는 것도 좋을 듯하다.
<나의 라임오렌지나무>에서 제제는 묻는다. "왜 아이들은 철이 들어야만 하나요?" 내 생각은 그렇다. 결국 이 사회에서 책임있는 한 독립적 인간이 되기 위해 철이 들어야 한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이고 싶다. "하지만 완전히 철들 필요는 없어. 나를 위해 철들지 않는 부분 몇 개쯤은 호주머니 안에 숨겨두어도 돼." 그것이 어쩌면 우리 삶의 숨구멍이 되고, 또 우리 삶을 더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는 가장 결정적이고도 작은 단서가 될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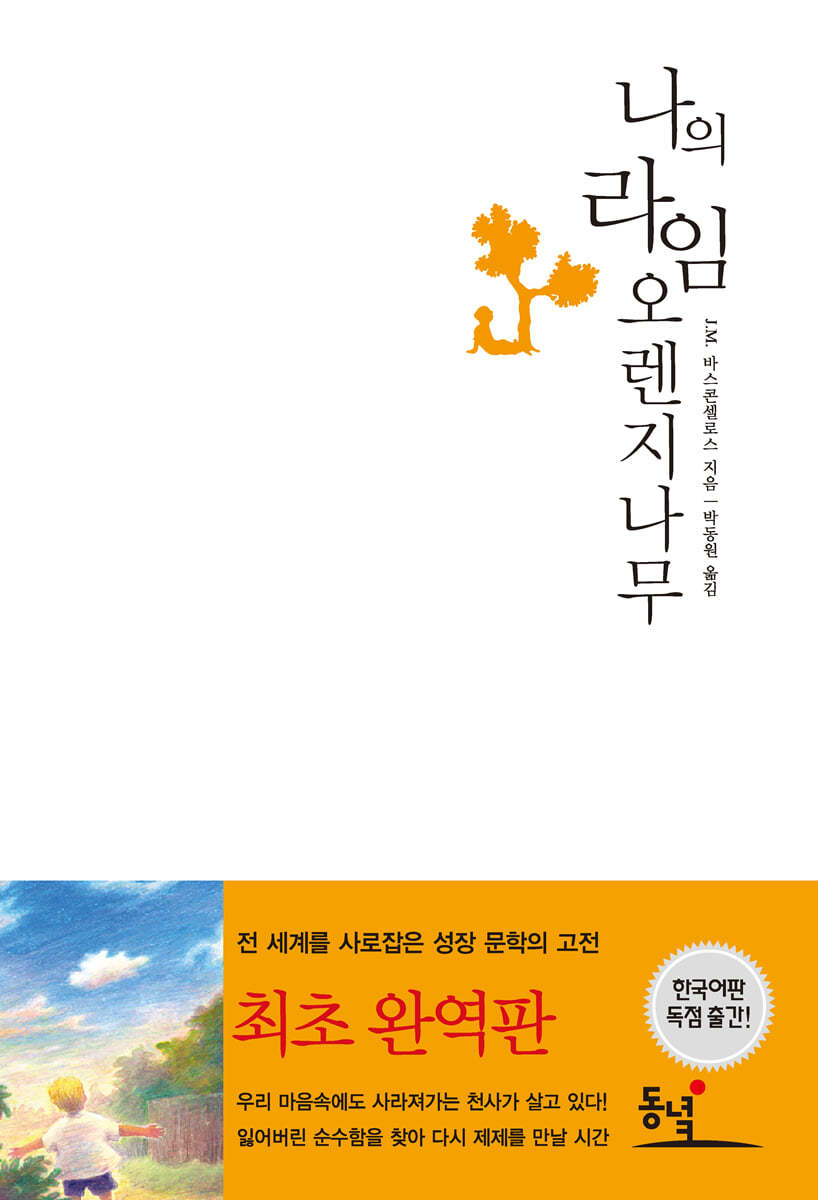
* '선한 이야기 읽기' 글쓴이 - 정지우
작가 겸 변호사. 20대 때 <청춘인문학>을 쓴 것을 시작으로, <분노사회>,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우리는 글쓰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사랑이 묻고 인문학이 답하다>,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 등 여러 권의 책을 써왔다. 최근에는 저작권 분야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20여년 간 매일 글을 쓰며, '세상의 모든 문화' 뉴스레터를 운영하고 있다.
페이스북 - https://facebook.com/writerjiwoo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jungjiwoowriter
공식홈페이지 - HOME | Law&Culture Lab (modoo.at)
* 원래 '밀착된 마음'을 연재 중이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당 코너를 당분간 쉬면서 다양한 '선한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코너로 임시 변경하였습니다('밀착된 마음'은 2024년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