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 음악평론가의 북토크 자리에 참여했다가 어느 뮤지션의 재미난 작업을 접하게 되었다. 스스로를 '출장작곡가'라고 표현한 김동산은 서울과 수원에서 이야기를 수집하고 이 내용으로 곡을 만든 앨범을 낸 적이 있다. 주로 노동자, 젠트리피케이션 현장의 상인들, 마을의 노인 등을 찾아가 이야기를 듣고 노래로 만들었다. 찾아보니 꽤나 오래 전부터 활동을 하고 있었고, 경기천년 도큐페스타 《경기 아카이브_지금,》 전시연계 프로그램으로 소개된 바가 있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서도 이미 아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 된다.)
북토크에서는 김동산이 작업한 곡 중 <수원 지동 29길>이라는 곡의 뮤비를 감상했다. 수원의 낡은 동네인 지동에서 활동하면서 예술가들의 벽화 그리기와 같은 방식의 활동에 반대하는 대신 지동 사람들의 삶을 조용히 관찰하며 예술가로서 최대한 소극적인 개입을 시도했다. 그러던 중 유네스코에 등재된 수원화성의 문화재 개발 때문에 평생 일구었던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어르신들의 삶을 목도하게 되고 그 이야기를 곡으로 만든 곡이 <수원 지동 29길>이었다. 당사자인 어르신을 관객으로 두고 노래하고 연주하는 장면을 뮤비로 만든 유튜브 영상이었다. (함께 감상하시죠.)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뮤지션 바로 앞에 앉아서 노래를 들어야 하는 할머니는 정말 뻘쭘했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T성향 기록활동가는 이런 생각도 했다.
'분명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듣고 남기는 행위는 구술 기록과 같다. 그런데 4분 남짓되는 노래 가사에 다 담기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있어 안타깝네. 그런데 이렇게 남겨진 노래는 기록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
1년 전 쯤 영상 예술가의 아카이브 작업에 대한 비평글을 써달라는 제안을 받고 곤욕을 치른 경험이 있다. 처음엔 흔쾌히 글쓰기를 수락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형이상학적인 작업에 억지로 억지로 분량을 맞춘 나의 글도 길을 잃고 형이상학적인 글이 되고 말았다. (너무 부끄러운 글이라 어디 숨키고 싶다)
1년이 지난 지금, 기록에서 '감정(effect)'과 '정동(affect)'에 대한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글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공부를 하는 중이라 이 뮤지션의 작업에 대한 고민은 1년 전의 영상 아카이브 작업을 보며 가졌던 생각에서 조금은 진전이 된 것 같다. 이 개념에 대해 서술하기에는 아직 부끄러운 수준이라 이경래(2023)의 논문을 참고해보시기 바란다.
예술은 사실적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기록이라기 보다 그 과정에서 '신체'에 새겨진 감정과 정서, 생각과 인식 등 뭐라고 하나로 표현할 수 없다고 말하는 '정동'을 전달하는 기록이 아닐까 정도로 정리가 된다. 구술기록은 말로, 또는 이를 글로 옮겨 구술자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한다. 증거적인 역할의 증언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당시 기분이 어땠나, 어떤 생각이 들었나' 하는 개인적이고도 주관적인 영역의 질문이 포함된다. 구술기록에서는 구체적 질문을 통해 구체화된 표현을 들어보려 애쓰지만, 기분 또는 감정을 적절하게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좋다'라는 표현에도 수만 가지 감정과 생각이 담겨 있다. 하지만 맥락과 목소리, 숨결, 대상과 나 사이에 흐르는 공기를 통해 짐작할 수는 있다. 할머니가 이야기를 통해 드러낸 내용과 감정은 이야기를 듣는 뮤지션 김동산의 인식과 감정으로 전달되었을 것이고, 김동산의 기록은 오히려 가사라는 형식에 내용을 압축하여 표현하고 악기와 멜로디로 그 감정을 옮겨 놓는 작업이었을 테다. 김동산이 이 노래를 계속 들려줌으로 해서 이야기와 감정, 정서는 다른 이의 신체에도 옮겨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치유'하는 힘을 가진 기록이 된다. 그의 1집 해설서에도 이와 관련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기쁘고, 슬프고, 화나고, 즐겁고, 흥분되고, 우울하고, 좋고, 싫은 사람들의 감정…….도서관, 동아리, 단체, 학교, 사랑, 우정, 사업, 직업, 해고, 쫓겨남, 투쟁, 가족, 가족사, 가치관, 스타일, 좋아하는 물건, 반려동물, 인간관계, 정치, 여성주의, 생태주의 등 많은 이야기들은 저마다 우여곡절과 더 큰 배경들과 차마 말할 수 없는 복잡한 심경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야기들이 노래로 될 때, 노래로 되기 위해 다시 한 번 그 사람의 입에서 이야기될 때, 그것은 이미 출장작곡가 김동산과 그 사람을 동시에 치유해 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출장작곡가 김동산 서울·수원 이야기 김동산 정규 1집 해설서>, ‘0.출장작곡의 비밀’ 중에서
이런 생각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글을 쓰기 위해 찾아본 자료에 위와 같은 글이 이미 적혀 있어 아주 허무하긴 하지만, 어쩐지 답안지 채점하며 동그라미를 그린 느낌이라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들었다. 이 해설서의 글과 김동산이 자신을 '출장작곡가'라고 부르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과 이 노래를 만들게 된 장소와 사건에 대한 배경 설명이 없었다면 이것은 기록이 될 수 있었을까. 기록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맥락'의 이해에서부터 이것은 기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들어간다면 예술가의 기록 작업에서 중요한 맥락 요소 중 하나는 행위자인 예술가이다. 이 사람은 어쩌다가 이런 작업을 하게 되었나를 파고 들다 보면, 소위 말하는 '아트 아카이브'와 '아카이브 아트'는 별개의 개념이 아닐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요즘의 '어수선' 하기도, '분노'하기도, '희망'을 가져보기도 하는 감각을 기록할 음악도 곧 나올 거라고 예상한다. 지금의 사건은 아니지만 과거에도 비슷한 경험 속에 불리었던 노래가 지금도 응원봉 현장에서 불리고 있다. 이에 노래를 하나 더 소개하고 단상이고 싶었던 정리 안된 잡설을 마치고자 한다.
이번에 윤석열 탄핵/파면을 촉구하는 음악인 선언에 참여하기도 '하이미스트메모리'의 <해가 사라지던 날>이다. 이 곡은 2009년 7월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디어법' 개정을 국민여론을 무시한 채 날치기 통과한 후 만들어진 노래이다. 당시 정국에 대한 예술행동으로 발표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난다. 앨범으로는 2016년 '시국선언'의 일환으로 정식 발매되었나 보다.
(참고: https://blog.naver.com/windntree/30078844697)

매우 서정적으로 시작하는 노래에서 뮤지션은 첫소절에 나오는 '개XX들'이라는 단어마저도 조용히 읊조리지만, 두 번째 나오는 '개XX들'은 울분을 토하는 듯한 느낌이다. 지금 누군가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이자, 남겨야 하는 감정의 기록이다. 물론 뮤지션들이 이런 노래를 더 이상 거리에서 반복해 부르지는 않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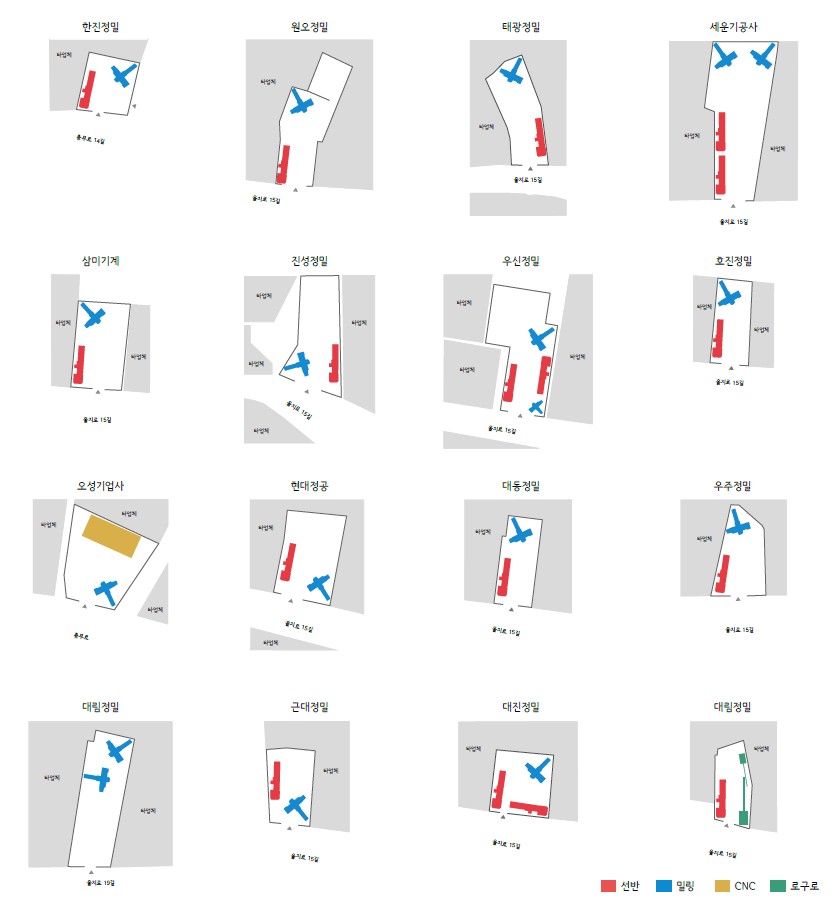
![[탐방기]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아카이브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202508/1754048382980392.jpeg)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