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의 끝을 알리는
2022-05-27
한줄평) 내가 쓰고 싶은 글
심규선....난 이 사람을 모른다. 그런데 유툽에 검색하니... 민망하리만큼 노래가 많다. 그리고 들려오는 음색....
과하지도 덜하지 않는 단백한 음색이 똥줄이 줄줄타는 그 순간에도 눈이 지긋이 감겼다.
노랫말을 쓰는 분이라 단순한 ‘기쁘다’, ‘슬프다’, ‘감동적이다’등등의 어휘력이 딸리는 사람들(자기소개)이 자주 쓰는 단어는 없다.
모든 문장이 숭늉처럼 단백하기에 질리지 않는 글들이 읽은 문장을 되뇌이게 만들었다.
이건 시가 아니다.
이건 산문이다.
그럼에도 곱씹게 만드는 글. 이게 에세이지.
어영부영 내는 글이 아닌, 이런 글이어야 한다.
가슴속에 뭔가를 끓게 만드는 것이 아닌, 나도 몰랐던 감정을 느끼게 하고, 내 감정을 살 필 수 있게 하는 글.
🌊작가가 말하는 풍경을 내가 경험한 적이 있는지 찾고, 작가의 섬세한 감정에 내 감정을 살포시 입혀 볼 수 있는 글.
🌊감정에 호소하지 않는 글. 에세이를 통해 들끓었던 마음을 치유하고, 그 글로 인해 버린 눈을 씻은 기분이다.
🌊작가는 순식간에 자신의 생각의 공간으로 나를 잡아끌었다.
📖첫문장
내일부터 비가 내릴 것이고 앞으로 사흘 내내 올 것이므로 초여름 땡볕에 축축 처진 수국 잎사귀들을 그래도 두고 말린다.
📖.37
나도 안다. 그는 크고 잔잔한 물과 같은 사람이며 우리는 완전히 반대의 인간인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나는 그의 곁에 있을 때 호흡할 산소와 평온을 얻는다. 붉게 달궈진 나는 그의 품 안에서 겨우 식는다. 심장박동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모든 불쾌한 신체적 증상이 점차 옅어진다. 그가 일러주는 말들이 마법처럼 내 안에 작용하면 다시금 힘을 얻어 뭍을 향해 헤엄친다. 푹 젖은 몸을 일으키는 동시에 쓰러지듯 누워버리고 겨우 다시 잠이든다.
📖.93
우리는 완성된 ‘둥지’라는 결과를 눈으로 보고 단순 이해할 뿐, 둥지를 이루고 있는 저 하나하나의 나뭇가지를 모두 별개의 노력으로 인식해내지는 못할 것이다.지금 허공에 쌓아 올리고 있는 우리의 허술하고 투박한 삶의 얼래. 누가 응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지켜봐주는 일도 없이 처음부터 삐뚤빼뚤 혼자 엮어나가야만 한다는 것이 어쩌면 자로 우리들의 삶이자 둥지이다. 지칠 만큼 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견딜수 없이 느린 듯이 보이지만, 아주 조금씩이라도 뭔가가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어주어야 한다. 우리가 완성하기 전까지 아무리 가까운 사람에게라도, 우리의 작은 시도들이 무가치해 보일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혹은 이해하면서.
내가 만약 글을 쓴다면 이런 글을 쓰고 싶다. 내 로망을 넣을 수 있는 글을 만났다.
자신의 감정을 독자에게 던지는 글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독자를 끌어들이는 진짜 에세이를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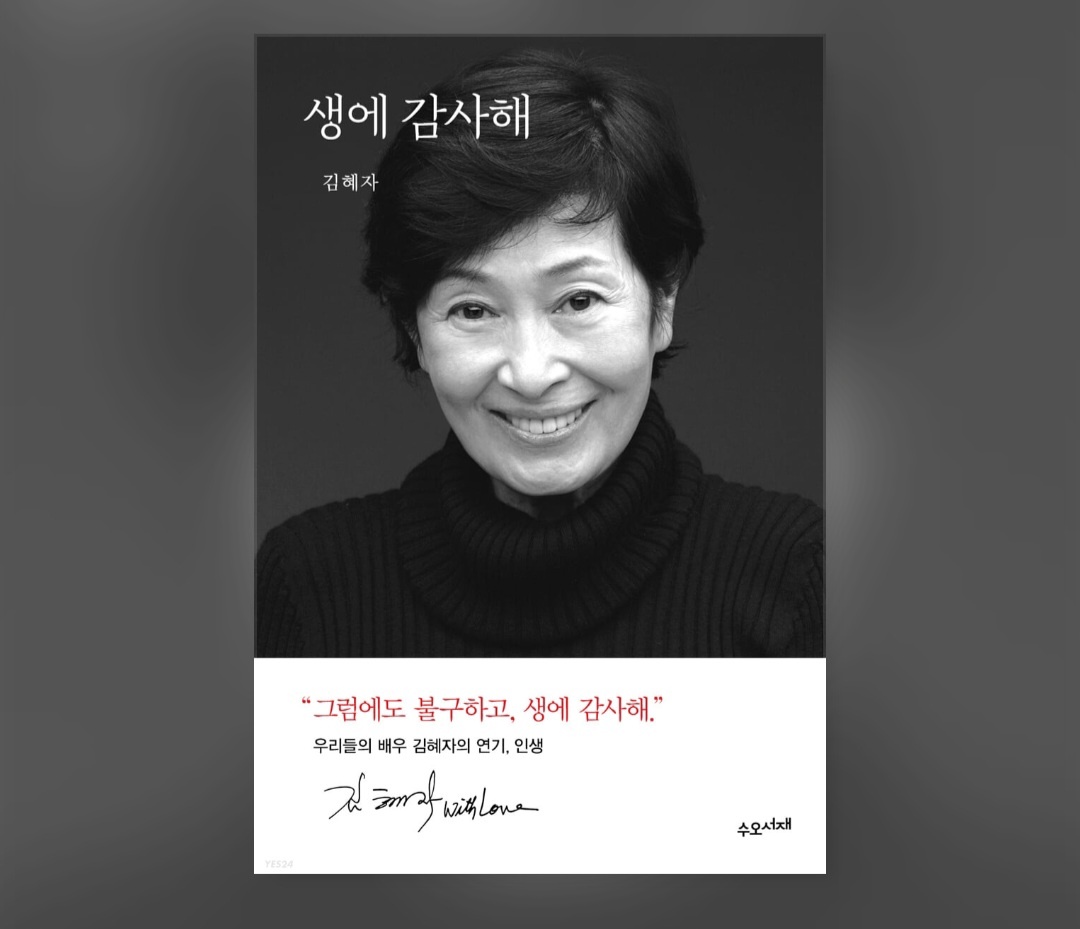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