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윗집에서 쿵쿵 대는 소리에 잠을 설쳐서 그런지 아직 시차에 적응하지 못해서 그런지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는데, 몸을 웅크리며 이불을 끌어올리는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생긴 거스러미가 살짝 벗겨지며 찌릿한 아픔을 주었다. 아주 커다란 고통이 아닌데 일상을 따끔 따끔 거슬리게 하는 거스러미.
나는 이 이름을 몇 년 전에야 알았다. 그 전까지는 '꺼시렁키'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아마도 엄마가 항상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나도 따라서 그렇게 불렀을 것이다. 언어라는 것은 아무리 사회적 규정이 있다 해도 내가 몸으로 배운 입말이 우선적일 수밖에 없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인데 사회에서, 특히 교육 시장에서는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마치 인간이 로봇처럼 입력하면 출력이 되는 것처럼 언어 교육을 시키곤 하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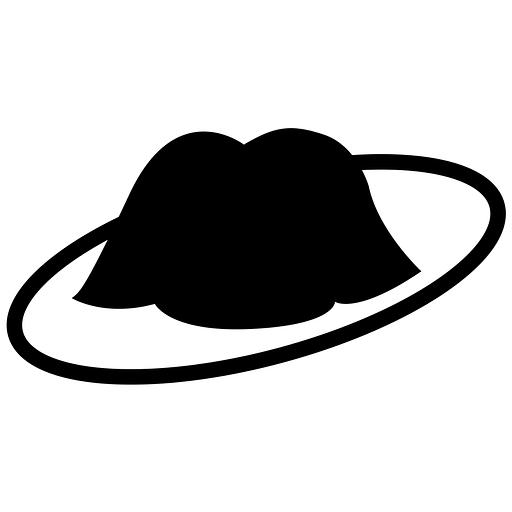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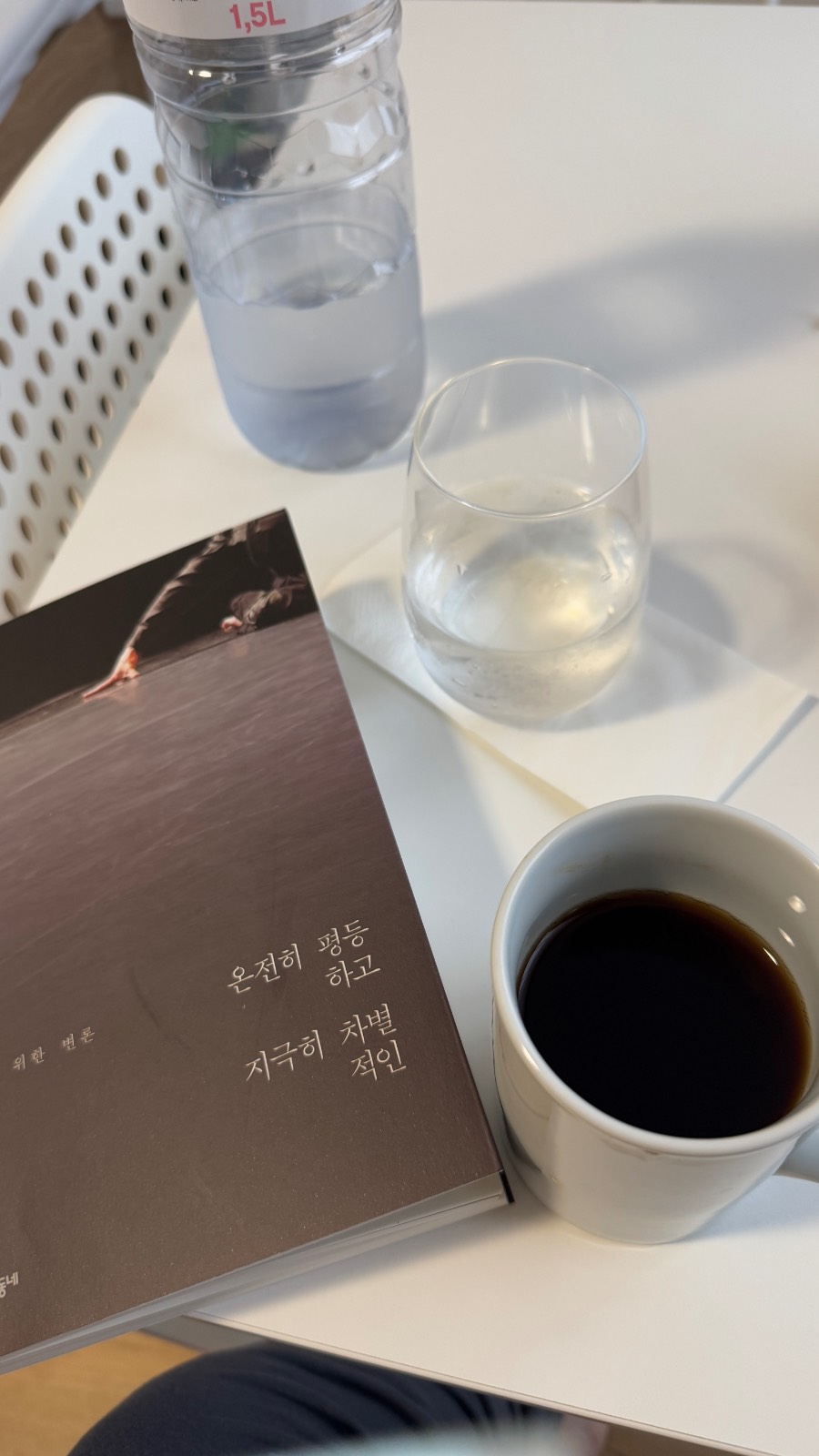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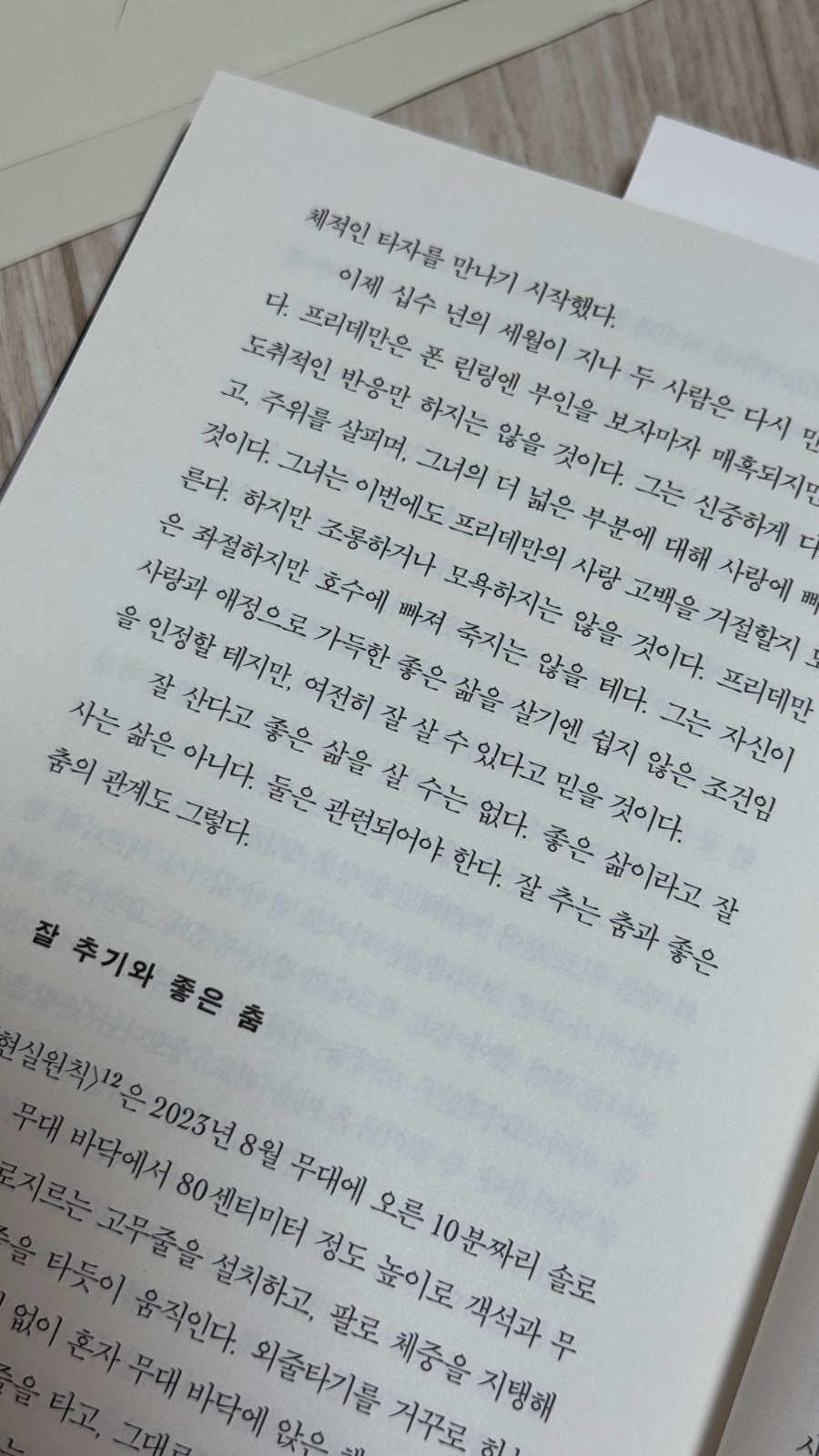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