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 도착하자마자 마주한 첫 관문은 고작 30kg짜리 캐리어 두 개였다. 하지만 그 무게는 어쩐지 세상 모든 짐을 얹어놓은 듯 느껴졌다. 한국이었다면 가족과 나눠 들었겠지만 이곳에서는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짐을 옮기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옷소매를 걷어 올리고 머리를 단단히 묶은 채, ‘해내야 한다’는 각오로 다시 힘을 냈다. 심기일전이 효과가 있었던 걸까. 도저히 들리지 않을 것 같던 캐리어가 마침내 수하물 카트 위에 자리 잡았다.
이 짐은 겨우 시작에 불과했다. 앞으로는 모든 걸 나 혼자 해결해야 했다.
공항 밖으로 나가자 홈스테이 가족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실 이 홈스테이는 나름 사연이 많다. 한국에서 숙소를 알아보다가 렌트비가 홈스테이 비용과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됐고, 현지 적응도 겸할 겸 홈스테이를 선택했다. 온라인으로 어렵사리 숙소를 구했지만 출국 일주일 전 돌발 변수가 생겼다. 원래 가기로 했던 집주인에게 사정이 생겨 다른 곳을 소개받은 것이다.
그렇게 새로 알게 된 홈스테이 가족의 집으로 향했다. 신원을 보증해 줄 사람도 없었기에 일종의 도박이었다. 혹시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그들은 좋은 사람들이었다. 긴장이 풀리자 피곤함이 몰려왔다. 지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누워 물끄러미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제 겨우 하루가 지났을 뿐인데 앞으로 남은 반년이라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길게 느껴졌다.
심란한 첫날밤이 지나고 다시 아침이 밝았다.
한국에서 미리 잡아둔 인터뷰 일정 덕분에, 캐나다에 도착한 지 이틀째 되는 날 회사 면접을 보러 갔다. 면접 결과는 꽤 긍정적이었다. 우선 3일간의 수습 기간을 거치며 서로를 알아보기로 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지만 한편으론 이렇게까지 잘 풀리는 게 오히려 불안하기도 했다.
면접이 끝난 뒤에는 '서비스 캐나다'라는 동사무소와 비슷한 곳으로 가서 PIN 넘버를 발급받았다. 이 번호는 캐나다 생활의 시작점과도 같았다. 구직 활동부터 은행 계좌 개설까지 기본적인 모든 활동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한 시간쯤 기다린 끝에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그런데 직원이 내 이름을 잘못 불러 순간 내 순서를 놓칠 뻔했다. "이 이름을 부른 게 맞을까요?"라고 확인 차 물었더니, 그는 자신이 잘못 불렀다고 사과하며 내 이름을 최대한 정확히 발음하려 애썼다. 정작 나는 아무렇지 않았지만 그가 진심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럴 때 보면 정말 파워 F가 맞는 것 같다.) 덕분에 외국 친구들의 이름을 부를 때 나도 대충 발음하지 말고, 정확한 발음을 확인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모든 이의 이름은 소중하니까.
하나 TMI를 더 말하자면 그날 마트에 간 김에 김밥을 사려고 들렀다가 뜻밖의 교회 스카우트를 받았다. 하루 만에 재미있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이어 벌어졌다. 한국에서였다면 그저 지나쳤을 평범한 하루가, 캐나다에서는 왠지 새롭고 특별하게 다가왔다. 낯선 곳에서 맞이한 작은 변화들이 웃음 짓게 했고 묘한 설렘을 안겨줬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캐나다에서도 외국에서도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때의 나는 세상이 내 편이라도 되는 듯 꽤나 자신만만했던 것 같다.
다가올 고난은 까맣게 모른 채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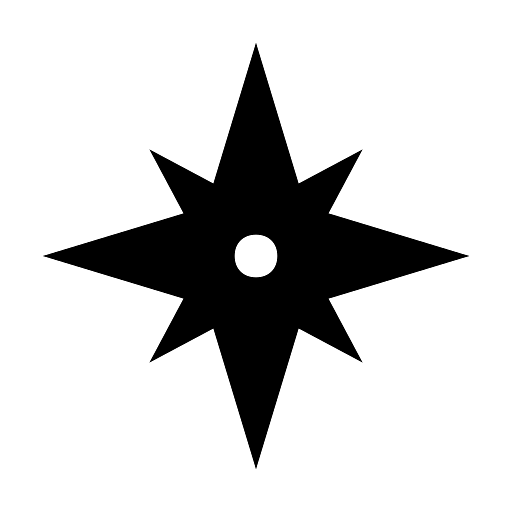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