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귀국 후 첫)주말을 맞아 CD장을 정리했습니다. 꽤 미뤄둔 일입니다. 전문 음악인이 되어야겠다 생각한 18살 때부터 틈틈이 CD를 사모았습니다. 고백컨데 그다지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관심이 있는 아티스트가 생기거나 특정 장르를 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때면 한 장씩은 사서 여러번 돌려듣곤 했습니다.
CD 구매에 열을 올리게 된, 기억속에 선명한 한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음악을 하면서 가까이 지냈던 친구 한명이 우리집에서 자게 되었는데 자연스럽게 저는 머리맡에 있던 카세트 플레이어를 재생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잠들 때까지 음반 한 장을 들으며 잠들던 버릇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거 팻 매스니인가?" 라고 묻더라구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음악을 전부 외우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날 이후로 더 많이 사고, 더 많이 들었습니다. 기억 속 어딘가에 이 음악들이 다 저장될거라는 믿음으로요.
재즈에비뉴를 위시로 뮤지션보다는 산업 종사자에 가깝게 되니 아티스트께서 CD를 보내주시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음반과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어딘가에 리뷰를 쓰지도 않았기에 다소 의아했는데 점차 그 양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음반들이 그냥 사라지지 않도록 무언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스도 만들어보고, 플레이리스트도 제작하면서요. 제 콘텐츠가 구매 촉진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제 기억속에는 많은 앨범들이 저장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일전에 소리의나이테 송미호 대표님과 인터뷰를 갖기도 했는데, 그날 이후로 대표님은 저에게 철마다 신보 앨범을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음반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끔씩 CD장을 정리할 때면 '이번엔 어떤 순서로 정리하지' 하는 생각에 빠집니다. 앨범 커버의 색깔을 따라 그라데이션으로 배치해두기도 하고, 어떤 날엔 손이 많이 가는 순서대로 놓기도 했습니다. 저는 CD장이 없어서 책장에 CD를 보관하는데 세로로 쌓아올리면 더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어 언제부터인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몇 년 전에 받아온 클래식 CD더미는 최하단에 가로로 보관하고, 그 위로 제가 구입했거나 자주 들었던 음반들을 세로로 쌓아올렸습니다. 그리고 선물 받거나 최근 구매한 음반들을 다른 층에 넣으면서 앞으로 채워질 음반들의 빈 공간을 넉넉히 확보해두었죠.

종종 공부 하기 전에 책상 정리부터 하는 사람이 있는데(그게 바로 저에요), 그러다보면 과거의 재미있는 추억이 담긴 사진이나 일기 따위에 빠져들기 마련이죠. 저 역시 앨범 커버만 스쳐지나가 보고도 이 앨범이 어떤 경위로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 모든 것들이 기억나더라구요. "이건 내가 생전 처음 구매한 음반이군(Miles Davis - Round Midnight)", "이 아티스트 참 좋아했는데.. 서재페에서 이 음반 공연 하기도 했는데 참 멋졌어(Esperanza Spalding의 [Emily's D+Evolution]). 그래서 몇 장 사모았지" 라거나... 칼이 없어서 열쇠로 비닐을 벗기려 했던 바람에 커버가 상한 Jim Hall의 [Concierto], 알라딘 혜화점에서 친구와 같이 갔다가 구매한 Manhattan Transfer의 [Vocalese] 같은 것들 말이죠.
심지어 Diana Krall의 [Glad Rag Doll]은 빈티지 사운드에 관심이 가는 요즘 '다시 찾아봐야지' 생각했던 음반이었기에 반가운 마음에 곧바로 재생했습니다. 이 노래 다음에 어떤 노래가 나오는지도 알고 있고, 즉흥 연주 라인도 똑같이 흥얼거리는 저의 모습에 살짝 놀라면서... 아무리 스트리밍으로 여러번 들은 음악도 CD로 들었던 음원만큼 기억에 오래 남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기분탓인가? 그렇다면 오늘 구매한 CD를 여러번 들어도 과연 그럴런지...' 생각도 살짝 스쳐갑니다.
그런데 CD를 정리하다보니 퍽 난감한 일이 하나 생겼는데, 과거에는 플라스틱 케이스로 규격화된 음반이 대부분이었는데, 근 몇 년동안 구매하거나 선물 받은 음반들은 종이 케이스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의식도 있거니와 CD제작비를 아끼고자 하는 아티스트들이 플라스틱 케이스보다는 종이 케이스를 사용하면서 벌어진 현상이겠습니다. 덕분에 다양한 사이즈의 음반이 출시되었다는 장점도 있어 이러한 변화에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종이 케이스 CD는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색도 바래고 모양도 변해버립니다. 여기저기 눌리고, 찌그러지고, 쌓아놓아도 예쁘지 않게 되죠.
물론 그렇다고 음악이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뮤지션들이 공들여 만든 음반의 형태가 예쁘지 않게 변하는 것은 저로서도 다소 속상한 일입니다. 더욱이 세로로 쌓아두다보니 무게 때문에 눌릴 수 밖에 없겠지요(가로로 두어도 변형이 생기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궁여지책으로 플라스틱 케이스의 CD는 하단에 두고, 종이 재질의 CD는 최대한 위쪽에 얹어두었습니다. 오와 열을 정확히 맞춘 플라스틱 더미와 달리 페이퍼 커버 음반들은 삐뚤빼뚤 치열이 고르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제 딴에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번 CD장 정리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중복된 음반을 분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끔 제가 참여한 음반을 더미로 받거나, 음반을 보내실 때 여러 장을 보내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사실 아티스트 입장에서 자신의 방 한켠을 차지하고 있는 CD는 은근히 귀찮은 존재입니다. 마치 엄마 뱃 속에서 나왔지만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그런 이치랄까요. 꽤 많은 제작비를 들여 만들었지만 수익 회수와는 별개로 그것을 덤프하고 싶어하는 자연스러운 심리적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장을 보내신게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또는 저희 회사의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들으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혼자 일하긴 하지만).
모쪼록 제 입장에서도 중복된 CD는 처치 곤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정된 책장 공간을 비우기 위해 두번 읽을 것 같지 않은 책들은 바로바로 나눔해버리곤 하는데, CD는 책과 달라서 말이죠. LP처럼 훌륭한 디스플레이 장치가 되어주는 것도 아니고, 요즘엔 차에도 CD 플레이어가 없이 출시됩니다. 그러니 CD를 드리기 전에 CD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있는지를 물어보는게 예의가 되어버린 시대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음반은 아티스트가 판매할 수 있는 최고의 굿즈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거창한 표현으로 존재의 이유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공기 중에 떠다니는 꽃가루와 같은 음악이 그들의 마음에 들러붙어 수정되고, 새로운 음악을 잉태해 출산하는 일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법칙과도 같은 것입니다.
조용히 CD장을 정리하다보니 별 생각이 다 들면서도 즐겁네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음악은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의 앨범인데, 이런게 있었나 싶은걸 보니 지인이 버린다고 내놓은 CD더미에서 주워온 것들 중 하나인가봅니다. 느긋한 쿠바의 리듬이 오늘의 날씨와 참 잘 어울립니다. 먼지를 조금 마셨으니, 점심은 쌀국수로 해야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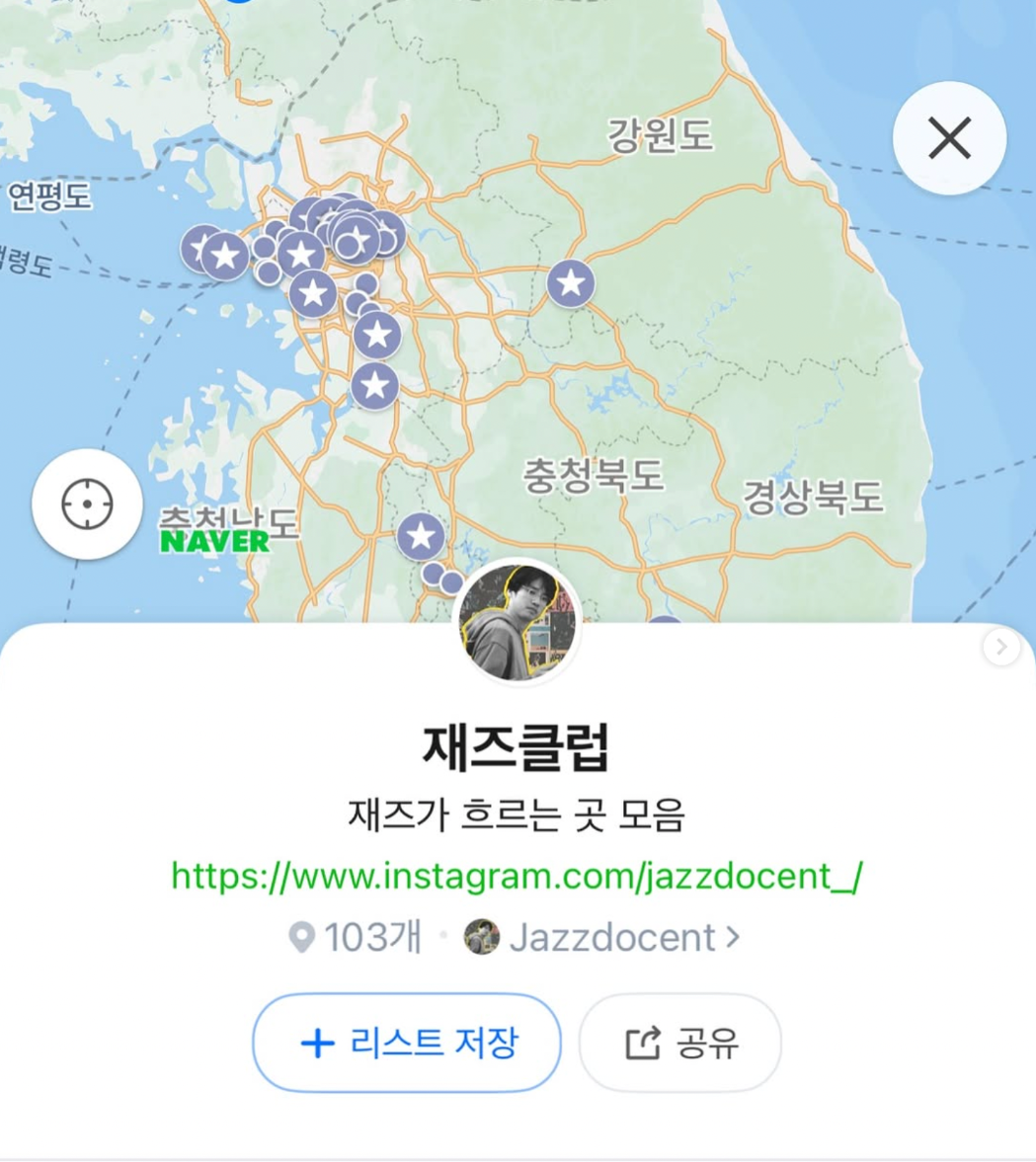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