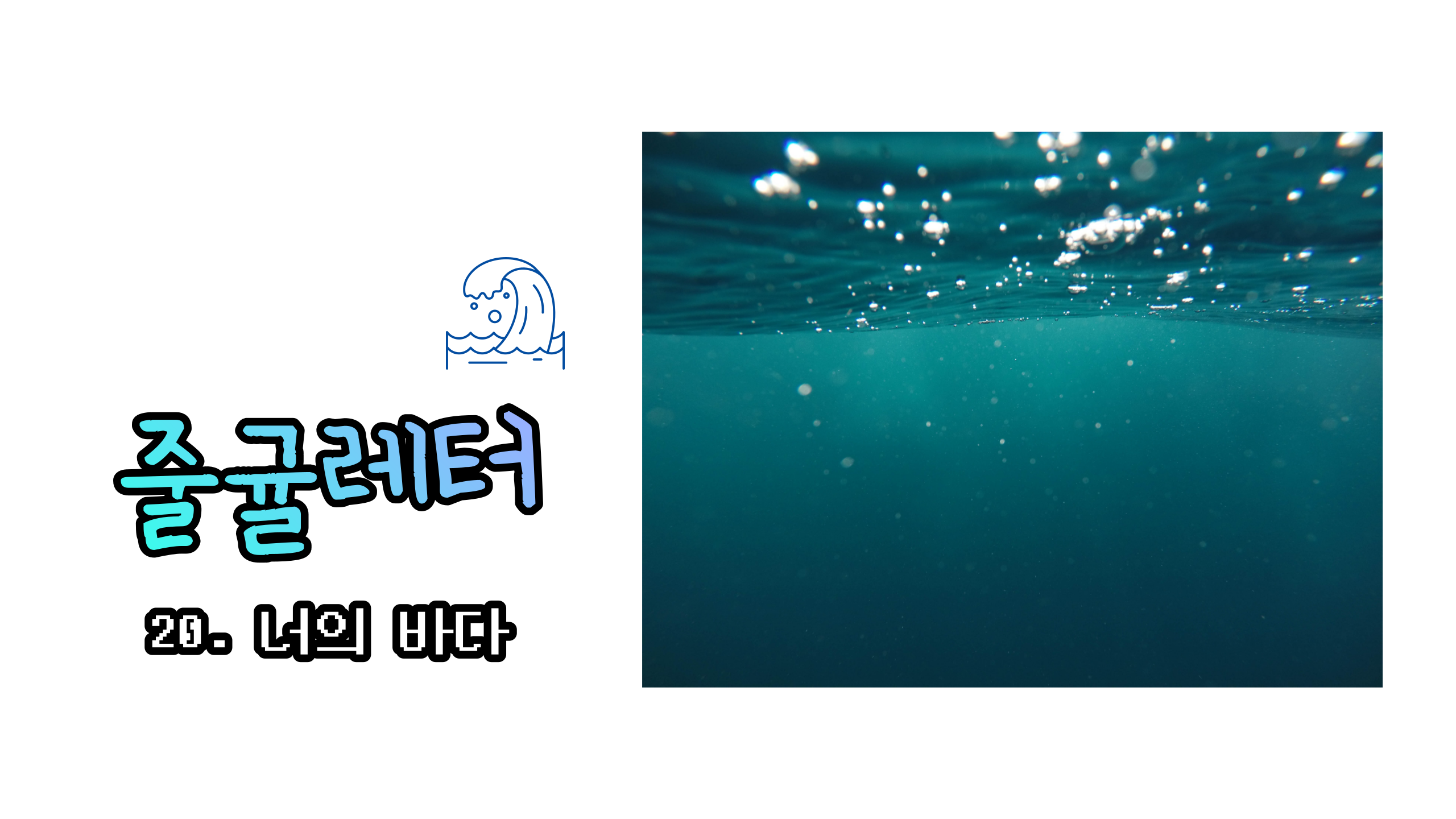
<너의 바다> 中
네가 오래 그리웠어. 긴 밤을 가로질러 시계침이 나를 관통하는 동안 넌 어디에 있었어?
흰 벽에 일렁이는 불빛을 멍하니 보곤 해. 물결처럼 일렁이는 불빛에 네 얼굴이 스쳐가고 울렁거리는 눈코입에 멀미하듯 메슥거리는 속으로 눈을 감으면 시커먼 어둠마저 요동을 쳐. 현실인 듯 상상인 듯 실재하는 듯 허망한 듯 너는 내게 그래.
그러나 저마다 고단함을 감내하게 하는 풍경이 있지.
나는 한때 공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연시를 대거 양산했었다. 그때 쓴 시들을 보면 다소 자기복제와 감정과잉인 모습이 눈에 띈다. 지금은 시작에 게으르기도 하고, 감정의 가지를 많이 쳐낸 뒤 쓰고 있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사랑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겠다. 그럼에도 간혹 어지러운 밤이 있다. 작년 가장 잘 산 아이템 중 하나인 ‘오로라 무드등’을 켜둔 채 천장을 멍하니 보노라면 묘령의 얼굴이 떠올랐다. 적정 주기로 반복되는 애정 활동(?)을 하지 않으니 주기적으로 심란한 시기가 찾아왔다.
여기서 말하는 ‘묘령의 얼굴’이란 내가 사랑했을지도 모르는, 말 그래도 익명의 얼굴이다. 마땅히 사랑에 빠지던 과거의 내가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떠올리던 얼굴들 중 하나이거나 목록의 끝에 추가될 예정이었던 것. 그렇다보니 간혹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가뜩이나 로맨스/연애 관련 미디어가 쏟아지는 우리나라의 일개 국민으로서 너무나 필연적인 감정이다.
그러므로 나는 사랑에 관해 아주 오래토록 번민해 왔다. 최근에는 사랑의 개념을 ‘연대감’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일상을 잘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찾아드는 안온함과 활력을 나는 감히 사랑이라고 부르고 싶다. 그 ‘사랑’은 나 또한 일상을 씩씩하고 꿋꿋하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준다. 잘 살아내는 일상이 모여 흘러가는 시간이 되고, 그 시간이 모여 또렷한 미래의 어느 지점에 데려다 줄 것을 믿는다. 살고 싶게 하는, 그것도 잘 살고 싶게 만드는 그 힘이 바로 궁극적인 사랑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을 자주 하고 있다.
여전히 시를 쓰는 일은 어렵다. 어렵다는 건 역시 잘 하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지독하게 빠져 살던 과거의 사랑으로부터 나의 시는 태어났으므로, 현재는 머물 곳을 잃고 헤매는 중이다. 그러나 새롭게 찾은 보금자리에 금세 정착할 것을 믿는다.
💌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저부터도 감성이 그리워 오랜만에 시세이를 들고와 봤습니다.
부디 하루의 마무리를 저의 글과 함께 잘 하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심심한 목요일에 까먹을,
줄귤레터🍊

![[줄귤레터] 19. 밸런스 게임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202210/julgyool/1666232013760366.jpg)
![[줄귤레터] 휴재 공지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202211/julgyool/1667263813874820.jpg)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