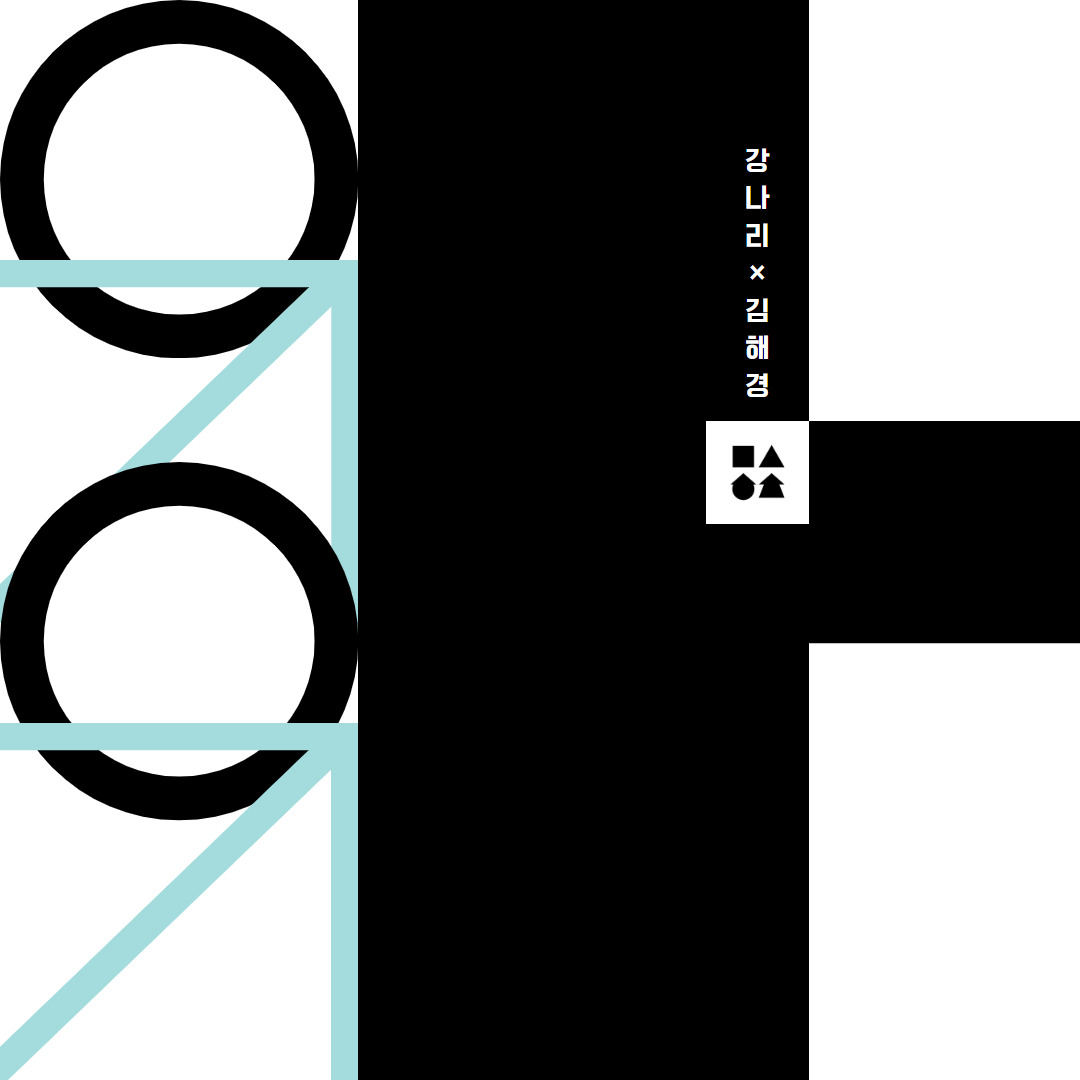
[두 번째 빵꾸]_강나리
여기저기 스며 흐르다 보니 물이 되었다. 꽤 오래 이어진 겨울에 결국 얼었다. 내 몸은 온통 여섯 각의 동그라미. 하물며 얼은 물의 결정조차 여섯 개의 각이 있다. 게다가, 유사과학을 빌려 보자면, 물에게 좋은 언어를 들려주면 예쁜 정육각형의 결정을 나타낸다고 한다. 믿거나 말거나. 동그랗게 방울졌던 물 안에 각을 세우는 것은 한파 혹은 사랑이다. 걸을 때마다 버글버글 부딪히는 정육각형들이 어지럽다.
나이에 비해 성숙한 사람을 높이 평가하고, 한평생 함께한 자기 자신을 잘 알지도 못한 채 사랑 받고자 하고, 해석이 불가능한 타인의 언어에 쉬이 분노하거나 좌절하는 일은, 본능이라 부르기 전에 내가 무엇을 소홀히 했는지 생각해 볼 지점에 다다랐다는 뜻이다. 가령 늘 과묵한 사람만을 추앙하며 이 사람이야말로 뭔가를 알고 있을것이라 판단한다면, 스스로 가까운 이와의 언어 생활을 미워하고 있다는 뜻이다. 사랑 받고자 하는 욕심은, 초 단위로 불어나는 내 안의 수수께끼를 몇 문제 풀지도 못한 채, 심지어 거울을 볼 시간도 얼마 안 되는 하루를 보내는 우리의 삶에 거대한 신기루를 띄워두곤 시키지도 않은 고행 길에 오르게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타인의 언어의 존재 연유는 길가의 돌멩이보다 미지수이다. 그야말로 예측과 해석을 불허하며 불가한, 어떤 물체, 맞닥뜨린 자연물이다. 이 사실이 우리를 조금은 편하게 해준다.
5월이 갔고 어떤 것들은 밀려오며 나는 엉덩이 붙이고 보따리 풀 새도 없이 바삐 움직였건만, 손을 열어보니 출처도 알 수 없는 나뭇잎 한 장이 눅눅하게 구겨져 있을 뿐이었다. 벌자고 한 건 아니었어도, 입을 다시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낡은 허탈함에도 내성이 생긴 난 오는 것들의 동그란 얼굴과 세모난 칼보다 가는 것들의 희고 네모난 등이 좋아졌다. 오는 때 굽은 무릎을 펴고 에그그, 일어나는 것보다 가는 때 비스듬히 앉아 오후의 파도처럼 손인사 흔들 때가 좋다. 어쩌면 5월은 오는 것이 유독 많은 달이었다. 뻑적지근한 무릎을 이제는 좀 쉬어야 할 때가 된 것도 같 같은 기분이 든다. 무엇이 가려나. 등이 유독 흰 것들만 가면 좋겠다.
[쪼그리고 앉아서]_김해경
쪼그리고 앉아 있으면 누군가 그 뒷모습을 보곤 "육각형"이라고 말할 것만 같다. 견고한 외로움이라고 말할 것만 같다. 어제 마신 술이 아직도 안 깨는 걸 보니 알콜의 결정은 오르페우스의 리라인가 보다. 괴롭다 못해 흥겹다. 외롭다 못해 절정으로 치닫는다. 쪼그리고 앉아서 바라보는 나의 사타구니 안에는 여름의 뜨거운 햇빛조차 허용하지 않는 고드름이 땅에서부터 거꾸로 자라나고 있다. 카지노에 가본 일은 없지만 베팅을 하기 위한 칩이 수북하게 쌓여있는 꼴 마냥 누군가에게 인생을 걸어본 일 없는 "육각형"들이 표정도 없이 작고 큰 산을 이루는데.
"나이에 비해 성숙한 사람을 높이 평가하고, 한평생 함께한 자기 자신을 잘 알지도 못한 채 사랑 받고자 하고" 우리는 또 무얼 잘못했을까. "해석이 불가능한 타인의 언어에 쉬이 분노하거나 좌절하는 일" 말고도 우리는 또 무얼 잘못 해왔던 걸까. 글을 쓰는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끼치는 일이라 생각했을 때, 나는 우리가 조금은 더 서로를 생각하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는 것들의 동그란 얼굴과 세모난 칼"이 아닌 "가는 것들의 희고 네모난 등이 좋아졌다"고 말하는 저 사람처럼 사랑을 받으려 오는 사람들보다 사랑을 주다가 돌아선 사람들을 위해 내 버선발을 내주는 일이 중요한 요즘이다.
어쩌다가 작별하는 일에 우리는 이토록 인색해진 걸까? 쪼그리고 앉아서 사타구니 안으로 깊게 패인 구멍을 바라보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 둘 켜지기 시작하고 태양의 목덜미를 쓰다듬는 산세와 저녁보다 먼저 온 빌딩의 거대한 그림자들이 뒤섞인다. 그 사이사이를 걸어다니는 우리의 동족들을 바라본다. 저 외로운 검은 점들. 한 번은 스쳐 지나간 인연이었을지도 모를 무명의 존재들을 바라본다. 일어선다. 엉덩이를 털고 나도 그들과 비슷한 모양이 된다. "네모난 등"이 된다. 우리가 각자 가졌던 집으로 돌아갈 때, 그래도 네 이름을 생각할게. 몇 번, 소리치면서 응원가처럼 불렀던 네 이름을 기억할게. 이 또한 메워지지 않는 구멍일 테지만 오늘은 불을 켜 볼게. 그러면 흩어져 있던 우리의 뒷모습들이 환하게 서 있을지도 모르니까. 안아줄 순 없지만 부정하지도 않을게. 작별의 모양을.
- 아자아자! 힘낼 때 쓰는 말. 그리고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을 때 쓰는 말. 강나리 작가의 글은 때로 침묵보다 더 침묵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으로 와닿는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저는 앞으로 강나리 작가의 열혈한 독자가 되어 매번 리뷰를 할 생각입니다. 에세이와 리뷰. 새로운 방식의 글을 읽고 싶으시다면 물성과 해체를 찾아주세요. 새로운 연재, <아자아자>였습니다.
- 강나리 : 식물학을 전공했다. 사람은 모두 얽혀 있고, 그 어디에선가 꽃처럼 사랑이 발생한다고 믿는다.
- 김해경 : 물성과 해체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산문집 『뼈가 자라는 여름』(결, 2023)을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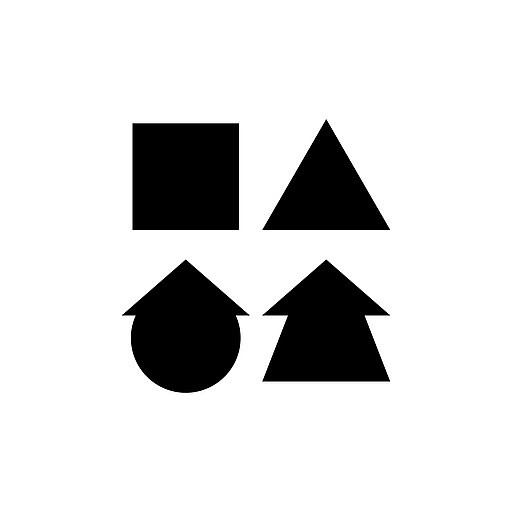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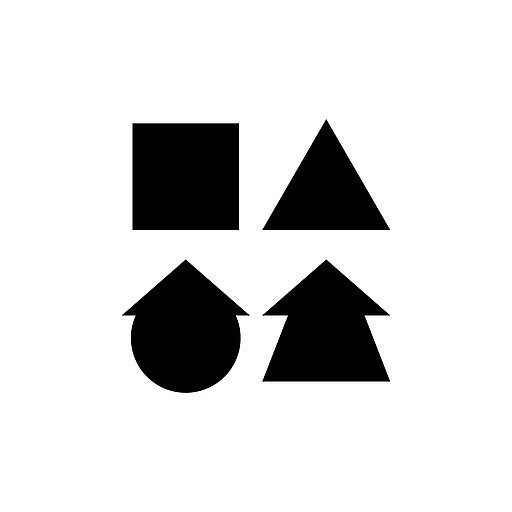
![[강나리와 김해경] 아자아자, 하나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202405/1716233599683197.jpeg)
![[박건] 사선에서, 다섯 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pa4giv30q8lntwbhr192877e9v2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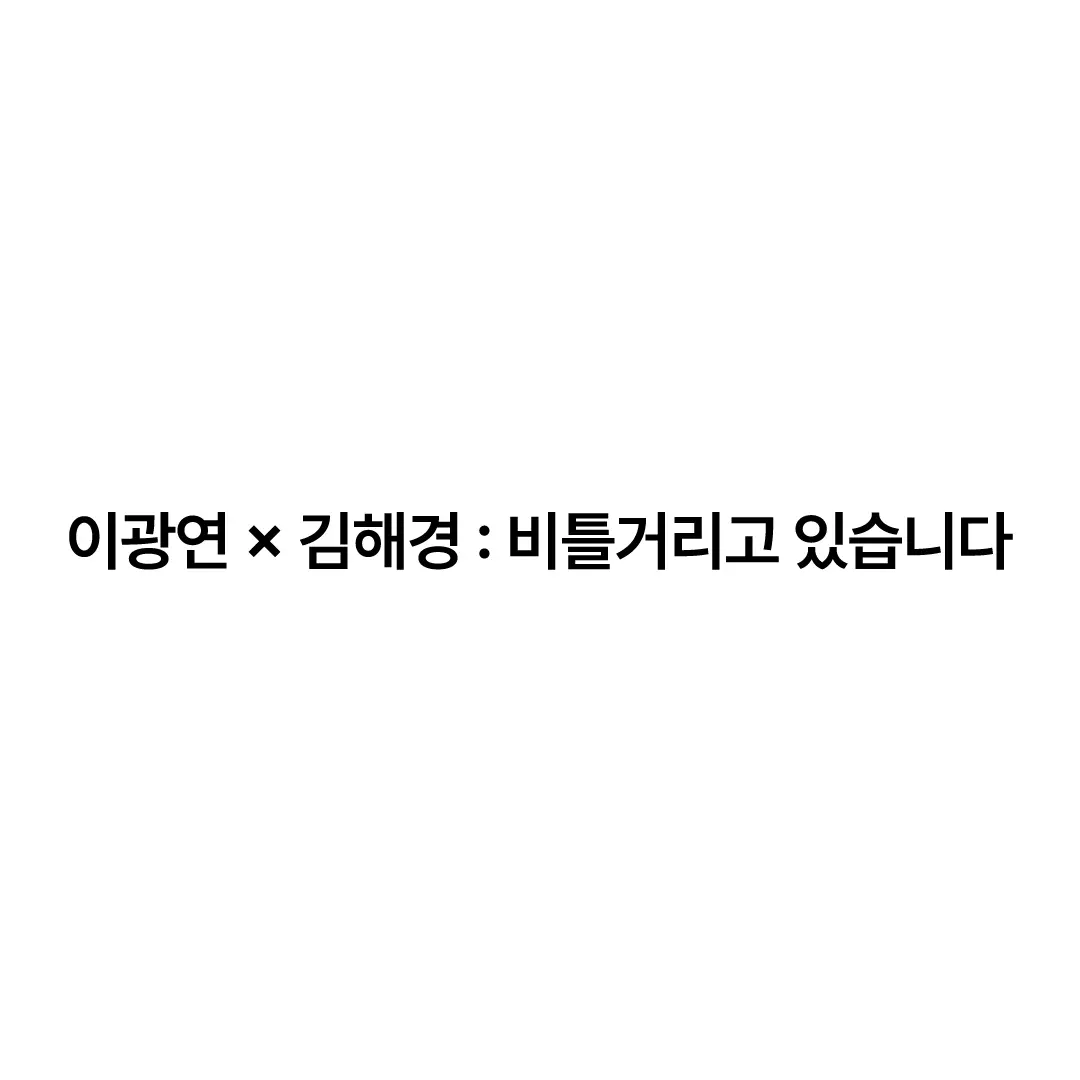


![[김해경] 라이팅룸 101호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r1qyv23ad7ug60982t919d03au22)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