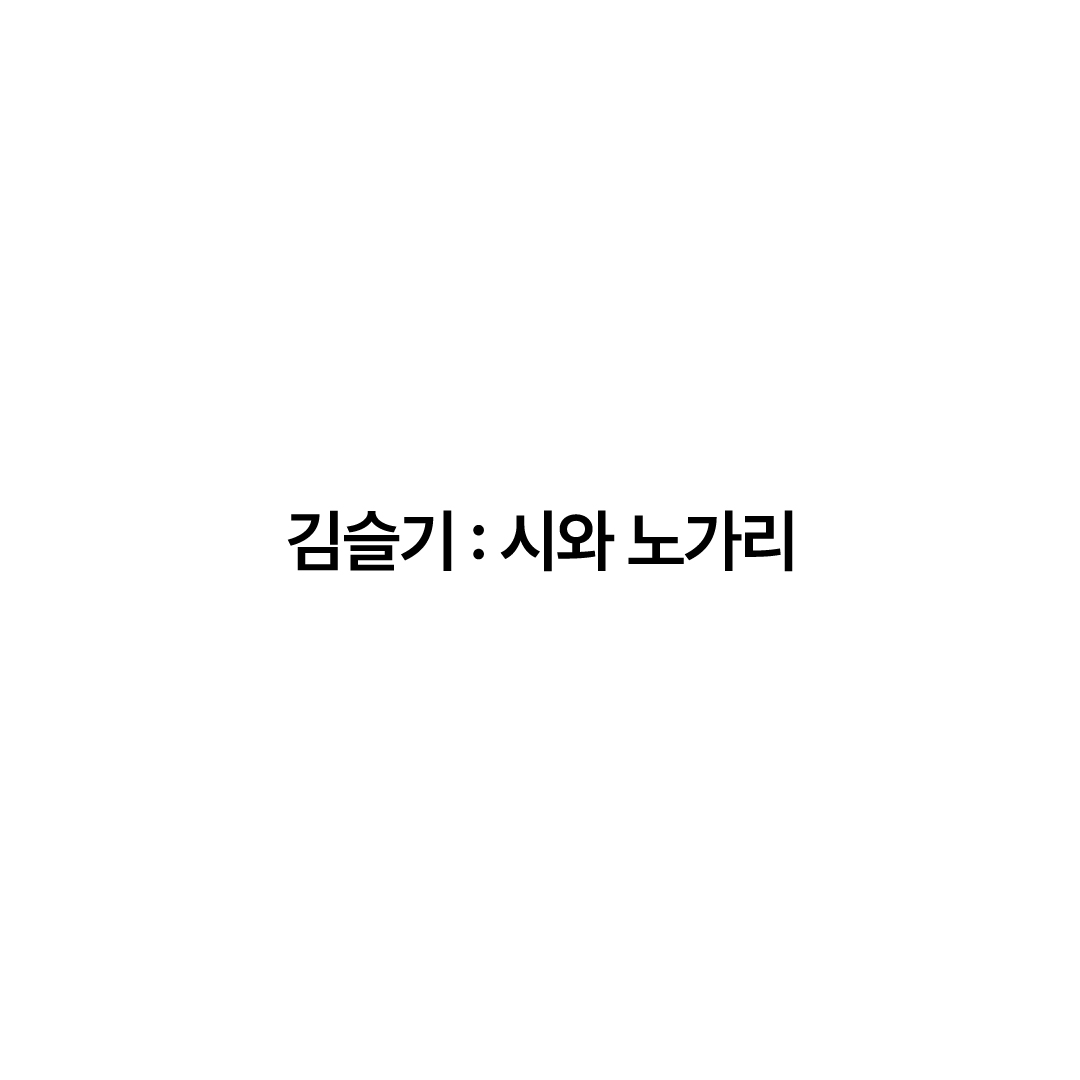
우리를 키웠던 시작은.
나를 키운 건 팔 할이 목소리였다.
자화상. 미당 서정주 선생님의 문장.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거나 인용해봤을 문장을 나 또한 천진히 따라 적어본 적이 있다. 선생님께서 그 문장을 적었던 나이가 스물 셋. 폭력과 격정과 울분의 시대에 적힌 문장의 무게를 내 것과 비교하기엔 부끄럽지만, 자기 초상을 그리는 부끄러움과 무게는 시대와 장소를 불문한 가르침 같다. 말하자면 부끄러움의 역사와 서사. 나도 그 디딤돌을 천진히 밟으며 나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젯밤에는 경이와 날벼락같이 시집 이야기를 했다. 관례나 형식도 없이 읽고 싶은 시를 읽고, 시인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하고, 또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 시인들을 허락도 없이 동석시켜 놓고서 속된 말로 노가리를 깠다. 어떤 시를 읽고서 경이는 ‘그냥 와서 때리는 것에 정신을 못 차리겠다’라는 말을 했고, 그 말에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스트레이트 펀치를 좋아하니? 카운터 펀치를 좋아하니? 언어를 ‘때린다’로 빗대어 말한 경이에게 물었고, 아무래도 그는 스트레이트 펀치를 나는 카운터 펀치를 좋아하는 편으로 결론이 났다. 자리를 파하고 혼자 생각해 보니 경이가 ‘때린다’로 빗대었던 그것은 내겐 주먹질보다는 목소리였다. 언어라는 방 안에서 메아리로 울려 퍼지는 외침 혹은 속삭임의 목소리.
갓 스무 살 성인이 되었을 때, 만 원으로 일주일을 행복하고 배부르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다. 여러 가지 실험과 가설들을 세웠고(그중 실패하여 폐기된 실험도 있지만) 가장 성공한 사례의 실험은 산책과 책 사기였다. 산책은 아마도 인류가 가진 최고의 무형자산이기에 군말이 필요 없겠지만, 오래 걸으면 걸을수록 입에 넣을 무언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유일한 단점이었다. 아무래도 조금 덜 허기진 것이 필요했다. 그런 궁리를 하며 읽고 있던 책을 뒤집어 가격을 봤더니 육천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있었다. 자장면 한 그릇과 별다방 라떼 커피의 가격이 딱 그 정도였다. 나지막이 혼잣말을 했던 것 같다. 미친.
균일가로 책정된 시집 한 권이 대략 육천 원, 300페이지 정도의 장편 소설과 산문집이 만 원 하던 시절이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동네 서점으로 가서 만 원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을 샀다. 소설이나 산문집을 사면 굶주림을 조금 감당해야 하니 되도록이면 시집을 샀다. 시집 한 권을 사면 딱 담배 한 갑과 간식거리를 살 정도의 돈이 남았다. 일주일, 그마저도 여운이 길면 한 달 내내 육체의 허기를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게 있다니. 그건 꽤 혁신적인 발견이었고, 시집을 쓴 시인들에게 감사의 큰절이라도 올리고 싶었다. 커피 한 잔의 값으로 이런 시를 읽게 해주시다니요. 황송합니다, 황송합니다라고 중얼거리며.
다시 생각해 보면 내가 느낀 허기는 육체의 허기 뿐만은 아닌 것 같다. 그건 가난과 외로움에서 나오는 모멸감이 똘똘 뭉친 꿈의 허기였던 것 같다. 하고 싶은 건 많았고 주머니는 얇았다. 나는 나를 꾸준히 키워서 어딘가로 닿게 해 줄 무언가가 필요했고 그것이 없을 때는 야금야금 스스로를 갉아먹었다.
야금야금 스스로를 갉아먹던 날들을 떠올리면 어렸을 적 만화로 봤던 에리식톤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자기 자신을 먹어 치우고는 이빨만 남아 딱딱 거리던 남자. 나 또한 그랬지 않을까. 야금야금 먹어 치우다가 비관과 원망의 이빨만 남아 ‘나였던 것‘으로 기억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다행히도 내게는 목소리가 있었다. 외침과 속삭임으로 굶주림을 달래고 보듬어주던, 때론 곁에서 함께 곡기를 끊어주던 낙관과 위로의 목소리.
시집 안에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고, 그 모두가 선생님이었지만 나는 ’하자, 와라, 가라‘라고 말하는 명령조의 가르침보다는 ’해줄래요, 와줄래요, 가줄래요‘의 권유의 속삭임들이 좋았다. 어떤 시를 읽으면 솜털들이 뻗치거나 등골이 서늘했다. 속삭임은 비밀스러운 동사이자 가볍고 부드러운 소리의 야한 어루만짐이다. 그것은 외침보다 가깝고, 침묵보다는 조금 멀다. 그 어루만짐들에 공명했다. 연인처럼, 혀 끝으로 설득하고 권유하고 간지럽히는 목소리들이 좋았다. 나는 거부를 즐기는 사람이고, 그 당시 삶의 선택권이 많이 없었던 내게도 속삭임의 시들은 몇 가지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줬다. 그것이 나를 키우는 목소리의 힘이었다.
나는 경이와의 노가리에서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어렸을 적 읽었던 것들을 다시 읽으면 알 수 있다. 내가 자주 기울이는 마음들, 쓰는 표현들, 세상을 바라볼 때의 부끄러움들, 그리고 그것을 딛고 나가는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것저것 잘 비벼 먹었던 목소리들은 내 몸 안의 피와 살과 뼈가 되고, 설익은 장기들을 여물게 했다. 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그것은 내 문장을 읽은 이들에게 듣는 최고의 찬사고, 역시나 누군가에게 전하는 최고의 헌사다. 언젠가 경이에게도 그런 편지를 썼다. 묵은 시집의 갈피에서 네 목소리가 툭 하고 떨어져 나왔어. 그날 읽었던 너의 문장에서 네 목소리를 들었어. 나는 경이가 어떤 목소리를 먹고 자랐는지 알 수 있었다.
나를 키운 팔 할을 생각하면서 나머지의 이 할을 고민한다. 이 이 할은 무엇으로 채워 넣어야 할까. 오랜 숙제 같다. 미당 선생님은 ’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진 않으련다‘ 하고 선언하듯 외치셨지만, 나의 이 할을 고민하면 자꾸만 뉘우치게 된다. 배불리 먹었으니 토할 일만 남은 것 같다가도 나머지의 이 할이 부족해 욕심이 생기는 것이다. 그 순간에 조용히 눈을 감고 나와 나를 키운 팔 할들의 목소리에 다시 귀를 기울여본다. 그러면 들린다. 너의 몫이다. 다시 누군가에게 가만히 속삭여 줄 수 있는,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목소리의 디딤돌을 만드는 것은 너의 몫이다. 그런 핍진한 목소리가.
’만들어 줄래요’
나는 오늘도 부족한 이 할의 허기를 향해 조용히 속삭인다.
2022. 07. 10
° 약 1년 전에 기록했던 문장을 옮겨 놓는다. <물성과 해체>의 편집장인 해경과의 일화이자, <시와 노가리>의 근간이 되었던 기록이다. ‘한 번쯤은 짚고 넘어 가야지’ 했던 이야기와 마음을 연재 10회차에 남긴다. 10회차를 기념하며, 한편으로 부끄러움과 죄송함을 품으며 독자들께 감사를 전하고 싶다. 부디 늘 무사하고 안녕하길 바라며.

김슬기 작가의 <시와 노가리>는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진 노가리를 앞에 두고 술잔 대신 시집을 듭니다. 술 대신 시를 나눕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시에 취해 보는 건 어떨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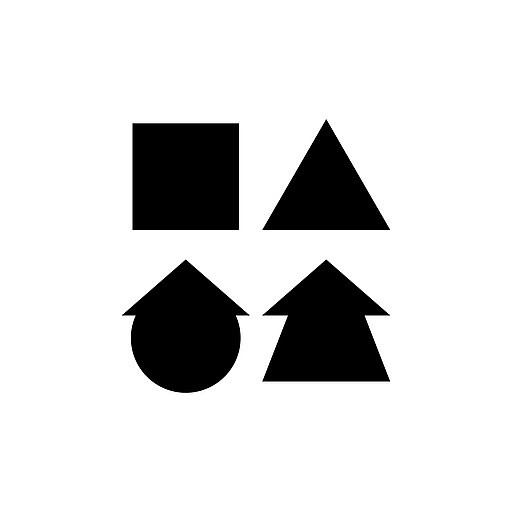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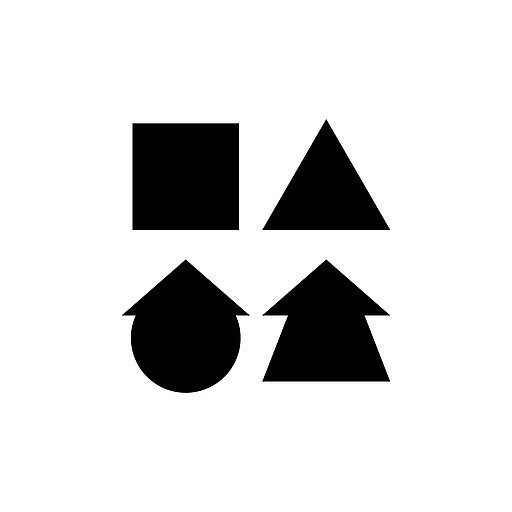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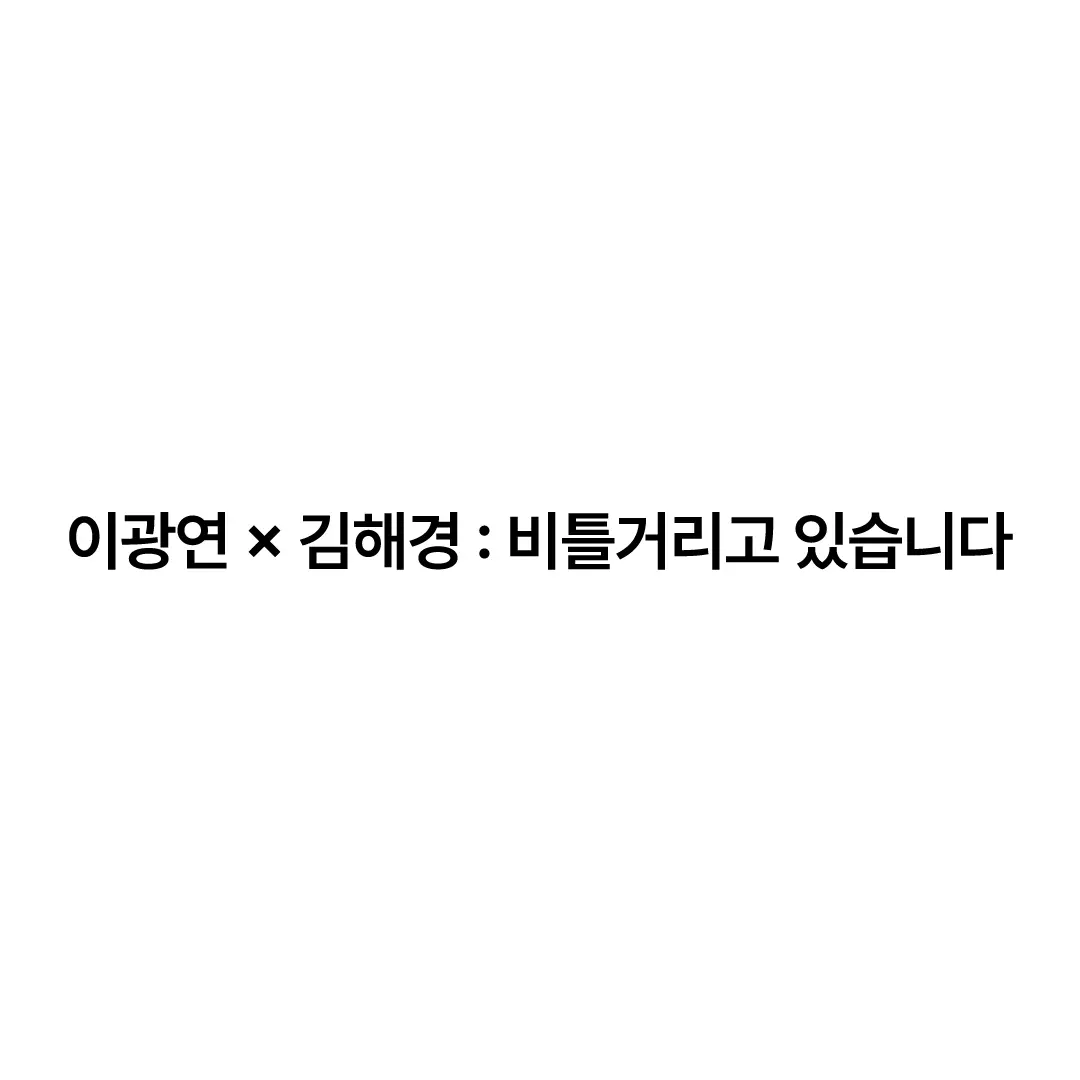


![[김해경] 라이팅룸 101호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r1qyv23ad7ug60982t919d03au22)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