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녀의 모든 노래가 아름답지만, 독백 같은 이 노래는 어떤 특별함이 있다.
숨기 좋아하는 그녀는 때로 빼꼼 고개를 내밀고 그녀다운 사랑을 노래하곤 하는데, 그 진정성은 다른 어떤 가수의 그것보다 깊이 다가오곤 한다. 그녀의 몇몇 노래들에서 그것이 돋보이는데, 어떠한 위로의 문장 없이도 가시 돋친 이들의 마음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곳에 불쑥 나타나 쓰다듬는다. 그러면 이들은 한동안 그녀 속에서 살 수 밖에 없게 되고, 귀에는 그녀의 목소리만 들리는 듯하다. 손 대면 부서질 듯 여린 그녀의 고독은 물을 머금은 듯한 목소리로 완벽하게 형상화되어 바다 깊은 곳에서 헤엄치는 듯하다.
온통 이해할 수 없는 이들 투성이라 투덜대던 내가
나 자신을 가장 이해할 수 없게 되기까지는
정확히 십 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구원을 주던 친구들을 원망하던 내가
구원을 주고 원망을 받기까지는 꼭 십이 년 정도 걸렸던 것 같다.
눈물도 웃음도 주체 못하던 어린 내게 다들 어찌 그리 냉랭했나요. 원망만 하던 나는 어느 새 그들이 남긴 숱한 잔상과 닮아 있다. 함부로 미워하면 닮는다고 조심하라더니, 그 말을 조심했어야 했는데. 어쩌면 나이가 들어가며 모두가 규격화 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듯한 닮은 말씨를 가지는 것은 서로를 미워하다 그리 된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안타까운 일이다. 도무지, 도무지도 알 수가 없는 사람들에게 난 도무지 얼마나 날카로운 상처를 남겼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절레절레 무례한 도리질을 하던 내 모습을 보며 당신들은 얼마나 답답한 가슴을 쳐댔을지. 그렇게 나를 닮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더 더 멀어졌던 나였다.
후회로 뿌옇게 흐려진 눈앞으로 다시금 사람들이 일렁이고, 부딪히는 어깨들 틈새로 크고 작은 손전등이 깜박인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 많은 시간들이 지나갔음에도 내 인연들이 아직도 젊다는 것은. 아직도 뜨거운 미소를 짓는다는 것은. 두 개 미지의 우주가 미소를 건너 끝내 연대가 되어 손전등 불빛이 터질 듯 깜빡깜빡인다. 이 바보가 다시금 당신을 믿어준다면, 당신도 훗날의 외로움을 채무로 나를 믿어줄까? 어쩌면 다정함이라는 건, 미지를 덮어 상처의 문을 닫아주는 지속적인 친절인지도 모르겠다. 이제 미지와 상처의 넓은 깔때기는 나에게, 정수의 좁은 깔때기는 당신들에게. 까만 내 옛 사람들을 수없이 거르고 짜내어 맑은 다정함을 새 사람들에게 줄 수 있기를.


글 쓰는 이들에게 사랑은 여름날의 장맛비 같은 건가 보다. 누구나 알지. 사랑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러나 너무 많이 알게 돼서, 한 번 짓물려버리면 어쩔 줄 모르는 마음도 신경을 써주나? 그런 마음은 어디 가서 치료를 받나? 물성과 해체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강나리의 에세이는 이런 물음에 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가 쫓아갔던 음악에 우리도 몸을 풀고 자유롭게 헤엄치며, 사랑에 대해 배워 보자. 또 아는가. 지루했던 여름인 줄로만 알았던 오늘에 새로운 길이 보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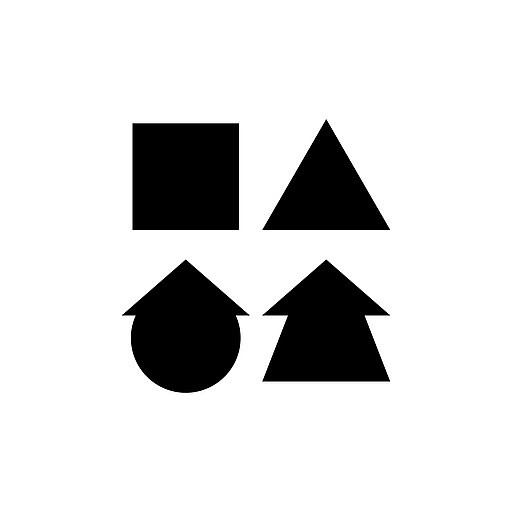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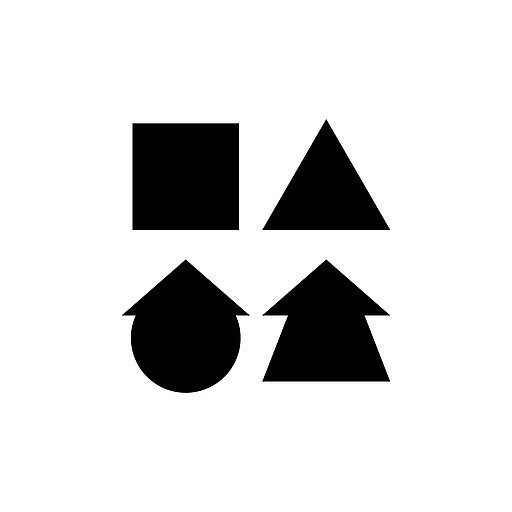
![시와 노가리 ep.10 [특집] 우리를 키웠던 시작은.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202305/mulhae/168462049177113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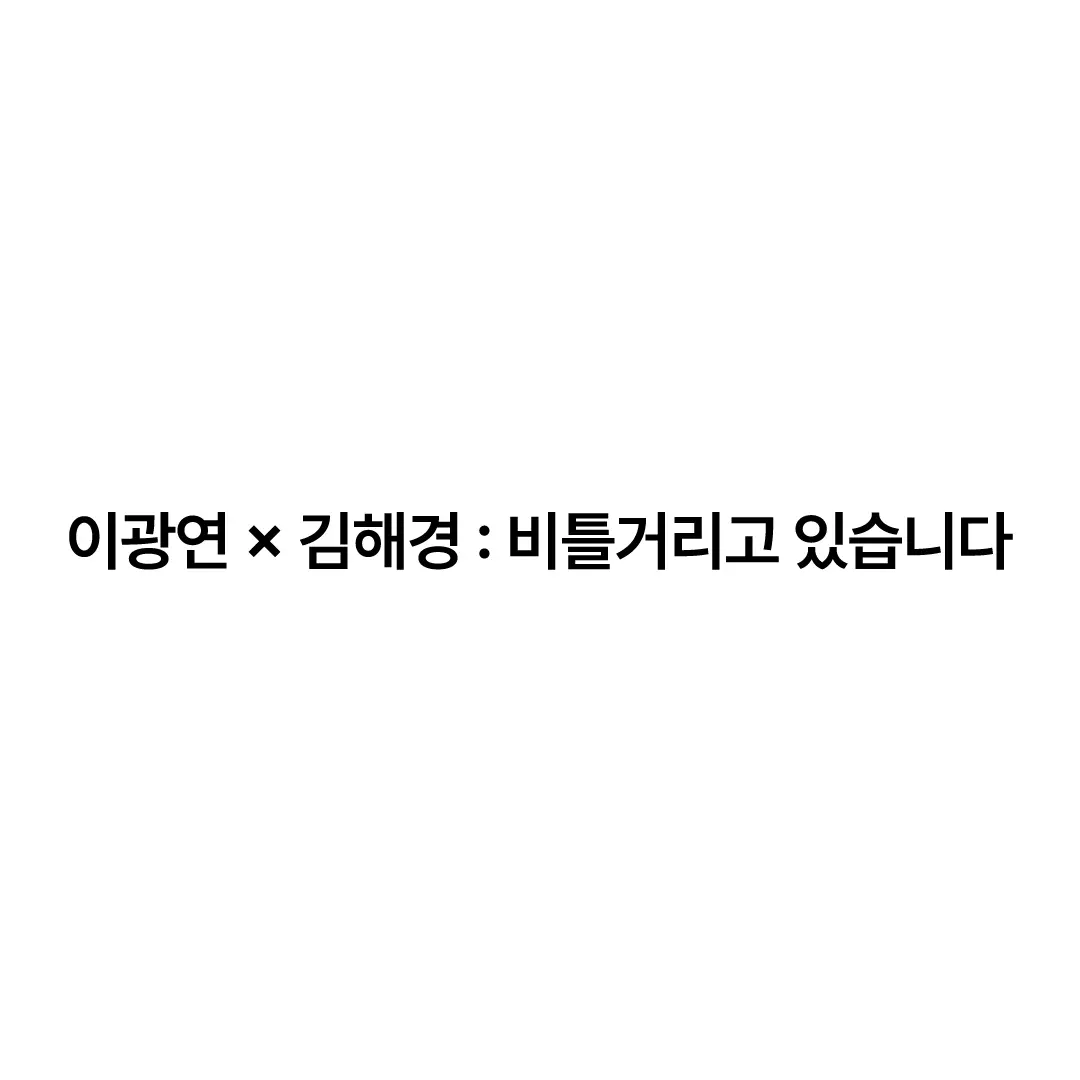
![[김해경] 라이팅룸 101호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r1qyv23ad7ug60982t919d03au22)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