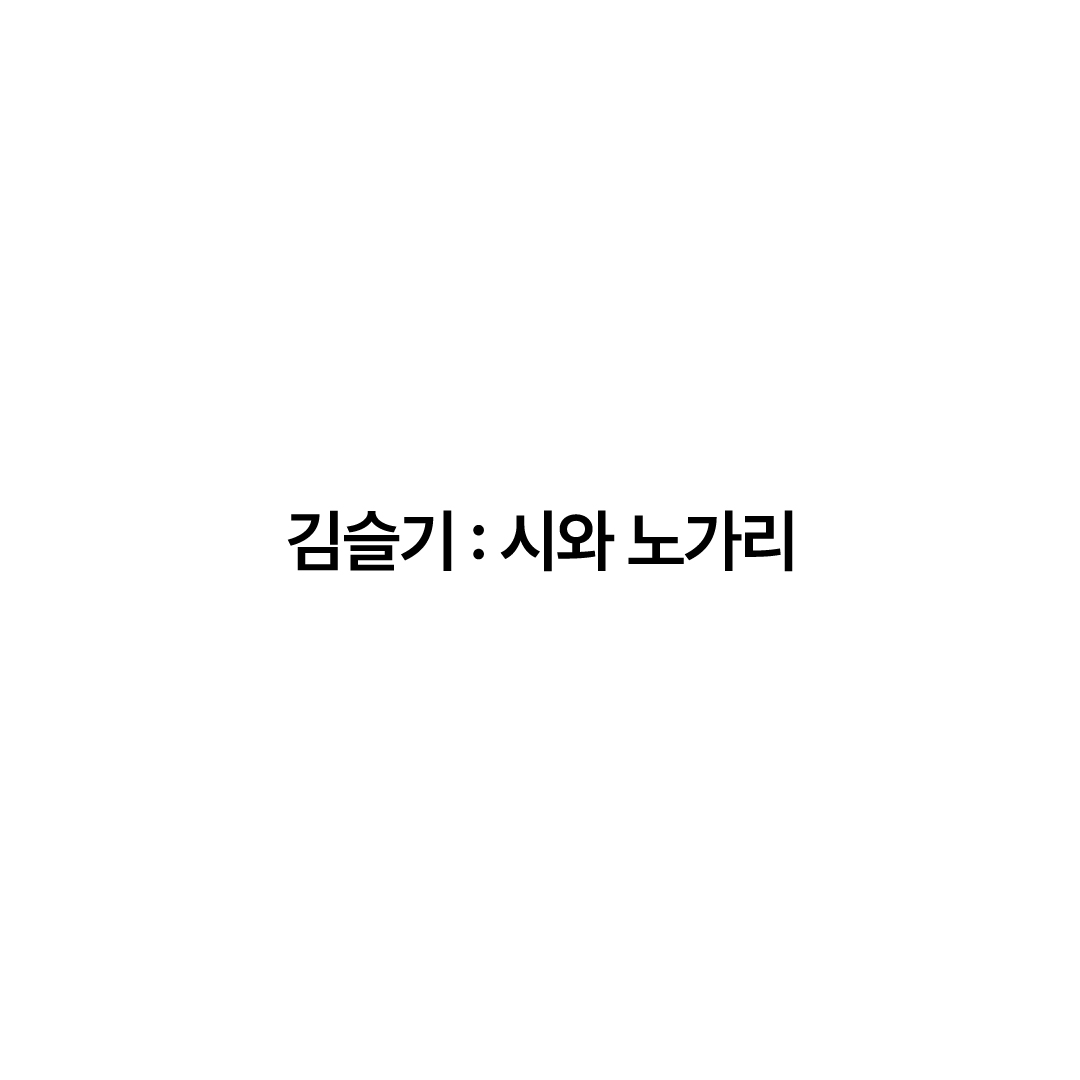
여름, 끝, 유령.
8월이 끝났다.
첫 문장을 적은 시점에서 쓰고 지우기를 여러 번 반복한다. 늘 무언가 끝났다고 말하거나 적어 놓는 문장은 그것만으로 완결인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고백하자면, 첫 문장을 적어 두고선 ‘이대로 보내버릴까’라는 충동에 사로잡혀 여러 번 서재와 거실을 왕복했다. 가장 나중으로 지연되어야 했던 말과 소회가 맨 앞에 배치되어서 이토록 충만할 수 있다니. 더할 말이 필요한가. 적어 놓은 문장을 뒤 따르는 여백의 황량함을 상상하고 있으면 이따금 마음이 차분하고 고요하다. 그곳에는 슬픔이, 줄줄 사족을 늘어놓아야만 하는 회한이 없다. 나는 종종 당신이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마음속 풍경을 함께 바라봐 주었으면 좋겠다고 바란다.
시인은 지나지 않은 계절에 대해 무슨 말을 하겠냐고, 일부러 웅덩이를 찾아 밟는 기쁨뿐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나의 입장은 다르다. 이미 지나버린 계절에 대해 끝났다고 말할 뿐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연재 초기에 8월에 대해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 8월의 한낮은 가장 깊은 그늘을 만드는 계절이라고.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여름으로 내달려 본다고. 다가오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가늠하는 일은 나의 오랜 취미다. 몸을 담고 있는 순간이 가장 맹렬할 때, 아무 말도 없이 누리고 싶다. 행복이나 불행, 기쁨이나 슬픔같이 온전히 두 손을 꽉 쥐어야만 하는 사건들 속에 가려지고 싶다. 그리고 끝의 이후에 나는 조용히 사라지고 싶다. 여름 중에서도 굳이 8월이었던 이유다. 태풍이 몰아치고, 한낮의 뙤약볕이 가장 맹렬하고, 그 맹렬함에 뒤따르는 그늘의 폭이 가장 깊은 계절. 벌써 시간이 그 계절의 바깥으로 나와 당신을 인도했다. 어쩌면 첫 문장에 근근이 이어 붙인 이 사족들은 유령의 문장들일 수도 있겠다. 원래 존재하지 않았어야 할 문장들을 애써 기입한다. 이제는 당신이 이 풍경을 알아봐 주었으면 좋겠다고 바라기 시작한다.
나는 유령의 속삭임을 기입하는 서기다.
*
한가지, 유령의 속삭임을 옮겨 놓는다. 한여름 언덕을 오르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마주한 적이 있다. 연인인지, 친구인지, 가족인지, 그들은 꼭 잡은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언덕을 오르고 있었다. 가까이, 이따금 조금씩 멀리. 한여름의 온도와 습도 때문에 땀으로 번들거리는 두 손.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로 이어진.
한여름의 손 잡기. 한여름에 손 잡기.
여름이 저물어간다.
그러나, 부디
꼭 잡은 두 손은 놓지 않기.
*
8월이 끝났다는 문장 이후에 모두 지웠다. 복원된 문장은 원래의 것과 온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전하기에 시기를 놓쳤다. 그렇게 유령이 되었다. 끝났다고 말한 후에 이미 너무 많은 말을 한 것 같다. 또다시 한 문장만을 남겨야 할 것 같다.
그만하자.
° 권누리 『한여름 손잡기』 (봄날의 책, 2021)

김슬기 작가의 <시와 노가리>는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진 노가리를 앞에 두고 술잔 대신 시집을 듭니다. 술 대신 시를 나눕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시에 취해 보는 건 어떨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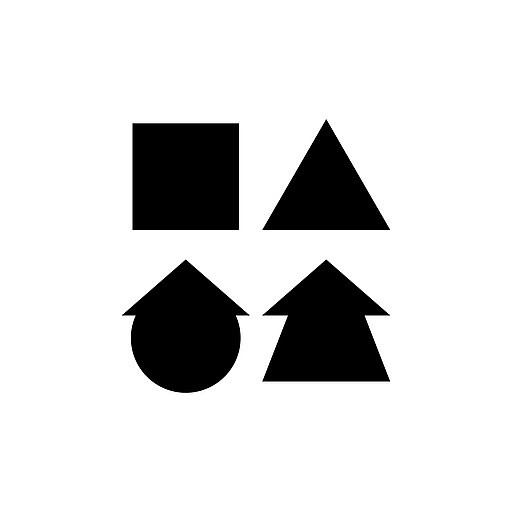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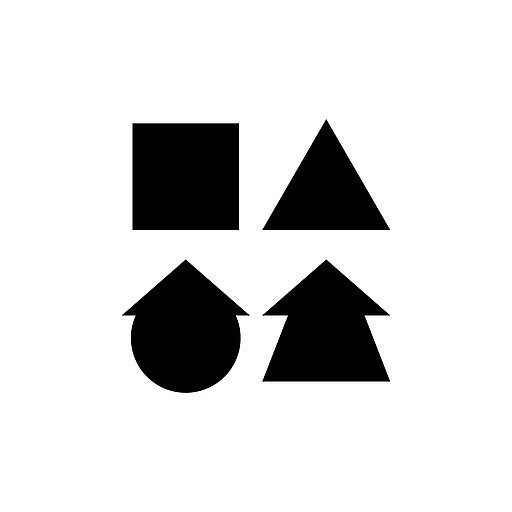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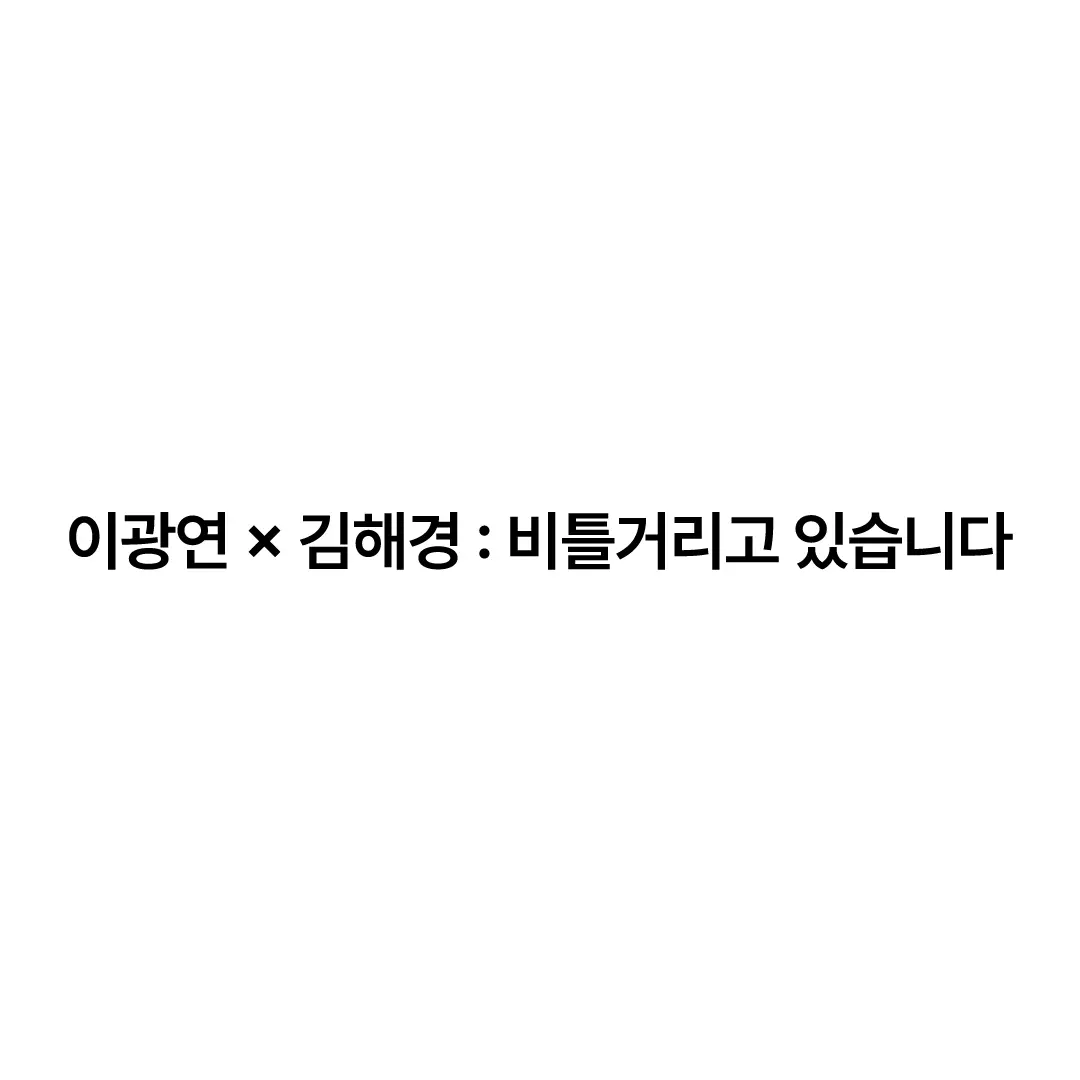

![[김해경] 라이팅룸 101호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r1qyv23ad7ug60982t919d03au22)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