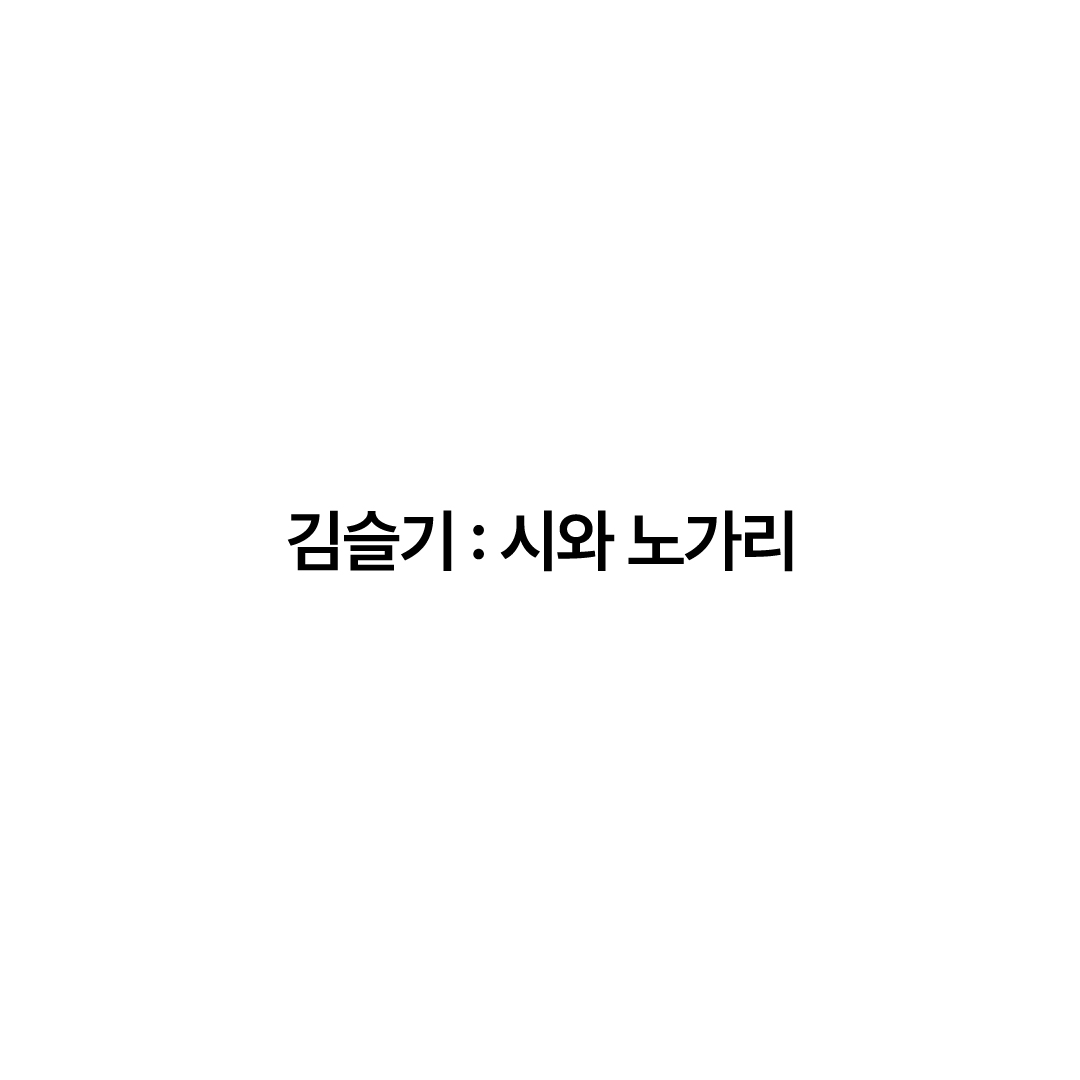
비포(Before) 시리즈 중에 어떤 작품을 가장 좋아해?
영화를 좋아하는 이들에게 자주 묻는 질문이다. 영화를 좋아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조금 더 알고 싶은 누군가를 가늠해 보기 위한, 이를테면 미량의 호기심이나 사심을 품은 질문일 수도 있겠다. 종종 ‘너’라는 타인의 역사를 알고 싶을 때가 있다. 너의 역사. 발견해주지 않으면 영영 묻혀 있을 타입 캡슐 같은 너의 이야기를 왜 캐내고 싶은 걸까. 잔뿌리들을 걷어내고, 더께로 쌓인 흙먼지를 털어낸 다음 열어볼 너의 속이 나는 왜 그리도 궁금할까. 그건 아마도 자세마저 없다면, 너를 한번 찾아서 열어보겠다는 여지마저 없다면, 네가 너를 절대 발설하지 않음을 어렴풋이 알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너를, 너의 역사를, 너의 이야기를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것. 그건 나 스스로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동의어다. 나는 너를 알고 싶고, 그리하여 나를 알고 싶다.
미국의 영화감독 리처드 링클레이터(Richard Linklater)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3부작(비포 선라이즈, 선셋, 미드나잇)은 오랜 기간 관객들에게 회자되는 시리즈다. 굳이 다른 예술이 아닌 영화, 더욱이 그 많은 영화들 중에서 이 작품들로 너라는 타인을 가늠해 보는 이유는 바로 맞물림과 엇갈림에 있다. 익히 알려진 이야기대로 이 시리즈의 첫 작품(비포 선라이즈)은 감독이 겪은 우연한 하룻밤에서 착상되었다. 어느 낯선 도시의 장난감 가게에서 만난 여자와의 우연한 하룻밤과 대화. 그 하룻밤의 이야기로 장장 18년의 세월이 걸린 3부작이 만들어졌다. 아직 영화를 감상하지 못한 독자들을 위해 영화 내외의 맞물림과 엇갈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해야겠다. 다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이 영화들은 멸종과 시간에 관한 영화라는 것뿐. 너라는 타인이 저 먼 우주에서 날아와 내게 부딪히고, 나라는 종족이 멸종하고, 그렇게 너라는 흔적이 덮어진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윤병무 시인의 시가 수록된 시집에는 유독 달을 제목으로 둔 시가 많다. 너와 내가 어떤 지점에서 맞물리고 또 어떤 지점에서 엇갈리고 있을까 가늠할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여 너를 부를 때, 달을 본다. 그렇게 빤히 쳐다본 달을 옮겨 쓰는 일이 내겐 이런 문장이고, 시인에겐 이런 시였을지도. 故 백남준 선생님의 <달은 가장 오래된 TV>가 떠오른다. 가장 오래도록 인간을 수신하고 중계해 왔다는 달. 머릿속에 뒤따르고 굽이치는 잔상과 윤곽. 어쩌나, 나는 가늠할 수 없다. 가늠할 수 없어서 비워둔다. 비워둔 것의 잔여만을 이곳에 옮겨 놓는다.
저 달이 얼마나 많은 눈빛을 수신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머금은 눈빛을 송신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너와 내가 눈을 마주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단지 우연, 하룻밤, 맞물림과 엇갈림, 이따금의 착각일지라도. 당신은 나의 옛날을 나는 당신의 훗날을. 혹은 그 시간의 반전을. 그러니까 너와 나의 역사를 들여다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 윤병무, 『당신은 나의 옛날을 살고 나는 당신의 훗날을 살고』(문학과 지성사, 2019)

김슬기 작가의 <시와 노가리>는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진 노가리를 앞에 두고 술잔 대신 시집을 듭니다. 술 대신 시를 나눕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시에 취해 보는 건 어떨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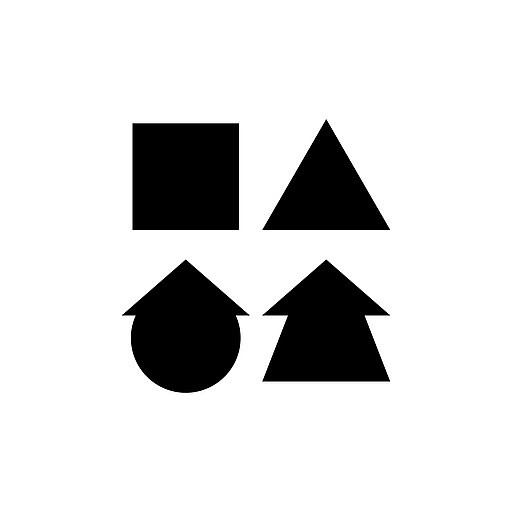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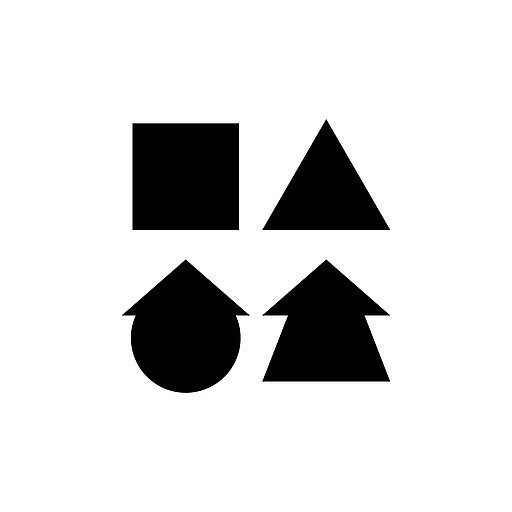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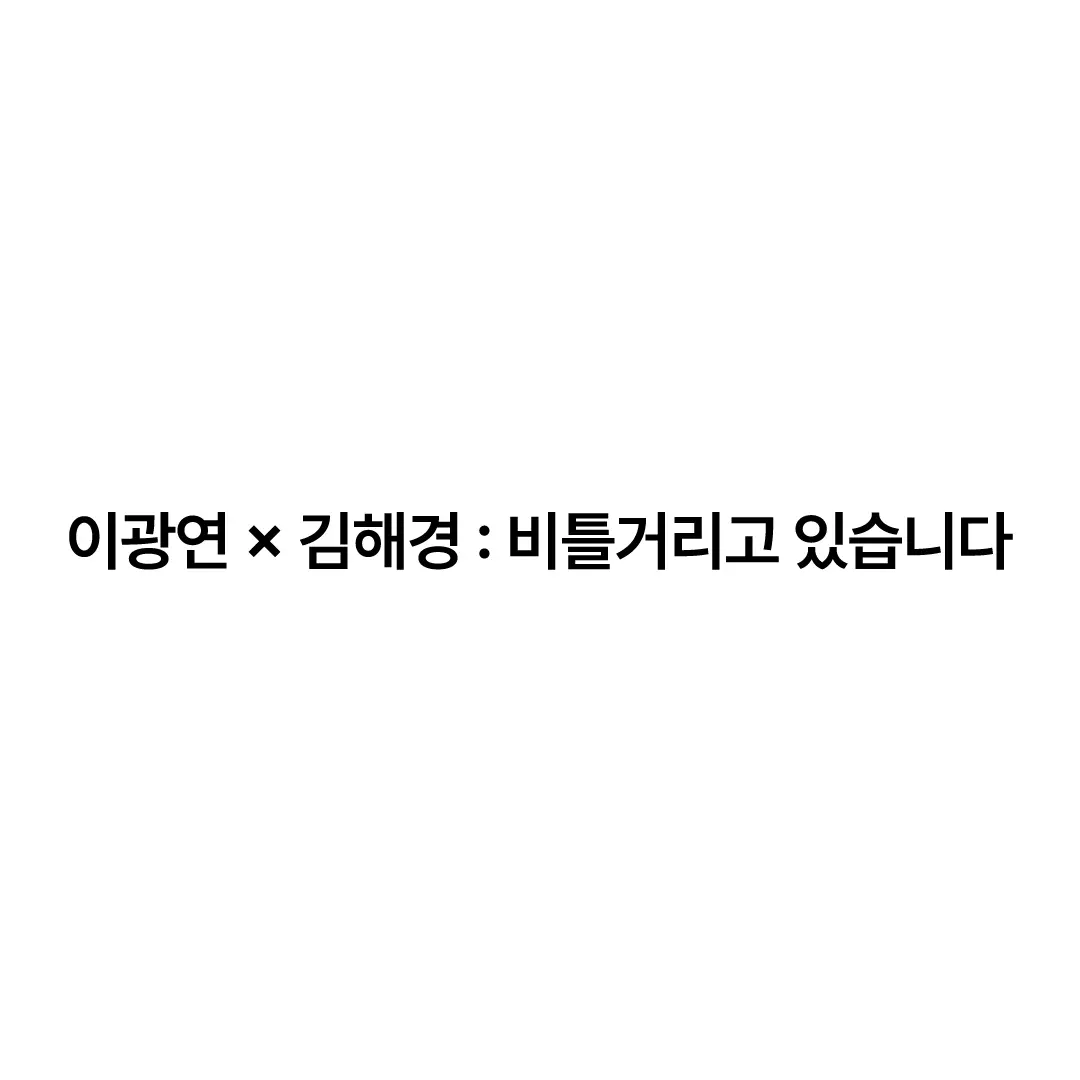

![[김해경] 라이팅룸 101호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r1qyv23ad7ug60982t919d03au22)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