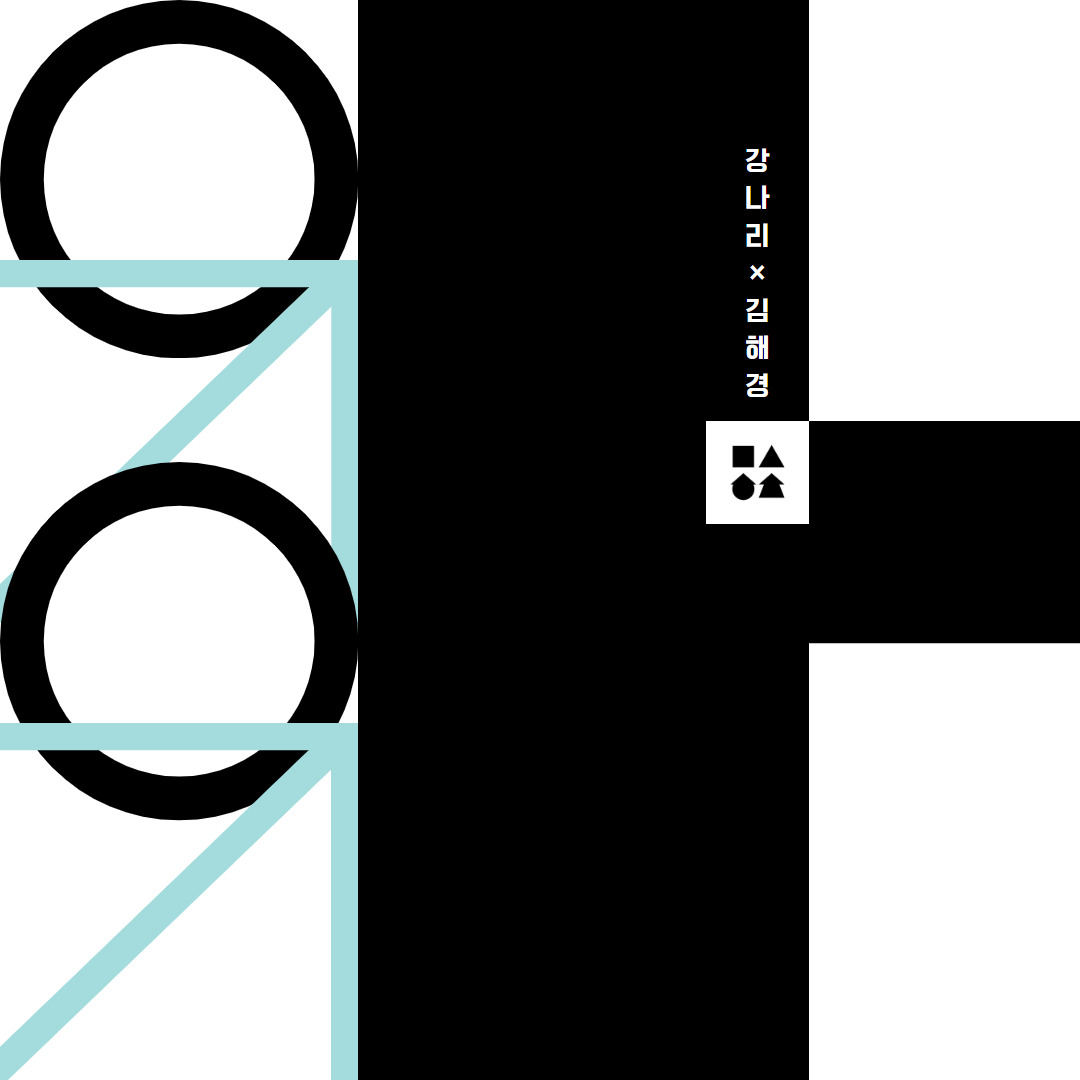
[세 번째 빵꾸]_강나리
빵꾸로 길게 늘어뜨려진 세 번째 월요일이다.
너무나 규칙적이게도 이 글은 “나온다”. “나오게 되어” 있다. 읽는 사람의 시간도, 쓰는 사람의 시간도 정해진 이 글은 그 규칙성만으로 회사인인 내 삶 위에 포개어져 있지만 아무래도 창작이란 규칙성을 지니기가 힘든 노릇이다. 초보 작가인 나에게 발행일이란 다른 날보다 더 무언가 쥐어짜내는 날로 정한 날이다. 달콤한 주말 후 맞는 월요일, 느슨해져 있던 몸과 마음을 다시 꽉 조이는 월요일. 내가 이 날로 발행을 결정한 것은 월요일이 어쩌면 우리에게 사랑이 가장 필요한 요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지친다는 이유로 동굴로 들어가지 마세요, 전부 다. 막막하기만 한 남은 4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글을 읽어 보세요! 내가 노트북을 막 부둥켜안고 입을 맞추며 쓴 글이랍니다.
세월이 무색하게도 내 무위 속 나는 같은 모습이다. 간편식으로 즐겨 보는 죽음과도 같은 무위. 무위의 따스한 파장으로 나는 먹음직스럽게 구워진다. 뭉친 덩어리들이 풀어지고, 잘 반죽된 몸에 도달한다. 이 과정은 늘 외롭지 않은 관계 속에서 벌어졌다. 외로운 관계란 ‘홀로’를 뜻함이 아니다. 외로움은 늘 무위에서 멀어지게 하는 어떤 이가 슬그머니 쥐고 왔고, 그것이 풍기는 악취에 나는 코를 틀어막고 방방 뛰다 그만 무위를 잃어버렸다. 아니, 그 사람 탓을 할 수 있을까? 초등학생 때부터 나는, 엄마 나 생각이 너무 많아서 괴로워. 다른 사람들도 이럴까? 했고, 수평선 위로 미끄러지는 구름으로 생애 첫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쉬이 잃는 내 무위에 누군가를 탓하는 건,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 나는 내 첫 구름을 가져다준 바다를 기억한다. 단지 그 바다를 닮은 사람을 찾고 있는 것 뿐이다. 한 가운데 던져진 그 공포, 울음조차 사치인 그 사투에서 살아남아 수평선에 포개어지게 된 사람. 바다를 조망만 하며 왈가왈부하는 설익은 인생론에도 냉소를 보내지 않는 사람, 그렇게 누구보다 바다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사람. 어느 날 메인 코스를 즐기러 떠날 때, 그런 사람과 보냈던 시간들이 떠오른다면 참 좋겠다.
저녁은 두부 김치를 먹었다. 아빠가 참 좋아하던 음식이다. 김치를 한 입 먹으니 엄마의 몸짓과 체취와 말씨와 농밀 묵직한 모성애가 물결쳤다. 깨진 호르몬 체계로 어김없이 먹으면서도 허기진 끼니를 씹어 넘기는 일은 엄마 김치를 곁들인 아빠 두부김치로 꽤나 풍족해졌다. 아, 잔인한 내 부모들. 이토록 슬픈 사랑을 가르쳐 준 사람들.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말하기엔 이토록 괴로운 역사여. 함께한 이 없었기에 말 없이 내 식사는 치뤄졌고, 그 모습은 입만 척척 벌렸을 뿐 묵상과 닮아있었던 것도 같다. 그러나 저러나, 고팠던 배는 한바탕 두둑히 채워졌고, 다음 코스로는 잠이 쏟아졌다. 보통의 저녁의 완성이었다.
[우리의 원대한 계획]_김해경
드라마 <삼식이 삼촌>에서 이런 대사가 나온다. “배가 불러야 마음이 열립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생각한다는 건 중요한 일이다. 먹고 살 수 있어야 꿈을 꾸고, 먹고 살 수 있어야 계획을 차근차근 현실의 영역으로 들여올 수 있다. 그러나 글을 쓰고 그 글을 어딘가에 발표하고, 누군가가 그 글을 읽게 되는 과정. 이 속에서 배불리 먹고 보통의 저녁이 완성되기란 참 어려운 일. 그래도 조급한 마음을 숨겼다. 고 발설했을 때.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이미 드러난 것들과 뒤섞이고. 우울했다.
빨리 빠져나와야지. 어서 다음 생각을 해. 다음 생각이 나지 않으면 눈을 감아. 그리고 잠들어버려. 꿈 꾸지 않는 잠을. 일주일 동안 무당 나오는 꿈을 꿨다. 그것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엄마한테도 전화하지 않았다. 무당은 굿판을 벌이고 있었다. 나무로 조각한 칼 위를 걷고 있었다. 피가 나지 않는데 나는 여기가 꿈속이란 걸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믿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는 쉼 없이 문제를 제기한다.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두드러기가 나는 병에 걸린 걸까. 또 누군가는 쉼 없이 슬퍼한다. 그는 나와 닮았다. 병원을 찾은 사람은 후자다. 나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글 쓰는 사람들을 옛날엔 많이 만났다. 지금은 만나지 않아도 글 쓰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안다. 다들 일리가 있는 글을 쓰고 있다고도 믿는다. 문제는 내가 쓰는 글이다. 나는 무얼 쓰고 있는 걸까. 형식도 내용도 없는 중얼거림이다. 스치듯 깨달으니 고쳐지지 않는 관성으로 쓰는, 이 알 수 없는 축축함.
그만두자는 말은 내일 다시 생각하자는 말. 그렇게 여기까지 왔나 봐. 스물아홉. 아주 젊은 나이. 그러나 나에겐 회의적인 숫자. 서른 마흔 쉰 같은 숫자들이 아득해서는 아니었는데. 덜, 이란 말이 알맞게 느껴지는 요즘. 덜 살았고 덜 썼다. 근데 힘은 더 안 나는. 웃어버릴 수도 없는 일. 우리에겐 원대한 계획도 없는데, 쓴다는 희망만 빵처럼 부푼다.
- 아자아자! 힘낼 때 쓰는 말. 그리고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을 때 쓰는 말. 강나리 작가의 글은 때로 침묵보다 더 침묵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으로 와닿는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저는 앞으로 강나리 작가의 열혈한 독자가 되어 매번 리뷰를 할 생각입니다. 에세이와 리뷰. 새로운 방식의 글을 읽고 싶으시다면 물성과 해체를 찾아주세요. 새로운 연재, <아자아자>였습니다.
- 강나리 : 식물학을 전공했다. 사람은 모두 얽혀 있고, 그 어디에선가 꽃처럼 사랑이 발생한다고 믿는다.
- 김해경 : 물성과 해체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산문집 『뼈가 자라는 여름』(결, 2023)을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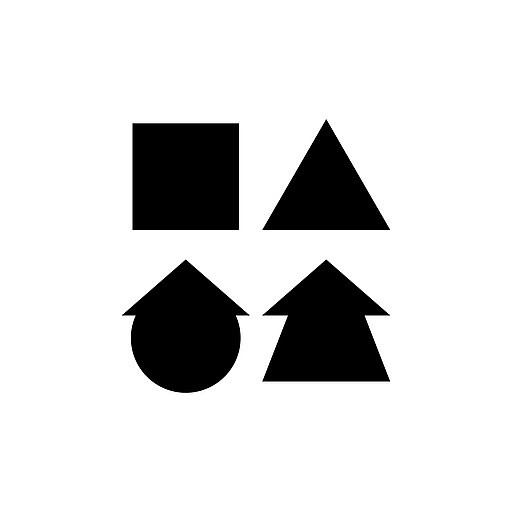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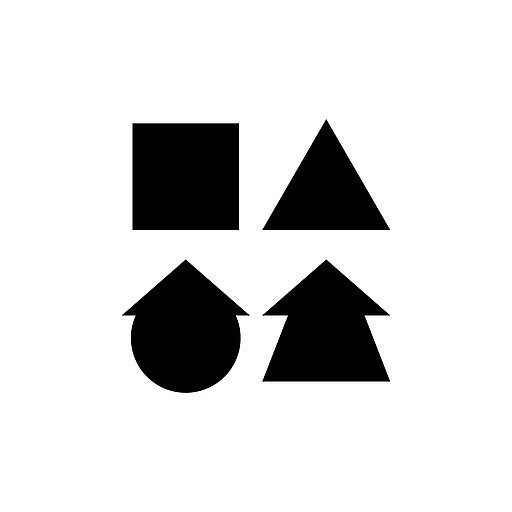
![[박건] 사선에서, 다섯 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pa4giv30q8lntwbhr192877e9v2b)
![[박건] 사선에서, 여섯 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gpylgum1tl2137k5xnextxt0te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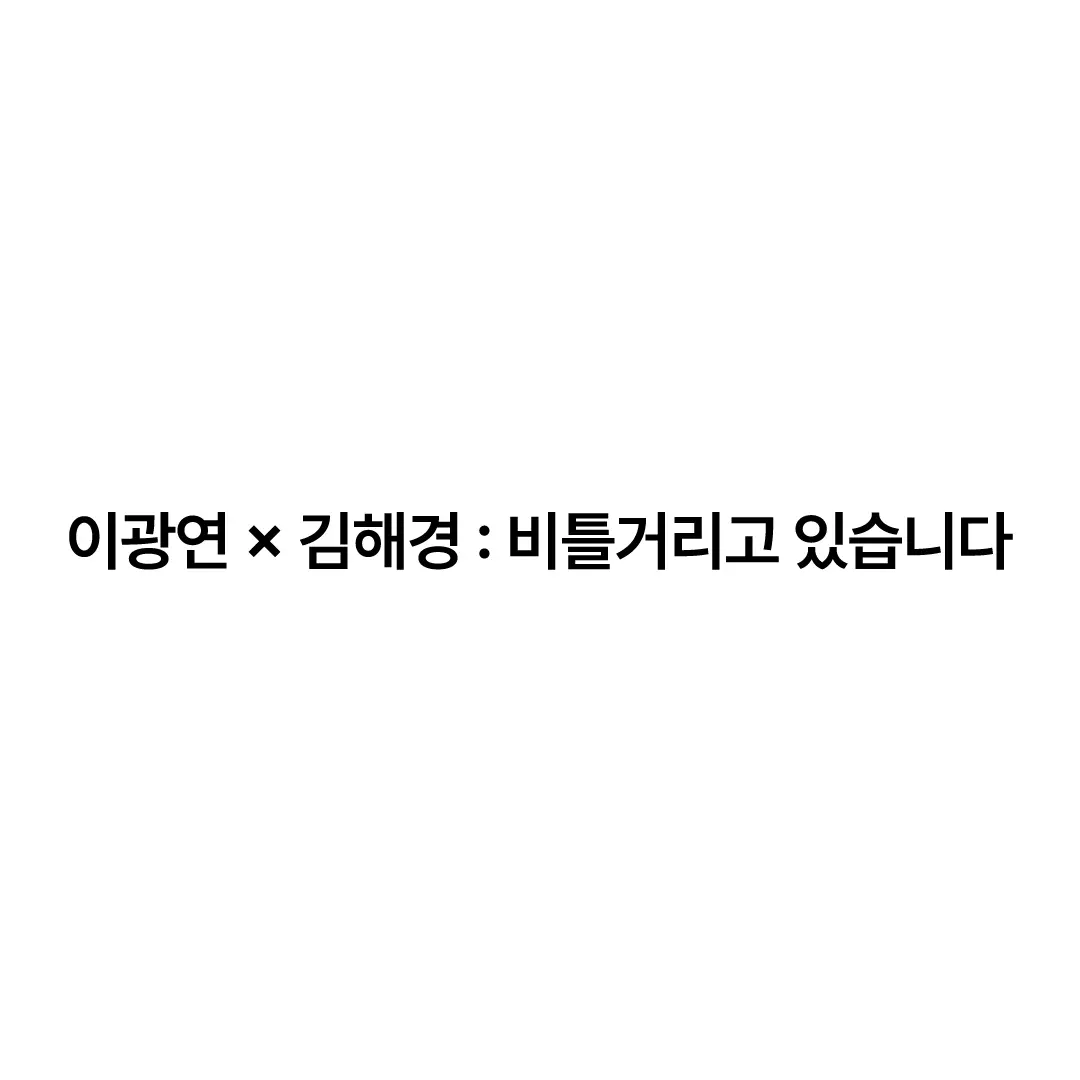
![[김해경] 라이팅룸 101호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r1qyv23ad7ug60982t919d03au22)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