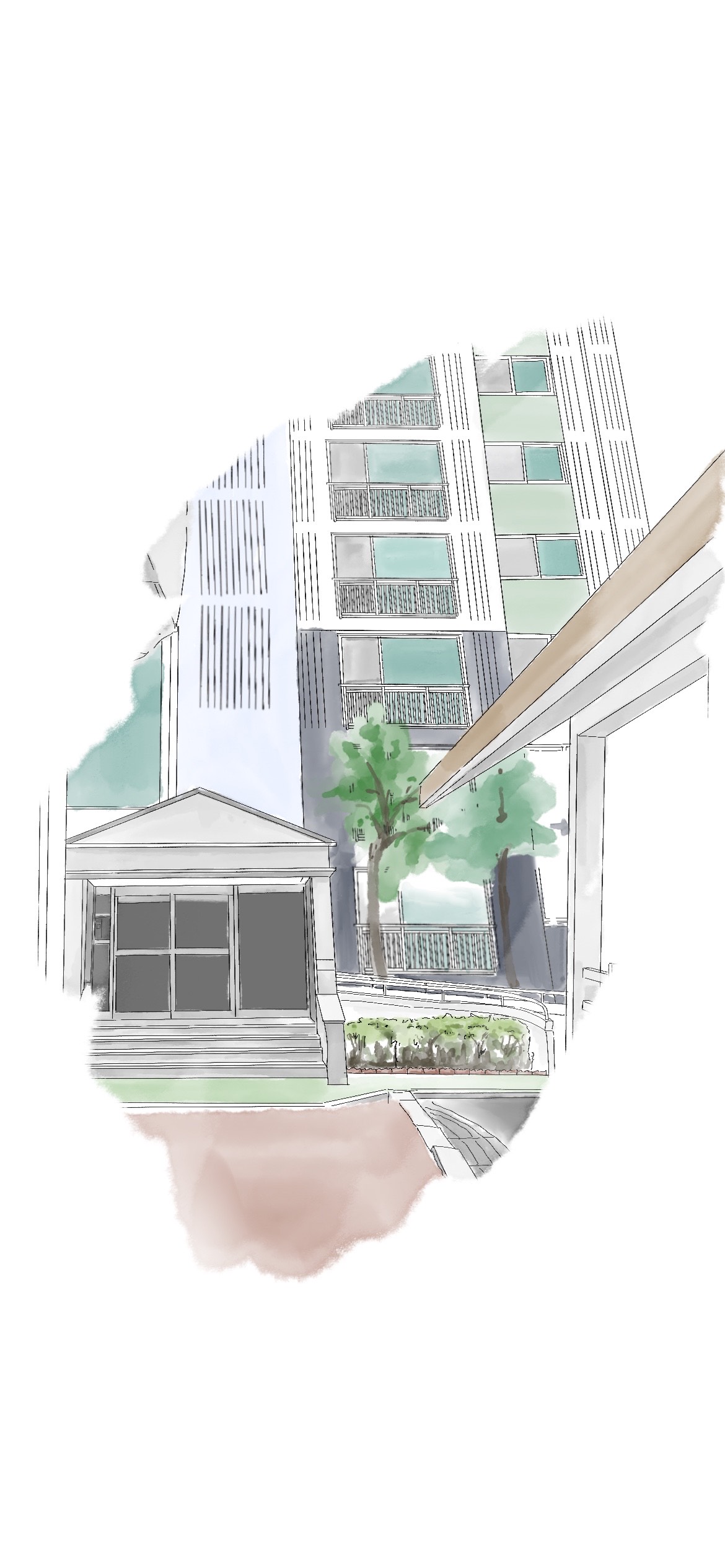
나이도, 계절도 잘 기억나진 않지만 장소만은 뚜렷하게 기억나는 날이다. 아파트 옆 동 라인으로 넘어가는, 아파트와 지하 주차장 입구 사이 넓지도 좁지도 않은 길을 지나가고 있었다. 정면으로 멀리 보이는 아파트 10층 쯤에 친구가 살고 있었던 것 같고, 그 친구를 떠올리던 중이었다. 순간, 그 애는 저 높이서 나를 바라보고 있을까? 생각하다 저 애는 나와는 다른 고민을 품고 있겠지? 저 애는 나보다 한 살 많으니까 저 애한테 한 살 동생은 01년생이겠네. 저 애는 내가 듣는 방과 후 수업을 듣지 않으니까 월요일 방과 후는 집에 가는 시간이겠다. 하며, 당연한 사실들을 내려놓다가 저 애의 머릿속엔 나와 전혀 다른 기억과 경험과 관념으로 가득 찬 세상이 있겠다는 것을 알았다.
저 애는 나와 시간을 세는 법이 다르고, 시간을 인식하는 방식이 다르고 , 집과 가족의 의미가 다르고, 자주 전화하는 치킨집이 다르다. 나는 내가 하나 하나 색 입혀가며 알아낸 세상이 오로지 나의 세상이었음을 느꼈다.
세상은 잿빛의 진흙으로 덮여져 있어 내가 그 진흙을 캐낸 만큼이 내 세상인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보다는 흰색 밑바탕에 내가 원하는 색을 칠해 나가는 행위에 가깝다고 생각했다. 어릴 적 과학의 달을 맞이한 미래의 서울 그리기 대회처럼, 근처 규모 있는 공원으로 놀러가 종이 한 장 쥐어줬던 백일장처럼.
나는 나와 비슷하게 세상을 칠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미워하고 있었다. 그치만 그렇다고 누군가가 유난히 틀린 것이라는 생각이 있던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나는 또 누굴 좋아하고 질색하고..
수학 문제를 푼다. 수학문제를 풀듯 타인과 타인의 세계를 바라보면 되겠다고 생각한다. 변수가 세개면 세개구나, 수렴하면 수렴하는구나, x를 구하면 되는구나 그렇구나 하며 의심의 여지없이 문제를 푼다. 문제가 왜 이러지? 왜 여기를 구하게 만들었지? 같은 고민은 하지 않는다. 그런데 선생님이 막상 수학에선 그런 질문이 필요하단다. 나는 있는 그대로 봐야 할 것엔 온갖 시비를 걸고 온갖 시비를 걸어야 할 것은 너무 주어진 대로 받아들인다.
이제는 이사해서 찾아가야 하는 곳이 되었지만, 언젠가 다시 그 길을 걷는다면, 10층 살던 그 친구에게 나를 창 밖으로 내려다 본 적은 없는지 묻고 싶다.
추신 / 글
보고 느꼈던 이야기를 쓰다 보면 항상 머리속에 있는 것을 제대로 써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찝찝함을 조금 남긴 채 글을 마무리합니다.
추신 / 그림
그리려고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녔는데 날이 선선해진게 느껴지네요. 가을이 오려나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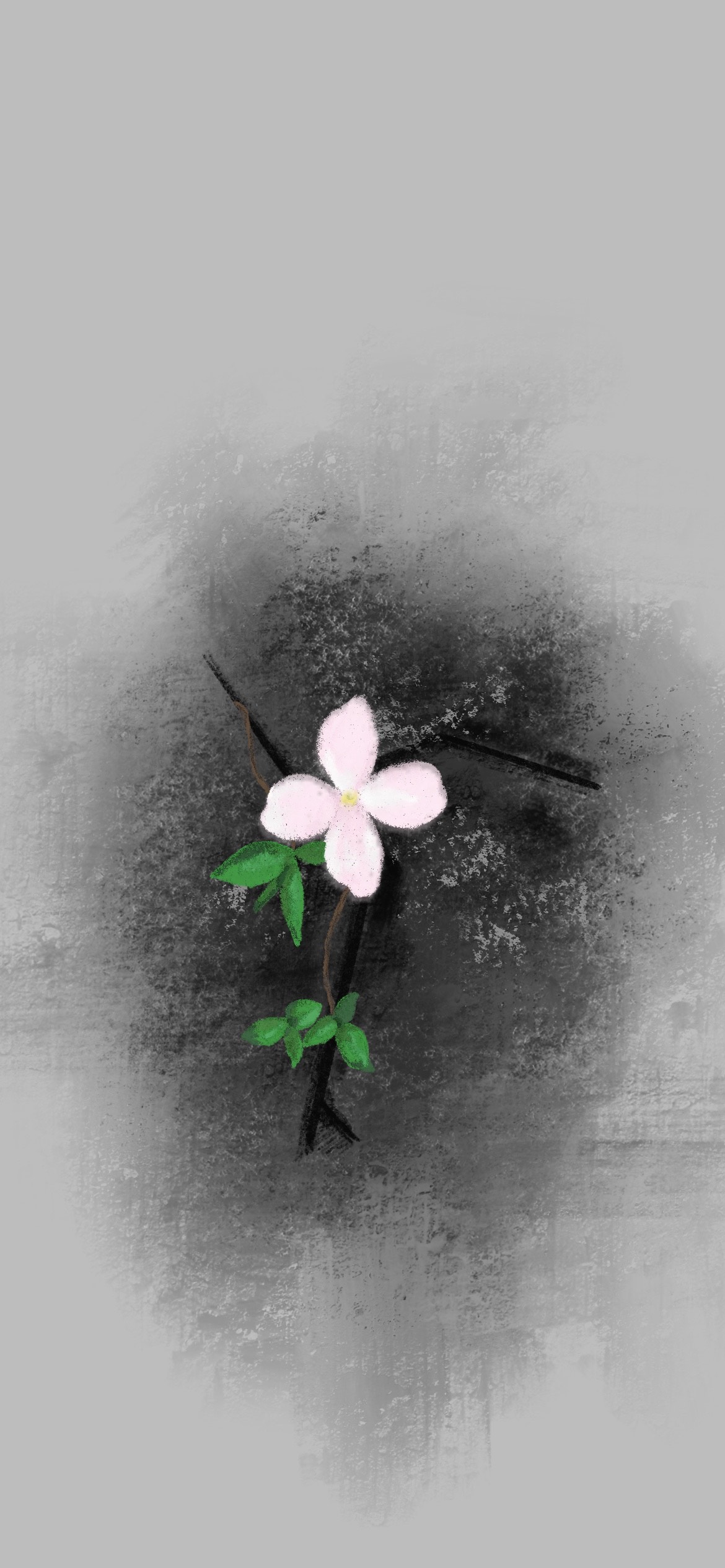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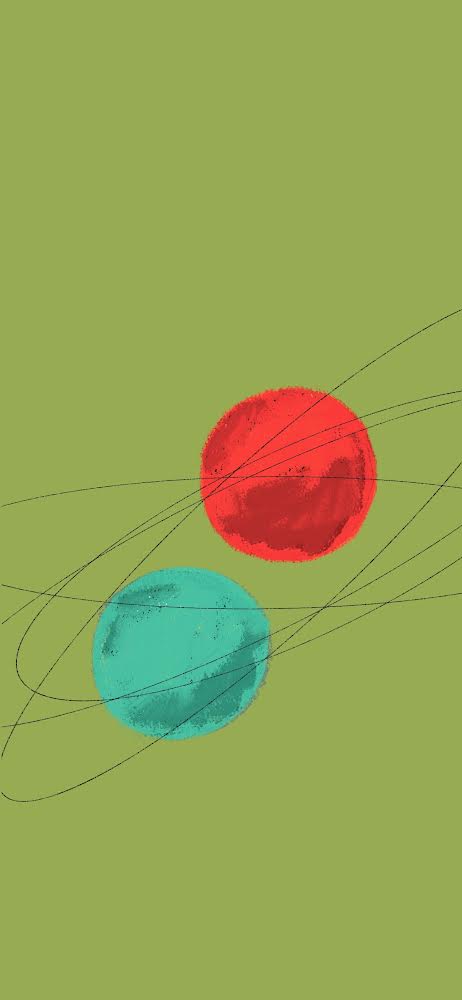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