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몇주전부터 신촌역의 스크린 도어가 고장나 열려 있다. 어느날부터 늘 닫혀있던 것이 고장나 삐삐소리를 내며 열려있다. 소리로라도 우리를 막겠다는 듯이. 나는 다음 열차를 기다리며 서 있다.
문득 스크린도어 이 놈은 벽인가 문인가 생각했다. 스크린 도어를 한 단어로 설명하라 하면 나는 이것을 벽이라고 할지 문이라고 할지 고민이 된다. 때맞춰 열리는 것이 꼭 문이다. 칸에 맞춰 열차가 정차하면 그제서야 출입을 허락하는 듯 스르르 열린다. 우리는 이 문을 통해서 열차 안과 밖을 드나든다.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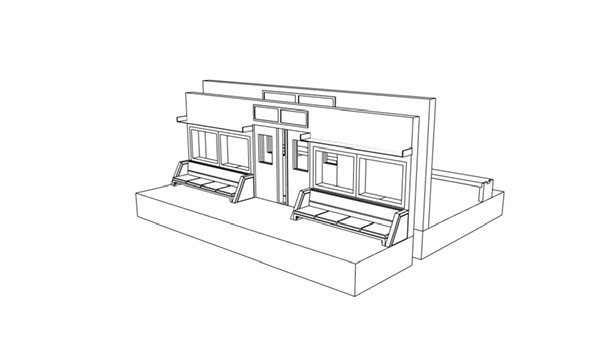
하지만 스크린도어는 열차를 지나가기 위해 만든 것은 아닐 것이다. 어디 단단한 벽 너머를 가고자하는 이유로 뚫어 놓은 통로가 아니다. 오히려 단단한 벽 그 자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열차가 없으면 그저 구렁텅이에 불과한 그 까만 기찻길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단단한 벽. 확실히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생각해보면 벽이라고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다. 심지어 문은 마음대로 열수도 없지 않나? 하 하지만 열차가 아구만 잘맞으면 여지없이 열리지 않나, 가고 싶은 곳을 가도록 해 주는건 문이 맞지 않나?
승강장 안에 있는 반쯤 쪼개진 나무 의자에 앉아 묻지도 않은 스크린도어의 정체성을 고민해주며 다음 열차를 기다린다. 그러다보면 문이었다가 벽이었다가 하는 그 네모난 모서리들에 단정한 다정함을 느낀다.
단정한 다정함.. 다음날 아침을 함께 할 가족들도 떠오른다. 지하철에서 가족이 떠오르는 것이 왜인지 어색하다. 지하철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은 보지만 새삼 우리 가족들은 보기 힘들기 때문인 듯 하다. 어릴적 정장을 입고 집을 나서는 아버지의 뒷모습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간듯 사라졌다 해가 지는 시간에 맞춰 돌아오는 만화 속 용사같다. 그리고 용사는 지하철을 타지 않으니까..지하철은 가장 어색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가장 익숙한 교통수단인 듯 하다.

시간이 지나고 다음 열차가 익숙한 모양과 소리로 온다. 의자에 앉아 기다린지 길어 봤자 5분, 열차는 그 이상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승차장의 나무 의자들도 누가 앉으면 5분만 버티자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왔을 것이다. 가족들은 집에서 보기로 한다. 열차는 주차하듯 앞뒤로 움직이며 입구와 칸을 맞게 조정하고 있는데, 고장난 신촌역의 스크린도어는 이미 입을 쫙 벌리고 있다. 그래도 필사적으로 서 있는 놈이 고마워서 조심히 기다렸다 열차에 오른다.
추신 / 글
스크린도어가 없던 지하철을 기억하시나요. 스크린도어가 고징난 덕에 예전의 지하철이 얼마나 시끄럽고 아찔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 다른친구의 그림을 올립니다. 벌써 세번째 좋은 이미지를 주는 친구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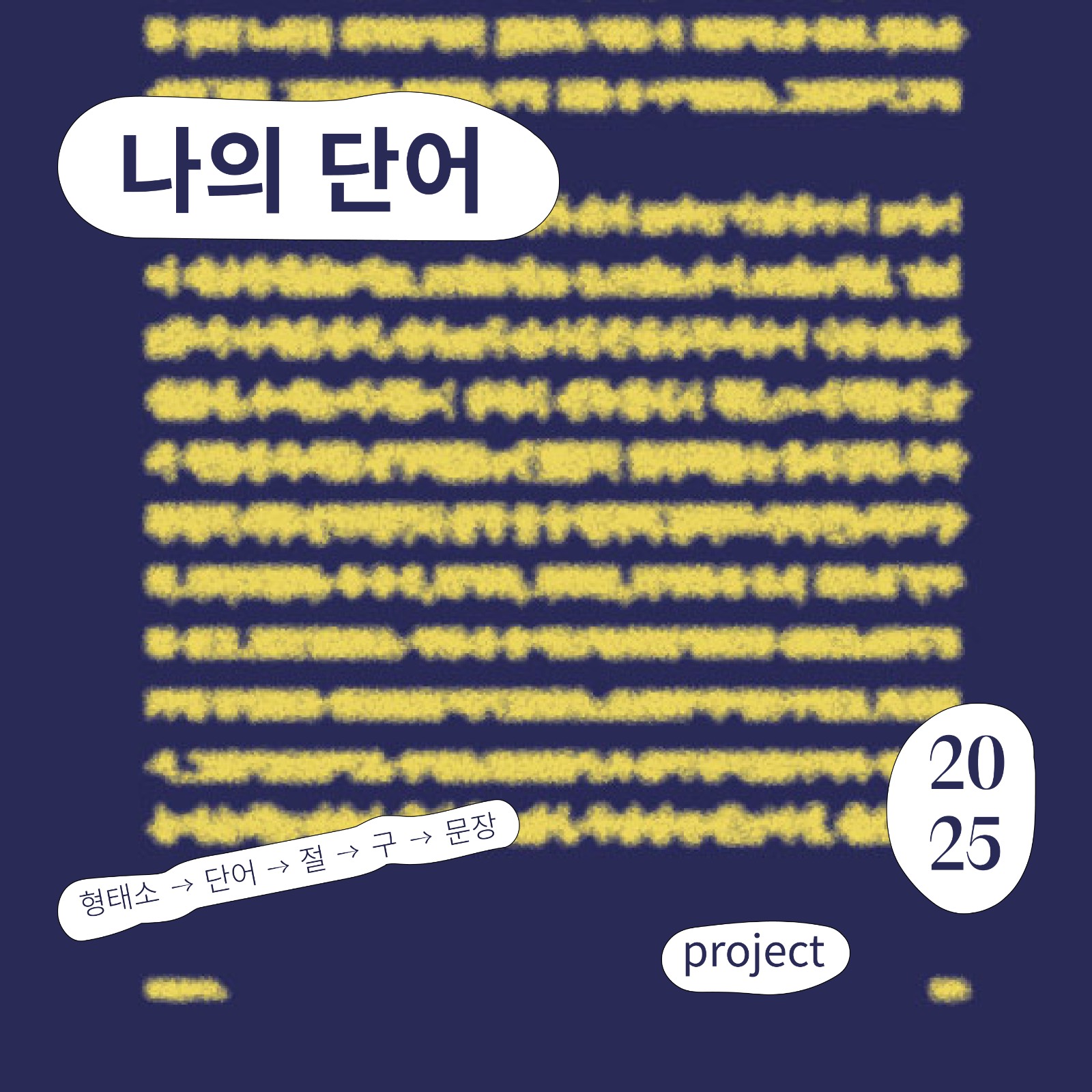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