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is a tragedy when seen in close-up, but a comedy in long-shot.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누군가의 삶을 멀리서 본 적이 있던가 생각하다 보면, 사람들이 야구경기나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로 귀결된다.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있을 법한 혹은 진짜 없을 법한 삶을 우리는 안방에서 지켜보고, 목숨을 걸고 공을 던지고 치는 선수들을 우리는 몇 미터는 떨어진 관중석에서 본다. 멀리서 그들의 몸짓을 지켜보며 진심을 다해 응원하지만, 경기가 끝나고 TV가 꺼지면 작은 여운 담은 채 다시 내 삶을 살아간다. 치열한 삶 속에서 잠시 타인의 삶을 구경하는 일은 좋은 취미가 되는 듯 하다.
남의 삶 말고 나의 것을 멀리서 본다면, 나의 삶도 그저 즐거운 연극이 되진 않을까. 그리고, 내 것이라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 둘 내려놓는 것이 그 시작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를테면 자식이나 애인이, 나의 소유가 아니란 것을 알면, 나의 기준과 관계없이 그들의 삶을 그저 박수치고 응원해줄 수 있다면 나는 얼마나 즐거울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로부터 남들을 놓아주는 일은 사실 남이 아니라 나에 대한 해방이 된다. 또 시간이 지나 내 몸뚱아리마저 내 것이 아님을 느낄땐, 나는 비로소 죽음 앞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얼마나 들뜨는 순간일까, 죽음조차 내 것이 아닌 일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 아는 것으로 미련이나 집착같은 끈적거리는 것들에서 사랑과 자유같은 맑고 순수한 것들을 뽑아낼 수 있다. 세상이 온전한 내 것 하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삶을 희극으로 만드는 단초가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야구 경기나 드라마에 진심으로 몰입하는 것만큼 그것을 재밌게 해주는 것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오래 자세히 보아야 아름다운 풀꽃같은 것들이 그러할 것이다. 내 집착이 풀꽃을 꺾지 않는 선이라면, 가끔은 가만히 앉아 풀꽃을 들여다보는 시간은 순수한 것과는 또 자극적인 가치가 된다. 그러니까 삶이 하나의 연극이라는, 그것도 희극이라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미련이나 집착같은 끈적거림은 삶의 좋은 오락거리이다. 가끔은 유치해지는 것, 내 것이 아닌 것을 알지만 괜히 부려보는 고집이나 미련 같은 것들이 내 연극을 희극으로 만들어 주는 문학적 장치가 된다. 점심시간 종이 울리면 들소떼마냥 달려가던 일은 밥을 빨리 먹겠다는 치열함과 늦게 먹어도 그게 큰 일은 아니라는 여유로움이 공존할 때야 진정으로 즐거워진다.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쩌면 소꿉놀이와 다르지 않다. 해질녘 손톱 사이에 잔뜩 모래가 낀 채로 뛰어다니는 나를 불러줄 엄마만 없을 뿐이다. 그러니 열심히 진심을 다해 사실은 내 것이 아닌 것들에 집착하다가, 그 끈적거림이 나를 질식시키기라도 할 것 같다면 바로 손을 털고 일어나야 한다. 그러면 된다. 우리가 어릴 때 소꿉놀이를 배운 것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 사실 그마저도 소꿉놀이였을 것이다.
추신 1
글을 쓰며 종교에서 말하는 행복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종교는 자신을 온전히 신에게 맡기고, 어떤 종교는 세상에 나온 순간 내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순수하고 본질적인 삶의 가치들은 내 것이 없음을 아는 데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 테면 불교에서 속세와 나를 구분하는 것 처럼 말이죠. 하지만 저는 아직 절밥이 건강하다고 곱창 전골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매일 소꿉놀이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놀이란 걸 알기만 하면 언제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추신 주제에 말이 너무 많네요.
추신 2
다음주부터는 ‘사랑’을 주제로 혹은 소재로 한 글들이 자주 등장한다는 소식입니다. 가장 많이 고민하기도, 써 놓기도 한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특집처럼 생각해 주세요. 또 하나 좋은 소식은, 제 글에 그림을 그려주는 친구가 생겼다는 일입니다. 매주 혹은 격주에 글과 함께 친구의 그림을 보내드립니다. 좋은 친구를 두어서 기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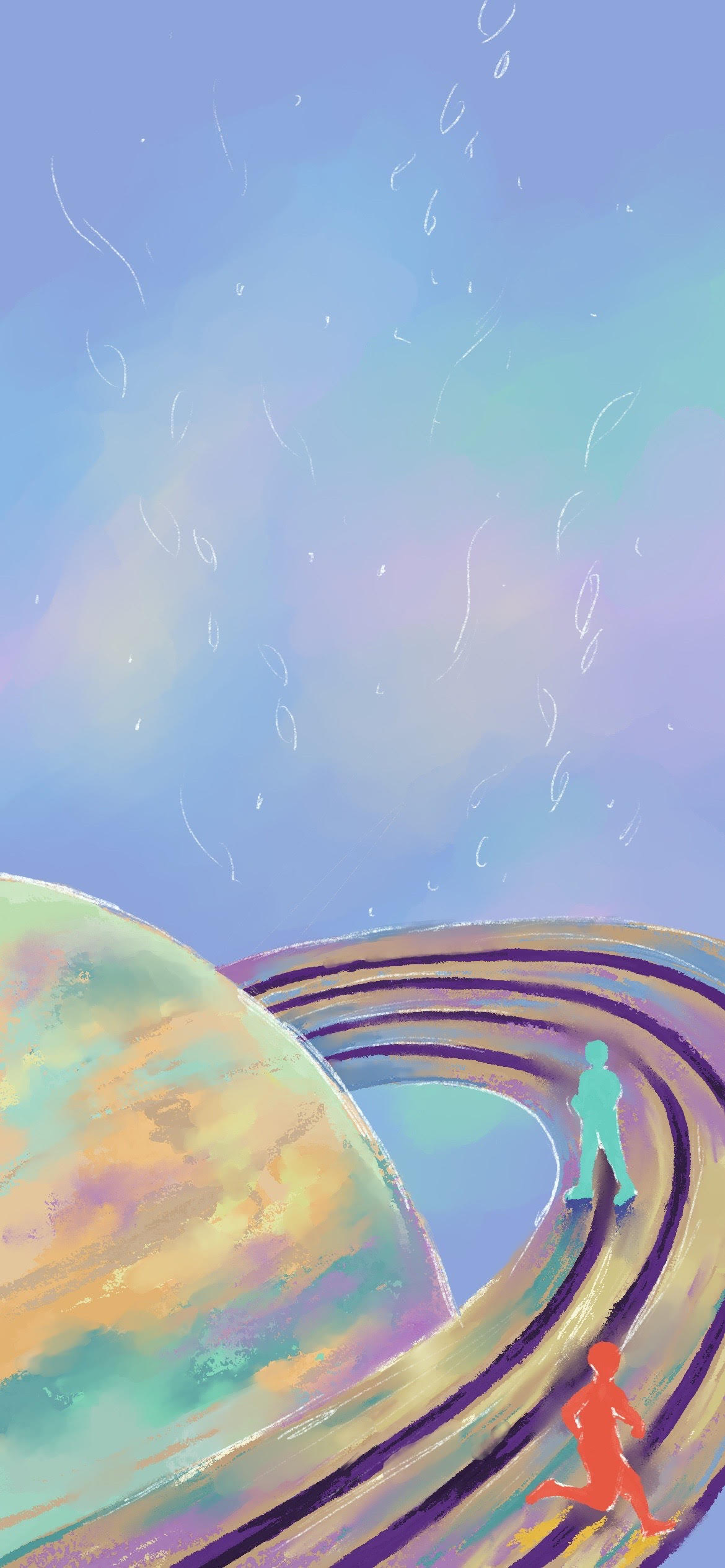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