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어짐 마저 사랑인 사랑이 있다. 떠나는 것이 사랑의 필연이자 완성이라고 여기는 사랑. 생각해보면 사랑은 세상 모든 불합리한 일들을 정당화시키니까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당연해지는 헤어짐이 어색할 일은 아니다. 떠나야 완성되는 사랑은 결국 떠나야 한다. 떠나지 않았다면 그새 사랑은 집착이나 도착(倒錯), 추함으로 바래진다. 그렇기에 떠나버린 일들이 나에게 적지 않다.
반면에 끝까지 놓지 않는 사랑도 있다. 떠나지 않도록, 내 곁을 열고 찌질거리는 일도 분명 사랑이다. 놓아주지 않아야 볼 수 있는 모습이 있다. 집착해야 얻어낼 수 있는 눈빛이 있다. 집착이 낳은 미움까지 사랑이라 부르는 사랑이 있다. 나는 사실 앞의 사랑보다 이런 류의 것들을 더욱 즐겨왔다.
너무나도 뻔뻔하게 역설을 허용하는 사랑은, 누구나 명쾌하게 듣도록 정의하고 싶어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 나가는 모래알처럼 한 줌에 전부 잡아낼 수가 없다. 흘러내린 모래를 주우려 고개를 숙이면 어느새 쥐고 있던 내 손은 빈 손이다. 바닥에 흩뿌려진 모래알을 세다 보면 전부 하나같이 사랑이다. 감정에 인격이 있다면 가장 말이 많은 것은 분명 사랑일 것이다.
추신 / 글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들도 누군가에겐 사랑이고, 사랑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누군가에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사랑이란 감정이 참 뻔뻔한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국을 위해 거리로 나서기엔 다소 추운 3월의 첫날입니다.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해준 어제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추신 / 그림
정말 간만에 연필을 잡았네요 2b, 6b, 8b의 사각거림을 느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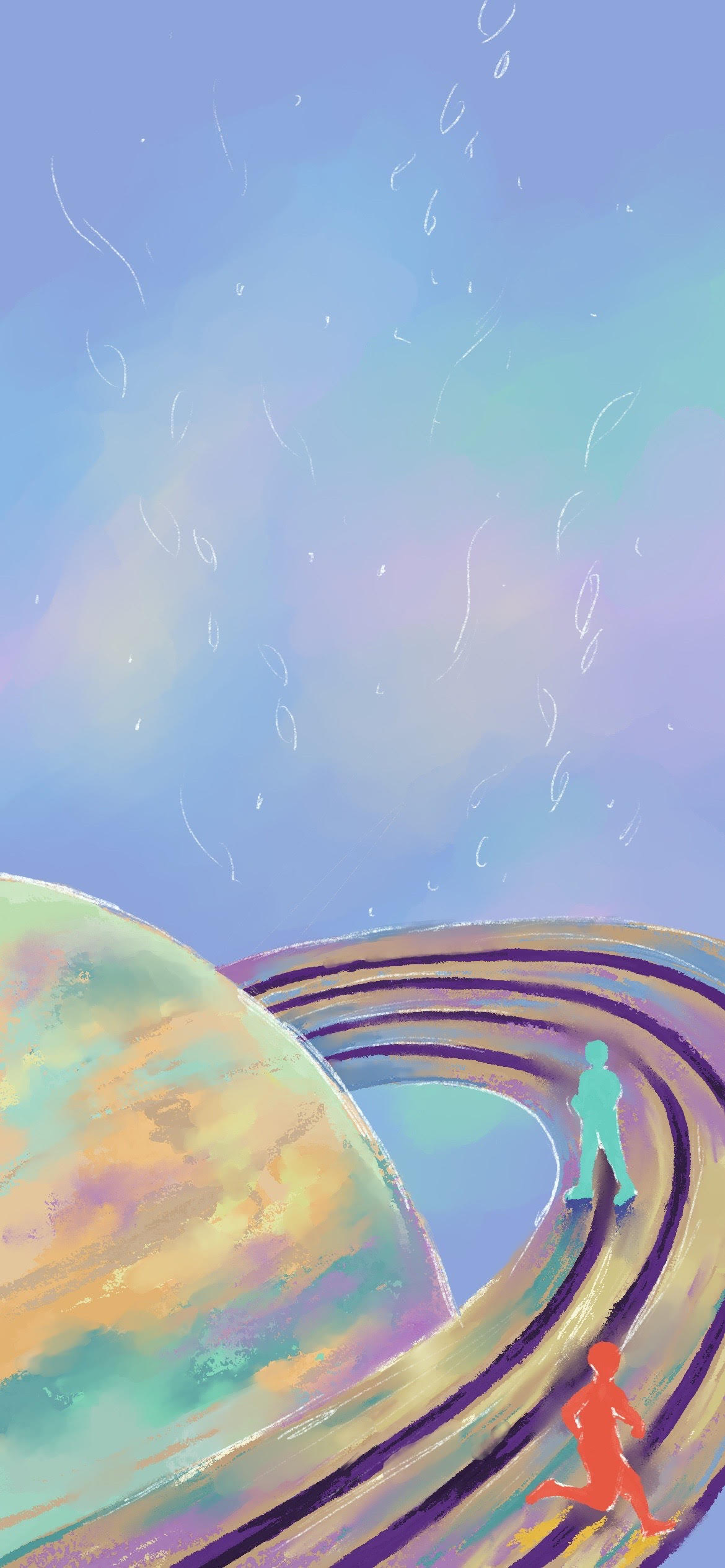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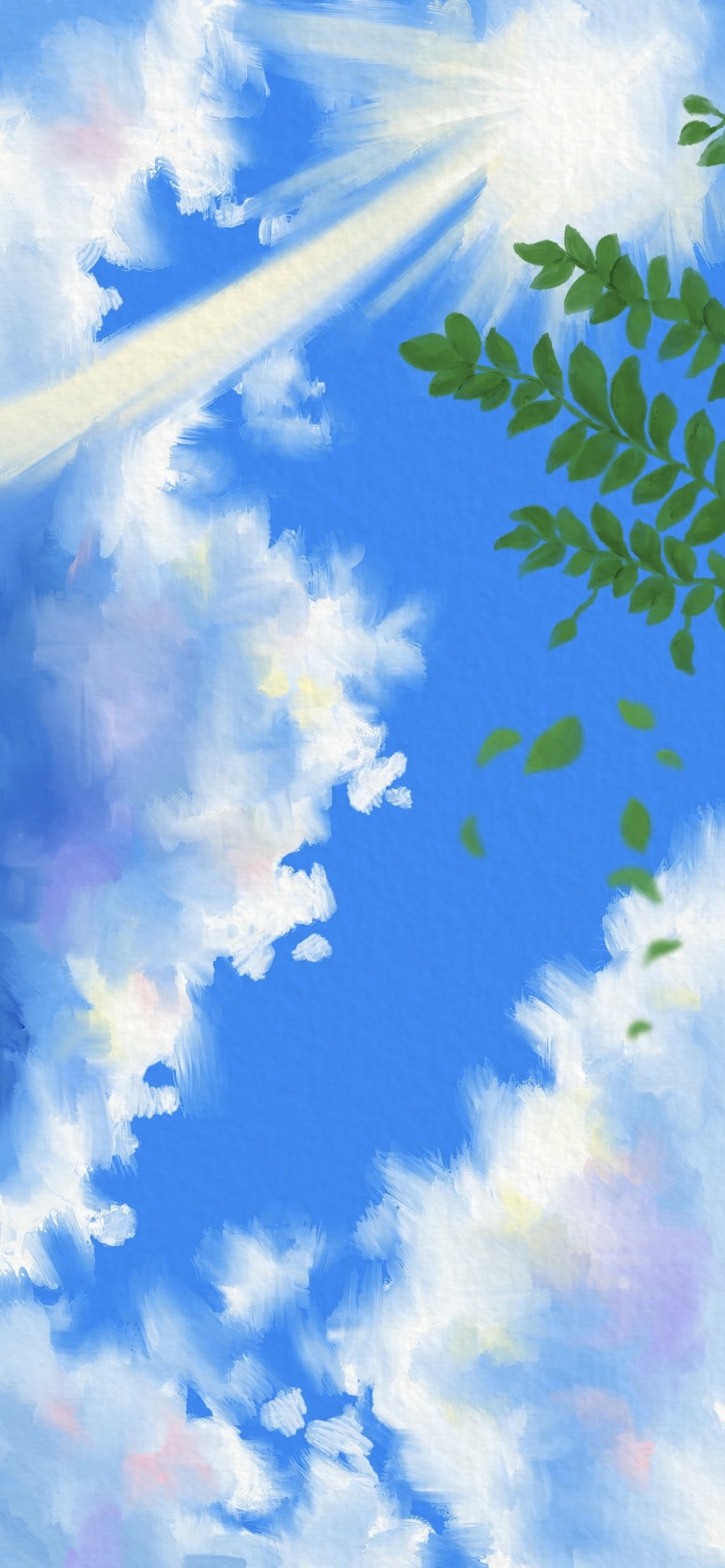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