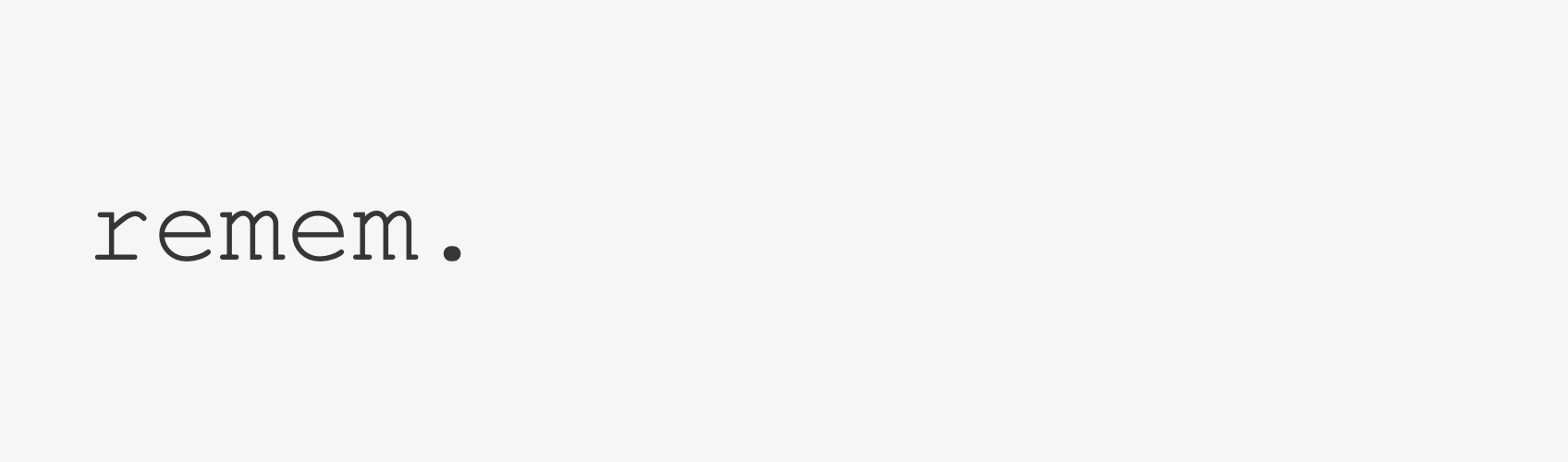
# 참 희한한 일
일간지 기자로 13년, 해외봉사 NGO 활동가로 만 14년, 도서관 기간제 사서로 20개월을 일한 이씨. 만 29년을 동지로 함께 산 동갑내기 남편 이씨처럼, 그 역시 다리 한쪽은 늘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봉사의 자리에 걸쳐두고는 아이들이 다 독립하면 자신들의 노동을 반겨 맞이해줄 곳으로 다시 떠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그의 생애 마지막 자리는 일터의 옹색한 미화원 쉼터였다.
2019년 10월 사서로서 근무 마지막 날, 아내는 일기 같은 에세이를 썼다. "(지난) 2년의 시간은 나를 위한 쉼의 시간이었다. (...서강도서관은) 나를 'start-up' 시켜준 곳이고, 나의 정체성을 다시 발견하도록 시간을 내어준 아름다운 공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한 달 뒤, 그는 서울대 기숙사(관악사) 무기계약직 청소노동자가 됐다.
중간관리자가 바뀌면서 미화원들이 듣도 보도 못한 영어-한자 시험이란 걸 치르게 된 일을 두고도 아내는 남편에게 "참 희한한 일도 다 있다"고만 말했다. 그게 아내 이씨가 욕하는 방식이었다. 시험을 함께 치른 이 중에는 한글을 못 익힌 이가 있었고, 점수가 공개돼 부끄러움과 서러움에 흐느낀 이도 있었다. 회의실에 올 때는 좋은 옷 입고 오라고 했다는 중간관리자의 이른바 '드레스코드' 지시는 과잉 충성이 빚은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땀에 절어 떡 진 머리를 내보이기 싫어서 회의실에서도 쓰고 있던 미화원의 모자를 한사코 벗게 한 일은 모욕이고 폭력이었다.
장남 이씨는 정형화-제도화된 삶 대신 나름의 삶을 모색하는 지금의 자신이 마음에 든다고, 좋은 영향을 준 부모님이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가 신념을 주도적으로 실천하는 분이라면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묵묵히 지지하며 돕는 분이었다"고, "아버지는 좀 어려웠지만 어머니는 속마음도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분이었다"고 말했다.
# 순순히 어두운 밤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암투병 중 41세 나이로 사망한 루이이통 최초 흑인 수석 디자이너 버질 아블로를 위해 티모시 샬라메가 올린 추모시
순순히 어두운 밤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노인이여, 저무는 날에 소리치고 저항하세요.
꺼져가는 빛을 향해 분노하고, 또 분노하세요.
현자들이 끝을 앞두고 어둠이 지당함을 깨닫는다 해도
그들의 말은 이제 더이상 빛이 나지 않으니
순순히 어두운 밤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선한 자들은 마지막 파도 곁에서 자신들의 가녀린 과거가
젊음의 바다에서 춤추었으면 얼마나 빛났을지를 슬퍼하니,
꺼져가는 빛을 향해 분노하고, 또 분노하세요.
하늘의 해에 사로잡혀 노래하던 무법자들은
해는 진다는걸, 철지나 깨닫고 부르짖으니,
순순히 어두운 밤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죽음을 앞둔 위독한 자들은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멀어버린 눈은 유성처럼 힘을 내어 번뜩일 수 있으니,
꺼져가는 빛을 향해 분노하고, 또 분노하세요.
그리고 당신, 슬픔이 절정에 달한 가운데의 나의 아버지시여,
바라건대, 당신의 모진 눈물로 나를 저주하고 축복해 주세요.
순순히 어두운 밤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꺼져가는 빛을 향해 분노하고, 또 분노하세요.
딜런 토마스, 1914-19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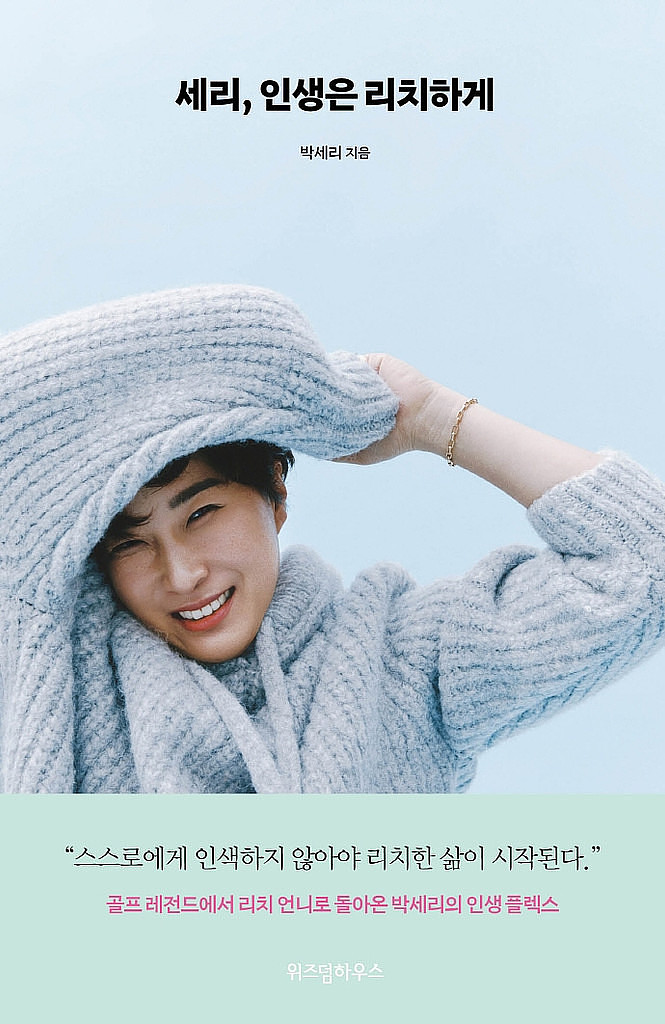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