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런치북 <서른의 나는 세살의 나를 불러본다>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외할머니 집으로 걸어갔다. 유치원에 다니기도 이를 만큼 어렸던 시절이었다. 늘 바빴던 부모님 대신 외할머니께서 어린 나를 돌봐주셨다. 할머니 손을 잡고 걷던 그 길을 아직도 기억한다. 차 하나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흙바닥 길이었다. 왼편에는 작은 주택과 빌라들이 줄지어 있었고, 오른쪽으로는 동네 뒷산이 시작되었다.
엄마가 할머니 집에 데려다주기도 했는데, 무언가에 쫓기는 듯 항상 발걸음이 빨랐다. 아빠는 차로 태워다 주셨다. 눈 깜짝할 사이였다. 아마 부모님은 얼른 일터로 나가셔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걸음을 재촉했던 부모님과는 달리, 할머니는 내게 한눈팔 여유를 허락해 주셨다.
어느 파릇한 초여름날이었다. 할머니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나비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다. 나비는 길 오른편 산길의 화단 쪽으로 날아갔다. 하얀 날개를 펄럭이며 꽃 사이를 자유롭게 누볐다. 알록달록한 들꽃 사이에서도 단연 눈에 띄었다.
가까이서 보고 싶었지만 도랑에 가로막혀 더 다가가지 못했다. 나는 나비가 이리 와주었으면 하는 마음에 할머니와 함께 노래를 불렀다.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노란 나비 흰나비..." 내 바람과는 달리,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나비는 저 멀리 산속으로, 하늘을 향해 높이 날아가버렸다. 풀꽃에서 나무로, 나무에서 하늘로. 나비를 따라 내 눈길은 더 멀고 더 높은 곳으로 향했다.
나비의 날갯짓 때문인가, 울창한 나무의 나뭇잎이 파도처럼 일렁였다. 푸른 바탕에 솜사탕 같은 구름이 두둥실 떠다녔다. 풀내음 섞인 산뜻한 바람이 불었다. 할머니의 따뜻한 손이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나비랑 재미있게 놀았으니, 집으로 가자는 뜻이었다. 못내 아쉬운 마음에 흰나비가 사라졌던 쪽을 계속 뒤돌아봤다. 아마 밝은 햇살 속에 숨어 있었지 않았을까.
나비를 만난 이후로 자꾸 산 쪽으로 눈길이 갔다. 들꽃이 피었다 지고, 나무는 붉게 단풍이 들었다. 반대편의 회색빛 시멘트 빌라와는 다른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그 기억 때문일까, 어른이 된 지금도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건물보다, 나비가 있을 것 같은 푸르고 청명한 자연이 좋다. 자연 속에는 내가 나비를 따라가게 두었던 할머니의 여유가 묻어있는 듯하다.
흙, 풀, 꽃, 나무, 하늘. 이런 자연의 단어는 할머니께서 가장 먼저 알려주셨을 것이다. 부모님은 나와 함께 하늘을 바라볼 여유가 없으셨을 테니까. 그 길을 함께 걷고 멈췄던 장면에는 항상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다.
지금도 가끔 본가에 내려가면 그 길을 지나치곤 한다. 좁았던 흙길은 왕복 4차선의 매끈한 아스팔트 길이 되었다. 더 이상 나비는 보이지 않는다. 꽃도, 나무도, 하늘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시멘트 건물 쪽에 만들어진 보도블록 위를 스스로의 발길을 재촉하며 걸을 뿐이다.
그때의 나비는 어디로 갔을까. 그때의 여유는 어디로 갔을까. 더 이상 잡지 못하는 할머니의 손길을 잊으려 괜히 힘차게 손을 흔들어본다.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다음화 보러가기
브런치북<서른의 나는 세살의 나를 불러본다>
이 글이 당신의 어린 시절 한 장면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숨 막히게 바쁘고 팍팍한 일상이라도, 따뜻한 추억 한 줌씩은 꼭 챙겨가세요 :)
📜브런치북 보러가기
지난 주의 완독 인증
읽은 흔적을 남겨주시면, 제게 큰 힘이 돼요.
"잘읽었음" 4글자만 남겨주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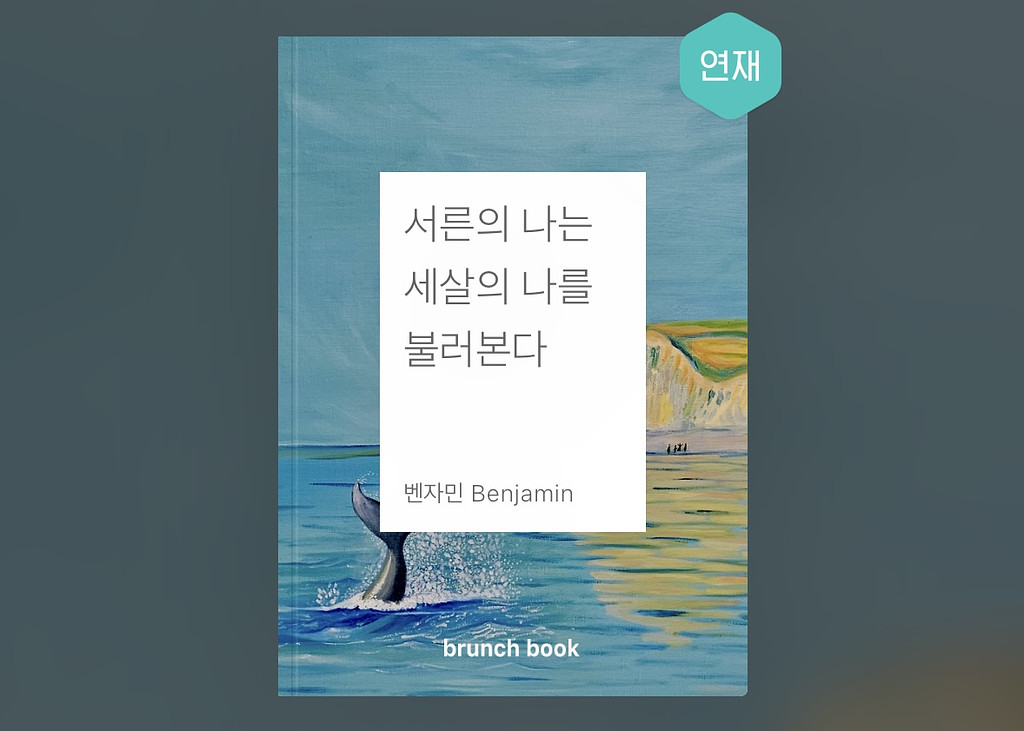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