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독자님의 오늘 출근길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지금의 직업을 선택하셨는지 궁금해지는 화요일 아침이네요. 힘들고 지치지만 그래도 에디터 우기가 연기를 계속하는 이유, <주간적인 영화썰>에서 만나보세요. 또, 이번 주 여러분의 퇴근길을 책임질 볼거리도 준비했어요. 오늘은 에디터 혀기의 추천작을 공개합니다. 주간 영화, 상영 곧 시작하니 자리에 착석해 주세요. 😌

그래도 우리가 연기를 하는 이유

나는 타고난 배우가 아니다.
이 사실을 가장 크게 깨달은 건 나의 첫 '배역이 있는'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였다. 가끔씩 단역 알바를 위해 현장에 어쩌다 한 번씩 일하러 간 적이 있었다. (스태프로 정신없이 일하는 것보다 단역으로 참여해서 현장을 제 3자의 시선에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일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그날은 드라마의 한 장면인 공개수업 씬을 촬영하는 날이었고, 나는 아침부터 서울의 어느 고등학교로 향했다. 말이 좋아야 단역이지, 그날은 30명의 학생 단역들이 교실에 앉아 다같이 비슷한 대사를 선생님과 주고받는 씬이라 실제로는 엑스트라와 별다를 게 없었다.
촬영이 끝나갈 때쯤 조연출님께서 '이중에서 자기가 연기를 꼭 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물었다. 의외로 많이 손을 들지 않았다. 고작해야 8~9명 정도였던 걸로 기억한다. 반장님 (단역/엑스트라 담당하시는 분)께서 나와 또 다른 한 명의 등을 두드리며 "얘네들이 잘하는 애들인데."라고 말씀하셨다.
여담이지만 촬영이 늘어져서 머리가 멍해진 상태였고, '뽑혀야지!'라는 생각밖에 머리에 없어서 반장님께 따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다. 아직도 그 때를 놓친것이 아쉽다. 그 한마디가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아있는 걸 보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싶다.
조연출님께서 싹 보시더니 안경을 쓴 순둥하게 생긴 남자, 그리고 나를 뽑았다. 쉴틈도 없이 우리는 바로 다음 씬으로 넘어갔다. 공개수업이 끝난 직후 누군가가 복도에서 '선생님!'하고 부르면, 기간제 교사인 주인공이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 고개를 돌렸다가 학부모와 학생 두 명이 다른 선생님에게 다가가 칭찬 세례를 퍼붓는 모습을 바라보는 씬이었다.

나에게 주어진 대사는 "쌤 너무 멋있었어요. 우리 엄마도 쌤 너무 좋대요."였다. 음... 타고난 배우라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대사였지만, 알아둬야 할 점은 앞에서 말했듯 나는 타고난 배우가 아니라는 것이다. 감독님께서 '액션'을 외쳤지만 나는 대사를 불과 30초 전에 처음 들어봤다는 점, 그리고 수십 명의 스태프 앞에서 배경에 녹아드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봤다는 점, 무엇보다도 타고난 배우가 아니라는 점. 이 모든 게 앙상블을 이루어 결국 대사를 입으로 말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수준의 연기가 나왔다.
컷하고 나서 감독님께서 고민하시던 5초 (체감상으로는 5분) 동안 정적이 흘렀다. 잠시 후 감독님께서는 애드립을 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하셨고, 결과는 처참했다. 이때 나는 진정한 아무말 대잔치가 무엇인지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사실 내가 이때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다. 아마 촬영본을 돌려본 편집 감독님께서만 아시지 않을까 싶다.
그때 생각만 하면 아직도 얼굴이 후끈거린다. 필자의 무리수스러운 애드립들을 듣자 상대 배우분 (선생님)께서 '어머'하고 웃으시면서 내 어깨를 탁 치셨고, 감독님은 '아까 버전이 더 낫다'며 웃으셨다. 그렇게 나의 역사적인 첫 연기는 막을 내렸다.
몇 개월 뒤. 본방은 차마 보지 못하고 나중에야 VOD 서비스로 내가 나온 씬을 찾아봤다. 놀라웠던 점은 통편집될 줄 알았던 내 분량이 의외로 대사까지 그대로 올라가있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내가 쓰는 VOD 서비스는 해외 서비스라 영어 자막까지도 올라가 있었다.
횡설수설했던 내 대사가 영어 자막으로도 나오는 것을 보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다. 그날 나의 대사 한 줄이 작품에 영향을 줬다는 느낌이라고나 할까. 드라마를 이루는 하나의 부분이 되었다는 묘하고도 간지러운 느낌. 나도 그렇고 다들 처음의 그 느낌을 잊지 못해 연기를 계속하는 건가 싶다.

영화와 게임을 광적으로 좋아하는 24살 너드.
취미로 가끔씩 영화도 만든다.
🍿 이번 주 볼거리

뉴욕의 한 경찰서에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다룬 형사물 코미디 시트콤.
코미디가 살아남기 힘든 시대에 이런 무해한 웃음이 얼마나 오랜만이었는지. <브루클린 99>의 노선은 분명하다. 진지해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기존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형식의 코미디 시트콤도 아니다. 분명 어디서 본 듯한 개성 강한 캐릭터들의 향연이지만 이는 <브루클린 99>의 단점이 아닌 분명한 강점이다.
제정신이 아닌 페랄타, 유능하지만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늘 곤욕을 치르는 에이미, 매사에 냉소적인 사이코 로사, 4차원의 한계를 넘어선 지나 등등. 어딘가 한구석씩 모자란 인물들이 모여서 만들어 내는 캐릭터 쇼는 정말 환장적이다. 그 누구도 아닌 캐릭터 스스로를 웃음거리로 삼는 유머 코드도 마음에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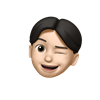
글로 이것저것 해보는 콘텐츠 에디터.
구독하는 OTT 서비스만 5개,
뭐 재미있는 거 없나 하다가 기어코 뉴스레터까지 손을 댔다.
오늘 상영은 여기까지에요. <주간영화>는 다음 주 이 시간,
에디터 혀기의 <주간적인 영화리뷰>로 돌아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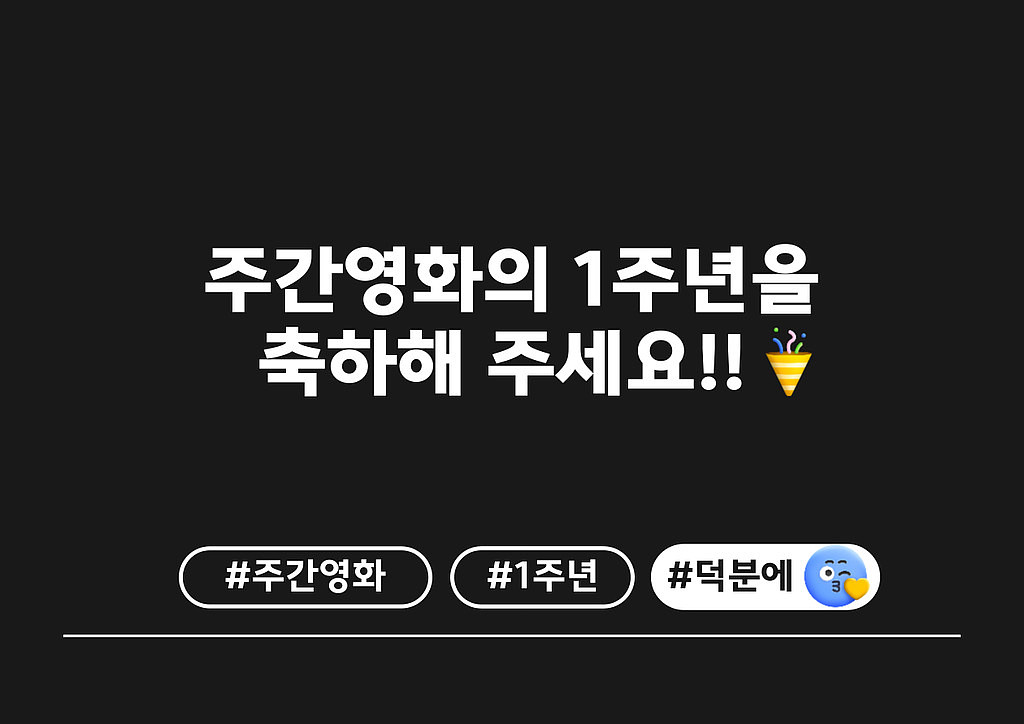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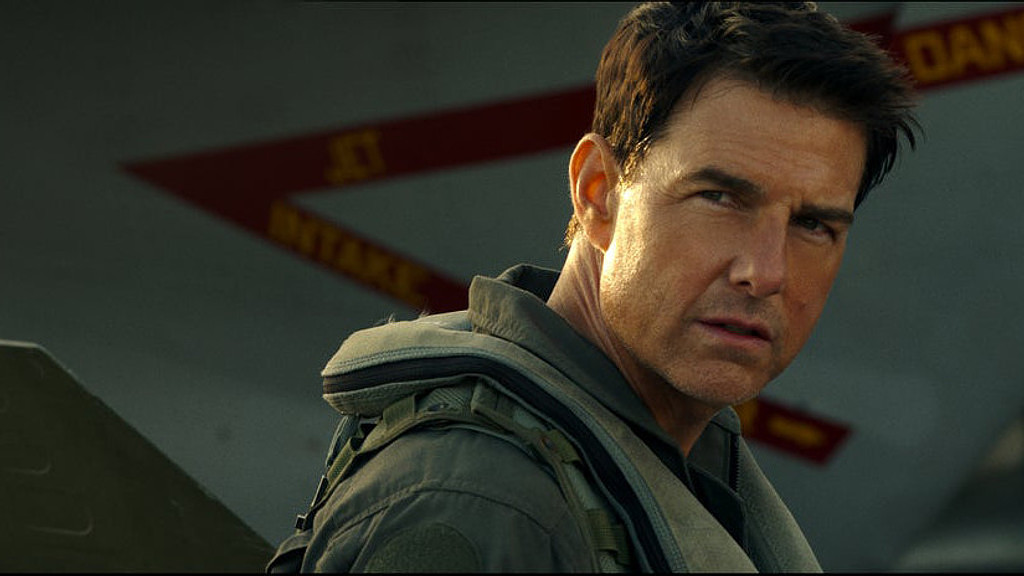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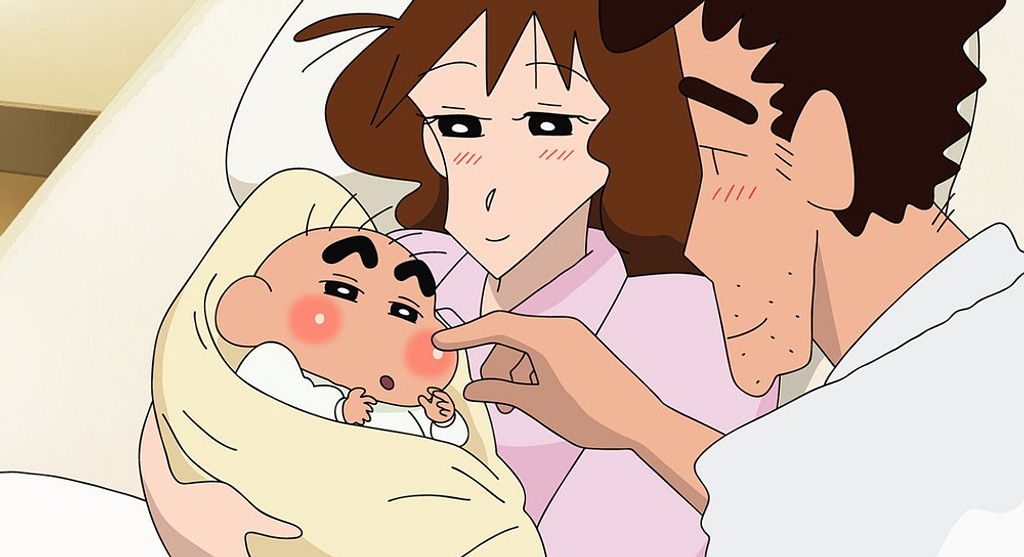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