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글쎄... 뛰는 게 체질에 맞지 않는 거 같아, 그냥 좀 빨리 걷지 모. "
매일 달리지 않으면 변 보고 뒤 닦지 않는 하루를 보낸 것 같다며, 하루 종일 회사에서 파김치가 되어 퇴근해도 밖에 나가 뛰어줘야 하루를 제대로 산 것 같다던 후배 녀석이 같이 좀 뛰자며 옆구리를 대놓고 쿡쿡 찌를 때마다 건넨 답이다. 뛰는 건 체질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평생 나와는 무관한 종목이라며 꿋꿋이 제끼고 살았다. 빨리 걷기랑 천천히 달리는 게 뭐 그리 다르다고, 별반 다를 바 없다며 단호하게 선을 긋고 살았다.
키는 160cm(해마다 줄고 있는 중이다), 체형은 작고 사지가 좀 짧은 편이다. 한눈에 보기엔 운동과는 크게 상관없어 보이는 몸이기도 하다. 보이기엔 딱히 기대하기 어려우나, 몸은 제법 기민해 중등교육을 받는 내내 체육 선생님들의 관심과 권유를 받아왔었다. 어깨 힘이 남달라 투포환 종목을 권유받았던 기억은 또렷하다. 국민학교 때 도 대표를 뽑는 육상대회에 나간 기억도 슬그머니 고개를 쳐든다. 체력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 단거리는 어쩌다 생긴 기회로 인생에 딱 한 번 마다할 수 없어 하긴 했어도, 정말 뛰는 건 질색. 굳이 원해서 뛰는 일을 만들진 않고 살아왔다.
서두가 길었지만 어쨌든 좋아서 뛰었던 기억이 없다. 뛰어서 좋았던 기억도 더불어 없다. 정말 없었나 하고 생각해 봐도 없다. 그런 내가 요즘 뛰고 있다. 어제도 뛰었고 오늘도 뛰었다. 그토록 뛰는 일은 평생 무관할 거라 단정 짓고 살았던 난 왜 뛰었을까?
궁금했다. 뛰면 가슴이 터진다고 했다. 호흡이 힘들어 죽을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곤 죽을 것 같다던 어제 말은 숫제 없었던 일인 듯 놀리듯 내 눈앞에서 다시 뛰는 사람들. '왜 멈추지 않고 뛰지?' 그렇게 힘들었다는데 또 뛰러 나간단다. 처음 보는 낯선 이도 아닌, 오랜 시간 함께 했던 지인들이 하나 둘, 뛰기 시작했다. 뛰며 달라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다 어느 날 불쑥 귀에서 맴돌며 부추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한번 뛰어봐. 아무것도 모르며 시작하는 일들이 요즘 얼마나 많아? 뛰기만 하면 금세 눈치채고 알 만한 건데 오늘만 뛰어 봐'라고.
옷을 주섬주섬 갈아입고 나가면서도 '뭐가 그리 다르려고'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다. '심장이 터질 때까지는 안 달릴래. 첫날인데 모. 그냥 천천히 뛰자' 하며 나갔다. 빠르게 걷는 거나 천천히 뛰기가 다르면 얼마나 다를까. 어차피 천천히 뛰니 속도도, 거리도 차이가 없을 테고, 혹여 에너지가 조금 달라질래나 하며 첫 발을 내디뎠다.
"어, 뭐야 이거?????"
달랐다. 힘차게 내디딘 걸음도 아니었는데 발이 땅에 닿으며 내 몸이 실리는 느낌이 쿵 하며 요동쳤다. 보폭도 아주 짧게 잡고 어깨에서부터 내린 팔놀림도 살랑살랑 몸이 흔들리는 대로 놔둔 채 그저 뛰는 모양새만 생각하고 디딘 걸음에 불과했다. 그런데 뒤이어 숨이 가빠진다. 옆에서 뛰는 모양새를 보면 그저 그냥 빨리 걷는 거나 진배없는 몸짓인데 숨이 가빠 왔다. 빨리 걸을 때는 한참을 걸어야 호흡이 가빠 왔기에, 갑자기 가빠 오는 호흡에 정신이 버쩍 들었다. 호흡이 가빠지니, 피가 어디서 쏠려오는지 몸 안 에너지의 흐름이 온전히 느껴졌다. 체중이 쏠려 땅에 닿을 때 무릎에 충격이 덜 가게 자세와 균형까지 마음을 모아야 했다. 곧이어 몸이 젖기 시작했다. 춥다고 온몸을 싸서 나갔더니 목에 두른 머플러가 목을 죄는 것 같았다. 풀면서 뛰었다. 이미 머플러는 땀에 젖어 버려 여러 차례 두른 목과 심히 화합 중이다. 빠져나오질 않는다. 빨리 걸을 땐 몰두해서 들으며 같이 웃고 울었던 '내 귀에 오디오북'도 이미 소음이 된 지 오래다.
<말의 품격>에 대해서 들으며 나의 격도, 아침 기운도 상승시켜야지, 하며 머플러에, 오디오북까지 세팅하며 나섰던 몸은 하염없이 젖고 가빴다. 체중이 실려 뛰니 장기가 요동치는 것까지 느껴졌다. 장 운동이 활발해지는 걸 가감 없이 느낄 수 있었다. 아침밥이 화근이었나. 속까지 미슥거린다. 맘 먹고 나온 첫날인데, 결과가 참담할 순 없지 싶어 뛰다가 다시 빨리 걷기로 전환하며 가빴던 숨을 몰아 쉬었다. 이참에 그냥 걷고 말까 싶은 얄팍한 꼼수가 올라왔지만, 순간 도리질을 했다. 나의 첫 달리긴데 말야. 다시 자세를 갖추고 뛰었다. 한참을 뛰었다. 나이키 앱에서 정다운 목소리로 따스하게 건넨다. 10분 지났다고. 뭬야???? 고작 10분인데, 남은 20분은 어쩌나? 이 상황이 믿기지가 않았지만 호흡이 가빠 쓰러질 정도는 아니었기에 맘을 잘 정돈해가며 뛰었다. 내리 30분을 뛸 수는 없어 4/5 뛰고, 1/5 번갈아 걸으며, 호흡을 정돈했다. 마지막 5분은 빠르게 걸으며 흐르는 땀을 식혔다. 심장은 터지지 않고 안전하게 요동쳤다. 덕분에 심장소리도 들었다. '나 여기 있다'라며 정확하게.
그저 한 끗 차라고 생각했다. 예상한 대로 기록은 별반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미세한 한 끗 차가 가져온 격차는 벅찼다. 뛰는 내내 몸 구석구석이 소리쳤다. 여기도 네 몸, 저기도 네 몸이라며 심지어 몸 안 억눌렸던 가스 마저 새어 나오며 네 거라 아우성쳤다. 짧은 30분 첫 달리기는 내 몸이 내 것임을 알싸하게 알려줬다. 너무 어려울 거라 미리 겁먹고 안 풀고 버려둔 문제가 한순간에 간단하게 풀린 기분이다. 몸과 관련된 건 이미 알고 있다 한편 과신하기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애초에 관심을 두려 하지 않은 터였다. 해보니 할 만했고, 안 하고 살았으면 크게 후회할 뻔했다. 이 개운함, 어쩔 거야
이제 첫 발을 내디딘 나로선 마라톤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꾼다. 하지만 언젠가 꼭 한 번은 단거리 레이스에서라도 서고 싶다. 요즘 나의 러닝메이트 '나이키 러닝' 코치 크리스 베넷의 말을 전한다. 이렇게 멋진 여정이 달리기라면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 발행 버튼을 누르려는데 2024년 첫 눈이 온다. 제법 쌓이겠다. 내일은 길이 미끄럽겠는걸. 뛸 수 있으려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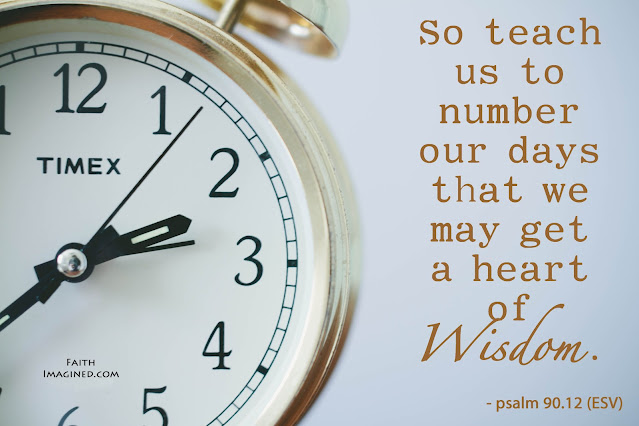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