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른 일곱,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 집안의 둘째딸로 태어난 지은이라는 사람이 적어도 7가지가 넘는 ‘업(業)’이라는 것을 넘어가는 과정 속 시간, 비용 두려움이라는 존재와 싸우며 부캐(부캐릭터)를 얻어간 순간의 이야기들.
조용한 대학생, 아웃도어 스위치를 눌러버리다
2008년 2월 이때 즈음이었다. 오전 7시, “빰빰 빠빰 굿모닝~”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은 휴대폰 알람으로 시작되었다. 부들부들한 이불 속에서 ‘5분만 더…’ 뒹굴고 싶었지만, 차가운 수돗물과 악수를 하며 잠에게 이별을 고했다. 늦어도 일년 뒤, ‘미국? 캐나다? 나는 어디 즈음에 있을까?’ 교환학생이 되어 초록 잔디밭이 끝없이 펼쳐진 캠퍼스를 누빌 상상을 하면 에너지는 풀 충전이 되었다. 그렇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매일 아침 영어학원에 출근도장을 찍었다. 그해 겨울은 비행기를 타고 어디론가 이미 날아간 것 같았다.
새학기가 시작되고 며칠이 지난 어느 평일, 30년 가까이 한 회사를 성실히 다닌 아빠의 전근 발표날이었다. ‘멀어 봐야 서울이겠지?’ 하지만 그날이 전근이 아니라 퇴직 통보일이 될 줄은 가족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렇게 몇달 뒤, 거짓말처럼 집안의 가세가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그래도 지은이 유학은 보내 줄게" 엄마는 학교-학원-집 루틴을 돌던 나의 손에 매달 학원비를 쥐여 주었다. 하지만 겉옷이 하나씩 얇아지고 반팔을 입을 때가 되자, 부모님의 한숨 쉬는 소리가 점점 커져갔다.
매미가 한참 소리칠 즈음, 우리집에선 금 모으기 운동이 시작되었다. 엄마의 결혼 패물, 아빠의 금 열쇠는 나의 학비가 되기 위해 현금으로 돌아왔다. 고맙기도, 미안하기도, 오묘한 마음이 점점 부풀어 올랐다. '이런 상황에 교환학생은 무슨, 일초라도 빨리 취업해서 돈이나 벌자'. 초록 잔디밭에 누워 둥둥 떠다니는 하얀 구름을 바라보다 사르르 잠이 드는 유학생 이미지는 곱게 접어 마음 속 상자에 담아버렸다. 그렇게 나의 루틴은 학원 대신 학교-아르바이트를-집으로 바뀌었다.
취업을 빨리하기 위해서는 두 갈래의 길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까만 밤을 책과 함께하며 장학금을 받고 교수님 추천서를 받거나, 하얗게 빈 이력서에 대외활동 경력을 빼곡히 채우는 것이었다. 나의 전공은 문헌정보학이라 공무원과 비슷한 사서가 될 수 있었고, ’공부를 열심히 해 볼까?’ 생각을 하려는 찰나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터져버렸다. 두번째 IMF가 온 듯 채용시장은 꽁꽁 얼어붙었다. 너도나도 안정을 목표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고, 열람실 대기줄은 점점 길어졌다. ‘몇 년간 시험준비만 하는 것보다 이력서를 화려하게 만드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자석에 끌린 듯 나는 후자의 길로 걸어갔다.
조용히 학교만 다닌, 대외활동 경험이 전무했던 나는 친구에게 전해들은 공모전 사이트부터 들락거리기 시작했다. 습관처럼 컴퓨터 앞에서 스크롤을 내리던 어느 날, 돋보기로 키운 것 같은 문장 한 줄이 눈에 확 들어왔다. 'W기업 마케터가 되어보세요. 활동 지원금, 더해서 해외 탐방까지 보내 드립니다' 대기업에서 올린 대학생 마케터 공고문이었다. '붙기만 하면, 100% 공짜로 해외여행에, 돈까지 준다고?' 유학 대신 새로운 기회가 저 멀리서 달려오는 것만 같았다. 심장은 쿵쾅대기 시작했다.
그날부터, 눈에 불을 켜고 ‘마케터’ 합격을 목표로 달리기를 시작했다. 대외활동 지원 과정은 취업 프로세스와 비슷했다. 서류를 내고 통과를 하면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학교-아르바이트-집 루틴만 돌던 나는, 이력서 쓰기부터 막막했다. 모니터 앞에서 타다닥 타이핑을 반복하며 ‘꼭 붙어서 해외에 가고 싶다’를 주문처럼 되뇌었다. 간절함이 통해서 였을까, 스무 살부터 조각난 모든 기억들은 어느새 소환되어 퍼즐처럼 맞춰져 갔다. 이어 붙인 기억들은 한자 한자 까만 글씨가 되어 하얀 모니터를 채웠다. 베이비시터, 콜센터, 행정 아르바이트, 거기에외까지 경력 칸은 눈길이 갈 만 해졌다. 더해서 "제가 딱 적임자입니다." 짧은 세마디를 부풀리고 또 부풀린 자소서 아닌 자소설? 까지 작성해 '지원서를 완성했다. 그리고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제출' 버튼을 눌렀다. ‘제발 플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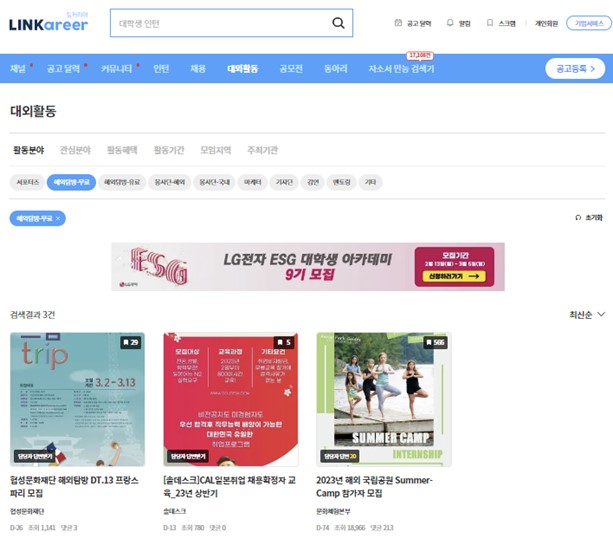
몇 주가 지난 후, 조마조마한 마음을 안고 W기업에서 날아온 메일을 열었다. '서류를 통과하였습니다. 면접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꺅꺅”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마음은 이미 공고문 속 해외로 날아가고 있었다. 떨리는 면접도 무난히 끝낸 후 꿈에 그리던 '대학생 마케터'가 되었다.
첫 물꼬 틀기가 어려웠을 뿐, 면접 하나를 붙고 자신감이 올라가니 이력서를 쓰는 손가락에 부스터가 달려버렸다. 처음에는 300자를 채우는 데 몇 주나 걸렸는데, 두 번, 세번, 네 번…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 몇 시간 단위로 줄어들었다. 시험을 대비하는 사람처럼 공고문을 뚫어져라 여러 번 읽고, 같은 스토리에 고무줄을 단 것 마냥 글자수를 늘였다 줄이며 400, 600, 1000자를 채웠다. 곧 줄줄이 소시지처럼 다른 기업에서 서류 합격 메일들이 날아왔다. 면접장에 들어서기 며칠전부터 ‘나는 이미 합격한 사람이다’ 마인드 세팅으로 무장하니 면접 합격율도 올라갔다. 책과 친했던 나의 아웃도어 스위치는 그렇게 점점 off에서 on으로 바뀌어 갔다.
돌아보면, 그때는 유학이라는 길 하나가 사라진 순간이 아니라 n가지의 일을 하기 위한 준비운동 기간이었다. 이력서 쓰기와 면접의 반복은 취업을 위한 스트레칭이었고, 새로운 곳에서 경험한 활동들은 어느 곳에나 떨어져도 적응하는 몸풀기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었다. 명동 한복판에서 소리도 쳐보고, 응원복을 입고 춤을 추기도, 머나먼 캄보디아에서 삽을 들고 땅을 파기도 했다. 점차 생존형 인간이 되어갔다. 더해서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인연은 이어진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시기였다. 이유 중 하나는, 지금 다니고 있는 스타트업을 함께 창립한 대표가 대학교 대외활동에서 만난 인물 중 한명이다. 자세한 이야기는,
To be continued…

* 지은이
호기심쟁이라 여러 일을 넘나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임원, 심리상담사, 학생, 작가' 네 가지 '직업(業)'을 병행하며 순간의 감정을 글로 풀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세상의 모든 청년>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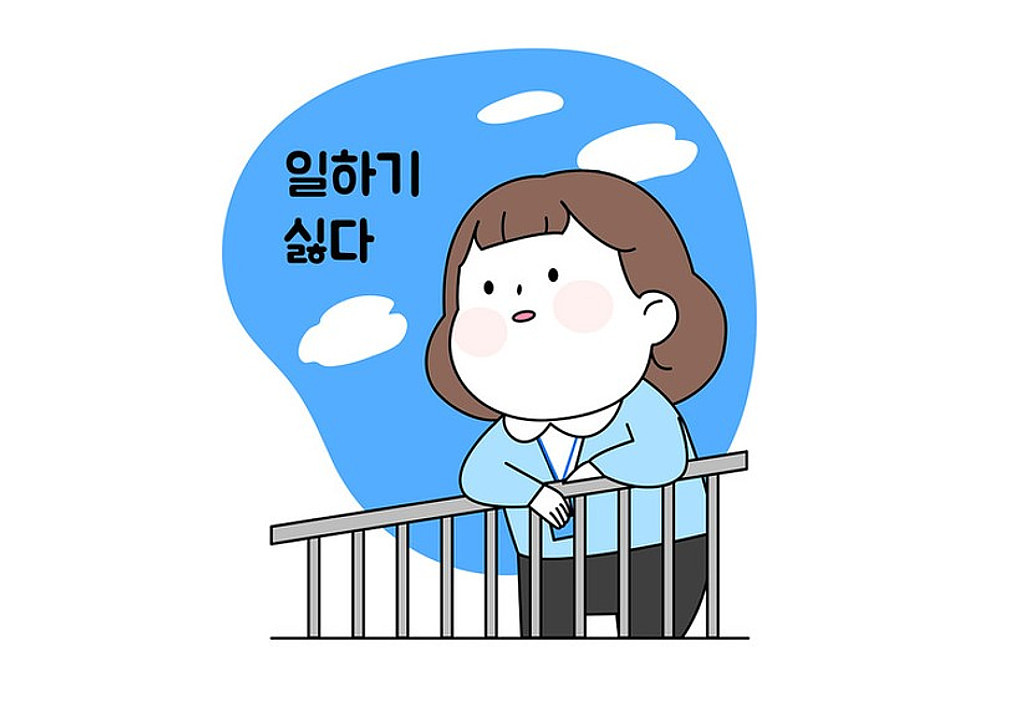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
당공이
살면서 부캐를 만들어 보려는 생각도 없이 인생 대충 사는 저에게는 반성이 되는 글이였습니다😂😂 다음 글도 기대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
비공개 댓글 입니다. (메일러와 댓글을 남긴이만 볼 수 있어요)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