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 정혜신의 <당신이 옳다>란 책을 접했다. 그는 정신과 의사다. 그러나 병원이란 권위 있는 공간에서 밀폐된 채 환자를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가 아니라 현장에서 피해자의 치유에 전념하는 의사다. 세월호 참사 당시 여러 심리치료사와 정신과 의사들이 현장으로 달려갔지만, 대부분 현장에서 외면 당하거나 스스로 뒷걸음쳐 나갔다. 그만큼 병원에서 마주하는 환자들과 병원 밖의 현장은 달랐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 정혜신은 누구에게나 일상 생활에서 “집밥 같은 치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그러한 심리학을 '적정심리학'이라 명명했다.
이 생소한 개념의 원천을 추적해 보면 '적정기술(適正技術, appropriate technology)'로 연결된다. 적정기술이란,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달하는 최첨단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술의 결핍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상적인 기술을 의미한다. 생각해 보면 한국전쟁을 겪은, 더 멀게는 일제강점기를 경험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입장에서 스마트폰에, 사물 인터넷에, 자동화된 기계에, 최근 AI 기술까지… 젊은 사람들조차 쉽게 적응하기 힘든 이 세상은 얼마나 낯설까. 차 한 잔 마시려고 키오스크 앞을 서성이다 뒤돌아서게 만드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기술 시대의 착잡한 이면이다. 적정기술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돕는 기술이고, 정혜신은 이를 심리학에 적용했다. “집밥 같은 치유”란 개념은 그렇게 나왔다. 그 개념과 낱말들이 내 가슴 어딘가에 와닿았다. 일상 생활에서 우리는 까지거나 다치면 아까징끼(?)를 바르고 대일밴드(!)를 붙인다. 그런 일상적인 심리 치료가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다.
이 책을 보며 그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던 중에 같이 사는 친구가 내게 아래 기사 링크를 보내주었다. 한때 나의 반려인은 주민자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적이 있다. 동시에 문헌정보학을 공부하면서 ‘공공성(publicness)’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며 논문을 썼다. 그래서 자치, 평등, 공정성, 정보 리터러시 등 여러 개념들이 그의 글에 교차한다. 그러던 중 소수자와 관련된 이 기사가 같이 사는 친구의 눈에 밟혔나 보다.
위 기사에 따르면, 미국 뉴욕에 거주 중인 한국인 이민자 사회의 구성원인 김영옥 님은 “망각 속에서 사라질지도 모를 기록을” 아카이빙해서 소수자인 이주 한인들의 삶을 세상에 내놓았다. 그 결과물이 <뉴욕 한인복지를 위해 공헌한 사람들>이라는 책이다. 우리 주변에 있는, 혹은 역사 속에 존재했던 소수자의 목소리는 쉽게 사라지고 또 사라져 왔다. 남길 방법이 마땅치 않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요사이 ‘아카이빙’이라는 용어가 우리 학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용되는 감이 없지 않으나) 전공자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있어 기록을 모아 발간물 형태로 아카이빙하는 방법은 결코 나빠 보이지 않는다. 위 책의 경우 소수자 이민 사회의 역사를 수집하여 정리한다는 것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책을 발간하는 과정과 그 결과물을 통해 한인 사회의 구성원들 스스로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간 겪었던 어려움과 서러움에 대한 치유의 감정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는 경험하지 않았을까.
이 기사를 보며 이러저러한 생각을 하다 보니, 적정심리학이라는 개념이 가능하다면 ‘적정기록학(適正記錄學, appropriate archival science)’이라는 개념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 즈음에 나는 같이 사는 친구를 포함한 몇몇 기록학 동지들과 함께 질적 연구를 위해 현장의 기록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기록연구사의 인터뷰를 정리하며 눈물 흘리는 반려인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적정기록학이라는 게 정말 가능하겠구나 싶었다. 우리가 만난 현장의 기록전문가들도 조직 내에서 홀로 소수자 신분으로 열악하게 일하고 있었다. 이들의 목소리를 끄집어 내어 아카이빙해서 드러내고, 그래서 그들의 권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글쓰기와 연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기록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있는 수많은 소수자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방법론으로도 연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실제로 이와 같은 실천적 연구를 하고 있는 보건학자 김승섭의 책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공부>을 접하게 되었다. 그는 여성, 트렌스젠더, 동성애자, 세월호와 천안함 피해자 등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서발턴'이라 불리는) 여러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집단이 겪는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연구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다. 딱딱하고 드라이한 연구로 사람을 감동하게 만드는 그런 재주를 지닌 사람. 그는 책에서 아래와 같이 말한다.
저는 연구자이지만 제가 비평가가 아니라 무대 위에 올라와 있는 플레이어라고 생각합니다. 제 학문에서도 거리를 두고 시스템을 관찰하고 보다 냉정하게 분석하는 일은 필수적입니다. 세상을 더 나은 모습으로 바꾸려면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내놓는 과정이 과학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생산되지 않은 지식을 생산하는 일은 누군가가 매우 의도적으로 준비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나와 내 동료들이 변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당장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현실이 변화할 가능성은 요원합니다. 일반화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과학의 자정능력도 실은 그 구체적인 과정을 바라보면 누군가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안간힘을 쓰며 노력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김승섭, 2023, 178)
아래의 말도 같이 인용해본다.
보건학은 응용과학이다. 이 학문에는 현실적 목표가 있다. 인간이 보다 평등하고 온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예방할 수 있는 질병으로, 피할 수 있었던 죽음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어떻게 학문으로 연대할 것인가 하는 질문은 보건학의 한가운데에 있다. 보건학자는 과학적 방법론을 이용해 시스템과 고통 사이의 인과성을 찾는다. 보건학의 학문적 탐구는 부조리한 현실을 바꾸어 내기 위한 과학적 근거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
(김승섭, 2023, 103)
위에서 인용한 김승섭 교수의 말들은 기록학에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할 것 같다. 기록학 역시 “세상을 더 나은 모습으로 바꾸려면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내놓는 과정이 과학적”이어야 할 테다. 기록학은 인문학의 카테고리에 속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회과학에 가깝다. 사회과학으로서의 기록학은 기록으로 소통하고 기록을 통해 보다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현실적인 목표”가 존재한다. 그렇기에 우리 기록학계도 “나와 내 동료들”이 “매우 의도적으로 준비”해서 “당장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현실이 변화할 가능성은 요원”할 것이 분명하다. 기록전문가는 현장에서 실천적인 대상적(對象的) 활동을 하고, 기록학 연구자는 기록 현실을 바꾸어 내기 위한 “과학적인 근거 생산을 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나는 여전히 기록학이 지니는 실천적인 힘을 믿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조직 내 소수자 신분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록전문가 동료들의 아픔과 힘듦은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것 같다. (왜냐면, 사실 나 역시 그들 중 한 명으로서 많이 힘드니까.) 지금 이렇게 적정기록학과 관련된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도 <기록과 사회>에 발행되었던 기록전문가 동료들의 몇몇 글들 덕이다.
그래서 적정기록학이란 결국 이러한 글 속 주인공들이 기록학 연구와 실천을 통해 상처가 치유되고 위로 받을 수 있는 기록학이라 하겠다. 절절함이 고스란히 묻어 나는 위의 글들을 다시금 읽으며 실천적 학문의 힘으로 누군가를 치유하는 기록학의 가능성을 타진해본다. 현장에선 나 역시 한 명의 기록전문가로서 활동하되, 학문 영역에서는 그 실무 현장을 받치고 있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과학적이고 또 인문학적인 근거를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속을 걸어가고 있는 요즈음이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든 적정기록학을 좀더 사색하고, 좀더 실천하고, 좀더 연구하는 내 마음 속 나침반으로 삼아야겠다는 결심을 해본다. (어쩌면 기록학을 통한 치유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바닥에서 희망이란 걸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 보이지만 누군가의 말처럼 내가 지쳤을 뿐 여전히 희망은 존재한다.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건 가장 쉽지만 “무책임”할 뿐이다. 그렇게 적정기록학의 힘을 믿어보며 글을 마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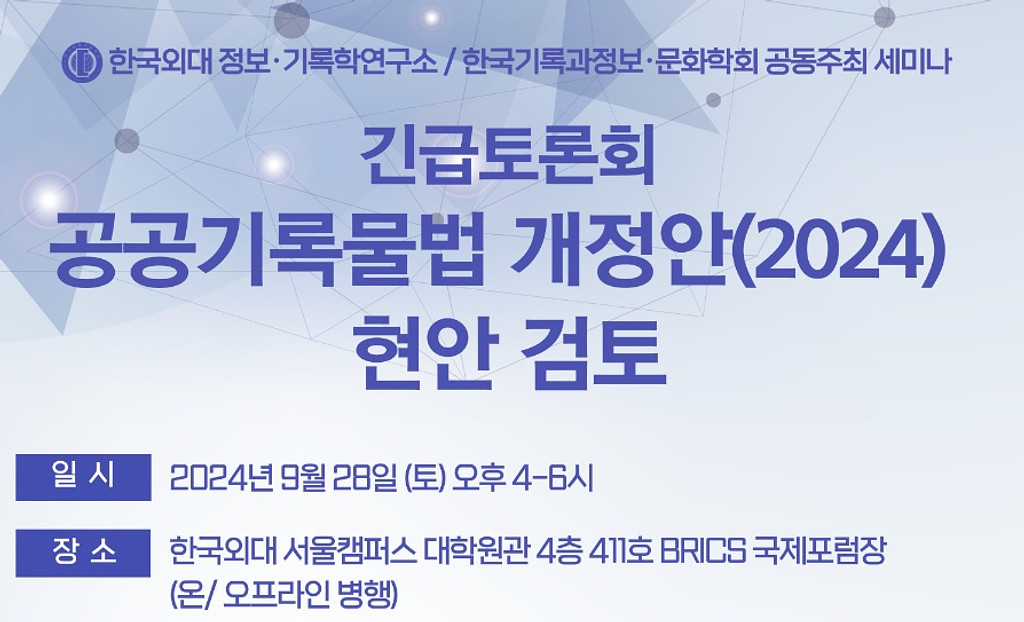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