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KEH PLAYLIST #춤을추며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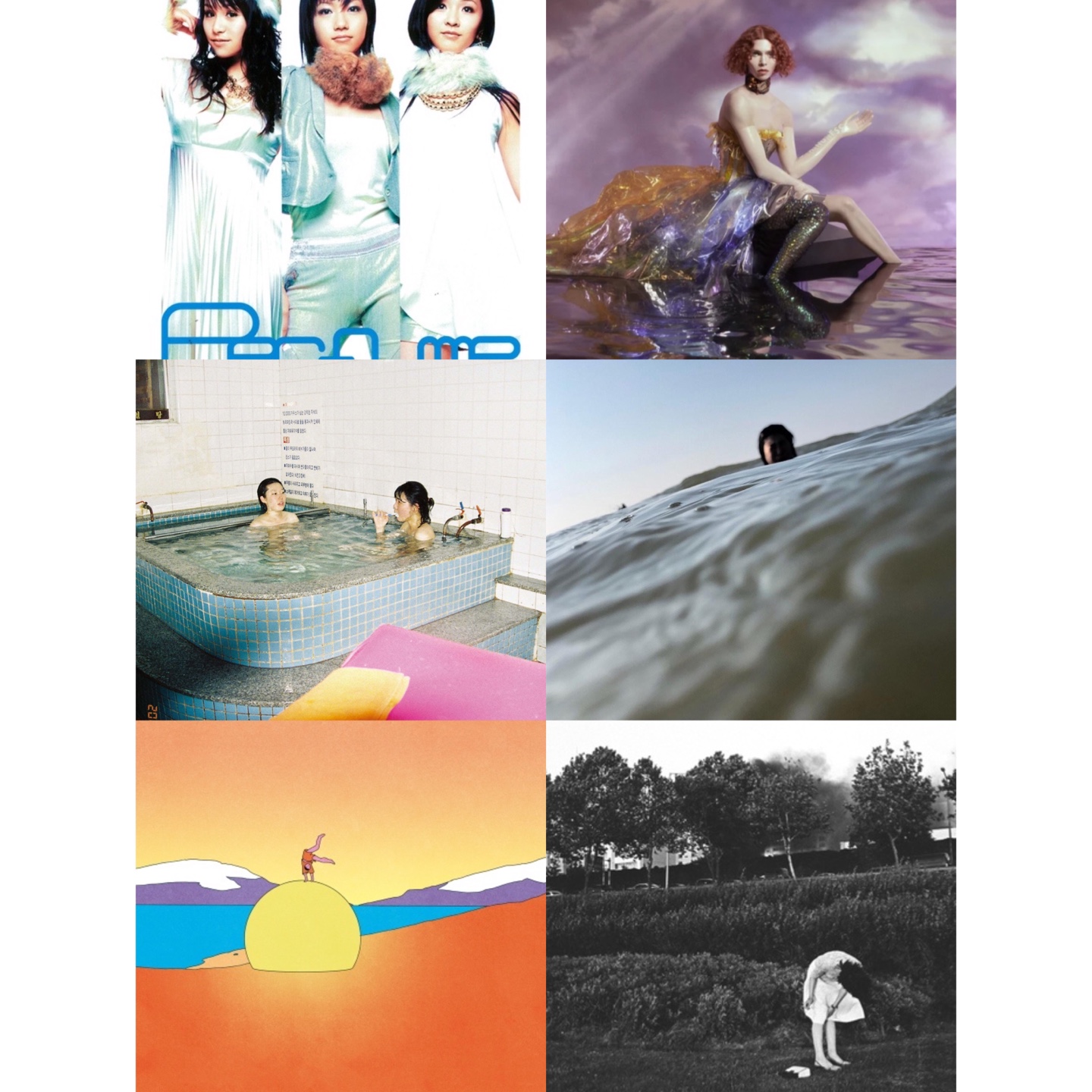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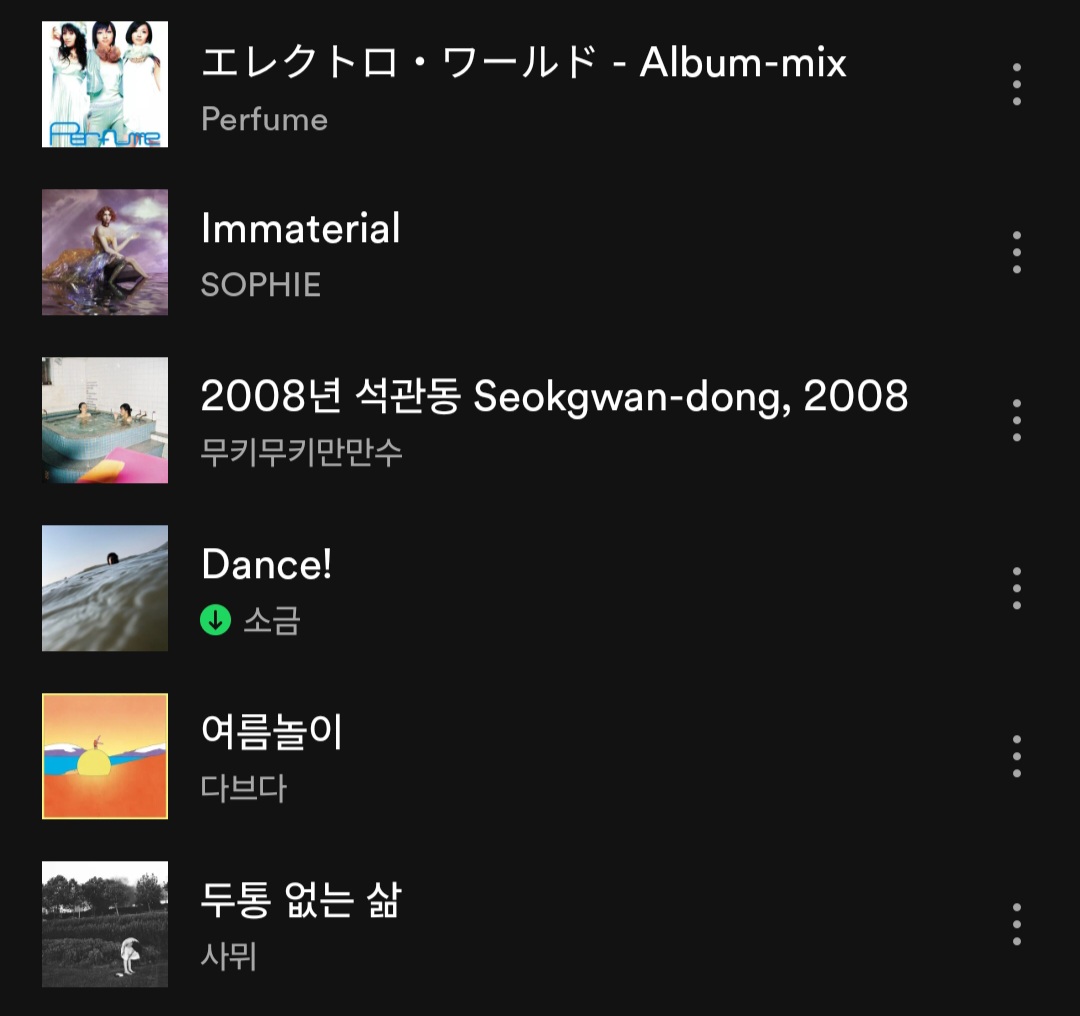
윤

춤이라곤 하나도 모르지만 돌이켜보면 나는 슬플 때마다 자주 춤을 추러 갔다. 우연히 을지로의 디제잉 파티에서 몸을 흔들다가 이것도 일종의 춤이란 걸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알아차렸다. 지금 이렇게나 즐거운데 슬프고 서러운 게 알게 뭔지.
위댄스의 노래 <아시나요>의 가사가 떠올랐다. ‘슬퍼서 추는 춤을 아시나요’. 나는 살풀이를 하려고 춤을 추는구나. 거의 엑스터시 상태가 된 채 말이다.
어떤 댄스음악은 어쩐지 슬프게 느껴지기도 하며 신나고 산만하지만 리듬을 타기 시작하면 무아지경에 빠져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게 된다. 록밴드의 라이브 공연과도 비슷하다.
타인을 의식하는 습관으로 과하게 주변의 눈치를 보던,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렸을 때의 내가 밴드의 라이브를 자주 다니면서 몸을 자연스럽게 흔들고 진정으로 음악을 즐길 때마다 전에 느낀 적 없는 자유로움을 실감하게 됐다. 춤을 춘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종종 음악을 듣는 일 자체도 버거울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밝은 댄스 음악에 맞춰 춤을 춘다. 슬픔도 춤을 추는 3분 동안은 어쩔 수 없을테니.
상욱

춤을 추는 게 뭐지? 춤이란 건 언제, 어떻게 춰야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 아예 모르는 언어를 마주하는 기분이다. 신이 나면, 흐름을 타면 몸을 흔들면 된다고 하지만 지나치게 원론적인 조언이라 별로 도움이 되진 못했던 것 같다. 물론 내가 언제 어디에 있든 30프로 정도는 울적한 기분이고 동시에 대부분의 파티에서 두 시간 정도 지나면 집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라 저 말을 더 이해하기 어려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종종 혼자서는 몸을 흔들거린다. 보통 적당히 나른하고 편안한, 약간은 울적한 기분일 때 음악을 들으며 몸을 움직인다. 특별히 대단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박자에 맞춰 몸을 움직이고 나름의 강세를 준다는 점에서 춤이라면 춤이라고 부를 수 있을만한 모습이다. 이번 주의 플레이리스트에는 나를 항상 '춤추게' 만드는 두 곡을 가져왔다. 가랑비에 어정쩡하게 젖어 집에 들어온 날의 기분 같은 음악들이다.
모두가 춤출만한 리듬의 곡은 아니지만, 파티에서 내가 고른 곡에 같이 흔들거릴 수 있다면 즐거울 것 같다. 다른 사람과 어떤 리듬을 공유하는 것은 기쁜 일이니까.
슬

지나친 슬픔이나 우울 앞에서 우리는 초연해진다.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끝없는 고민 속에 침잠할 때 그 고리를 끊는 것이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지만, 슬픔 앞에서 초연해지기란 무림 고수가 되기 위해 수련 하는 과정과도 같다.
초연해진 단계에 도달한 무림 고수들은 해탈한 상태로 행복을 흉내 낸다. 아니, 어쩌면 행복해지기 위한-적어도 고통 속에 몸부림 치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한-최후의 발악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나에게는 다브다의 <여름놀이>와 사뮈의 <두통 없는 삶>이 그렇다. 경쾌하고 밝은 사운드의 이면엔 지독한 여름놀이가 끝나면 모두 울어버릴 것이라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겟다 싶을 때마다 두통 없는 삶을 간절히 바란다는, 희망적인 멜로디와는 상반된 비관적인 가사로 노래한다.
슬픔과 고통의 현실을 받아들이기 보다는 슬픔 속에서 춤을 추며 현실을 회피하자는 메세지로 읽힐 수도 있겠지만, 이는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이를 즐거움으로 이겨내보고자 하는 필사의 노력이기도 하다.
참을 수 없는 불안 속에 유영할 때, 못 이기는 척 즐거운 음악에 몸을 맡겨보자. 춤을 출 때 만큼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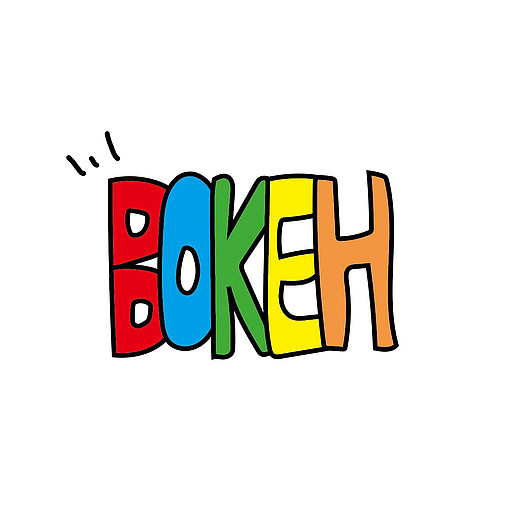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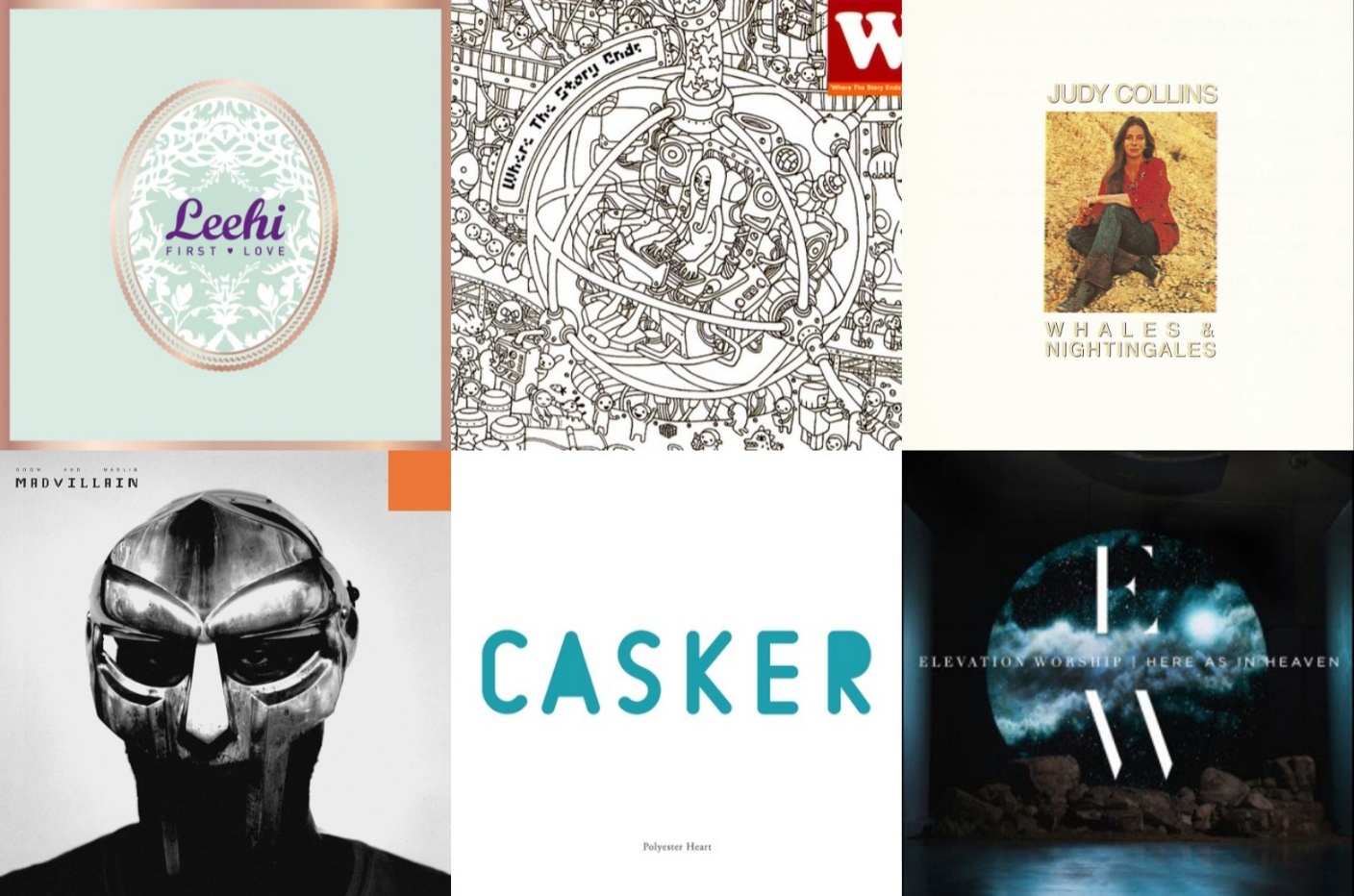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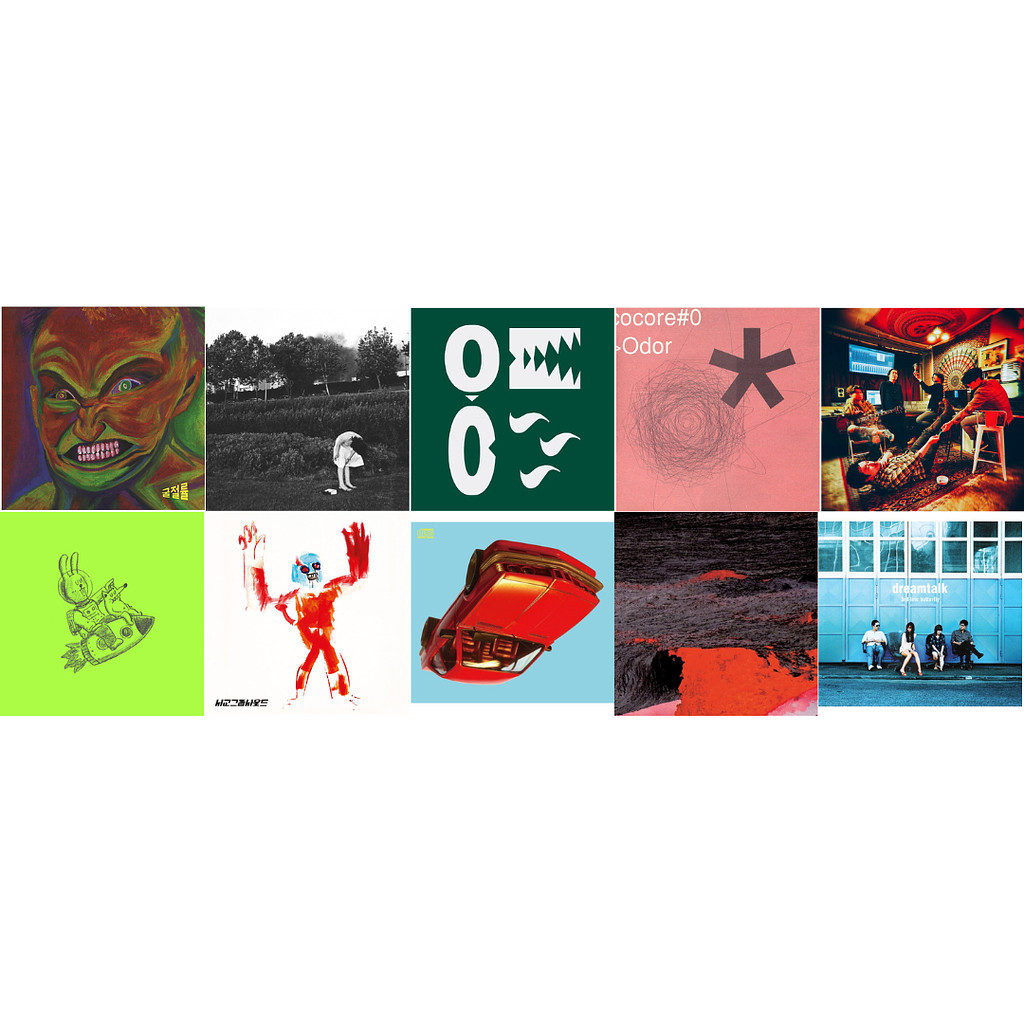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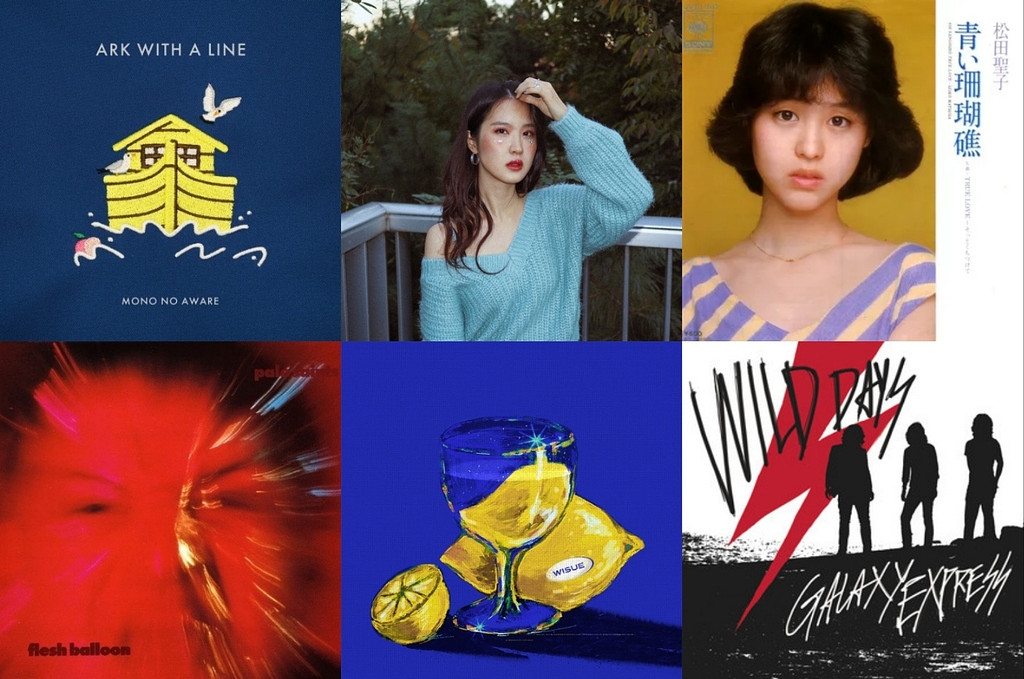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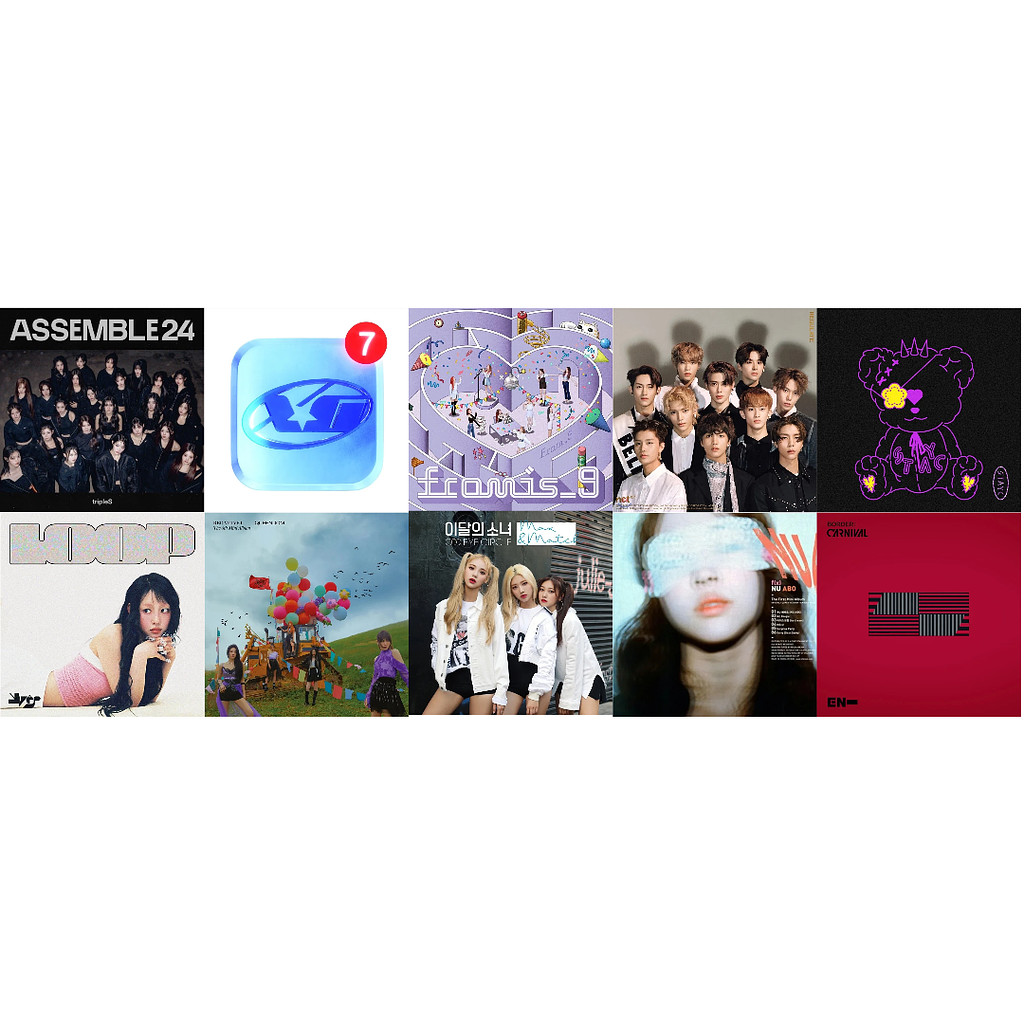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