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곱 번째 책 편지
가정의 달이라는 5월의 시작. 모두 잘 보내고 계실까요. 가끔 생각하곤 합니다. '잘' 지내다 혹은 '잘' 못 지내다와 같이 '잘' 이라는 부사를 언제 어떻게 써야 하나 라고. '잘' 이라는 것이 옳고 바르다 라는 뜻을 가졌다 하지만 그렇다면 바르게 지내고 못 지내고의 차이를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좀 엉뚱하고 심오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이렇게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에서 둘로 파생되어 나와요. 그래서 제 손에 잡혀 든 소설이 어쩌면 이것이었나 싶기도 했고요. 여전히 책을 선택하는 이유가 지극히 사적이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랬던 어제였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바로 장편 소설입니다.
영의 자리, 고민실, 한겨레출판, 2021. 04. p. 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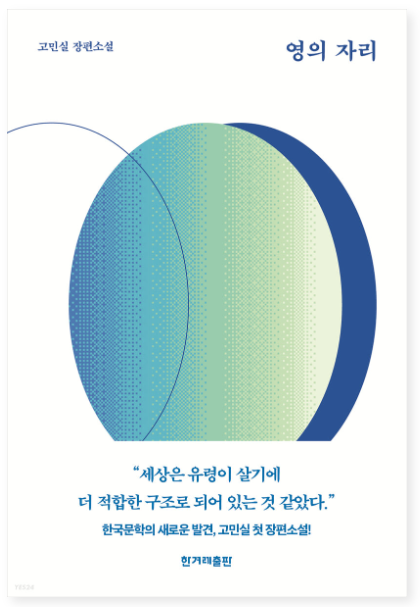
책 띠지의 카피 문구가 다가와서 선택했던 걸까요. 아니면 저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해서였을까요. '유령' 과 '영' 이라는 단어에 꽂히고 말았던 저였기에 아이들이 잠시 노는 틈에 집에서 공원에서 틈틈히 단숨에 읽어냈던 장편소설이었습니다.
사실 이 책을 펼치기 전, 저도 가끔 숫자 '영' 을 생각할 때가 있었거든요. 작가님의 문장들이나 사유와는 사뭇 다른 전개와 이유를 가집니다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여전히 저는 살면서 때때로 숫자 '영' 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는 더더욱 삶에 부칠 때. 그야말로 씻기지 않는 고단함과 피로함과 죄책감이라는 늪에 빠져 허우적댈 때. 숫자 '영' 을 떠올릴 때가 있었어요.

리셋. 아무것도 없음. 무.
뭐 이런 좀 우울(?) 감을 자극시키는 단어들을 떠올리며 꾸역꾸역 삶을 돌파해나가는(?) 연습을 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하여튼 지극히 이기적인 이유입니다만. 숫자 '영' 이라는 것에 대해 나 말고 또 생각하는 이가 이렇게 있구나 라고... 이 장편 소설이 나왔을 때 그래서 가슴이 '쿵' 했었나 봅니다.
책은 상당히 잘 읽혔어요. 아마도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일까요. 수험생, 취준생, 직장'생' 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언의 현실감이 상당합니다. 무엇보다 저 또한 그 청년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게다가 뭐 그리 대단한 존재감 넘치는 청년이 '아닌' 입장에서 담담히 그려진 작가의 문장체가 어쩐지 정말 마음 깊이 와 닿았거든요. 약국에 취직을 하게 되기까지. 주인공이 졸지에 '유령' 이 되어 버린 그 어이 없는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의외로 고요하고 덤덤한 문체이지만 뭔가 깊은 마음 속 파도를 자극시키는 그런 이야기만은 분명한 소설이 아니었나 싶었네요.
책 속으로
- 유령이 유령이지 뭐겠어. 원래 유령은 자기가 유령인지 몰라
약사의 입가에 웃음이 고였다. 농담이라기에는 같이 웃어주기 어려운 껄끄러움이 있었다. 나도 모르게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문질렀다. (중략)
유령이 되기로 했다. 유령이라고 하니까. 믿음 앞에서 논리는 무용했다. 사람들은 사실을 근거로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은 이야기를 선택할 뿐이다.
그때까지도 나는 여전히 '생' 의 기분에 젖어 있었던 듯했다. 상실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유령이 되는 것쯤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p. 20, 32-33
일을 배우며 터득한 자세가 있었다. 모르는 건 일단 수긍하면 편해졌다. 내가 유령이구나. 벌써 오래전부터 유령이었는데 몰랐구나. 대체 언제부터였을까. 그동안 내가 겪은 일들은 누구나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일상이지 특별한 비극이 아니었다. 그만한 일로 유령이 된다면 세상에 유령 아닌 사람이 없을 것이다. p. 47
김 약사가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아까 구구단을 외우던 아이가 쪼그려 앉았던 자리를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유령일 리가 없다, 고 무단횡단을 하는 내가 생각했다. 투명인간일 수도 있다, 고 숨쉬는 법을 잊은 내가 생각했다. 유령이든 투명인간이든 무슨 상관이냐, 고 생각하는 내가 조를 바라보았다. p.79
어머니는 인내할 줄 알았고 포기할 줄 몰랐다. 아버지를 상대하다가 체득한 방법인지 아니면 본래 지닌 특질이 아버지를 만나 더 강해졌는지 알지 못했다.출산하기 전에는 회계사무소에서 일했다고, 일을 그만두기 전까지 아버지보다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던 어머니를 떠올려보았다. 그대로 계속 일했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 상상해보기도 했지만 의미가 없었다. 지금의 어머니는 권위적인 아버지도 손들게 할 만큼 성마르고 집요했다. 도리어 아버지가 어떤 면에서는 말이 더 잘 통했다.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현재의 모습이었다.p.136-7
하나씩 짚어 말하면 평범한 일상으로 보인다는 점이 비극이었다. 차라리 혜를 만나지 않았다면 더 편했을지 모른다. 나는 달라졌는데 나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그대로였다. 서른이라는 섬에 얼마나 지쳐서 도달했던가. 유령이 되는 건 외로움에 대한 저항이 실패하는 과정이었다. p.218
주인공은 '1' 이라는 인생이 되어가고 싶었던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즉 유효한 숫자값을 의미하는 것과 같은 어떤 인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무의미한 '0' 에 가까운 것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한 셈이죠. 자신의 삶에 어떤 소소하고 희미한 상실감들이 더해진다면 어떨까요. 무엇 하나 확실한 의미가 있지 않은 것 같은 '생' 을 수험생, 취준생, 그리고 직장인이 되어서도 느끼게 되는 주인공.
사실 뚜렷한 존재감이 '없는' 사람의 인생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어 보는 소설이었는데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존재감이라는 것이 '타자' 와 비교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반문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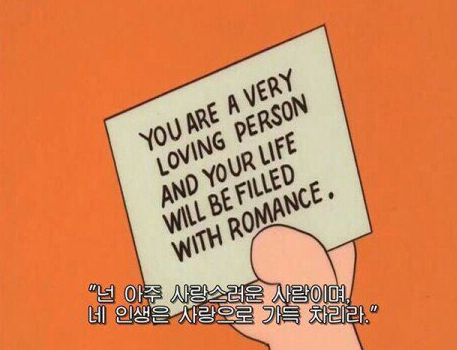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라서 '나' 라는 인간은 그 자체로 스스로 존귀하고 가치 있고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을...솔직히 하기가 쉽지 않은 법이죠. 남들에 '비해' 좀 더 뭔가 '있어' 야 할 것 같고. 그런데 그 '있다' 라는 것보다 '없다' 라는 느낌에 가까운 일상이라면.
없어도 괜찮을 용기나 자유를 떠올리게 됩니다. '영' 에 가까운 인생이어도 그 인생도 충분히 '잘' 지냄 이라고 언제쯤 우리는 생각하게 될 수 있을까요. 결국 내면의 강인함 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인가 싶었어요. 쉽게 흔들리지 않는 파동이 덜한 평온함이라는 것은 그래서 비교에서 오는 행복이나 비교에서 오는 '존재감' 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 모습 그대로의 삶을 사랑하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
작가의 말이 더욱 인상 깊었습니다. 직장을 일곱 번이나 옮기는 동안 이 소설의 초고를 완성하셨다는 작가님의 그 문장이. 어쩌면 주인공의 삶 속에서 우리는 작가의 일상을 엿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지 싶었던.
저 또한 비록 비슷한 '영' 의 의미는 아니겠지만, 가끔 사는 게 참 남루하고 초라하고 별 거 없다는 허무한 생각 끝에 '영' 이 되어 버리고 싶어 지는 저로서는.... 그래도 살다가 '일 (숫자 1)' 이라는 확실한 인생의 장면들, 고마웠던 순간들과 만나게 되면 또 살아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네요.
인간의 인생이 참 그런 것 같아요. 답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
에세이나 소설이 주는 깊은 여운은 이렇게 남겨지네요.
오늘도 두서 없는; 책 편지에 죄송한 마음이지만 (언제쯤 글도 잘 쓸 수 있으련지...)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인 인생이다 싶은 믿음을 지니며
오늘도 나아가봅니다..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