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밤에 영화를 보기 위해 조용한 골목 안, 이 낡은 극장을 찾는 이가 있을까. 걱정과 설렘을 안고 상영작을 고른다. 케케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필름을 영사기에 건다. 필름 영사기에 난 길을 따라 구불구불하게 필름을 끼워 넣고, 눈이 부실 정도의 빛을 쏘면 비로소 필름은 스크린에서 살아 움직인다. 그럴때마다 필름 캔 속에 담긴 이야기를 진짜라고 믿을 수밖에 없게 된다.
내가 만약 극장 주인이 된다면, 처음으로 상영할 영화로 <체리 향기>를 떠올리곤 했다. 흥미진진한 사건, 잘생기고 예쁜 배우들, 눈을 사로잡는 화려한 미술은 커녕 흙먼지를 날리며 황량한 테헤란로를 달리는 자동차와 우울한 남자의 표정만이 스크린을 채우는. 그런 영화를 보러 오는 이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는 영화를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좋았을까, 슬펐을까. 혼자 영사실 작은 창 너머로 보이는 관객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한다. 아무도 이 영화를 보러 오지 않더라도, 오늘은 오랜만에 나도, <체리 향기>를 보고 싶다.
영화 <체리 향기>의 주인공처럼 나도 죽고 싶었던 적이 있다. 그냥 그래야만 할 것 같았다. 살아갈 이유보다 죽어야 할 이유는 백만 가지가 넘는 듯 했고 그 이유들은 모두 ‘나의 쓸모’를 가리키고 있었다. 쓸모가 없는 존재라는 생각과 앞으로도 나의 쓸모를 증명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그 외에도 세상에 너무 많은 민폐와 잘못을 끼친 것 같은 죄책감.
방 안 어디에 줄을 걸어야 할지, 어떤 줄을 어떻게 매듭을 지어 목을 들이밀지, 그것도 아니면 어느 건물 옥상에 올라가 뛰어내려야 알맞을지 등. 실행할 용기도 없으면서 생각만. 가만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 상상에 지치면 잠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뜰 때면 죽었다 다시 살아나 새로운 하루를 사는 기분이 들었다. 또 나는 살아있구나, 한심하게. 미적지근하게 주어진 하루를 또 살아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알 수가 없었다. 어떤 날에는 살만 하다가도, 도저히 죽음을 떠올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때 <체리향기>를 영화관에서 만났다.
이 영화를 처음 본 곳은 지금은 사라진 서울극장 안 서울아트시네마. 달리 갈 곳은 없는데 집 밖을 벗어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오랜만에 극장에나 가보자는 생각으로 나섰다. 상영관 내부는 다소 한산했다. 별 생각없이 예매한 자리에 앉자 편안함이 밀려왔다. 좌석 시트가 푹신해서일수도 있지만, 그래서 느끼는 편안함은 아니었다. 죽지 않아도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 잠시 동안 유령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공간. 그런 곳은 극장이 유일했다. 아마도 그래서 내가 영화와 극장을 사랑하는지도 몰랐다.
영화가 시작되자 영화관 의자는 주인공의 차 카 시트가 된다. 남자는 계속 차를 몰고 다니며 자신의 부탁을 들어줄 사람이 나타나길 기다린다. 영화 속 남자가 제시하는 자살 방식은 신박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구덩이를 파서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다음, 대신해서 흙을 덮어줄 사람만 구하면 된다니. 살고 싶다는 말 대신 ’내일 꼭 내 몸 위로 흙을 덮어줄 거죠?’라며 마음에도 없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영화속 남자의 모습이 꼭 자살할 용기도 없으면서 막연히 죽음을 떠올렸던 나를 보는 것 같았다.
마지막 장면에서 그는 깜깜한 밤에 하늘을 바라보며 눕는다. 흙을 덮어주러 올 노인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체리 향기’를 맡을 날을 떠올리며 아침을 기다리는 걸지도 몰랐다. 무엇을 기다리는 지는 몰라도 그의 눈은 어두운 스크린 안에서도 선명히 빛이 났다.
나라면 그의 제안에 뭐라고 얘기했을까. 아무리 그저 흙을 삽으로 퍼주는 거라도 그건 자살 동조 행위지 않나? 죽지마. 왜 죽으려고 그래.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그냥 살아요. 살아도 돼요.
남자가 진심으로 간절히 나타나길 바랐던 것은 흙을 덮어줄 사람이 아니라, 그런 말을 건네줄 사람이었을 것이다. 어쩌면 나도 가장 필요로 했던 말. <체리 향기>는 나에게 ‘살아도 된다’고 말해주었다.
죽음에 대한 생각과 막막한 미래, 절망적인 마음이 뒤엉켜 잠들지 못하는 어느 밤에 괴로워하는 이가 있다면 <체리 향기>를 꼭 봤으면 좋겠다. 누군가에게 진심어린 위로를 받기 위해 이리저리 헤매고 방황하지만 상처만 가득해지는 어느 날, 영화는 어떠한 판단도 없이 우리를 위로한다. 영화의 곁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가끔은 세상에 혼자가 아닌 듯한 기분이 든다. 곁을 내어주기 위해 나는 영화관에 불을 켜고 누군가를 기다린다. 간절히 원했던 위로의 말과 기꺼이 자유로워지는 순간을 찾아 헤매는 누군가를 위해서.
Cinema cahiers : 프로그램 노트

<체리 향기> The Taste Of Cherry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1997 / 이란 / 98분 / 12세 관람가
출연: 호마윤 에르사디, 압둘라흐만 바그헤리, 압돌호세인 바게리
"생각해봐요. 새벽에 막 떠오르는 해를 보는 기쁨, 맑은 샘물에 얼굴을 씻는 상큼함, 보름달이 뜬 밤하늘의 아름다움 그리고 혀끝에 감도는 달콤한 체리향기를”
<체리 향기> 중에서
황량한 비포장도로를 멍한 눈으로 운전하는 한 남자가 있다. 그는 먼 길을 가야하는 이에게 차를 태워주는 대신, 자신의 부탁 하나를 들어달라고 한다. 수면제를 먹고 누운 자신의 위로 흙을 덮어달라는 것. 그는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고 부탁하지만 그의 부탁을 들어주는 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던 중, 그의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하는 한 노인이 나타난다.
압바스 키아로스타미의 1997년 작품으로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영화 속에서 이어지는 대화 씬은 극영화와 다큐의 경계를 오가며 마치 삶과 죽음, 꿈과 절망, 소박한 일상 등에 대한 솔직한 인터뷰를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특유의 다큐멘터리적 연출은 관객에게 영화를 그저 보고 즐기는 것을 넘어 질문을 던짐으로써 적극적인 사유를 가능하게 해요.
삶이란 무엇인지, 죽음 이후에 오는 것은 무엇인지.
영화는 끝나도 영화가 던지는 질문은 남습니다.
‘당신을 다시 살게 한 순간은 언제였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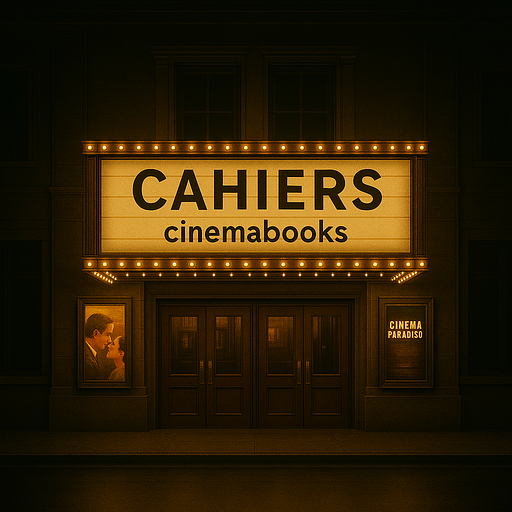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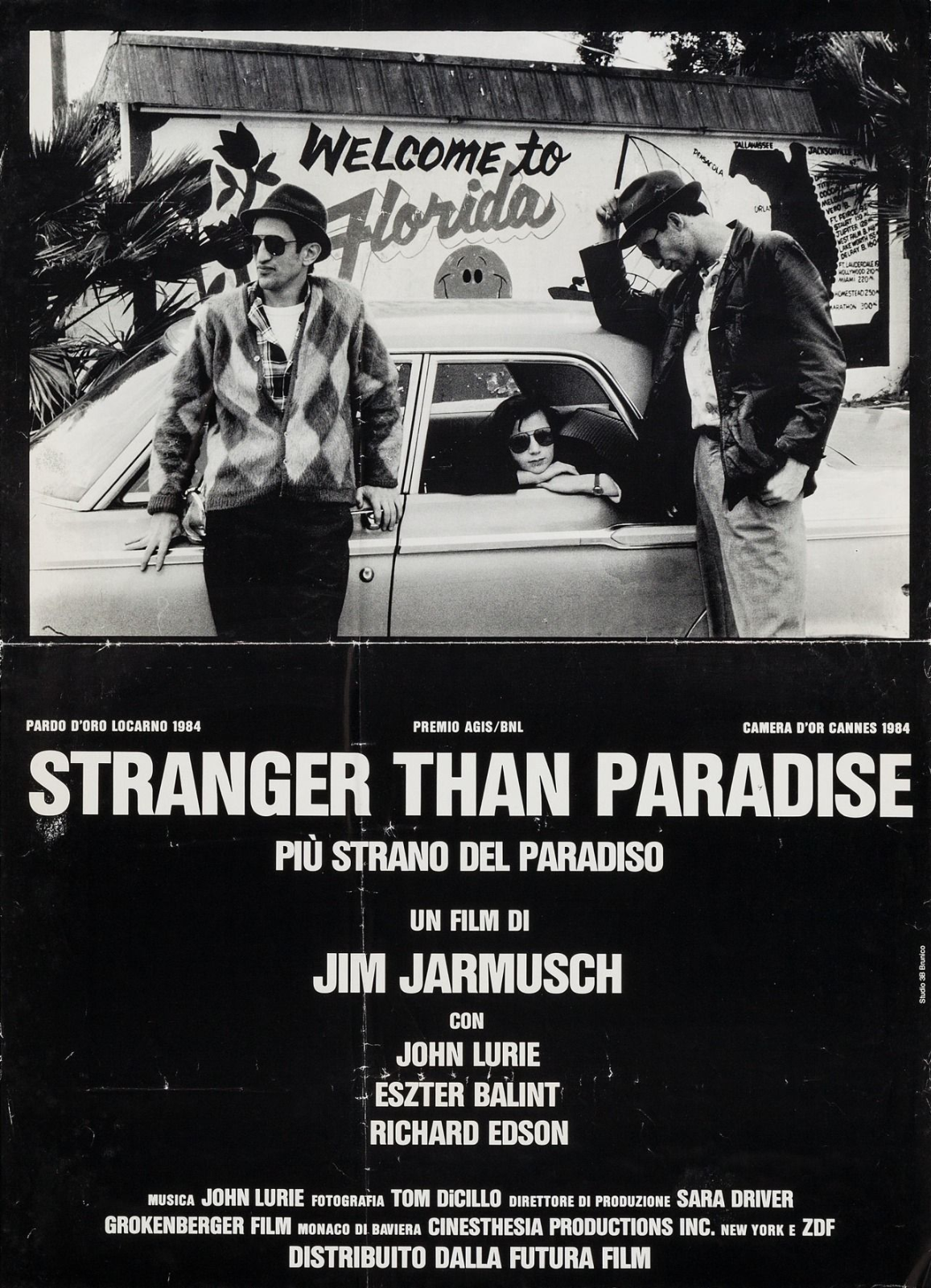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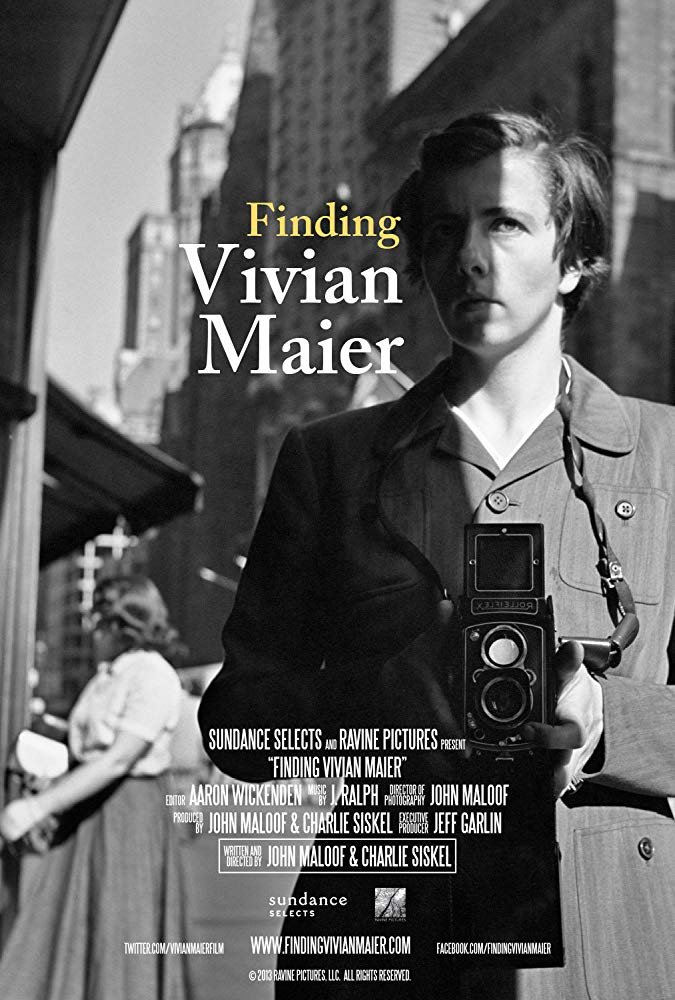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