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이 영화를 처음 보았다.
오래된 극장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라 언젠가 꼭 보고 싶었다. 나는 늘 ‘오래된 극장’이라는 공간에 매혹되곤 하니까. 예상과는 달리 흔히 극영화에서 자주 나오듯, 오래된 극장을 둘러싸고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나올줄 알았지만 그의 영화는 달랐다. 지루할 법도 한 길고 긴 롱테이크 컷들이 약 80분 동안 극장 안을 채운다. 어느새 나는 극장 속의 극장 ‘복화대극장’의 관객이 되어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현듯 떠오르는 영화가 있다.
<안녕 용문객잔>이 바로 그런 작품이다. 추적추적 내리는 빗소리. 눅눅하고 어두컴컴한 복도. 담배 연기 자욱한 상영관. 썰렁한 객석. 커다란 극장 안을 홀로 청소하는 여자의 절뚝거리는 발소리. 시멘트 건물 특성상 그 소리들은 텅 빈 채로 공간을 채운다. 밤이면 관객을 기다리며 홀로 이 극장을 지키는 동안, 늘 <안녕 용문객잔>을 채우고 있는 소리와 질감, 공기들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안녕 용문객잔> 속 극장이나 내가 있는 곳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이 느껴졌다.
이제는 발길이 뜸해진 극장과 추억으로만 존재하는 영화. 유령처럼 떠도는 극장 안의 사람들.
그들의 무표정한 얼굴과 그들을 담아내는 방식이 좋다. 이유없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매표원 여자가 등장하는 부분이다. 그녀가 1000석 가까이 되는 넓은 상영관과 화장실을 혼자 청소할 때나 스크린 뒤쪽에서 등장할 때, 복숭아처럼 생긴 팥빵을 잘라서 먹을 때, 퍼붓는 빗 속을 홀로 유유히 걸어가며 퇴근할 때 모두 좋다. 관객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각각의 인물 중 누구를 따라갈 것인지는 각기 다를 것이다. 누군가는 영화 <용문객잔>에 출연했던 노배우를 유독 인상깊게 봤을수도, 영사기사인 이강생에게 마음이 기울었을수도, 파트너를 찾아 헤매는 남자에게 자신을 투영할 수도 있다. 나는 묵묵히 극장을 지키는 여자의 하루를 따라가는 것이 좋았다. 쓸쓸히 극장을 지키는 건 나 혼자가 아니구나,라고 잠시 착각을 해서 일지도 모르겠다.
80분 내내 침묵 속에서 이어지던 장면들이 왜 계속 마음에 남아있을까. 오늘 이 영화를 틀기로 한 것도 그 이유를 다시 알고 싶어서였다. 차이밍량 감독의 영화는 쓸쓸함이라는 단어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그의 시선에는 의지가 보인다. 어떻게든 기억하고자 하는 노력. 필름 안에 담아내려는 고집스러움. 곧 사라질지도 모를 존재들의 마지막 자취를 응시하기로 결심한 듯한 그의 시선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도, 나는 보고 있어. 나는 기억하고 있어라고 말한다. 그렇게 유일한 목격자가 되고자 한다. 그것은 보통 인내심으로는 힘들다. 인물들을 끝까지 바라보고, 기억하고, 유일하게 곁에서 기다려준다. 그래서 차이밍량의 영화는 쓸쓸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그립다.

어떤 기억이 영화가 되는가.
차이밍량 감독은 <거기 지금 몇시니> (What time is it there, 2001) 에도 등장했던 타이베이의 복화대극장이 곧 사라진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이 곧 주인공인 영화 <안녕 용문객잔>을 만들어 마지막 모습을 기록한다. 그리하여 <안녕 용문객잔>은 그 자체로 관객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공간이 된다. 비 내리는 날 ‘복화대극장’에 마치 가봤던 것 같고, 영사기의 빛 사이로 먼지가 일렁이는 극장에서 언젠가 재미없는 무협영화를 봤던 것만 같다. 분명 차이밍량 감독에게도 이런 기억 속의 공간이 있었을 것이다. 그 기억은 곧 내가 경험한 무언가가 되어 뇌리에 박혀버렸다. 끈질기게 응시해 필름에 담아낸 끝에.
영화는 기억과 추억, 희망과 절망, 불안과 기대를 모두 담아내어 모두가 함께 볼 수 있는 ‘꿈’이 될 수 있다. 그 점이 계속해서 영화를 보게 만들고 신비롭게 느껴지기도 한다. 살아가며 마주치는 수많은 장면과 기억들 중, 어떤 것이 ‘영화’가 될까?
아마도 나의 극장에 관한 첫 기억은 부산 남포동에 있던 ‘대영극장’에서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을 봤던 날이다. 그 전까지는 비디오가게를 하다 망해 몇몇의 재고로 집에 남아있던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보다가 처음으로 큰 극장에서 마법의 세계를 경험했다. 책을 읽으며 혼자 상상했던 해리의 이모네 집 계단 밑 방과 그리핀도르 기숙사, 9와 4분의 3 승강장 모두 상상 그 이상으로 실감나게 펼쳐져 입을 벌리며 봤던 그 날. 가장 강렬했던 것은 볼드모트의 얼굴이었다. 기괴하게 일그러진 그 얼굴은 10살 어린 아이에게 적잖이 충격이어서 한동안 밤마다 볼드모트를 떠올리며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쓰기도 했다. 나에겐 마법같은 공간 그 자체였던 대영극장은 어느덧 사라지고 말았다. 2024년 1월을 마지막으로 폐관한 ‘롯데시네마 대영’의 자리에는 볼링장과 옷가게, 영풍문고가 들어섰다.
바깥에선 비가 내리고 있다. <안녕 용문객잔>을 상영하기에 너무나 어울리는 날씨다. 비를 뚫고 기억 속 영화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유령같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극장 안에 울려 퍼진다.
Cinema cahiers : 프로그램 노트
<안녕 용문객잔> Goodbye, Dragon Inn
차이밍량, 2003 / 대만 / 83분 / 12세 관람가
출연: 이강생, 천샹치, 먀오티엔
No one goes to the movies anymore, and no one remembers us anymore.
아무도 극장에 오지 않고, 결국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낡고 오래된 복화극장. 내일이면 문을 닫을 복화극장의 마지막 상영작은 호금전 감독의 <용문객잔>이다. 1,000석 규모의 대형 극장이지만 몇 안 되는 관객만 앉아있을 뿐. 그 중에는 <용문객잔>에 출연했던 노배우 먀오티엔과 시천이 있다. 상영관 밖에는 영화가 끝나면 헤어질 매표원과 영사기사가 있다. 영화가 상영되는 시간 동안 카메라는 곧 사라질 영화관 구석구석을 돌며 극장의 여러 모습들을 담아낸다. (출처: 한국영상자료원)
<안녕 용문객잔>의 장면을 담은 많은 영상 중, 10년 전 정성일 평론가와 차이밍량 감독과의 대담 중 한 대목을 담은 위의 영상을 발견했어요. 차이밍량 감독에게 영화란 무엇인지, 극장이란 공간은 그에게 어떤 의미인지 영화를 보고나면 느껴지지만 그가 이 영화를 만들게 한 계기는 역시 기억 속 오래된 극장이었다는 걸 들을 수 있는 영상이라 공유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에겐 어릴 적 추억이 담긴 오래된 극장이 여전히 존재하나요? 아니면 이미 사라졌나요.
영화에 등장하는 위의 대사처럼, 저는 영화관과 영화가 언젠가 사라지고 심지어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때가 올까봐 두렵습니다. 그것이 사라진다는 것은 곧 우리의 삶의 한 장면들이 사라지는 것이고 아무도 꿈을 꾸지 않는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은 특히나 쓸쓸히 사라져가는 것들을 묵묵히 기다려주고 기어코 사라지지 않게, 외롭지 않게 바라보는 태도가 많이 어렵기도 하고,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 자체를 바라보는 차이밍량 감독의 영화를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도 모든 영화를 다 본 것은 아니고, 차이밍량 감독의 열렬한 팬도 아니지만 이상하게도 가끔씩 그의 영화가 떠오를 때가 있더라고요. 특히 <안녕 용문객잔> 은 시간이 지날수록 문득 보고싶어지는 영화에요. 물론 어쩔 땐 5분 넘는 롱테이크에 지쳐 나가떨어질 때도 있지만요.
여러분에게는 영화처럼 저장하고픈 기억 속 장소나 순간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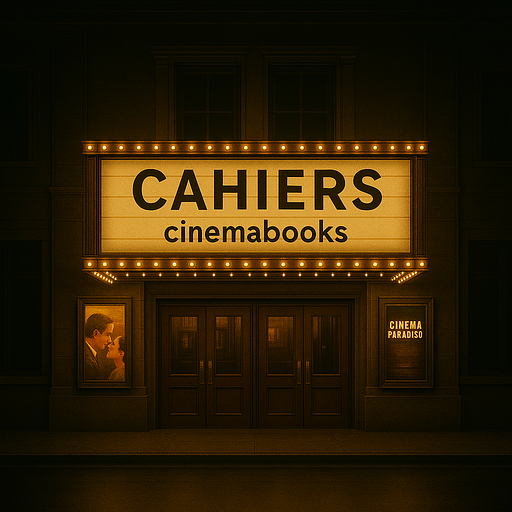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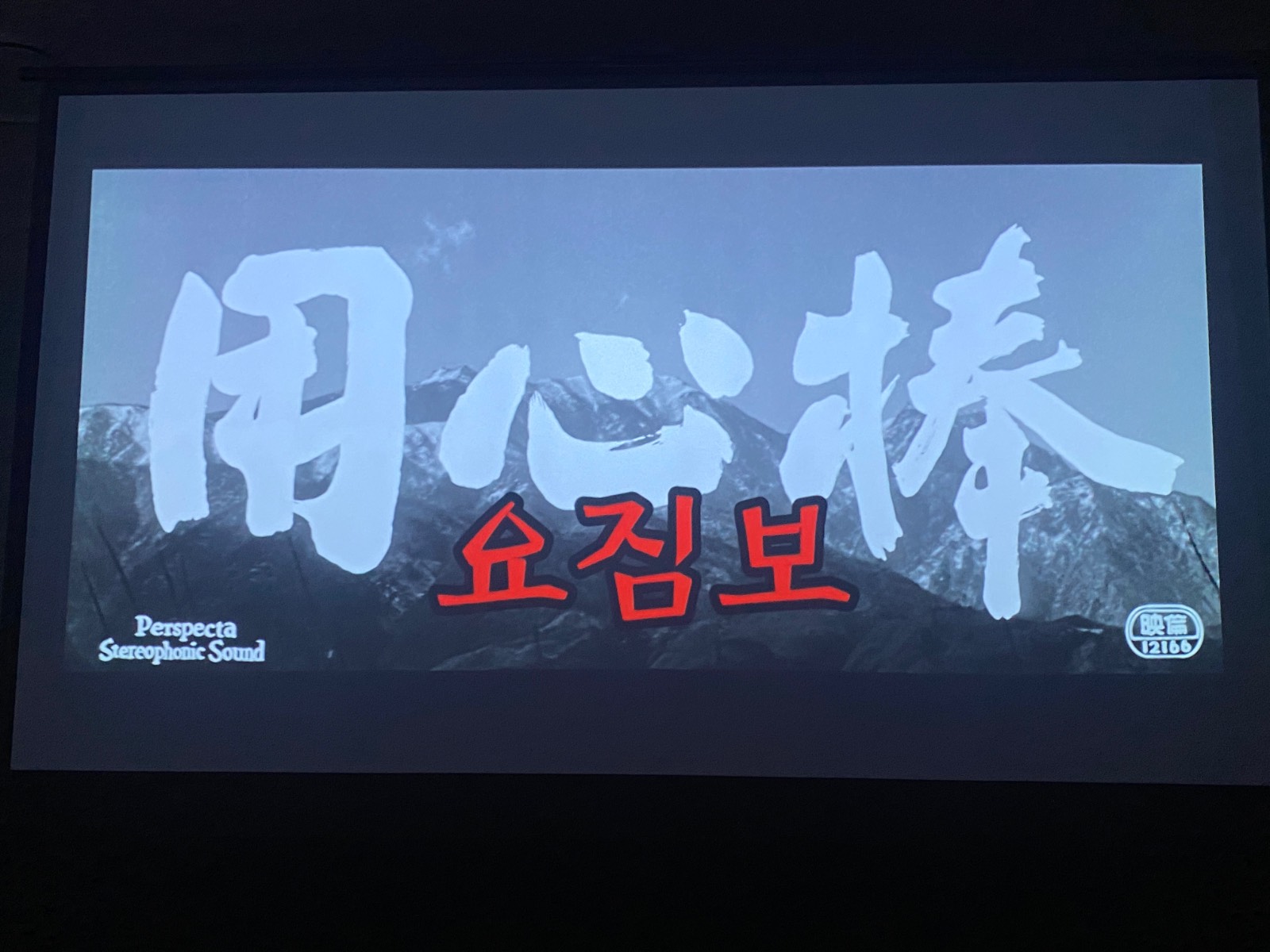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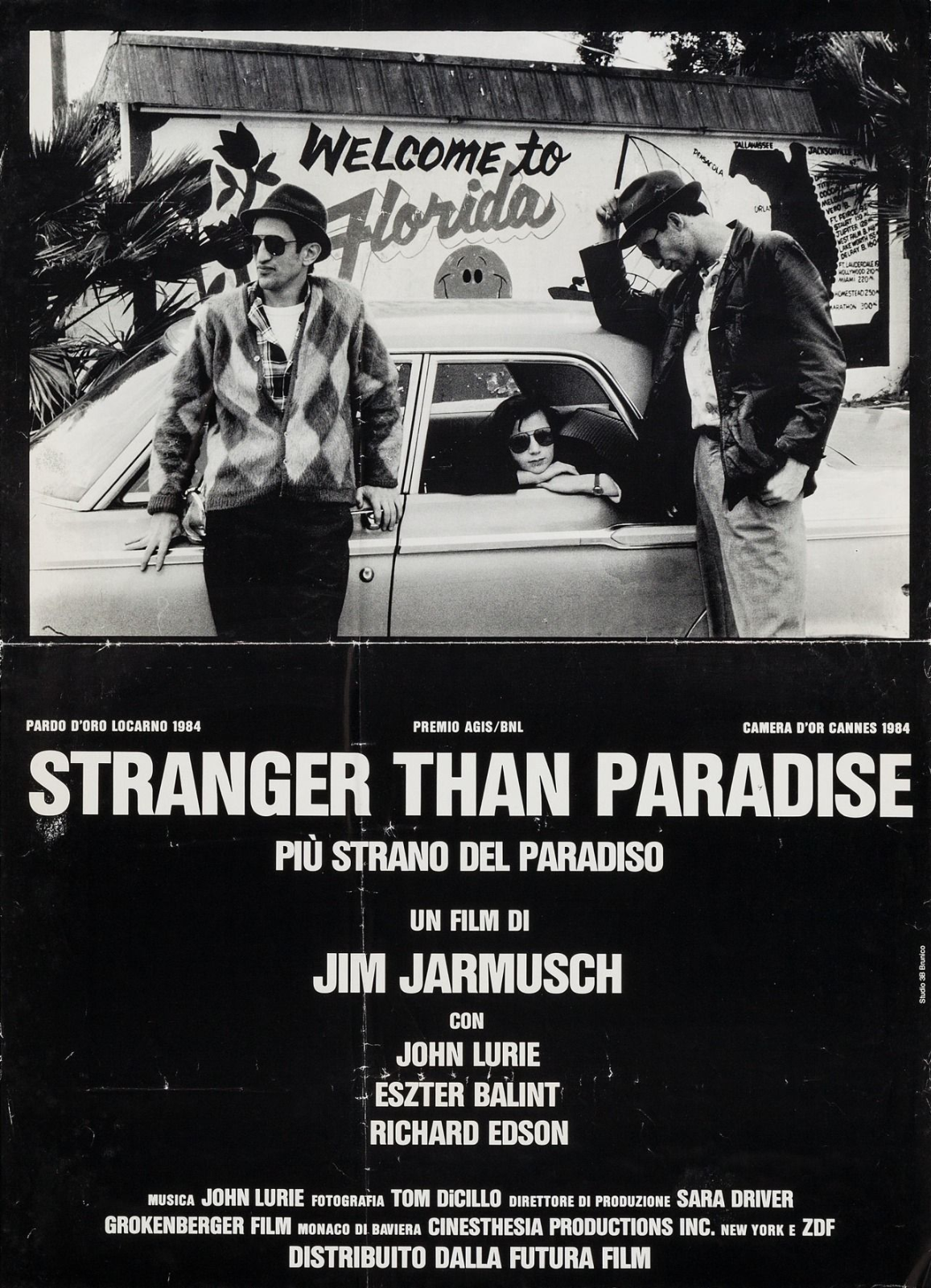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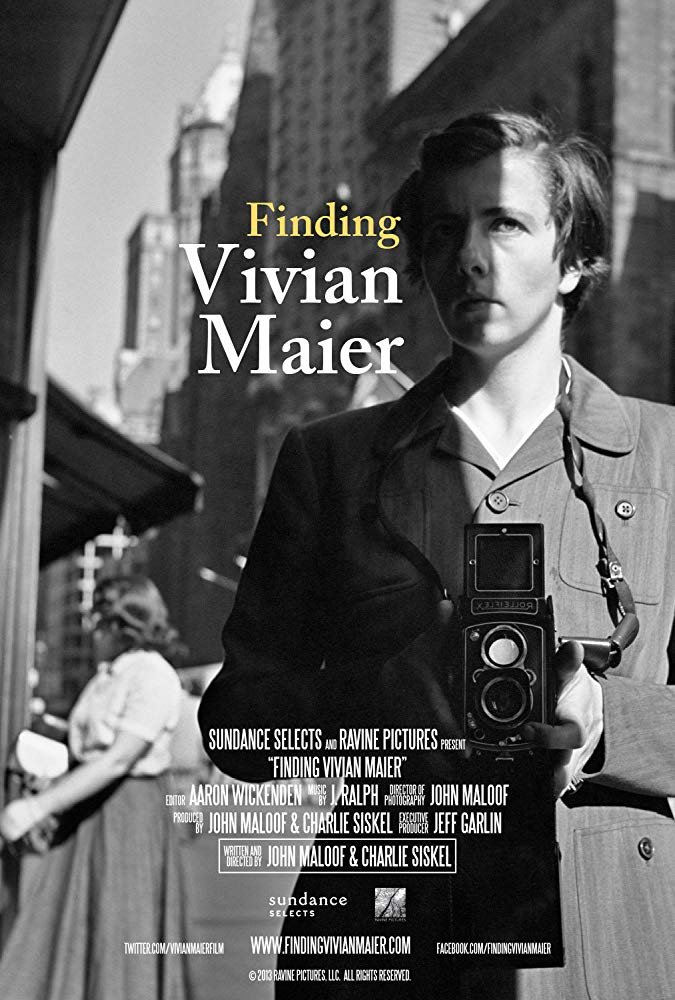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