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혼자서 가버릴래. 해 따라 길을 따라 나 갈래.
산울림의 10집, 두 번째 트랙 ‘꿈이야 생각하며 잊어줘’는 몇 번이고 ‘아아’거리며 홀로 진저리친다. 싫어, 너무 지쳤어, 안녕, 안녕. 이렇게나 내 죽음관을 투영하는 가사가 있을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생각한다. 한 달만이라도, 일말의 접점도 없는 곳에서 홀로 살고 싶다고. 그 욕구를 거침없이 충족하는 죽음이라는 이벤트. 경험 뒤 아쉬울 일도, 후회할 새도 없이 담백하다.
지난 달 목포에 내려갔을 때, 아빠는 조수석에 앉은 내게 요즘 죽는 사람이 너무 많다며 불평했다. 어쩜 다들 몰아서 죽나. 아빠 나이 쯤 되면 이런 일 많아? 부모님들이 많이 가시고, 가끔 본인상, 빙부상도. 많네. 너 미용실 데려다주고 해남 다녀와야 해, 장례식장. 눈물 안 나? 갈 사람은 가는 거지. 죽음은 생각보다 가깝고 잦은 일이구나.
그때 생각했다.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나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죽음 또한 누구나 경험하게 될 과정이니까. 늘 떠나고 싶던 나였고. 그러니 그저 꿈이야 생각하며 잊어줬으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내향인으로서 지나친 관심을 원치 않는다. 장례식장에서도 사람들이 내 얘기 말고 다른 대화를 나누게 하고 싶다.
이 방법은 어떨까. 조문객의 콧구멍이 바짝 커질 정도로 감칠맛 나는 홍어회를 대접해 줬으면 한다. 장례식장이라 대놓고 말은 못 하지만, 눈가 근육을 미친듯이 씰룩거리며 앞 사람에게 ‘여기 회 뭐야?’라는 시그널을 보낼 정도로. 육개장도, 수육도, 몇 그릇이고 공기밥을 비울만큼 뜨끈하고 맛있었으면 좋겠다. 어느 노포에서의 저녁처럼 맛있는 음식에 술잔 기울이다, 검은 양복이 흐트러진 채로 2차에 가길 바란다.
‘꿈이야 생각하며 잊어줘’는 어떤 만화의 엔딩 곡 같다. 끝없이 작별을 되뇌는 가사와 거침없는 일렉 기타 소리는 단호하게 마무리를 향한다. 커다란 노을빛을 등지며 하염없이 뛰어가는 주인공의 모습도 함께 그려진다. 드디어 인생의 막바지에 왔고 난 떠날 거야. 예쁘게 웃으며 보내줘. 장례식장에서 이 노래가 나올 때, 친구들은 이런 내 마음을 헤아려 줬으면. 그래, 지희답다. 하고 살풋 웃어줬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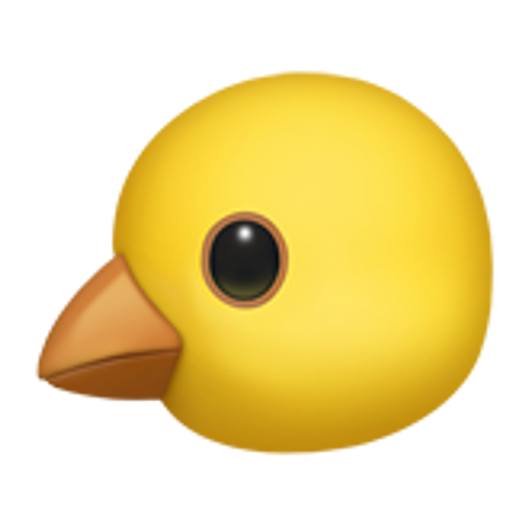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