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여행은 고래가 가이드를 맡았다. 작년에 친구들과 다녀온 터라 지도 없이도 길을 꿰뚫고 있었다. 그가 추천한 대로 도시 한 가운데에 숙소를 얻어 모든 여행지를 걸어 다녔다. 하루종일 하는 거라곤 걷기, 먹기, 사진 찍기가 전부! 아, 쉴틈없이 나눈 수다까지. 파리 여정의 마지막 여행으로 최고였다.
엇박자
저녁 시간이 되어 어느 바 테라스에 들어가 앉았다. 스테이크 한 점과 와인을 시켜 놓고 사진을 같이 살펴봤다. 오늘따라 유독 내가 찍은 사진이 없었다. 고래는 “오늘은 내가 찍은 사진이 더 예쁘네.“라고 뿌듯해 했다. 웬종일 머리가 복잡해 사진찍기 귀찮았다는 걸, 같이 붙어 있는 시간이 길어져 슬슬 피곤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모르는 듯 했다.
자고로 여행길의 묘미는 동행인과의 다툼에 있다. 한 번쯤 제대로 싸워봐야 진짜 추억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MBTI에서 S인 그와, N인 나는 정반대의 뇌구조를 갖고 태어났으나 같은 E 외향인이라서 둘 다 말이 많았다. 종종 길을 걷다가 내가 감상에 젖어 느낀 점을 얘기하면 고래는 “이거 다 00이 돈 벌려고 하는 거야.”라고 제대로 찬 물을 끼얹었다. 그리고는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 이를테면 국가 간의 외교, 기업 간의 경쟁, 정치 권력 다툼, 각종 역사적 배경 등을 늘어 놓았다.

가만 보면 그는 논리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길 좋아하고, 나는 인간적으로 감정이입하길 좋아한다. 우리 둘 다 자기 생각을 안 되는 영어로 장황하게 늘어놨지만, 상대는 끝까지 동의하지 못 했다. 어쩜 같은 걸 보고 들어도 이토록 다르게 생각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다.
우리는 끈질긴 대화 끝에 어떤 결론을 찾아냈다. 그는 macroscopic 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나는 microscopic 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둘 다 맞는 거라는 대화의 끝맺음. 참으로 간단한 것을 오래도 고민했다.

비가 내린 뒤 로마의 골목길은 운치가 짙어졌다. 우리는 새벽 밤이 되도록 걷다가 적당한 곳에 멈춰 서 담배를 물었다. 밤이라 청명해진 공기 반, 오늘따라 더 희끄무리해 보이는 연기 반. 엇박자라 불편한 상황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행복했다.
애드리브
다음 날 저녁도 어김없이 바를 찾아 들어갔다. 너무 많이 걸어 노곤한 몸으로 맥주 두 병을 시켜 놓고 그에게 물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말이야. 내가 다시 파리에 돌아온다면 우리는 계속 사귀는 사이인 거야?” 상대를 떠보는 ’만약에‘라는 질문을 혐오하는데, 그 찌질한 짓을 내가 하고 있었다. “아니지.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잖아.” 그의 답에는 주어가 없었다. 다른 누군가를 만나는 게 내가 될 수도 있고 그가 될 수도 있었다.
무안해져서 괜히 마음에도 없는 말을 이어 붙였다. “네 말이 맞아. 내가 한국을 떠나고, 너는 혼자 파리에 남으니까 그게 미안해서 물어봤어.” 개똥같은 애드리브를 그는 찰떡같이 받아주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우린 처음 만날 때부터 서로 솔직하게 털어놨잖아. 나는 결혼생각이 없고, 너는 한국으로 돌아갈 거라는 걸.“ 씨바 뭐가 이렇게 쿨해. 일기에 욕을 쓰지 않는 편이지만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이게 듣기만 했던 유럽식 연애인가. 짜증이 솟구치면서 표정관리가 되지 않았다. 애초에 내가 어떤 대답을 기대한 건지 모르겠다.

그치만 슬퍼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파리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심지어 로마를 여행하는 중이므로 걱정이 들어올 틈을 주고 싶지 않았다. 있는 힘껏 긍정 회로를 굴렸다. 한국에서는 힘겹게 연차 내서 신혼여행으로 겨~우 오는 유럽을 나는 남자친구랑 신나게 돌아다니고 있잖아? 지금 그딴 걸 따질 때가 아니야!
어머니, 내 인생에 결혼운은 없나봅니다
나도 결혼해서 예쁜 애기 낳아 평범한 엄마로 살고 싶을 때가 있었다. 회사 일을 열심히 하면서 집도 사고 차도 사는 미래를 꿈꿨다. 내게 딱 하나 부족한 게 있다면 나랑 딱 맞는 신랑. 그게 없어서 안정적인 삶을 이루지 못 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 내가 결혼을 못 한 진짜 이유는 누군가와 함께 내 인생을 설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껏 내 인생을 나 아닌 누군가에게 맞춰 본 적이 없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연인, 친구 그 누구에게도 내 삶을 양보하지 않았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은 언제나 ‘나’로써, 나를 위한 선택만 했다. 그러므로 하고 싶은 일을 실컷 하다가 혹여 잘못되더라도 나만 책임지면 되는 심플한 삶이었다.
이렇게 좋은 싱글라이프를 뒤로 하고 결혼을 한다면 과연 무엇 때문일까. 선택의 기준이 ‘나’에서 ‘우리’로 옮겨 가고 책임은 상황에 따라 한 사람이 ‘독박’을 쓸 수 있다는 상황을 굳이 만들려면 정.말. 큰 동기가 필요할 것이다. ‘남들이 다 하는 결혼이니까’라는 것 말고.

그래도 연애운은 있습니다
한국에 돌아간다고 해도 내가 사랑했다는 사실은 변함없을 것이다. 한국을 나와 두 번의 연애를 했고 모든 순간이 따뜻한 추억으로 남았다. 그밖에 여행 중 만난 모든 인연들까지 하나같이 소중했다. 하지만 이 인연들을 한국이라는 현실로 가져가는 건 다른 장르다.
비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비혼 여성, 아무튼 잘 살고 있습니다>, <비혼입니다만, 그게 어쨌다구요?!>, <아무래도 아이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혼자서 완전하게>,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두 명은 아니지만 둘이 살아요>, <혼자 살아보니 괜찮아> …. 일본과 한국에서 비슷한 책들이 우후죽순 나오는 요즘, 왠지 나의 삶도 이들과 비슷하지 않을까 짐작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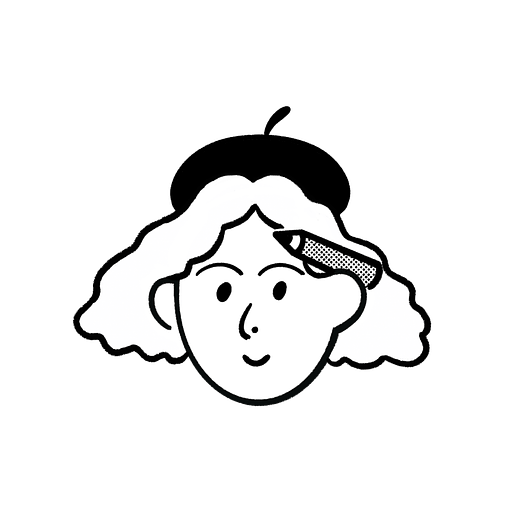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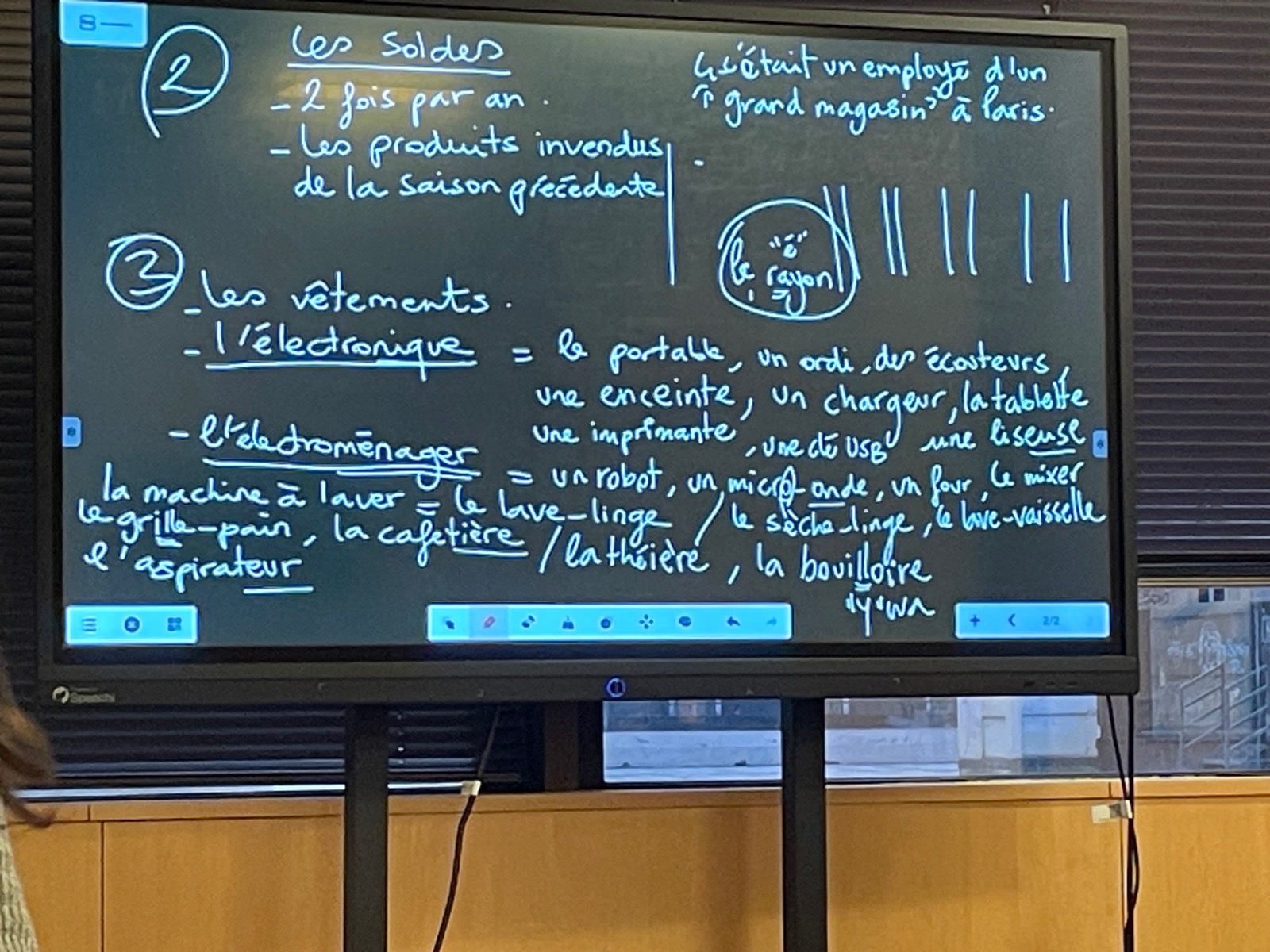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
Paul Song
비공개 댓글 입니다. (메일러와 댓글을 남긴이만 볼 수 있어요)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