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새 또 여행을
파리에서 연애를 시작한 지 반 년이 흘렀다. 이번 남자친구는 내 일상에 깊게 침투해 매일을 함께 보내고 있다. 아침에는 팍드쏘 공원에서 만나 한 바퀴 조깅을 하고, 저녁이면 왓츠앱으로 시시콜콜한 하루를 주고 받는다. 문자로 못 다한 이야기는 삼 일에 한 번꼴로 만나 시간가는 줄 모르게 수다를 떤다.
연애는 최고의 언어 수업이라고들 한다. 그래서 나 역시 처음에는 프랑스어를 배우고자 가볍게 만났다. 허나 방심한 사이 그는 힘들 때 찾아와 위로가 되어주었고, 잊지 못할 추억들을 던져놓았으며, 평범하고 소소한 주말에 특별함을 더해줬다. 한 마디로 정들어 버렸다.
즐거웠던 이 연애가 곧 끝난다. 잘 끝맺기 위해 마지막으로 그가 가장 좋아하는 도시 로마로 여행을 떠났다. 굳이 장거리 연애로 끌고 가고 싶지 않다는 데에 의견을 맞췄으므로 내가 한국으로 가는 날 우리는 이별이다.

저와 함께 춤을 추시겠어요?
공연의 끝에 이르러 한 무용수가 객석을 향해 부탁했다. 모두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사람들은 손을 들었다. 무용수가 물었다. 누가 저와 함께 춤을 추시겠어요? 모두가 멋쩍게 웃으며 재빨리 무안한 손을 거뒀다. 한참 후, 한 사람이 무대로 걸어나갔다. 무용수가 그를 안고 천천히 춤웠다. 그날 커튼콜이 끝난 뒤 나는 울고 있는 친구를 발견했다. 어째서 춤추겠다고 하지 못했을까, 눈물을 쏟으며 그는 자신의 근원적인 용기 없음에 절망했다. 그것은 춤에 관한 질문이었으나, 누군가는 삶을 생각했다. … 사실 그 공연의 결말은 매번 달랐다고 한다. 어떤 날에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어떤 날에는 사람들이 무대를 가득 메웠다. 그리고 아마도 파리에서의 초연 때였을 것이다. 역시 모두들 웃으며 손을 내렸고, 한 이란 사람이 일어났다. 그는 객석을 향해 말했다. 이란에서는 춤추는 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선 그렇지 않은데, 당신들은 왜 춤을 추지 않습니까.
<모국어는 차라리 침묵>, 목정원 산문
누군가 연극을 보고 ‘춤’을 삶에 빗대어 생각할 때, 나는 사랑을 떠올릴 것이다. 고래가 태어난 알제리는 연애 금지 국가다. 결혼한 배우자 또는 결혼할 약혼자와만 데이트가 가능하다. 물론 고래처럼 몰래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하여튼, 고래를 만난 지 일주일 정도 됐을 무렵 애써 거리를 두려는 내게 그가 말했다. “우리 파리에 있으니까 괜찮아.” 남자들이 흔히 하는 플러팅인 걸 알면서도 ‘자네, 사랑하기 딱 좋은 도시에 와놓고 무엇을 망설이나‘라는 영화 속 대사처럼 들렸다. 이상하게 나를 안심시켰다.

첫 스텝
‘여기는 파리니까.’라는 말은 실로 무시무시하다.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게 만든다. 파리가 아니면 절대 하지 않았을 어플로 고래를 만났다. 지인들에게 차마 어플로 만났다는 말을 할 수 없어 거짓말을 하고 다녔을 때가 있었다. 그러나 이젠 아무렇지 않다. 이곳에서는 정말 백이면 백 다 어플로 연애를 한다. 어플의 종류도 수없이 많다. 나는 그 중 안드레아 친구가 소개해준 호핀?을 사용했다. GPS를 통해 가까운 이웃 사람을 매칭해주는 어플인데, 이 동네에 이렇게 많은 남자가 있다는 사실에 조금 놀랐다. 자기소개 문구 없이 최소한의 정보만 올렸는데도 동양인이라서 그런가 알람이 바쁘게 울렸다. 뻔한 사람들과 뻔한 대화들을 주고 받다가 그 중 섬세한 배려가 눈에 띄는 한 사람을 만났다. 그거슨 고래. 운이 좋았다.

며칠 메시지를 주고 받은 뒤 만날 약속을 정했으나 막상 만날 날이 다가오자 불안했다. 파리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다가도 납치라도 하면 어쩌나 혼란스러워 만나는 날을 조금 미뤘다. 그리고 그나마 최대한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몽파라나스로 장소를 정했다. 학원 수업 받으러 매일 가는 곳이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학원으로 도망가야지, 별의 별 생각을 다 했다.

처음 만나는 날, 걱정이 무색하게 그는 엉뚱한 장소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국에서 쌓아온 소개팅 짬으로 그의 옷 색깔을 물었다. “너 뭐 입고 있어?“ ”흰색 티셔츠. 너는?“ ”검정색 나시“ 그리고 내가 먼저 그에게 다가가 반갑게 인사했다. “봉쥬흐! 싸바?” 쭈뼛거리며 비쥬를 주고 받았다. 누가 봐도 홍대입구역 10번 출구에서 처음 만나는 남녀였다. 간단하게 커피 한 잔 하기로 하고, 앙발라드(Invalides)까지 십여분 가량 보폭을 맞춰 걸었다. 걷는 와중에 수시로 손이 스쳤다. 그럼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고, 나는 가방을 잡았다.

앙발라드는 드넓은 정원과 전쟁박물관이 있는 곳이다. 잔디 위로 여기 저기 널부러져 있는 파리지앵들을 가로질러 어느 평범한 바에 자리를 잡았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 테라스에서 술먹기 딱 좋은 날씨였다. 그러므로 커피대신 맥주를 시켰다.
그의 눈은 왕방울만 한게 웃을 때면 반달 모양으로 변했다. 그런 예쁜 눈으로 테이블 위에 팔을 올려놓고 몸을 앞으로 기대며 질문을 하나씩 던졌다. 억지로 짜내지 않은, 관심에서 나오는 질문이었다. 맥주를 가운데 두고 시간가는 줄 모르게 대화를 나눴다. 어느덧 시간은 9시가 넘어 저녁도 먹지 않은 채 2시간을 앉아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시계를 보았고, 그는 “이제 일어날까?”하고 눈치를 챘다.
집에 돌아가는 길, 우리는 잠시 센강에 들려 에펠탑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파리가 왜 사랑의 도시인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춤을 추고 싶은 야경이었다. 나는 이게 꿈인가 싶어 배들이 느릿느릿 떠가는 걸 멍하니 바라봤다. 그는 그런 나를 바라봤다. 그 시선이 싫지 않았다.

어제 만났지만
다음날 저녁, 친구의 재즈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 고민하던 참에, 고래와 같이 가면 좋겠다 싶어서 먼저 연락했다. 한국이었다면 밤 9시에 만나는 게 그리 늦은 것도 아니지. 그리고 여긴 파리니까. 이번에도 무적의 카드, ’파리니까‘를 사용해 “재즈 공연 보러 갈래?”라고 문자를 보냈다. 그는 가능하다는 연락을 보내왔다.
집 앞에서 그를 만났다. 일하고 온 몰골이기엔 너무 멀끔하고 향수 냄새가 강했다. 집에 들렸다 나온 듯 했다. 그는 재즈바가 처음이라며 기대하는 눈치였다. 하루만에 다시 만나다니 그를 보는 순간 웃음이 났다. 반갑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오늘 하루 어땠는지, 고작 오늘 12시간 근황을 얘기했을 뿐인데 금새 재즈바에 도착했다. 입구에는 연주자 친구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에게 고래를 소개해주고, 근황을 주고 받았다. 얘기가 길어지는 사이 고래는 내 입장권을 구입해 나를 기다렸다. 입장료가 꽤 비쌌으므로 초대해 놓고 미안했다. “내가 사려고 했는데! 맥주라도 사야겠네!”

우리는 명당 자리를 점 찍어 두고 잠시 담배를 피러 나갔다. 9시 시작이라던 공연이 9시 30분이 지나도록 시작하지 않았기에 여유를 부렸다. 그 사이 자리를 뺏기고 말았다. 분명 옷을 두고 나갔는데 그걸 밀어두고 누군가 떡 하니 앉아 있었다. 하는 수 없이 우리는 좁은 자리를 비집고 바짝 붙어 앉게 됐다. 아직 이정도로 친한 건 아닌데…
공연이 시작되자 우리는 리듬에 맞춰 어깨를 들썩이다 수시로 귓속말을 했다. ”저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탈리아 사람!“ 음악이 고조될수록 더 가까이 다가가 얘기했다. ”어쩌다 저 음악인들이랑 친구가 된 거야?“ ”재즈바에서 공연 기다리다 만났어.“ 잠시 후 공연 쉬는 시간이 되어 바람을 쐬기 위해 또 다시 바깥 테라스로 나와 담배를 물었다. 우리 둘 사이의 거리는 이전보다 확실히 상당히 가까워져 있었다. 그는 알았을까, 그 거리가 부담스러워 허리를 뒤로 살짝 젖히고 서 있었다는 걸. 그는 두 번째 담배를 피며, “공연에 데려와줘서 고마워. 그리고 오늘 옷 잘 어울린다.“라고 말했다.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옷 중 가장 예쁜 걸로 입었다는 걸 알까.

밤 12시, 녹초가 된 몸으로 집으로 향했다. 나는 영어도 안 나오는데 고래는 에너지가 돈다며 활기를 되찾았다. 그는 내가 내리는 지하철 역에서 두 정거장 떨어진 곳에 산다. RER B의 더러운 의자에 마주보고 앉아, 프랑스 지하철 특유의 찌릿한 냄새를 맡으면서, 집에 가는 길이 퍽 낯설었다. 그는 내일 밤 9시에 또 보자는 얘기를 꺼냈다. 3일 연속으로 만나는 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었지만, 볼링을 치자는 말에 확 구미가 당겼다. “좋아 자세한 건 메시지로 정하자.” 새벽 1시가 넘은 시각, 겨우 씻고 침대에 누워 나에게 주문을 외웠다. 진.정.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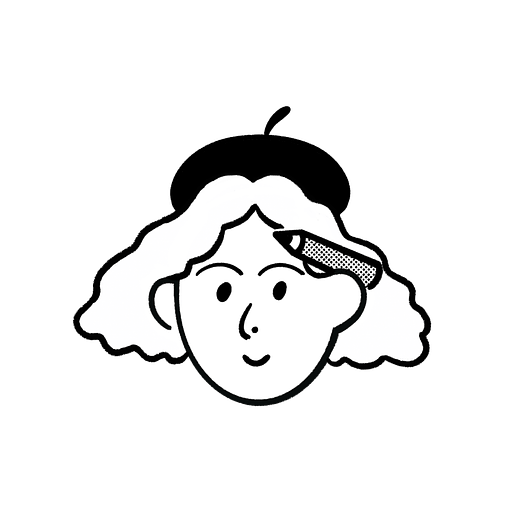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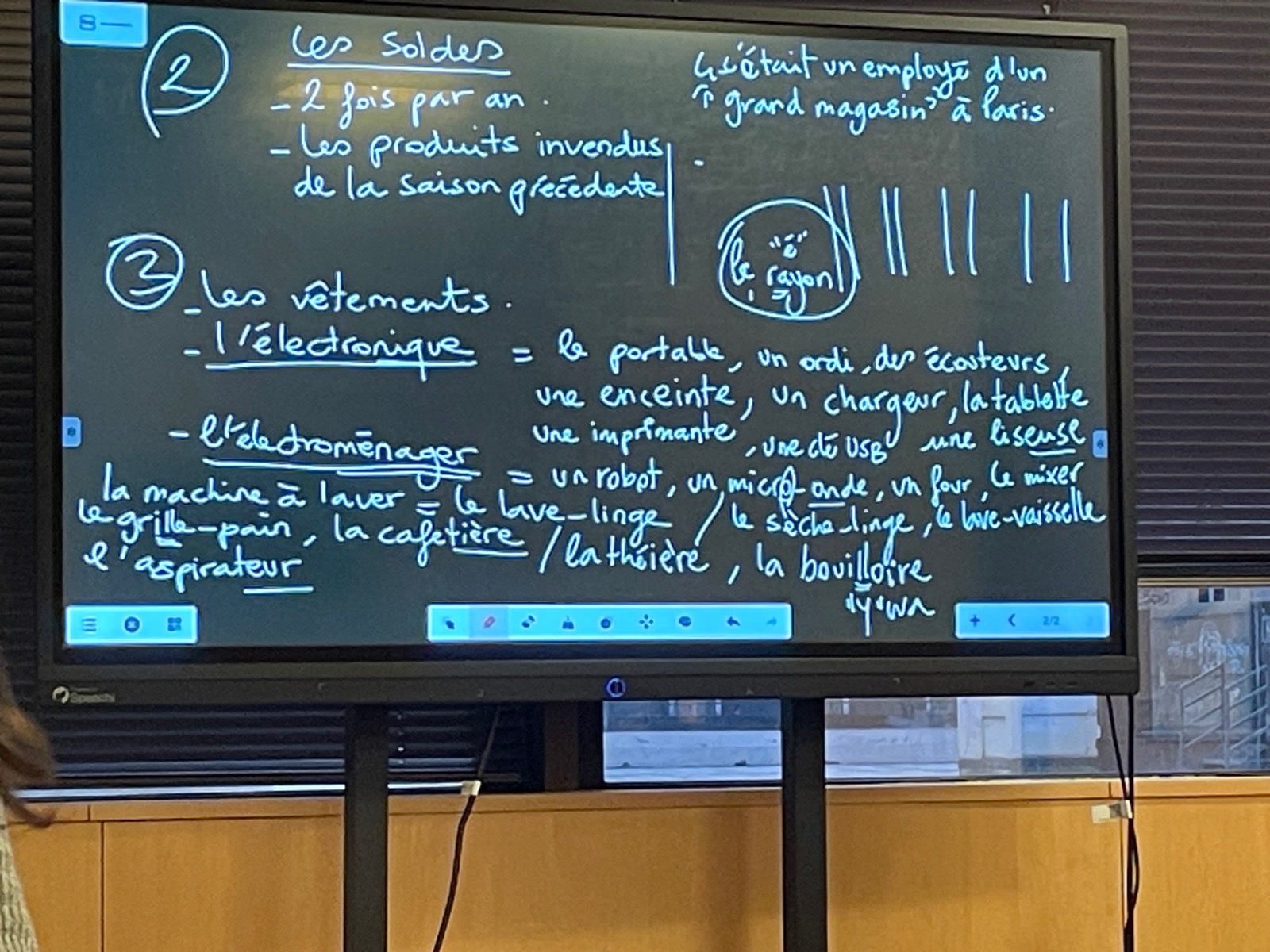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
은호
흥미진진해요🙌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