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이사
일정이 살짝 복잡해졌다. 베이비시터로 2주 일하고 나면 곧바로 클로이의 방학이 시작한다. 그것도 무려 2달이나. 참고로 프랑스는 7월, 8월 학교가 방학하고, 은행, 공공기관, 기업, 동네 레스토랑과 가게 등은 문을 닫고 쉰다. 1년에 무려 2달을, 공휴일로 ‘공식적으로’ 쉰다는 게 프랑스에서는 가능하다. 연차까지 껴서 3달을 쉬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 이래서 내가 여길 왔지.
아무튼 방학기간 동안은 베이비시터 일이 없으므로 집주인은 집세로 월 500유로를 제시하셨다. 안 내던 돈을 내야 할 때면 이상하게 아까워진다. 이 금액을 낼 거라면, 파리 시내에서 살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집 구하기 성공

이참에 조금 돈을 더 내더라도 딱 한 달만 파리 내에 살아보기로 결심했다. 그러던 중 재즈바에서 만난 기타리스트 친구가 7월, 한 달 동안 휴가를 떠나서 집이 빈다는 사실을 인스타에 올렸다. 1주에 175유로로 빌려준다고 했다. 4주면 700유로, 100만 원이다. 인터넷, 수도, 전기, 가스 모두 포함된 가격이고, 파리 안에서 혼자 지내는 방은 보통 150만 원 정도 하니까 비싼 편은 아니었다. 지하철에서 2분 거리에 있으니 안전도 보장되었다. 그리고 괜히 모르는 사람에게 빌렸다가 문제 생기는 것보다 이게 나았다. 곧바로 연락해 집을 찜했다. 나도 드디어 파리 피플!
달랑 가방 하나
이사하는 날, 이불 빨래와 방 청소를 마치고 배낭을 쌌다. 산티아고 다녀온지 2주만에 다시 이사라니, 쉴틈이 없다 쉴틈이 없어! 가방에는 여름 상의3, 하의3, 속옷5, 수영복, 신발3, 노트북과 아이패드, 세면도구, 보조가방2 정도로 간촐하게 챙겼다. 줄인다고 줄였는데 무거워서 노트북과 보조가방을 뺐다. 산티아고 순례를 다녀온 이후로 물건은 다 짐이다.

짐은 말 그대로 짐이 된다. 미니멀리즘 삶을 살기 위해 뭔가를 사거나 챙길 때 조건 세 가지를 달았다. 첫 째, 다른 물건이 대신할 수 있는가? 없다면 사야지. 근데 대신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굳이 살 필요가 없다. 둘 째, 이번 주에 필요한 물건인가? 가방이 무거워지는 건 질색이다. 아무리 싸더라도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라면 굳이 사지 않는다. 필요할 때 사야지. 셋 째, 30유로를 넘기는가? 넘는다면 일단 보류한다. 나중에 생각하면 안 사길 잘 했어 하는 물건이 대체로 많다.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치면 살 게 없다. 돈은 저절로 아껴진다.
숲 속 난장이

새 집은 작고 작고 작았다. 너무 작아서 2층에 침대를, 1층에 식탁 겸 책상을 두고 사는 구조였다. 이토록 작디 작은 곳에 그 사이를 비집고 각종 식물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일찍이 집 안의 식물을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식물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많을 줄이야. 이런 공간에서 사는 건 처음이었다.
때로는 아침 햇살을 쬐면서, 때로는 늦은 밤 은은한 조명불 아래에서 조심스럽게 물을 주고, 썩은 잎은 잘라냈다. 이 루틴을 하루 이틀 반복하다보니 슬슬 재미가 붙었다. 어느새 아침 저녁으로 더 자주 식물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내게 보답이라도 하듯 새로운 떡잎을 짠 하고 보여줬다. 나도 같이 생기가 돋는 것 같았다.
종종 식물의 사진을 찍어 집주인 친구에게 보내주었다. “얘 싹 텄다! 애들 잘 자라고 있으니 걱정 마.” 이 친구는 어느새 식물에 진심이 되어버린 내게 작은 화분을 선물하겠다고 했다. 클로이네 집으로 들어가면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지. 벌써부터 신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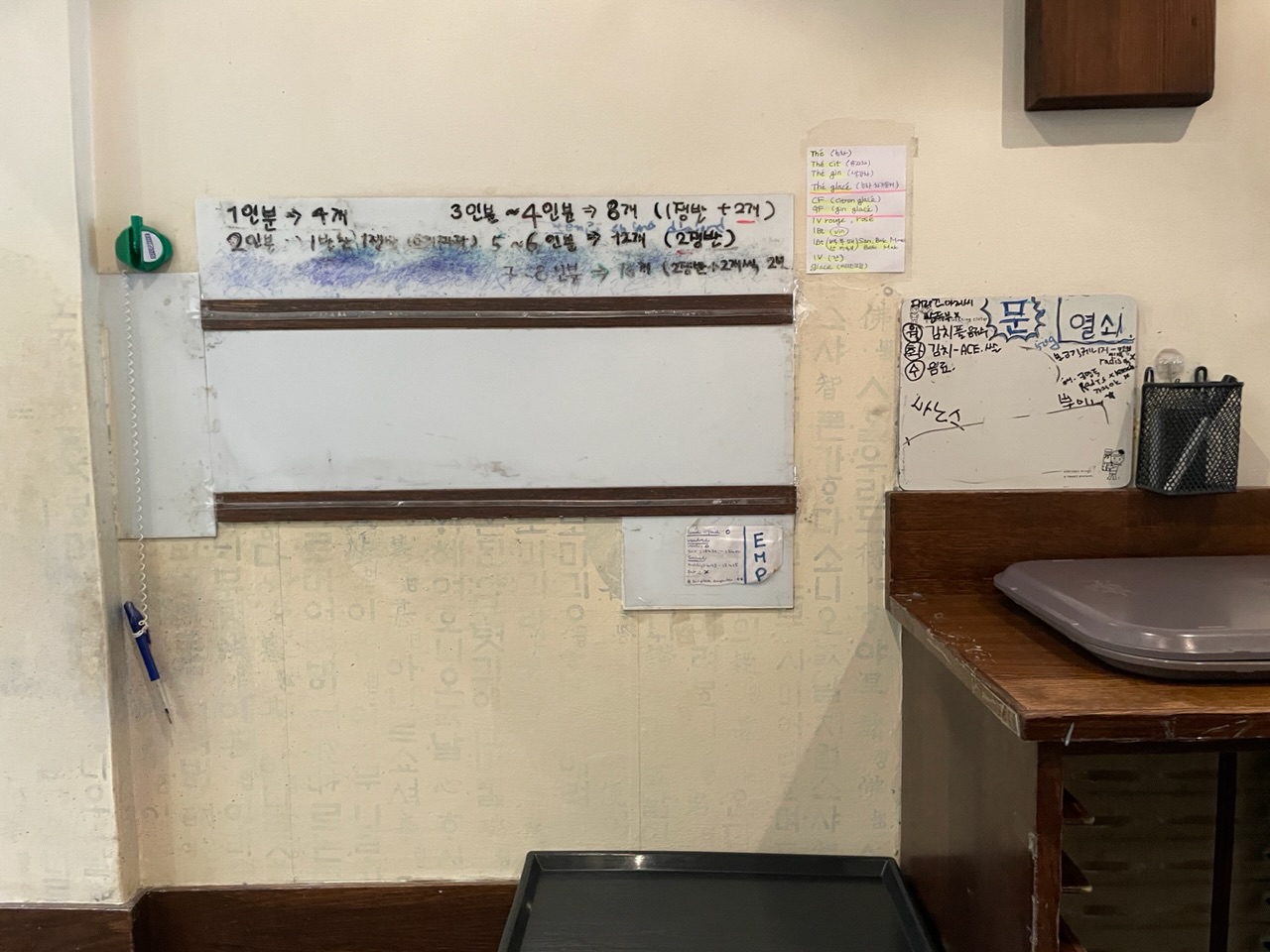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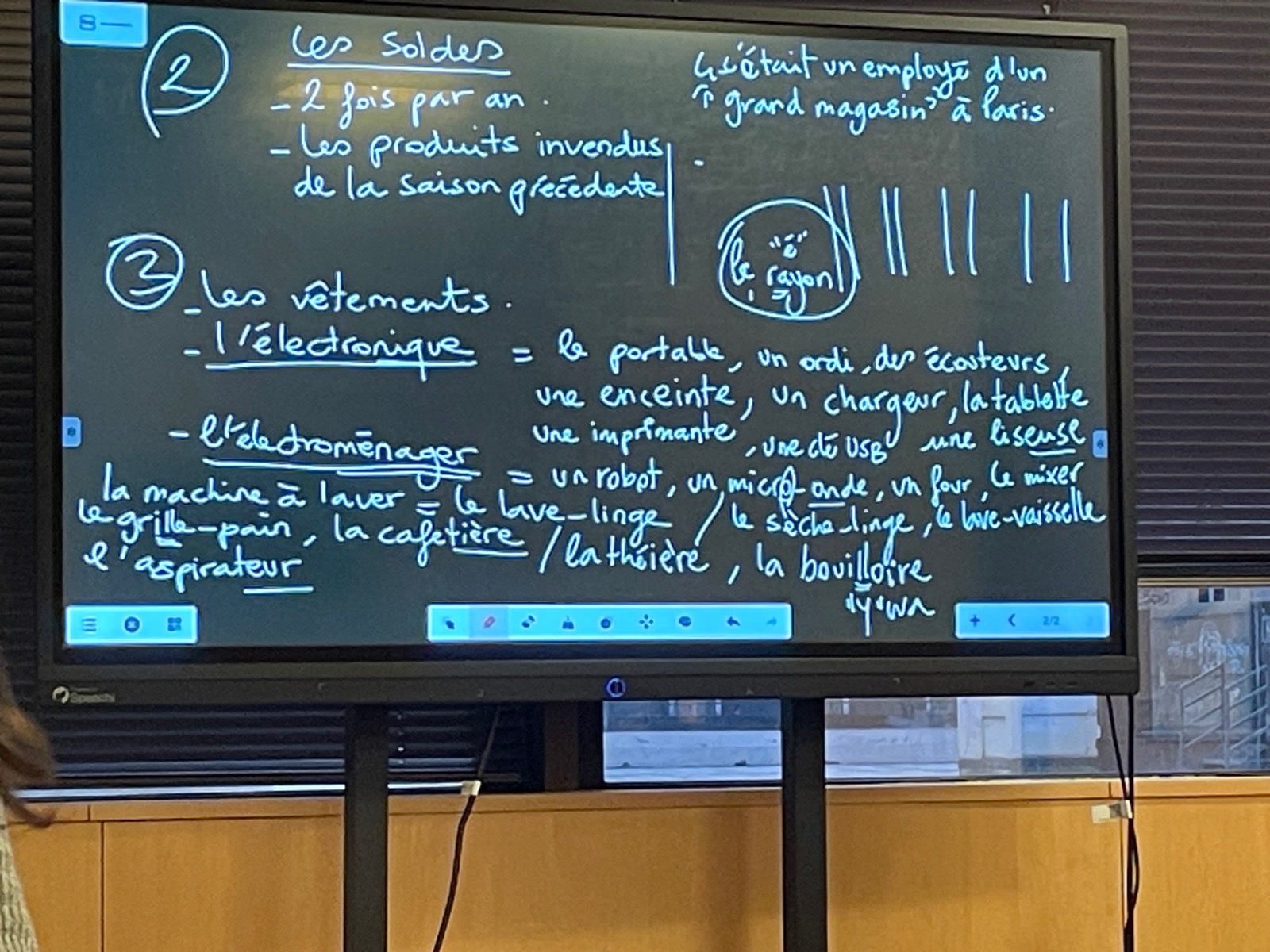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