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든 사이 누군가 나를 기차에 태운 모양이었다. 위잉, 철컥. 위이이잉, 철컥. 단단한 철근이 부딪히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길게 늘어졌다. 무궁화호, 아니면 누리호다. 누리호. 이름이 누리호가 맞던가? 친구들을 따라 서울로 올라가고 내려갈 때마다 평택역에서 기차를 타곤 했지. 좌석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열차 칸 사이 공간에 몸을 구기고 앉았더랬다. 맨바닥에 앉아서 누구는 다리털이 한쪽밖에 없고 누구는 털이 하나도 없는 얘기를 주고받았던 이십 대 초반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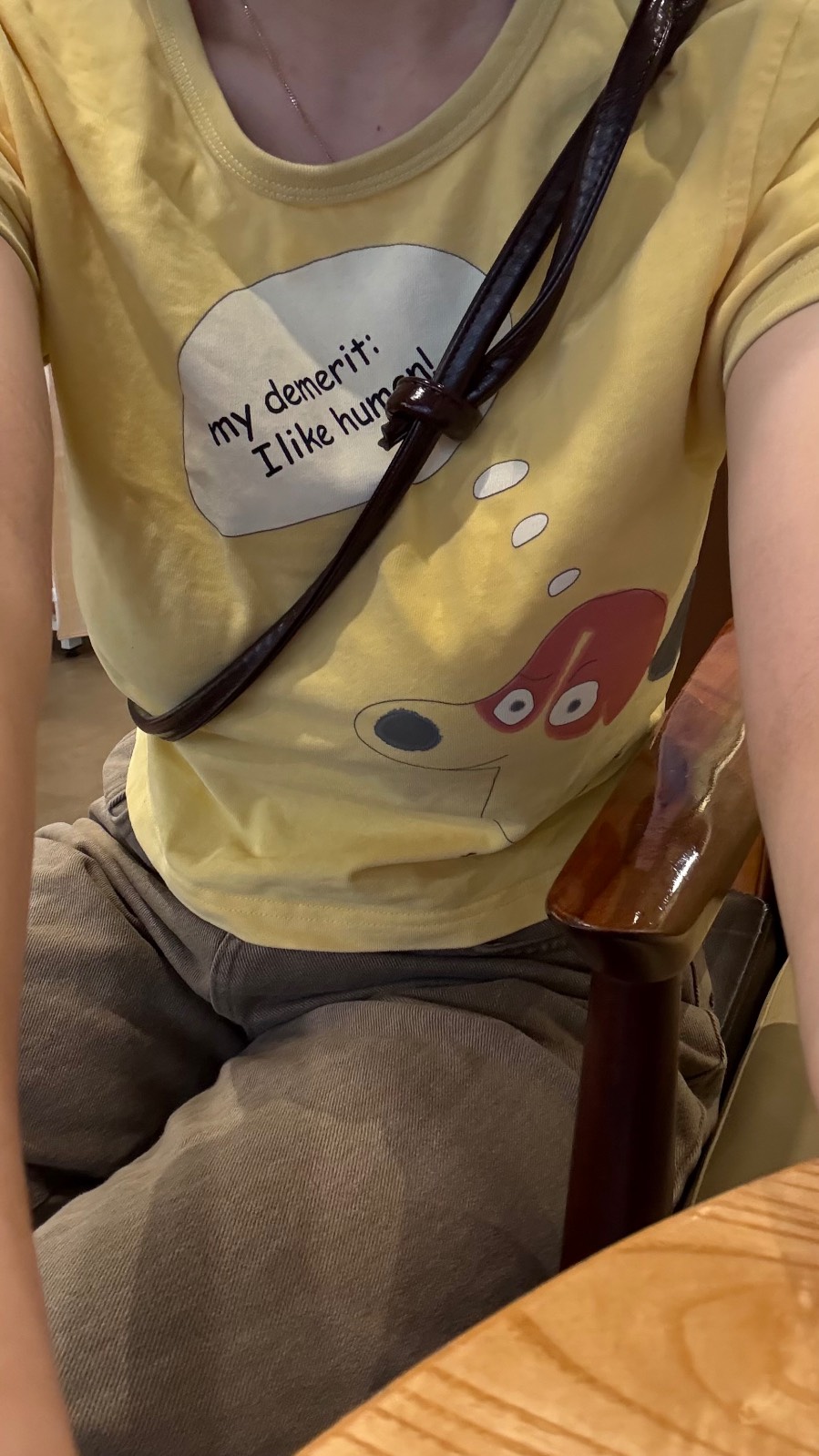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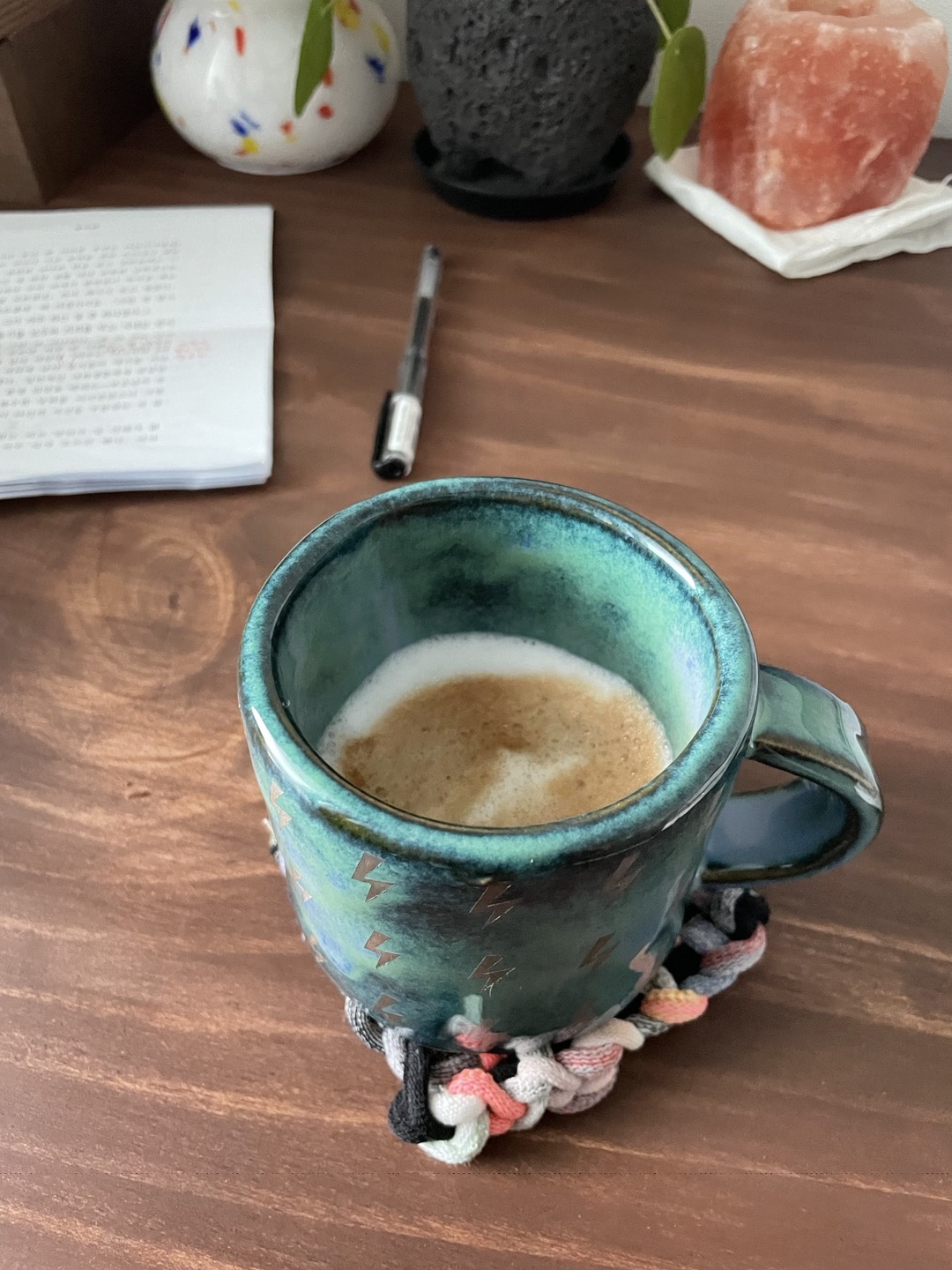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