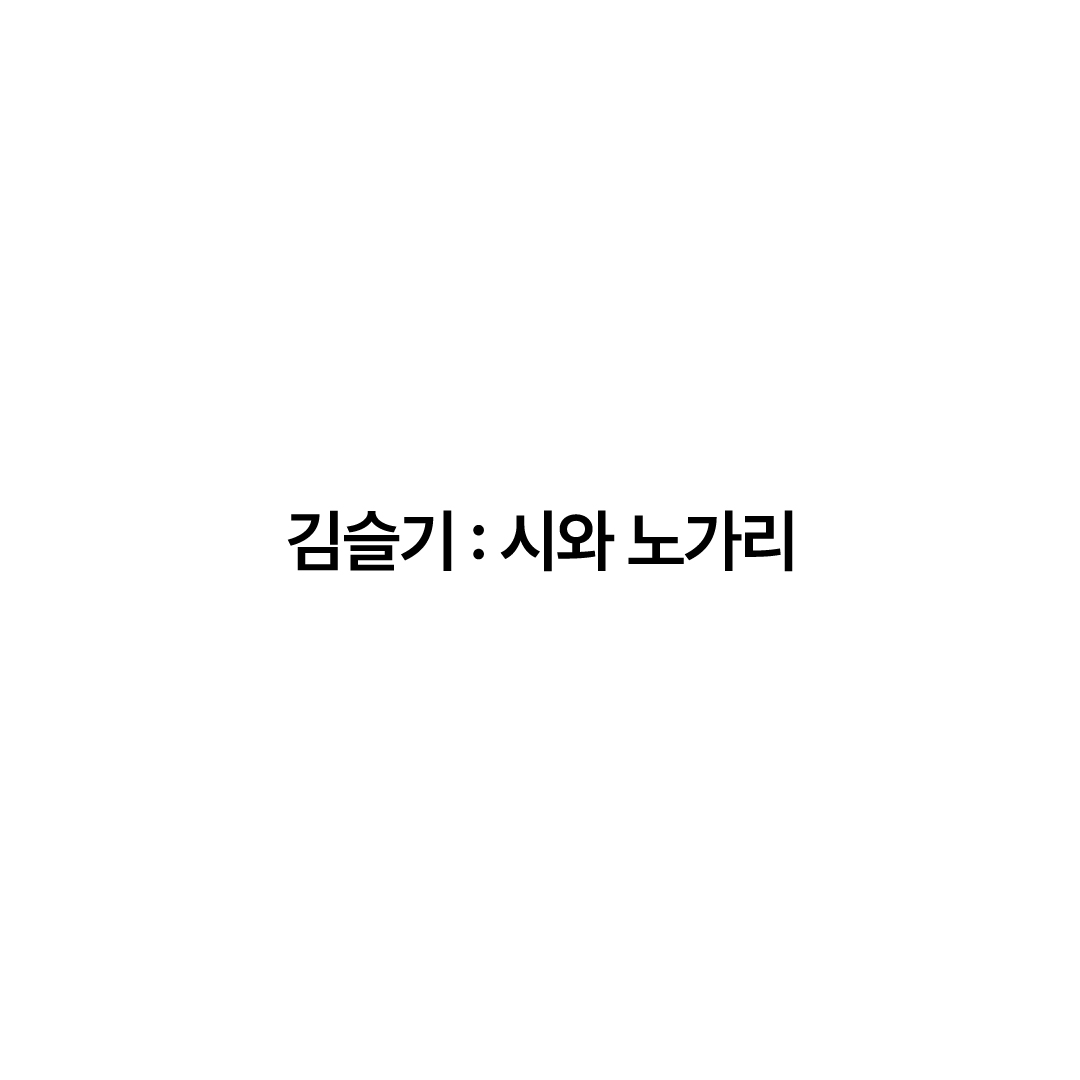
시인의 말
시집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읽게 되는 문장은 무엇일까. 제목이나 목차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집은 아마도 시인의 말 일 것이다(창작과 비평사에서 출판된 시집은 시인의 말이 끝에 수록되어 있다). 한 권의 시집이 시인이 지은 집이라면 그 안쪽은 어떻게 활용될까. 집이니 통풍과 환기를 위한 창문도 있을 것이며, 휴식을 위한 소파나 테이블이 들어서 있는 거실도 있을 것이고, 잠을 청하기 위한 침실도 있을 것이다. 시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라는 재료와 도구가 모두 다르기에 시의 집은 미로에 가깝다. 어떤 집은 들어서는 문과 복도가 좁거나 클 수도 있고, 창문이 너무 많거나 적을 수도 있으며, 침실과 거실이 협소하거나 혹은 합쳐져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집이라는 장소 혹은 건물의 쓰임새는 거처다. 시의 집을 열었을 때, 나는 그곳에 머문다.
시집의 제목이라는 문을 열고 첫 번째로 만나는 문장. 그러니까 시인의 말은 아마도 복도쯤이 되겠다. 나는 이 복도에 머물러 있기를 오랫동안 즐겨왔다. 이십 대 초반쯤이었던가? 실제로 셋방살이를 하던 반지하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내가 가장 좋아하던 공간은 복도였다. 볕이 잘 들지 않던 집에서 그나마 가장 따듯하고 밝은 볕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그곳이었기 때문이다. 그 집에서는 복도에 앉아 담배를 태우며 시집을 읽는 순간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던 순간이었다. 생각해 보면 시집은 나의 또 다른 거처가 아니었나 싶다. 집이라는 곳은 어쨌든 내가 돌아와야 할 장소이니, 그 열악함 속에서도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지 않은가. 도피처와 거처의 역할을 동시에 해내는 집. 가난하고 암울했던 시기에 시의 집은 내게 그런 역할을 해주었다. 그래서일까. 어떤 시집이든 시인의 말이라는 복도에 들어서면 왠지 볕을 받는 따듯함과 편안함을 느낀다. 그 복도는 당부나 안녕이고, 때론 후회나 자책이기도 하며, 또 다짐이나 선언이다. 시의 집이 가진 쓰임새가 다양하듯, 그 안 복도의 쓰임새도 다양하다.
시의 집에 있는 모든 복도를 좋아하지만, 내가 그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복도는 아마도 시인 김소연의 『수학자의 아침』인 것 같다. 언젠가 반지하의 복도에서 들어선 그 집의 복도는 자장가였다.
애도를 멎게 하는
자장가가 되고 싶다.
2013년 11월김소연- 김소연, 『수학자의 아침』 중 시인의 말
나는 정신분석학자나 롤랑 바르트가 아니기에, 그리고 이 글을 통해 애도라는 개념을 줄줄 늘어놓을 만한 무뢰한이 아니기에 아주 사전적인 의미의 애도를 말하고 싶다. 애도. 그것은 모든 의미 있는 상실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알려져 있다. 흔히 우리가 인터넷 밈으로 알고 있는 이별을 수용하는 5단계(부정-분노-우울-수용)는 이 애도의 개념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렇다면 애도를 멎게 하는 자장가란, 그 자장가가 되고 싶단 말의 마음은 무엇일까. 나는 오랫동안 고민해왔고, 스스로가 내린 결론에 닿았지만, 이 문장을 읽는 분들께는 시인이 직접 밝힌 한 이야기를 옮겨 놓으려 한다. 내가 이 이야기를 만나게 된 것은 『수학자의 아침』이라는 집을 떠나 거의 10년이란 시간이 흐른 뒤였다. 김소연 시인의 산문집 『어금니 깨물기』의 일부분이다.
(...) 시간을 몸소 형상화하는 기나긴 이야기, 그 이야기는 버겁다. 무겁거나 지루하거나 고루하다. 미량의 계몽성마저 포함돼 있다. 그 모든 무게를 휘발하고 감수성만 앙금으로 남길 때에, 이야기 하나가 야릇하고 얇게 도래한다. 그걸 나는 기도라고 여긴다. 누구를 위한 기도인지 누구에게 하는 기도인지, 방향이 부재하는 기도. 그 출처만을 겨우 알아챌 수 있는 기도. 누구를 위한 기도인지를 가만히 헤아리다 보면 저주처럼도 들리고, 누구에게 하는 기도인지를 가만히 헤아리다 보면 비아냥처럼도 들리는 기도. 신음처럼 삐져나오는 모든 기도들을 위한 어떤 얇은 기도. 기도들을 잠재우기 위한 자장가와 닮은 기도. 나는 기도를 자장가로 간주한다. 시가 기도들을 잠재우는 자장가와 닮기를 바란다.
아기들은 오직 오늘만을 살고 내일은 없다고 여긴다고, 어딘가에서 들었다. 또, 아기들은 잠드는 걸 죽음과 비슷한 공포로 여긴다는 얘기도 들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잠들려 하지 않는다고. 내일을 위해서 이젠 자야지, 하고 생각하면 아기가 아니라고. 그런 아이들에게 내일이 있다는 것을, 내일이 곧 오늘처럼 이곳으로 오리라는 것을 가장 평화로운 방식으로 설득하는 일이 자장가를 불러주는 일이라 했다. 자장가 속에 담긴 야릇하고 평온한 약속에 기대어 아이들은 애써 붙잡고 있던 오늘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스르르 잠이 든다. 약속에 기대는 한, 아이에겐 기도가 필요 없다. 그렇게 기도가 무용해지도록, 기도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는 일. 그게 시가 아닐까 생각한다 (...)- 김소연, <기도를 잠시 멎게 하기>, 『어금니 깨물기』 에서
애도를 멎게 하는 자장가가 되고 싶다는 마음은 이런 것이다. 시인의 이야기처럼, 내일이 곧 오늘처럼 이곳으로 오리라는 것을 가장 평화로운 방식으로 설득하는 일. 그 마음. 그것이 시인이 『수학자의 아침』 이라는 집을 지었을 때의 마음이었다면, 그것으로 나는 충분히 잠들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시의 집이라는 거처에서, 그 복도에서.
이 글을 준비하기 전, 오랜만에 복도에 앉아 시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 보았다. 그곳에는 역시 시인의 말이라는 복도가 나 있고, 안으로 이어져 있었다. 복도를 딛는 느낌은 여전히 따듯하고 편안했다. 굳이 안쪽으로 들어가 거실이나 침실을 찾지 않아도, 복도를 거처로 삼고 잠들어도 좋지 않겠나 싶은 기분이 들 정도로.
나는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절박한 심정으로 복도에 주저앉는 자가 아닐까 염려한다. 애써 오늘을 붙잡으며 내일을 생각하기에, 거처가 실로 거처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끝나지 않는 애도나 기도로 이어질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그 순간의 당신이 시의 집으로 오길 바란다. 시의 집에서 문을 열고, 어디라도 좋으니 머무르기를. 잠시라도 좋으니 그 자장가로 잠을 청하기를.
복도에 앉아 복도를 본다. 그리하여 야릇하고 평온한 잠이 양 떼처럼 몰려오는 기분.
오늘은 이곳에서 잠들어야겠다.
° 김소연, 『수학자의 아침』 (문학과 지성사, 2013)
° 김소연, 『어금니 깨물기』 (마음산책,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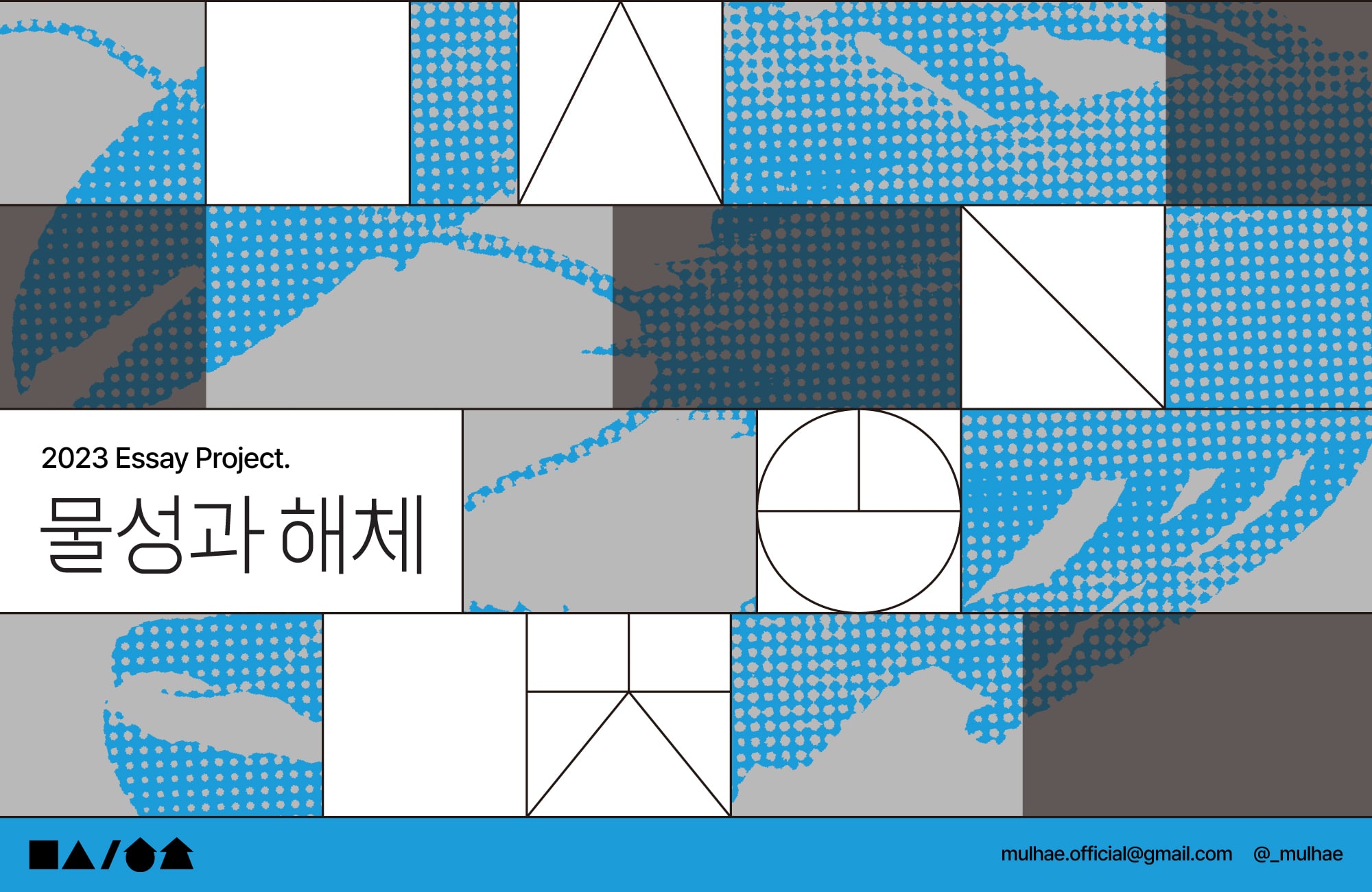
김슬기 작가의 <시와 노가리>는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진 노가리를 앞에 두고 술잔 대신 시집을 듭니다. 술 대신 시를 나눕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시에 취해 보는 건 어떨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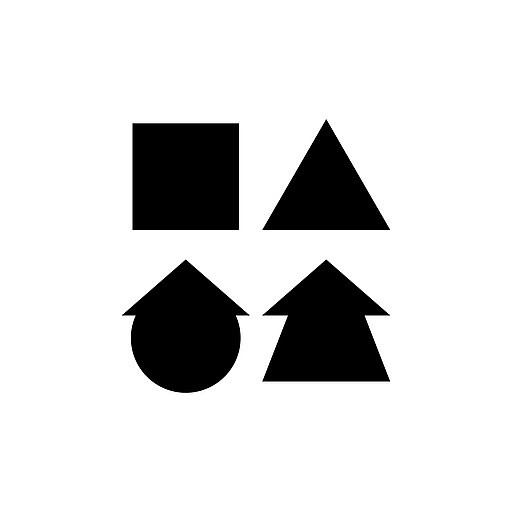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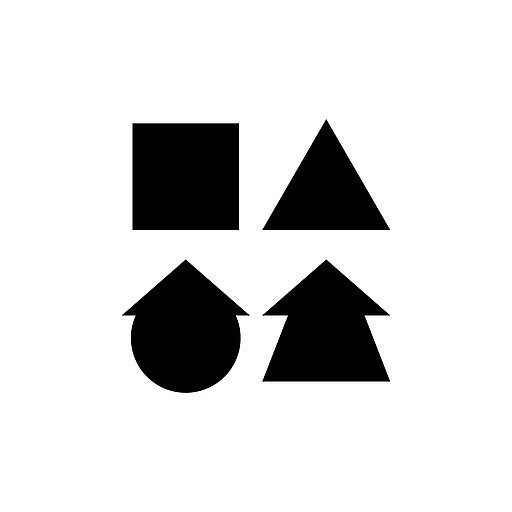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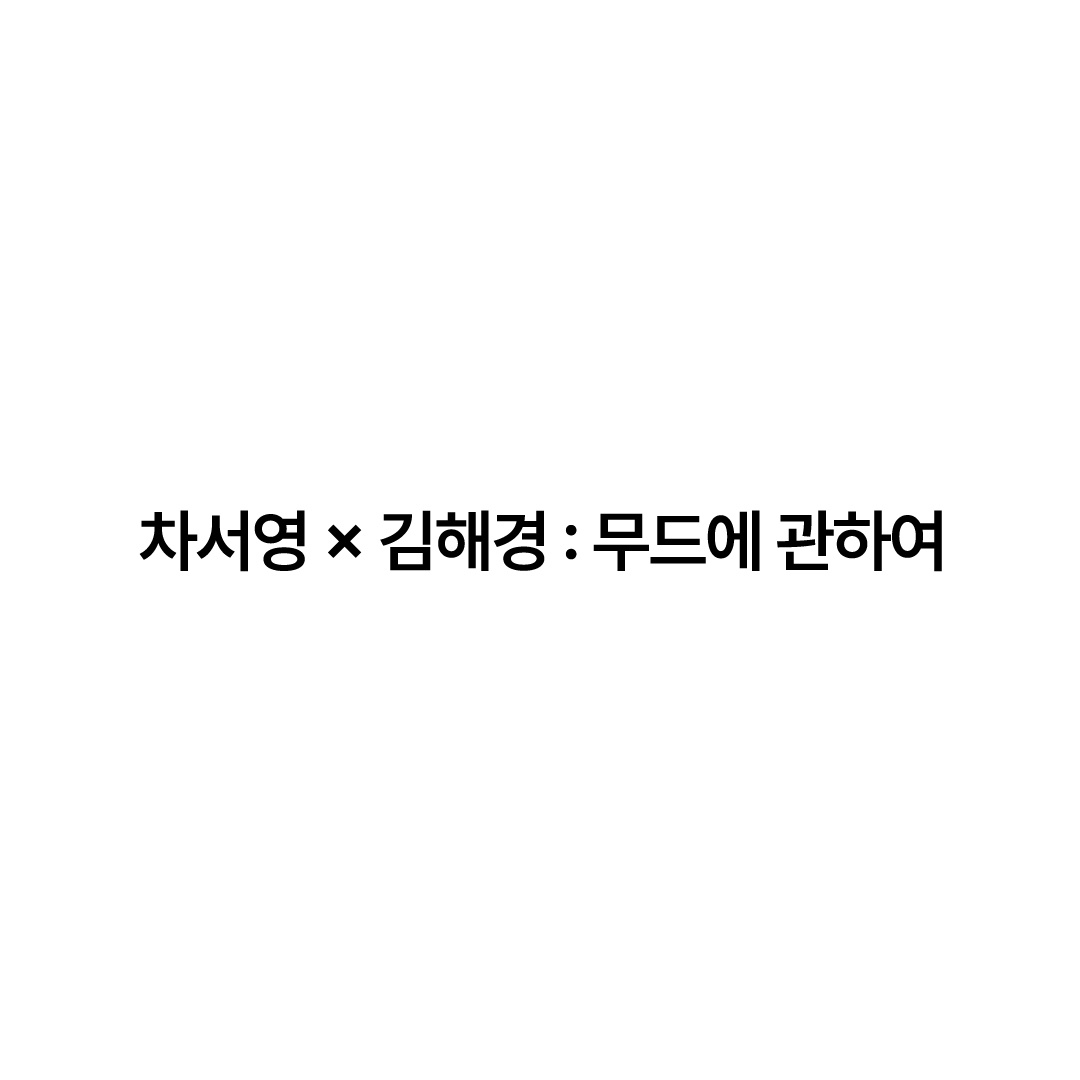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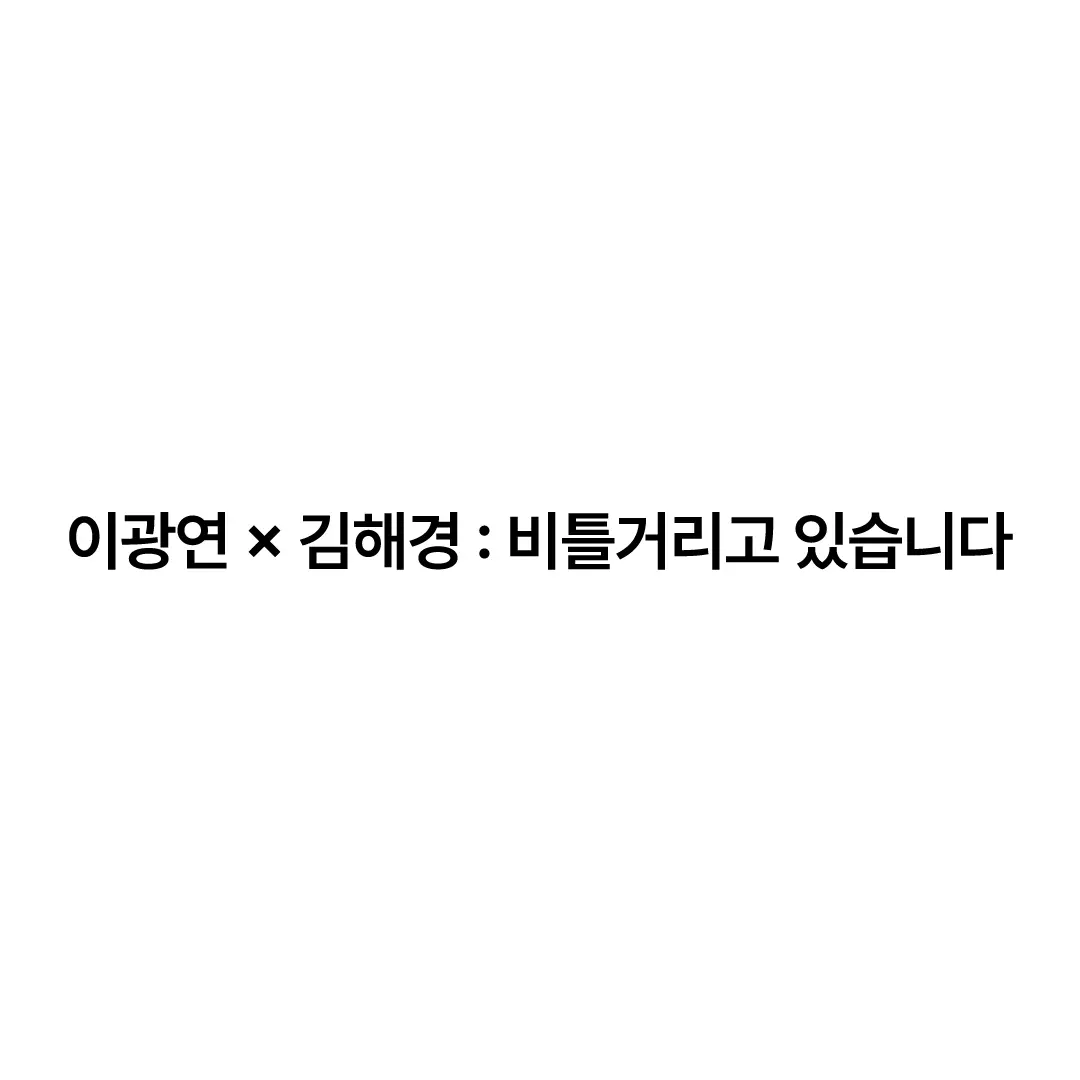
![[김해경] 라이팅룸 101호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r1qyv23ad7ug60982t919d03au22)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