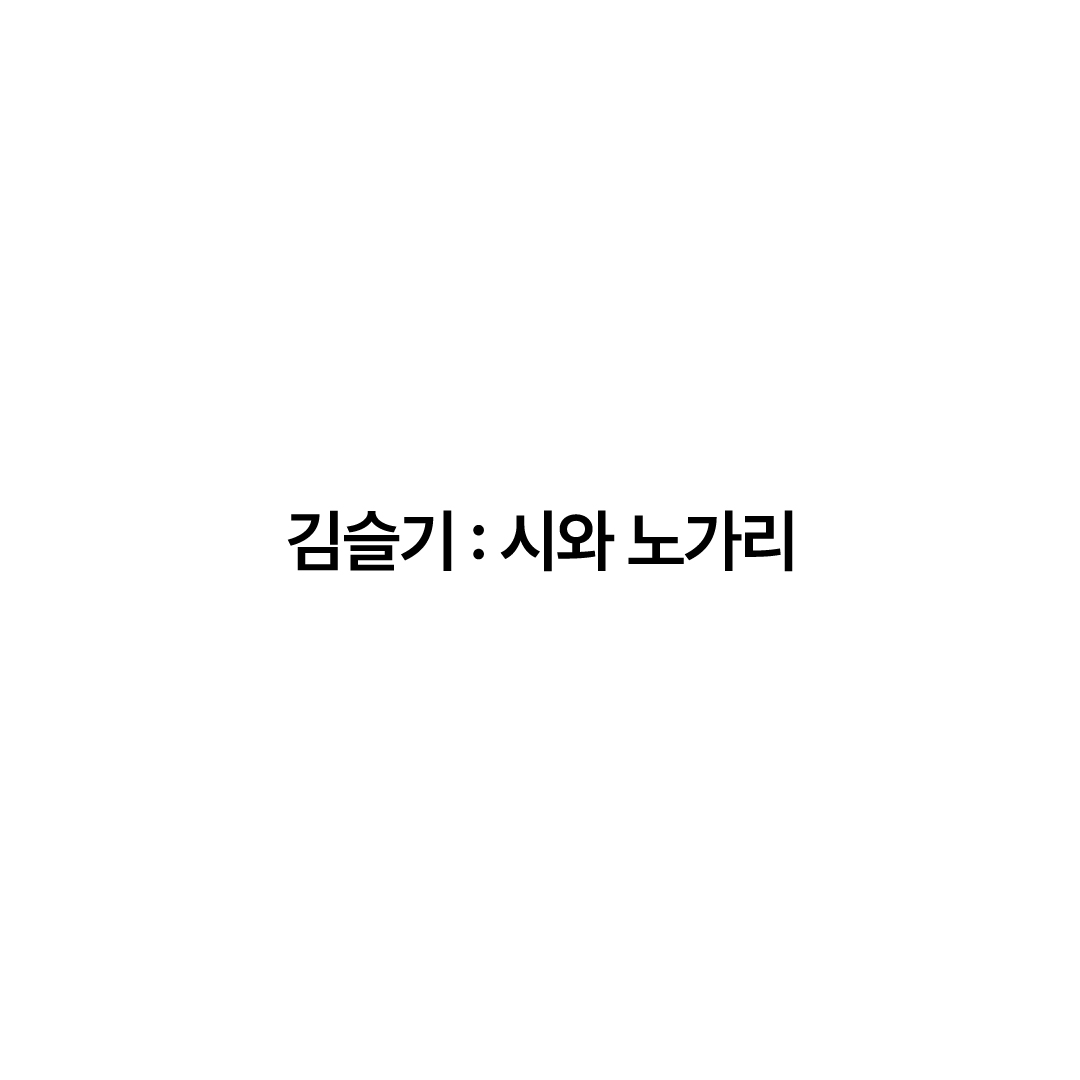
우리가 좋아했던 야생소녀
"형, 엄마는 치트키에요."
올 초에 <물성과 해체>의 편집장인 해경에게 넌지시 한 편의 문장을 내민 적이 있었다. ‘작은 서랍 속에서 엄마의 수첩을 몰래 꺼내 본 적이 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 엄마의 이야기였다. 가까운 지인들에게 쓰고 있는 문장을 보여주는 일을 꽤나 부끄러워함에도 유독 엄마의 이야기는 확인을 받고 싶어진다. 그날, 눈에서 무언가 떨어지고 있다는 해경의 너스레를 뒤로하고 조용히 엄마에 대해 생각했다. 엄마를 쓰고 싶다. 요즘은 자꾸만 이런 기분이 들어 엄마를 생각한다. 쓰고 싶다는 기분은 일종의 불안감일지도 모르겠다.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가 어딘가로 멀리 가버릴 것 같다. 그래서 자꾸만 엄마를 쓰고, 확인받고, 그것으로 위안을 얻으려 하는지도. 엄마를 쓰면 엄마가 계속 그 자리에 남아있을 것 같다. 가끔씩 엄마의 얼굴을 보면 시간의 불공평함을 알게 되고, 왠지 내 시간을 나눠주고 싶은 기분이 든다. 엄마의 시계가 더뎠으면 좋겠다.
갓 스무살이 됐을 무렵의 여름, 집에서 잠을 청한 날이 손에 꼽는다. 친구들과 매일 어울려 다녔고, 늘 취한 상태였고, 무서울 것이 없었지만 늘 위험에 처해있는, 산에서 갓 내려온 고라니 같은 나날이었다. 엄마는 늘 자정 무렵에 전화를 했다. 전화를 받지 않은 다음날에는 꼭 문자 한 통이 남아있었고, 그것은 거의 포기에 가까운 애원이었다.
"어디니, 슬기야. 엄마 먼저 잔다. 밖에 너무 오래 있지 말고 일찍 들어와."
보건소에서 보내오는 코로나 방역 문자처럼 어쩜 그리도 똑같은지. 어울렸던 친구들 모두 비슷한 문자를 받곤 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가 그런 문자를 보내는 능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엄마들은 그랬다. 그리고 그 문자에는 조금의 거짓이 담겨있다는 것을 나는 나중에야 깨달았다.
외할머니의 기일에 맞춰 광주에 있는 큰삼촌댁에 머물렀을 때였다. 외가 쪽 친척들 중 맏이였던 나는 제사를 끝내고 뒷정리를 도왔고, 사촌 동생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어울려 외출을 했다. 나는 제사 준비와 정리로 피곤했었는지 깜빡 잠에 들었는데, 깨어보니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이었다. 갈증이 심했고, 물을 마시러 주방으로 가던 찰나에 인기척을 느껴 화들짝 놀라고 말았다. 거실의 불은 꺼져있었고, 소파에는 사람 형상의 그림자가 고개를 꾸벅꾸벅했다. 외출한 사촌 동생의 엄마인 숙모였다. 내버려 둘까.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숙모에게 다가서서 말했다.
"숙모, 들어가서 주무세요. 왜 여기서 졸고 계셔요."
"00이 아직 안 들어 왔잖니. 기다려야지."
"에이, 다 큰 성인인데 뭘 걱정하세요. 알아서 하겠죠. 들어가서 주무셔요."
"엄마는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매번 니 엄마도 그랬을 거다."
그날, 잠들지 못하는 숙모의 말벗을 새벽 내내 자청했고, 사촌 동생은 역시나 산에서 갓 내려온 고라니처럼 아침에 불쑥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아침잠을 청하는 숙모 대신 사촌동생을 크게 나무라다가 슬며 물러설 수 밖에 없었다. 먼저 잠들겠다는 엄마의 거짓말을 철썩 같이 믿었던 나의 한심 때문이었다. 그리고 다시금 엄마를 생각했다. 세상 모든 엄마는 아니겠으나, 나의 엄마와 내가 알고 있는 엄마들을.
1.
시장 좌판에서 배 보이며 누운 암게들을 본다
배딱지가 황금 알로 누렇다
황금색 옷을 입은 천수관음 무희들처럼 팔을 벌리고
세로로 촘촘히 진열돼 있다
2.
눈먼 여자가 그물을 손질할 때, 아얏!
똑바로 하라고 손끝을 물던 집게 달린 손
내 정신줄에 엉켜 이마에 숨겨둔
빛나는 눈을 꺼낸다
3.
술을 마시고야 고작
눈을 부릅떴던 분노의 새벽길
나를 보고 달려오던 어머니의
벌린 팔이 삼식육 개였다가
구십구 개였다가, 백팔 개였다가,
이윽고 천수(千手)가 되어 부둥켜안았다
희디흰 눈알이 눈발이 되어 부딪쳤다
4.
어머니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어머니,
또 그 어머니의 어머니의 까마득한 그 어머니가,
일제히 팔 벌리고 나를 붙들었다
경계 없고 한갓지다- 윤진화 <천수관음(千手觀音)>
불교의 보살 중에 천수관음(千手觀音)은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으로 작은 자들을 보살핀다고 한다. 그 자비로움으로 야생 같은 세상을 붙들고 쓰다듬는다고. 떠올려보니 집에 천수관음상 하나를 고이 모셔두며 살았던 것 같다. 구십구 개였다가, 백팔 개였다가, 이윽고 천 개의 마음이 되어 나를 하염없이 기다렸던, 엄마라는 이름의 천수관음상. 어쩌면 나는, 우리는 엄마가 좋아했던 야생의 소년 소녀였을 것이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춤을 추며, 불빛 속으로 폴짝폴짝 뛰어드는 고라니 같은. 그렇게 폴짝폴짝 새벽길에 뛰어들고 있을 때, 소파에 앉은 천수관음은 천 개의 눈과 손 같은 기도로 달려오고 있었겠지. 엄마의 엄마, 그 엄마의 까마득한 엄마들 모두가. 그것이 엄마라는 이름의 역사였겠지.
엄마, 라고 쓴다. 부른다.
경계 없고 한갓지다
아무래도 엄마는 치트키인 것 같다.
º 윤진화 『우리의 야생 소녀』 (문학동네,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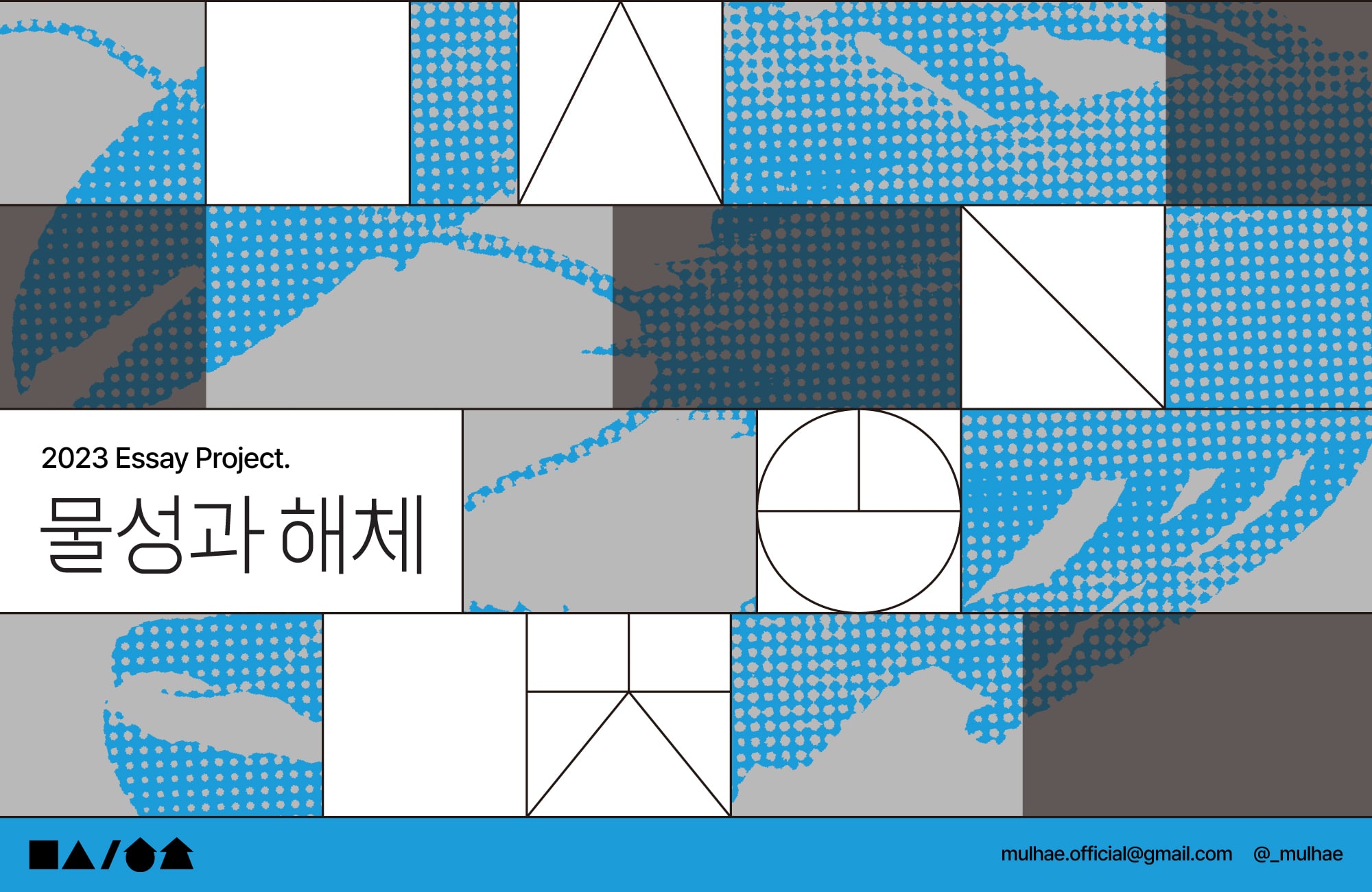
김슬기 작가의 <시와 노가리>는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진 노가리를 앞에 두고 술잔 대신 시집을 듭니다. 술 대신 시를 나눕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시에 취해 보는 건 어떨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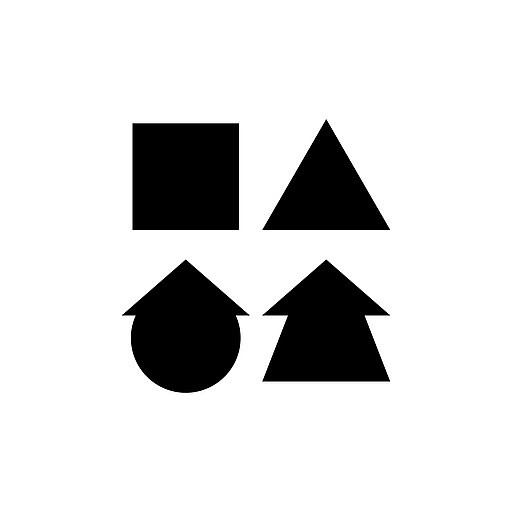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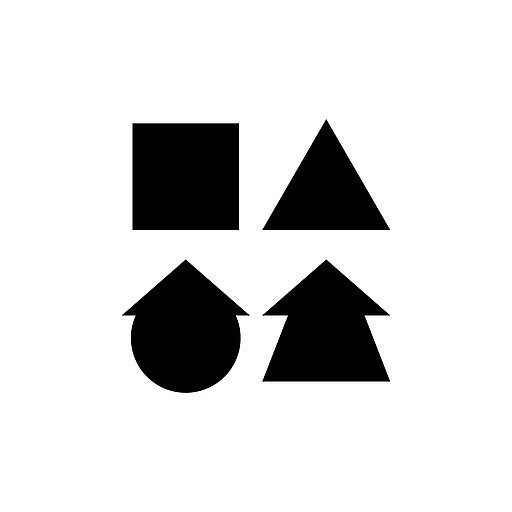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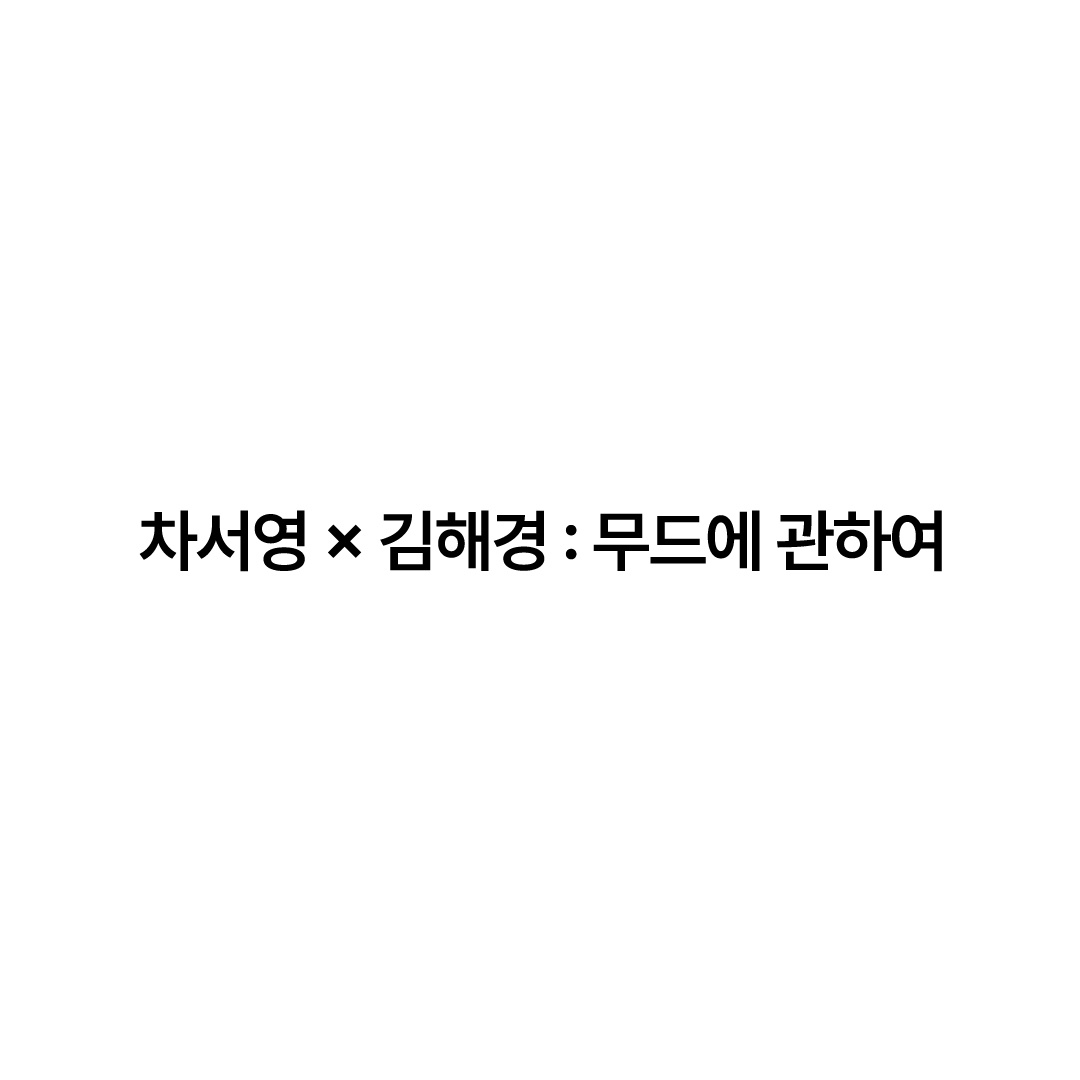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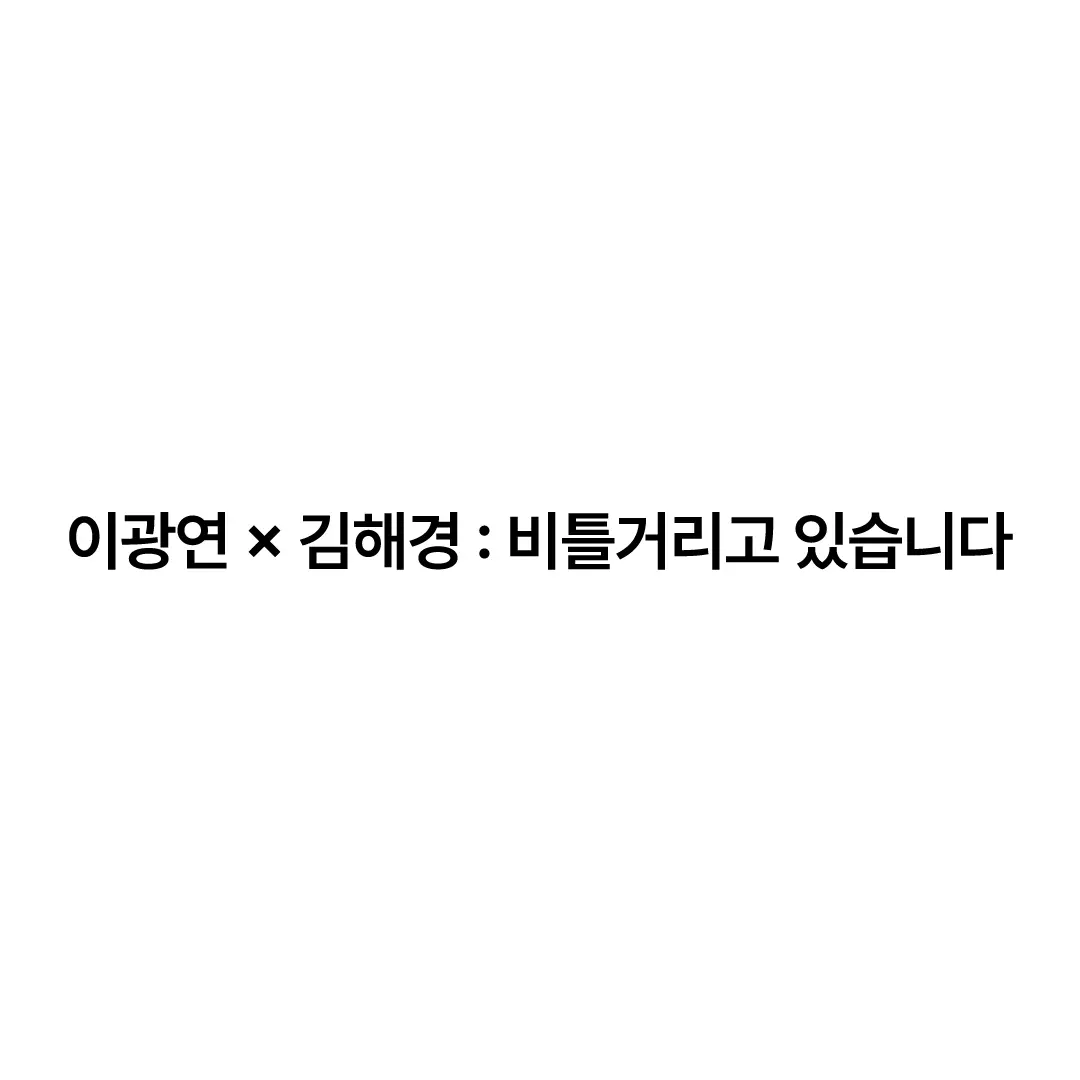
![[김해경] 라이팅룸 101호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r1qyv23ad7ug60982t919d03au22)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