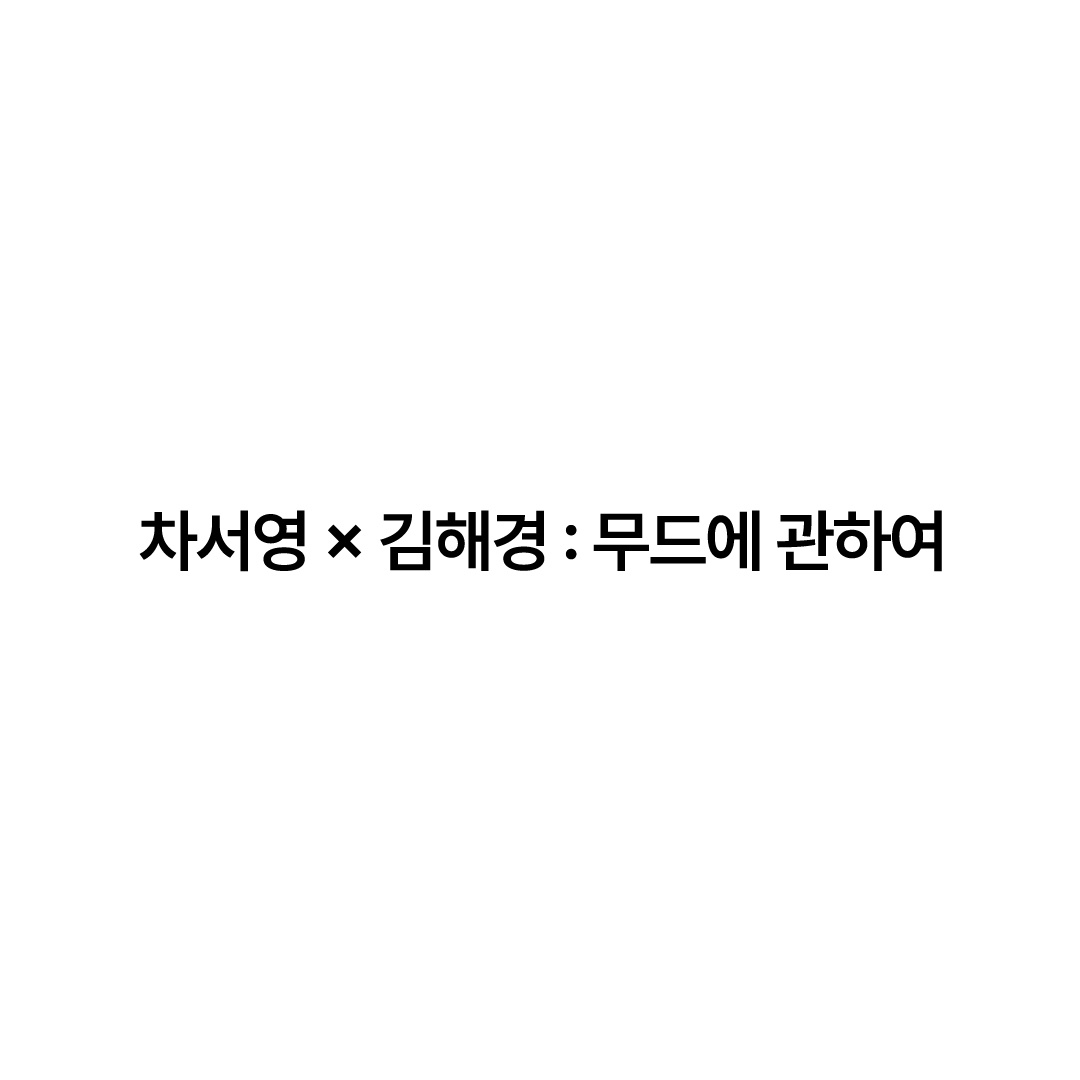
다자이의 편지

일본의 소설 작가 다자이 오사무에 대해선 소문으로 그 이름을 익히 들었습니다. 그 작가가 쓴 인간실격이나 여치, 사양 같은 작품을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원체 소설은 읽지 않는 편식주의자라 처음엔 그의 작품도 많은 추천을 받기는 했으나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이란 영화를 감명 깊게 보았는데, 한 친구가 그 영화와 비슷한 소설이 있으니 꼭 읽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실격이었습니다. "부끄럼 많은 생애를 살았습니다"로 시작하는 그 소설은 왠지 소설이라기 보다는 누군가의 오래된 일기장을 훔쳐보는 기분이 들어 손을 놓지 못하겠더군요. 그리고 소설을 그렇게 순식간에 한 자리에서 다 읽은 적도 처음이었어요. 제가 책을 다 읽은 경우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시집과 학술서적을 통독하는 이 외에는 네 번 정도가 다입니다.
첫 번째는 이승희 시인의 거짓말처럼 맨드라미라는 시집이었는데, 여름날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과제와 시험이 다 끝난 저는 침대에 대자로 뻗어 짙은 자줏빛의 그 시집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냄비받침보다도 얇은 책 속에 담긴 시 서른여 편을 순식간에 읽어버리곤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승희라는 사람도 보통의 나날을 보낸 사람 같지는 않았습니다. 죽음이 드리우는 무드는 대부분이 너무 어두워서 비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가 말하는 죽음은 마치 한낮의 죽음 같아서 아이러니하게 생을 지속하고 희망하는 우리의 현실과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줍니다. 그 맛에 취해서 그날은 까무룩 지워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다자이의 인간실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대구에서의 생활을 잠시 접고 경주에서 지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운동장을 열 바퀴씩 뛸 정도로 생에 대한 애착이 강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경주엔 서점이 없어서, 동네 참고서 서점 정도가 책을 구할 수 있는 전부였는데요. 아니면 놀러도 갈겸 대구에 있는 대형서점을 갔어야 했습니다. 아무튼 친구로부터 인간실격을 추천받고는 혹시나 하여 동네 책방에 가니 실제로 그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매를 한 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부모님을 기다리며 그 자리에서 인간실격을 다 읽어버렸습니다. 부모님이 도착했을 때 전 이미 생의 부끄러움을 다 아는 듯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로부터 끓어오르는 알 수 없는 혐오감. 아, 이건 뭐랄까 좀 짜증나면서도 내게 살아갈 이유를 주석으로 붙여주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자이는 일찍 죽었답니다. 자신의 애인과 강물에 투신했다고 전해집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의 작품 앵두를 따 그의 기일을 앵두기일이라고 한답니다. 모르긴 몰라도 요즘 저는 그의 서한집을 읽고 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나 랭보처럼 욕정에 가까운 문학에 대한 열망을 토로하며, 인생의 철학 같은 게 아니라 그야말로 시시콜콜한 편지들로 가득합니다. 그 중 재밌는 건 다자이도 젊은 시절 사람들과 모여 앤솔로지를 하나 냈다는 것입니다. 다자이는 끝없이 원고를 달라 조르고, 모임에 참석해달라 조르며 우리가 문학을,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당신 글 참 좋다고, 깜짝 놀랐다고. 글은 못 보내도 모임에 꼭 와서 술 한 잔 하자고. 회유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창간호이자 종간호였던 <푸른 꽃> 1집을 내고는, 바로 푸른 꽃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는 것까지 보면서, 그 결말은 푸른 꽃을 접되 종종 모여서 문학 이야기 하는 연을 이어가자는 것까지도 보면서 저는 웃겨 죽을 뻔했습니다. 1930년대 쟁쟁한 작가들이 판치는 문학판에서 그렇게 여리디 여린 이름을 가진 사화집이 통할리가요. 그래도 다자이의 열정과 문학적 안목까지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소년미가 저는 문득 귀여웠던 것입니다. 제가 만든 <물성과 해체>와도 비슷한 것 같구요.
다자이는 사람이 참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아쿠타가와상 수상에 계속 실패하면서 히스테리가 점점 심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을 자기 글벗들에게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그때라도 글벗들이 조금 도와줬더라면, 맛있는 것도 사주고 네가 최고다 말해줬으면 다자이의 운명이 바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윤곤강이라고 있습니다. 다자이와 비슷한 나이에 죽었습니다. 시란 이런 것이다! 하고 1930년대 그 당시에 시론도 썼던 똑똑한 사람이었으나, 누구 하나 그를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런 거 있죠. 맞아 너 잘 쓰지. 잘 쓰는데 너의 말은 좀 어려워. 너의 생각은 좀 위험해. 그런 글벗들의 충고 탓에 윤곤강도 말년엔 신경증에 시달리다가 화동, 그의 말을 빌리자면 꽃마을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다자이의 말에는 어느 정도 광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을 바라보는 현미경 수준의 섬세함이란 광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다자이의 글을 읽다 보면 내 마음을 다 들켰다를 넘어서 내 옷을 벗겼다는 기분까지 드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런 작가 이런 시인들이 몇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찍 죽었거나, 일찍 죽으려고 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초월에 초월을 거듭하면 끝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없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그들만이 알 것입니다. 나는 다만 그들이 만들어간, 그리고 만들어낸 무드를 믿고 지지할 뿐입니다. 다자이, 이름만 들어도 슬픕니다. 다자이, 이름만 들어도 기쁩니다. 슬픔과 기쁨이 공존할 수 있다니. 그것은 마치 현관문 같습니다. 돌아올 수 있다는 슬픔. 떠날 수 있다는 기쁨. 그것을 앞뒤로 가진 모양이 꼭 인간 같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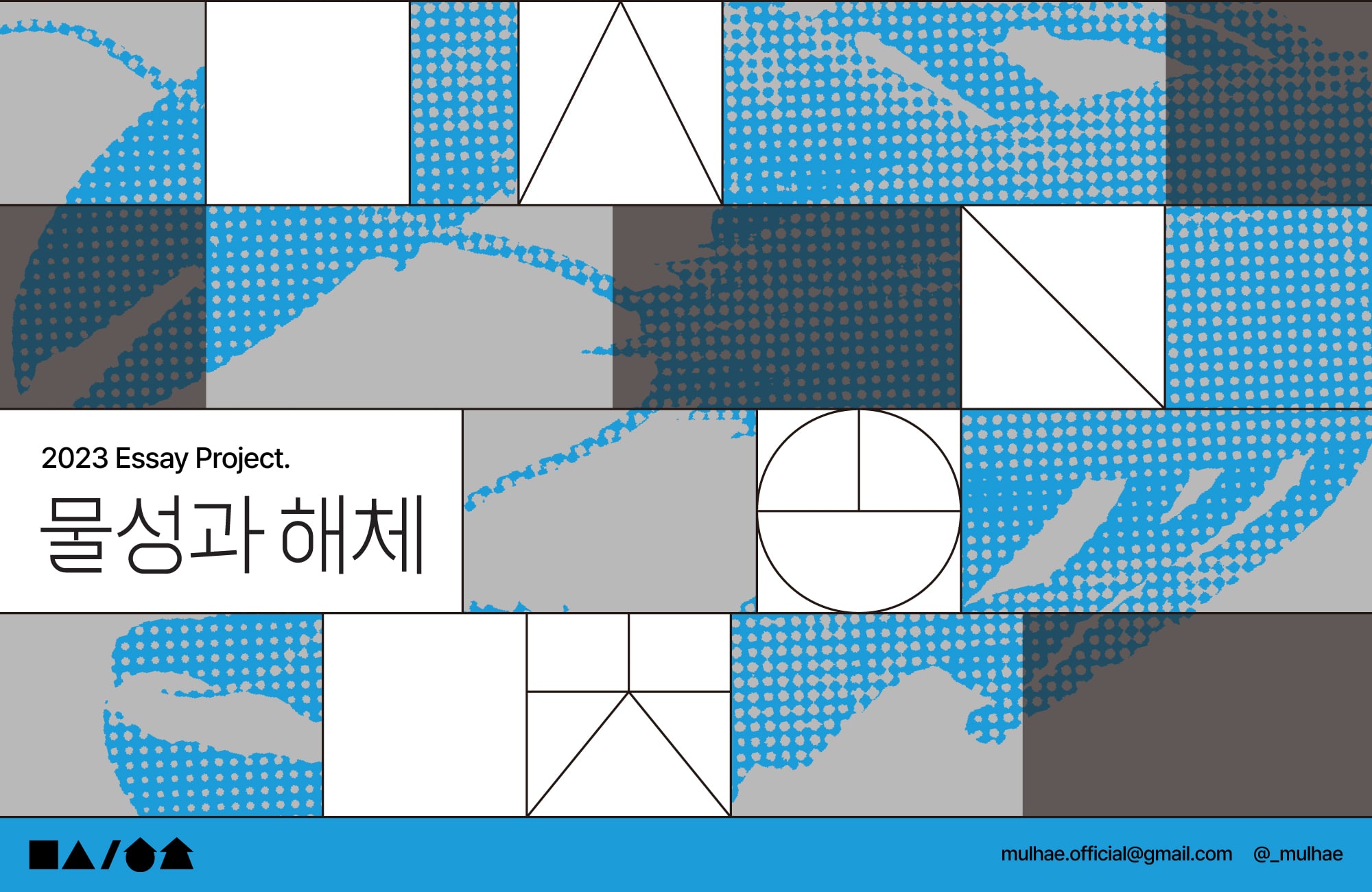
"누나의 사진과 나의 글, 생각만 해도 좋지 않아?" <무드에 관하여>는 차서영 작가의 사진과 김해경 작가의 글로 구성된 사진에세이 단편입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밤에 찾아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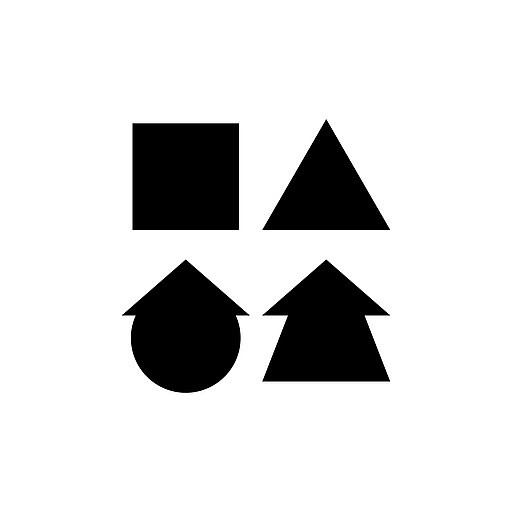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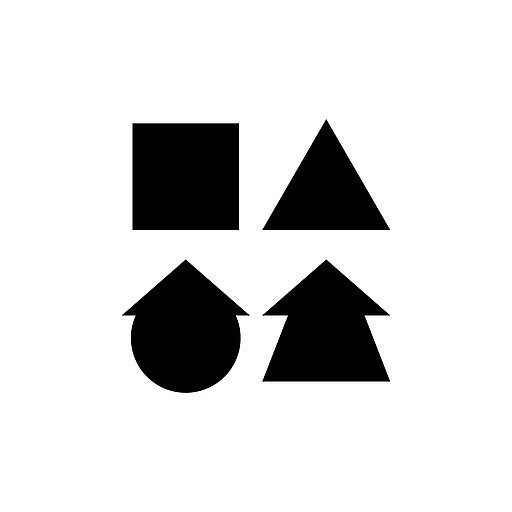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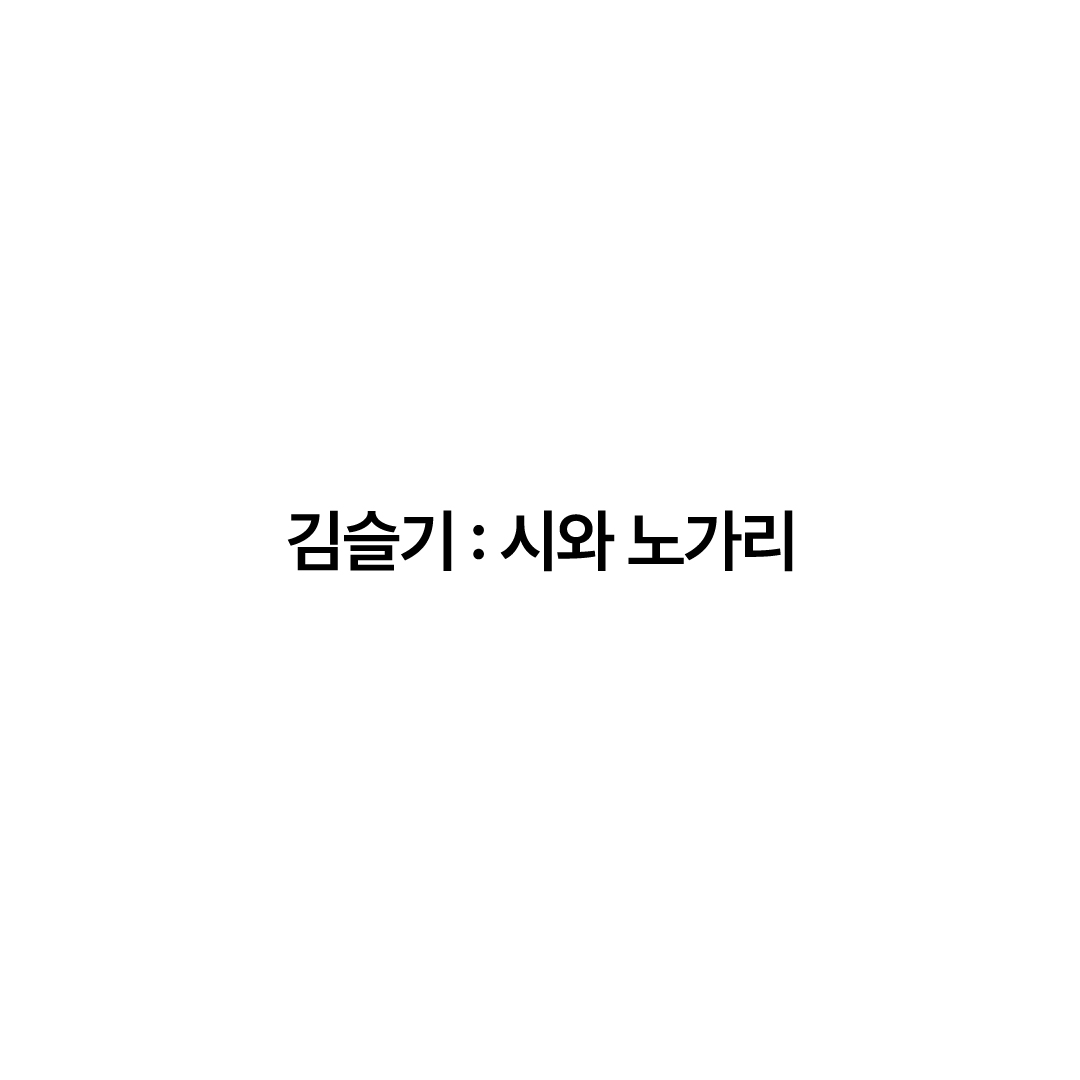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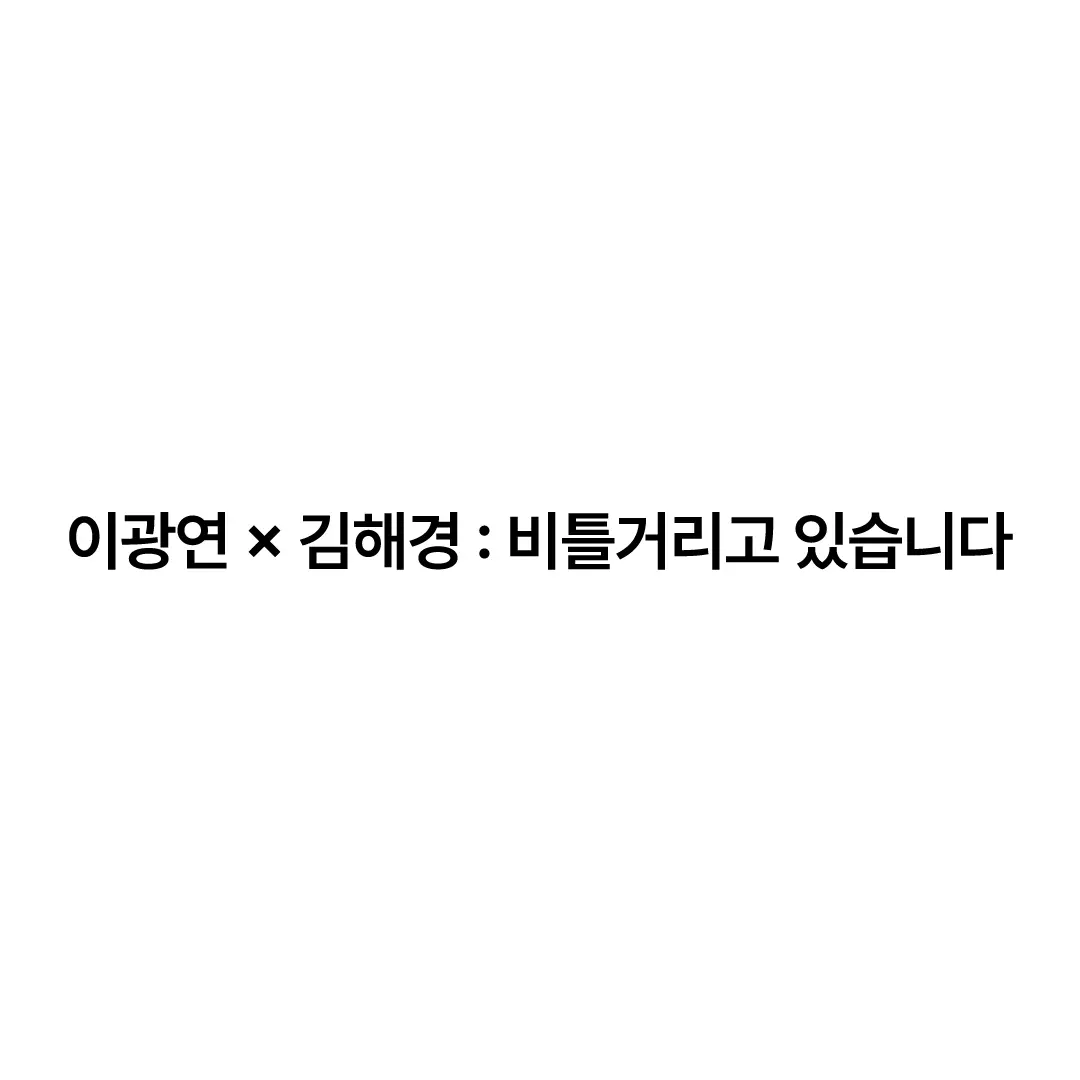


![[김해경] 라이팅룸 101호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r1qyv23ad7ug60982t919d03au22)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