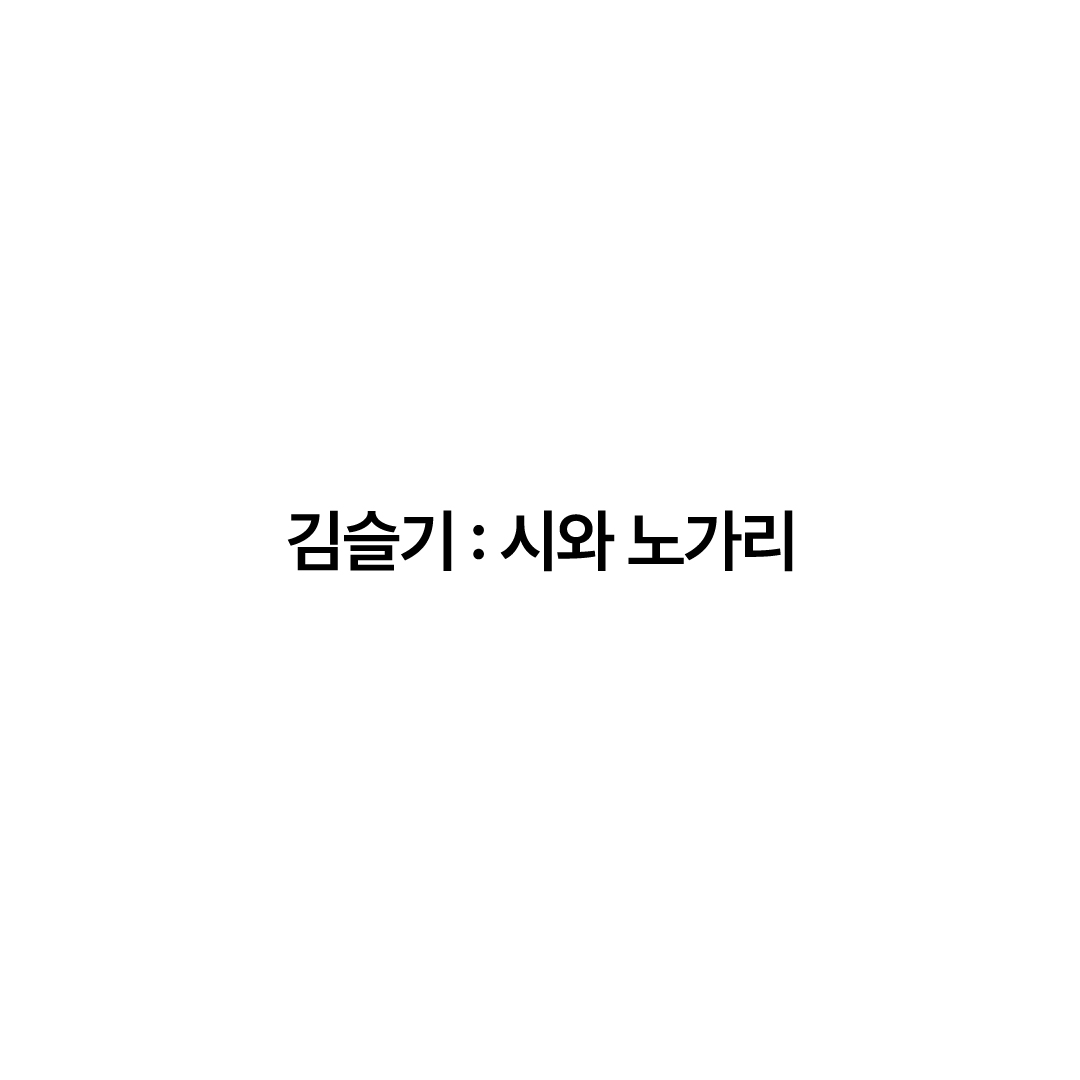
안녕, 잘 지내니. 새벽녘 차려진 밥상에 첫술 뜨듯이 어렵게 첫 문장을 쓴다. 이유도 용건도 없이, 해 뜨기 전에 잠시 볼 수 있는 그믐처럼 편지를 띄우고 싶은 날이 있다. 보내고 싶은 기분이 아니라 띄우고 싶은 기분이라는 것에 몹시 황망해서 두서가 없겠지만, 그래도 잠깐 봐 주었으면 하는 조심스러운 마음을 적는다. 마침 이 편지를 네가 받게 될 날은 그믐이고, 이 편지를 읽게 될 너의 시간이 그믐과 일치할지 나는 모르고, 그럼에도 그 찰나가 일치한다면 너도 새벽을 지새운 흔적을 더듬고 있지 않을까. 모쪼록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의 틈새에 이 편지를 밀어 넣는다.
벌써 2023년의 절반이 지났고, 그간 내게는 몇 가지 새로운 관심사가 생겼다. 살아 있는 것들을 그저 바라보는 취미의 범위가 조금 더 늘어났달까. 요즘의 나는 식물들과 물고기에 관련된 서적들을 찾아 읽고 있는데, 꽤나 흥미롭고 재미난 일이어서 시간을 쏟는다. 특히나 물고기들의 종류와 특성들을 주의 깊게 읽다 보면 쏟아진 시간이 아주 더디게 흐르는 것만 같다. 책장을 휙휙 넘기다가 특별한 물고기 한 마리를 찾았다. 아주 특이하고 별난 성질을 가진 녀석인데, 네게 알려주고 싶어 이름을 적는다. 하프문 베타피쉬. 아름다운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어서 관상용으로 기르는 열대어이자, 성격이 모나고 거칠어 투어(鬪漁)로 분류된 싸움꾼 물고기다.
빛나는 가시를 세우고 너에게 갈게
보고 듣는 것이 죄악이어서 무엇도 유예하지 못하고 부서져 완전해진 무늬가 되어 헤엄칠 때, 우리가 가진 비늘이 일제히 진동한다 지느러미를 펼치니 너와 나의 그믐
어쩌면 이렇게 단단하고 빛나는 것을 몸 안에 담가두었니
뼈, 거품 속에서 떠오른 얼굴. 그 얼굴은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 있어 네가 머물던 자리에 다른 비참이 들어선다 서로를 흉내내다가 서로에게 흉(凶)이 되는 순간. 늑골을 숨기고 촉수를 오래 어루만지면
우리는 두 개의 날카로운 비늘, 아름다운 모서리가 남겨졌다
아직은 목젖을 붉게 적시며 구체적인 오후를 꿈꾸고, 잃어버린 아가미를 찾아 돌아올 수 있을 거야 우리의 기도는 한곳만을 고집스레 방향하는 일이니, 깊이 고인 맹목이라해도 헛된 문장만은 아닐 것
그러니 함께, 멀리로 가자
아름다울 몫이 남아있다- 이혜미, <투어(鬪漁)>
베타피쉬는 한 어항 속에 두 마리가 있을 수 없다더라. 한 어항 속에 같이 있게 되면 다른 하나가 죽을 때까지 서로를 할퀸다고 하더라. 있잖니, 가끔 나는 물고기가 싸우는 상상을 한다. 비늘이 찢기고, 흰 가시가 드러나고, 하나가 다른 하나를 쓰러뜨릴 때까지 부딪히는 모습을 상상하다 보면 아름다울 수 있는 일인가 물어본다. 그건 꼭 내 안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투쟁 같으니까. 돌이켜보면 나는 그렇게 살아남아 왔다. 그래서 나(我)다.
ㄴ으로 시작하는 명사들을 찢어발기고 싶은 순간이 있다. 나를 찢어발기고, 날을 찢어발기고, 남을 찢어발기고 싶은 순간. 여전히 그런 마음은 내 안에 잔존하고 있고, 나는 그것을 미움이라 부른다. 그럴 땐 물고기의 비늘이 진동하듯이 눈꺼풀이 떨리고, 생각을 펼치면 지금처럼 그믐의 시간이 온다. 그제야 몸과 말은 제 기능을 멈추고 그 안에 있는 의미에 손을 넣어 본다. 물고기의 가시가 뾰족한 이유를 찾고, 빛이 찌르는 손을 가진 이유를 찾고, 그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뽀족한 모양의 말을 습득하게 된 이유를 찾는다.
나(我)다울 때 아름답다는 말을 좋아한다. 가장 나다울 때 사랑받을 수 있냐고 물어본다면, 글쎄, 아니. 그러나 잡아먹힐 준비는 되어있겠지. 몸채로 잡아먹혀서 목구멍에 걸린 빛나는 가시 정도는 될 수 있겠지. 목젖을 붉게 적시고 구체적인 오후를 꿈꾸며, 한 어항 속에 담긴 두 마리의 투어(鬪漁). 그 공존의 몫을 상상할 수 있겠지. 너에게 묻는다. 아름다울 몫은 남겨 두었니. 그렇다면 네가 담긴 어항에 나를 넣어봐도 되겠니. 여전히 그믐이고, 살이 잘 발라진 물고기의 뼈처럼 뜬 그믐의 시간을 우리는 공유하고 있고,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는 다급히 그곳으로 향하고 있으니. 함께 그곳으로 가자. 깊이 고인 맹목에 지치고 찢긴 나를 들고 너에게로 가자.
그믐, 진다.
아름다울 몫을 남겨두었다.
º 이혜미 『보라의 바깥』 (창비과 비평,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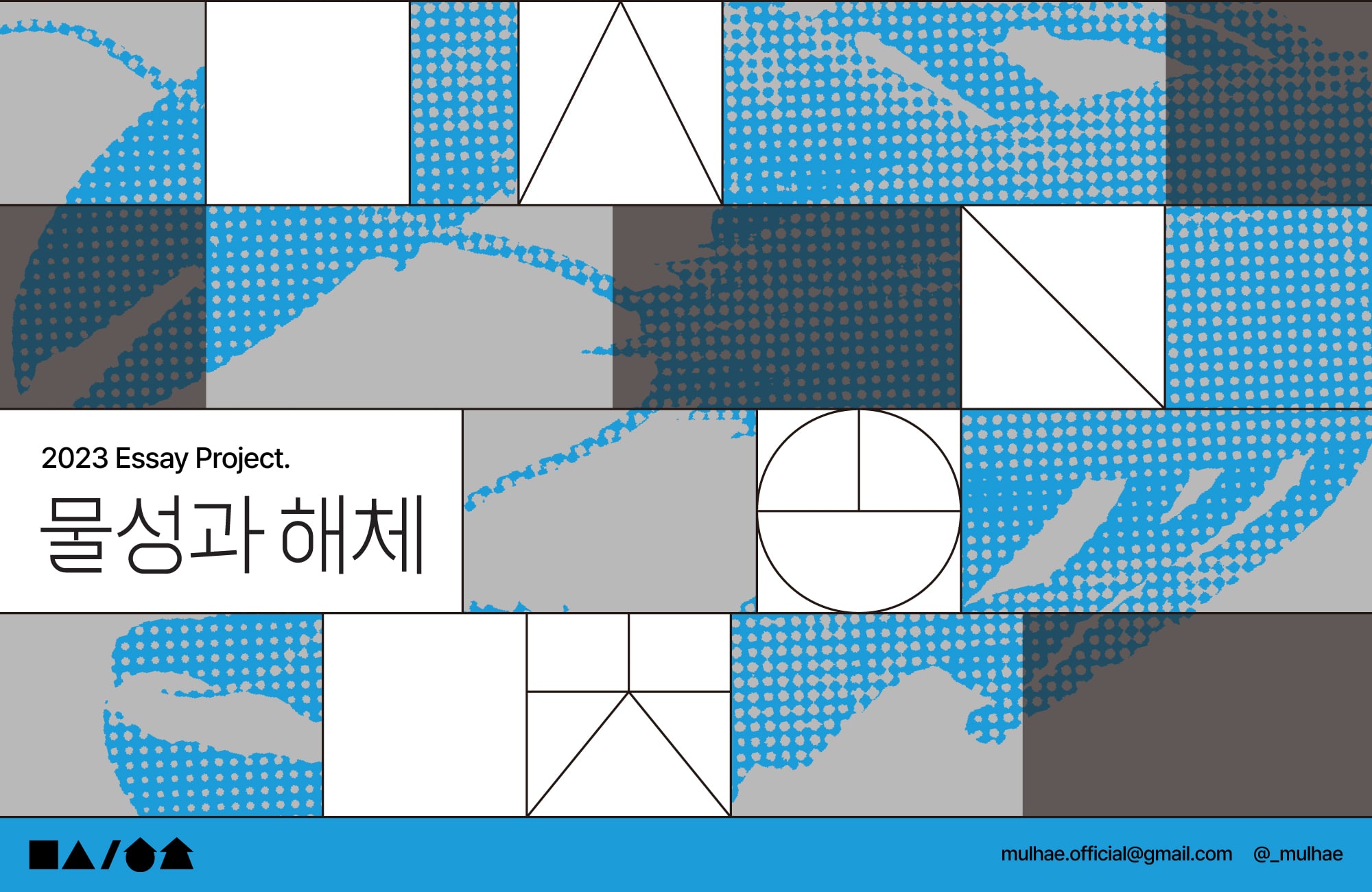
김슬기 작가의 <시와 노가리>는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진 노가리를 앞에 두고 술잔 대신 시집을 듭니다. 술 대신 시를 나눕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시에 취해 보는 건 어떨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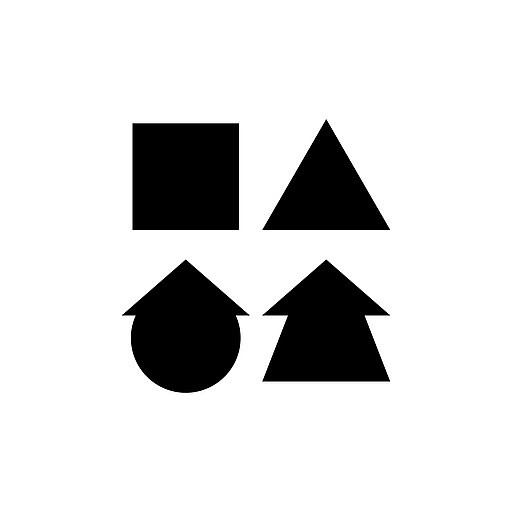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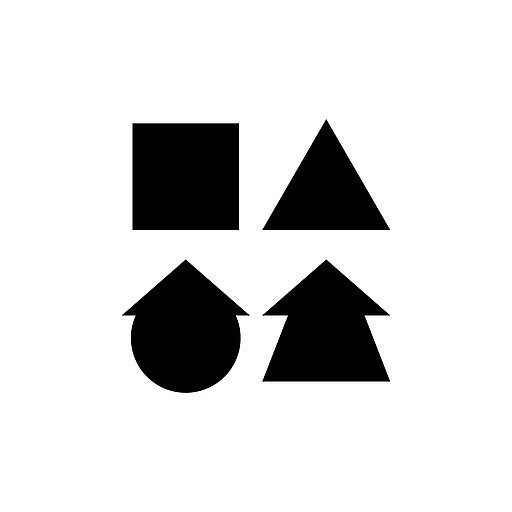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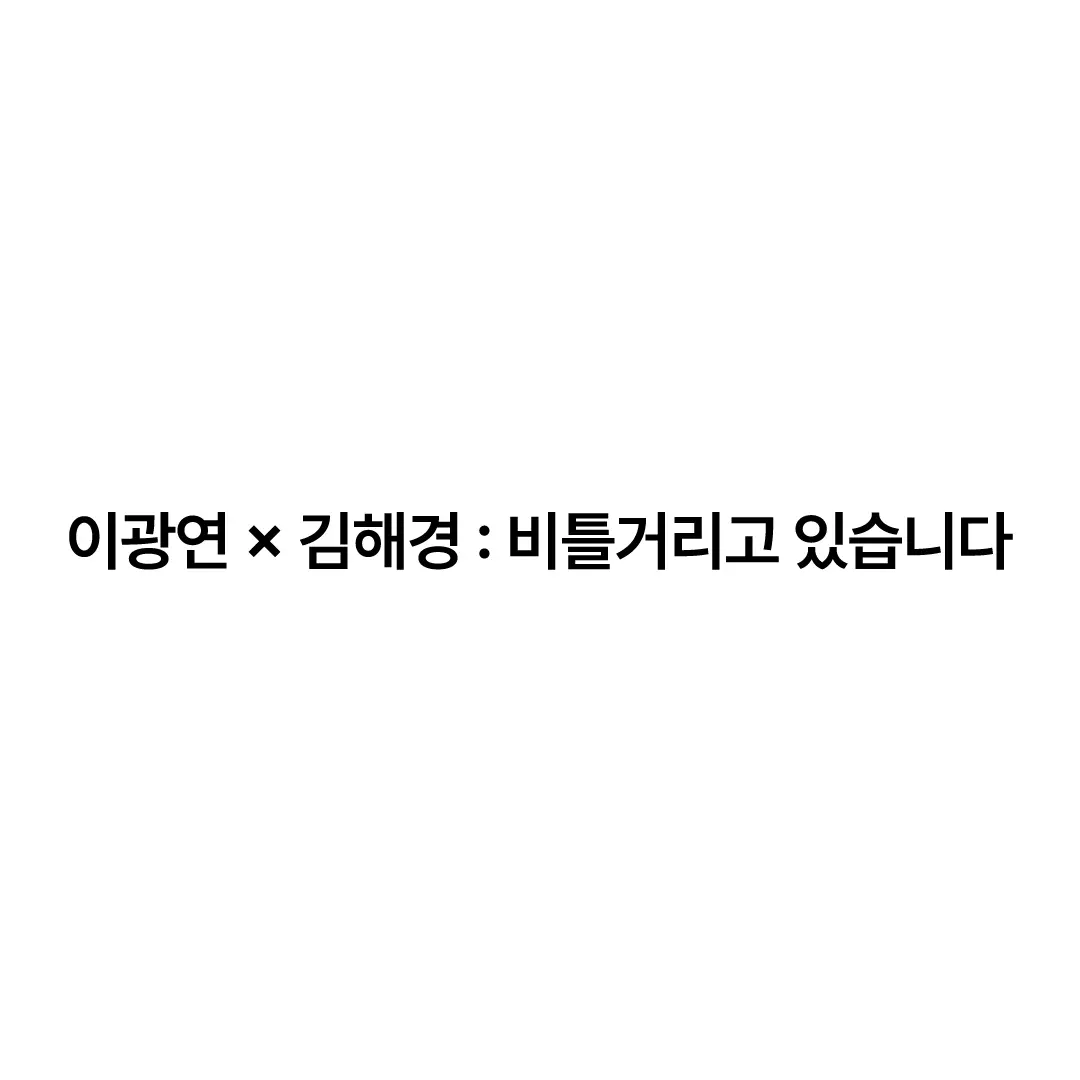

![[김해경] 라이팅룸 101호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r1qyv23ad7ug60982t919d03au22)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