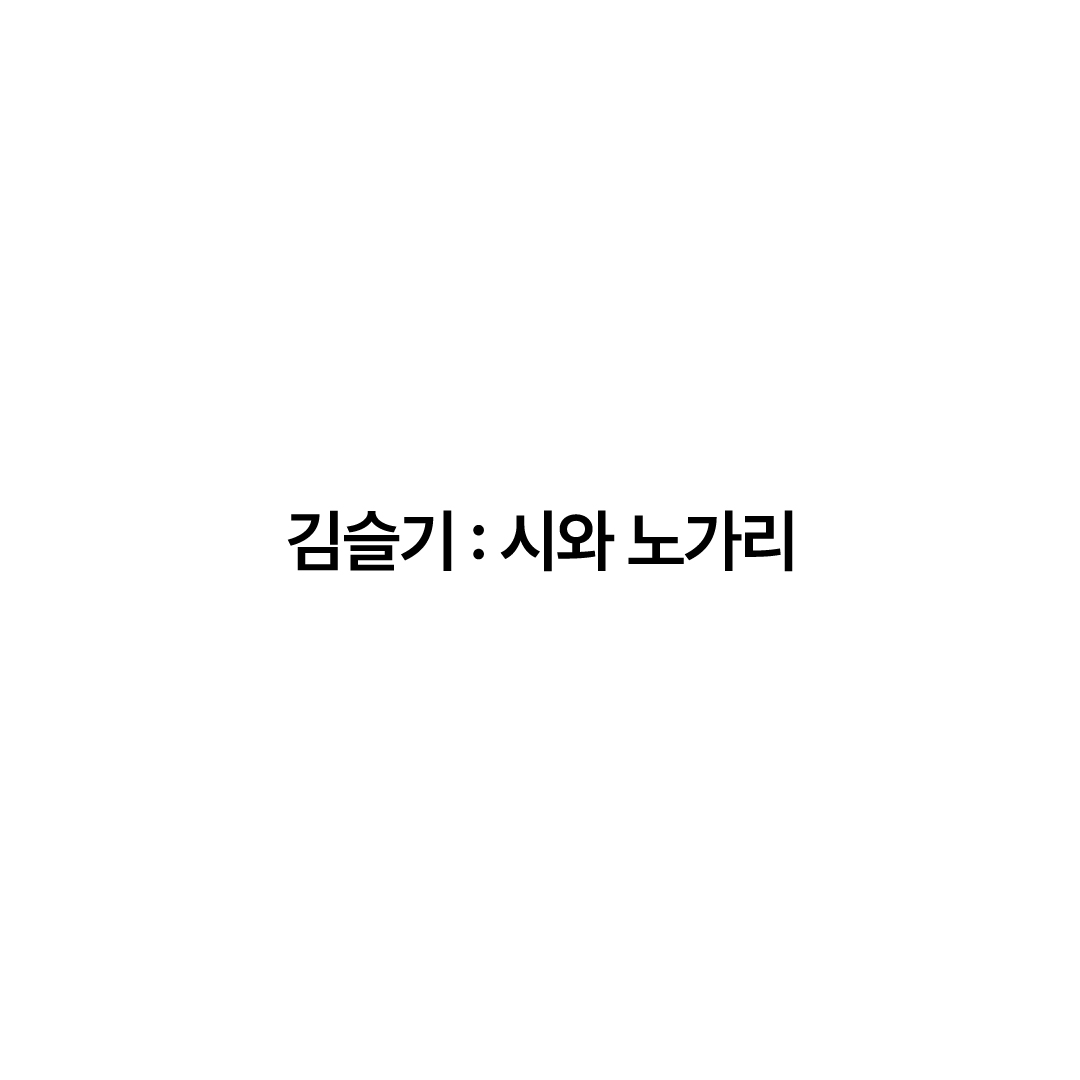
장마가 시작되기 며칠 전, 낯선 이로부터 다이렉트 메시지를 받았다. 어떤 경위로 내 이름을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자신도 같은 이름으로 살고 있다는 말을 전하며 대뜸 인사를 건넸다. 나는 갑작스러운 소개와 인사에 조금 당혹스럽다가, 그 기분이 퍽 나쁘지만은 않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슬기입니다.
그의 프로필엔 일본의 가타카나로 スルキー(스루기-) 라고 적혀 있었는데, 인사말에 적은 슬기와 프로필의 スルキー를 번갈아 바라보니 묘한 기시감과 미시감이 동시에 들었다. 나 아닌 슬기를 만나는 경험. 흔한 이름으로 생각해 왔던 내 이름을 타인으로 마주할 때, 이 묘한 떨림은 뭘까. 슬기 씨의 살가운 메시지에 화답은 해야 할 것 같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은 되고, 그렇게 망설이다가 전한 인사가 고작 이런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슬기 씨. 반가워요.
그 후로 낯선 슬기와의 메시지는 이어지지 않았고, 일상의 작은 사건으로 묻어두었지만, 떨림으로 남은 이미지는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다시 생각해 보니, 나는 누구에게 인사한 거지? 그건 혹시 다른 나였나?
초등학생 시절 이후로 슬기를 만나 본 일이 드물다. 분명 어디선가 마주쳤을 텐데, 전무하다고 할 정도로 기억 속엔 나 아닌 다른 슬기는 찾을 수 없다. 내겐 독특한 경험인 것이다. 살아가는 동안 동명의 타인을 만나 느끼는 기시감(Deja vu) 혹은 미시감(Jamais vu)은 영화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 가령 영화 <매트릭스>에서 데자뷔 현상이 가상적 현실의 균열을 의미한다든가, 역시나 같은 현상이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에서는 다중우주를 의미하는 것처럼. 데자뷔, 도플갱어, 다중우주와 같은 소재들은 끊임없이 재창작되어왔고, 그것에 대한 인간의 상상력 또한 멈추지 않았다. 상상은 인간적 욕망의 투영이고, 그 욕망은 또 다른 나, 즉 동질성에 대한 소망인 셈이다. 아마도 나 아닌 슬기를 만났을 때의 묘한 떨림은 여기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이 이름의 마지막 생존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계기, 나 아닌 다른 나가 어디선가 존속되고 있을 것이라는 상상, 그로 인해 둘 혹은 그 이상의 경험들이 공유되고 전이되는 것만 같은 환영. 같으면서도 다른 모순적 이미지들의 오버랩.
근래에 나 아닌 슬기를 만난 또 다른 경험은 <물성과 해체>를 통해서였다. <물성과 해체>의 연재작 중 <흰 종이>라는 작품으로 만나게 된 슬기. 다시, 데자뷔와 자메뷔, 환영과 교차. 내 것 아닌 나의 이름과 문장에 눈길이 머물렀다.
다른 유니버스의 슬기는 수행중인가 보다. 마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지나치지 못한다. 왠지 또 다른 나의 세계가 이 문장 안에 펼쳐져 있을 것 같은 기분. 나의 과거였거나, 현재이거나, 미래일지도 모르는. 전생 혹은 환생의 착시 거나, 정말로 또 다른 우주에서 왔을지도 모르는 슬기의 수행. 언젠가 당신도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시집을 손에 들고 있었을지도 모르지. 울려고 일어난 어느 날, 지하철 안에서 이 시를 읽었을 수도 있지.
한 편의 시에 나의 문장을 덧붙여 놓고 다른 슬기의 수행을 응원한다면. 그것은 나를 응원하는 일이 되는 것이기도 할까. 저 쪽의 슬기가 수행할 때, 그 묵시적 에너지가 이쪽의 슬기에게 전해진다고 한다면. 잠깐 이름이라는 동질성에 묶여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착각해도 좋은 일일까. 당신은 나인가? 안다. 나는 당신이, 당신은 내가, 아니다. 우리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떨림의 서사는 신뢰해도, 잠시 나 아닌 다른 나의 잔존을 착각해도 좋을 듯하다. 문득 지금 내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느 계곡에 찍힌, 멸종된 다른 개체의 손자국. 우리와 엇비슷한 손들의 기록으로 우리는 최초이자 최후임이 아님을 알았다고 하니, 그것은 또 다른 나. 그렇게 손자국처럼 이어져 온 무언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너와 나의 이름, 슬기라는 학명. 더 나아가 모든 우리의 이름.
눈을 감는다. 말을 멈춘다. 숨을 고른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고 팬을 들어 다음 문장을 적는다.
안녕하세요, 수행하는 슬기씨. 나는 글쓰는 슬기입니다. 당신의 수행을 응원합니다.
나는 방금 슬기의 수행을 응원했다.
나는 나를 응원했다.
° 이슬기, <흰 종이> (물성과 해체, 2023)
° 김경후, <울려고 일어난 겁니다」 (문학과 지성사,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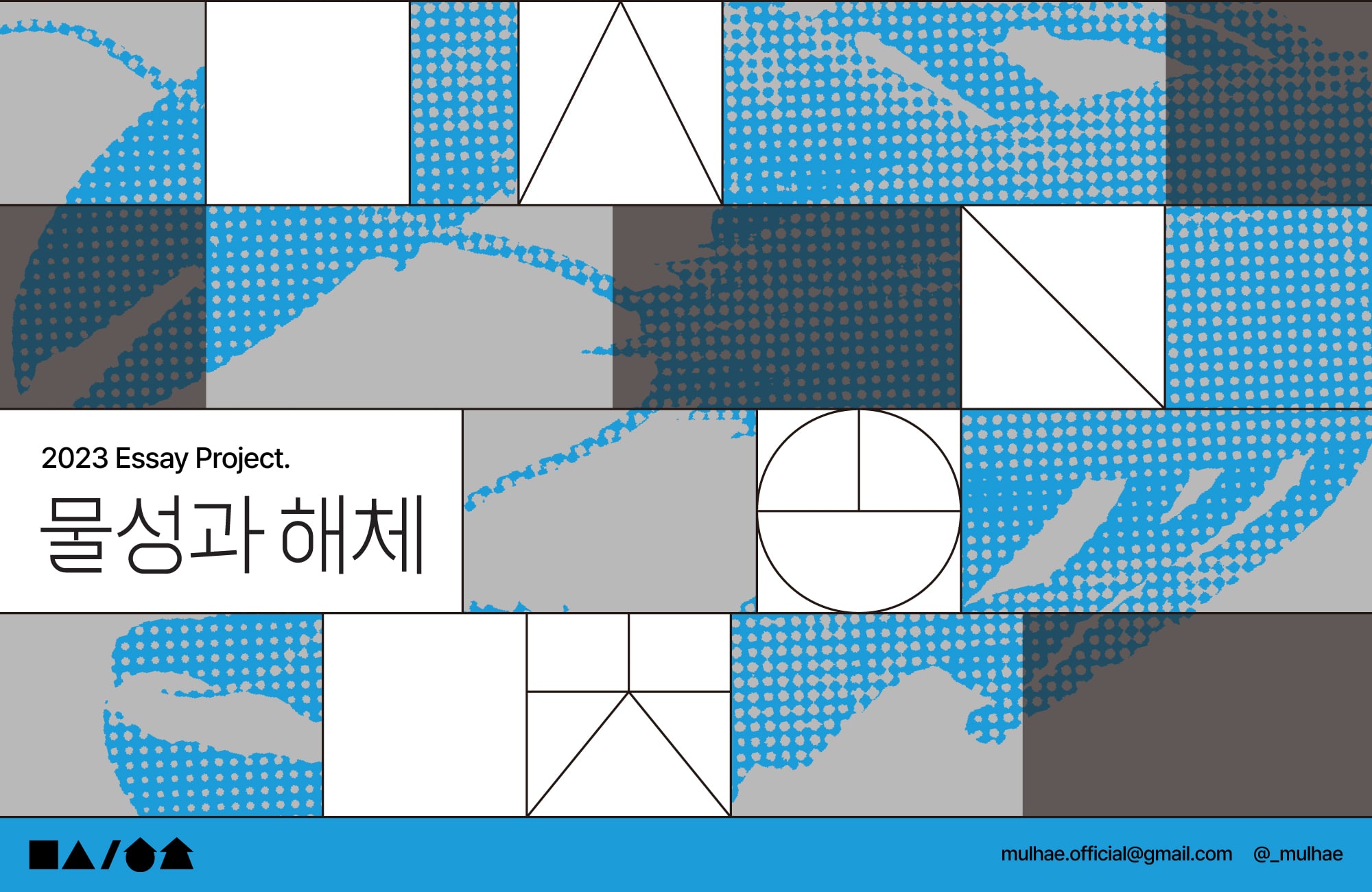
김슬기 작가의 <시와 노가리>는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진 노가리를 앞에 두고 술잔 대신 시집을 듭니다. 술 대신 시를 나눕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시에 취해 보는 건 어떨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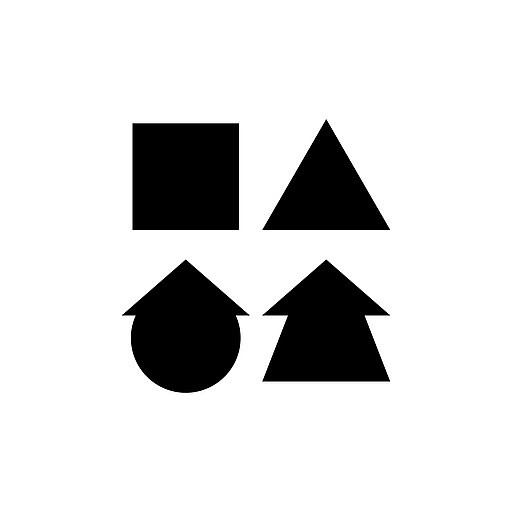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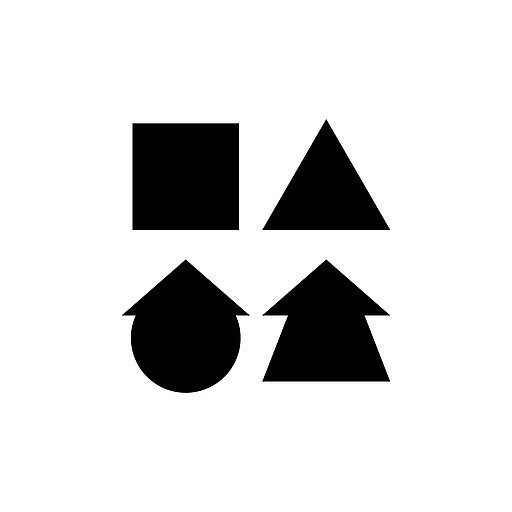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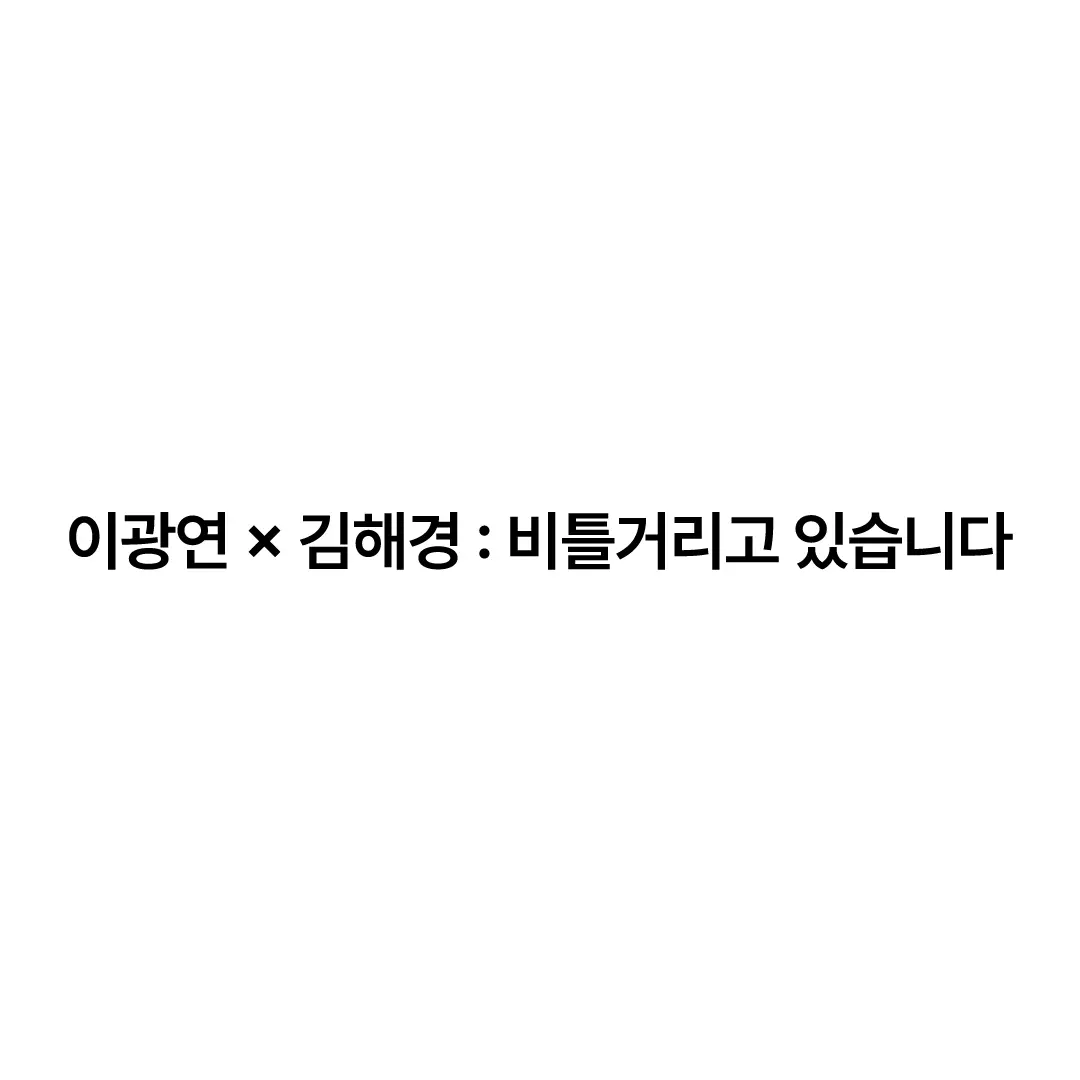

![[김해경] 라이팅룸 101호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r1qyv23ad7ug60982t919d03au22)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