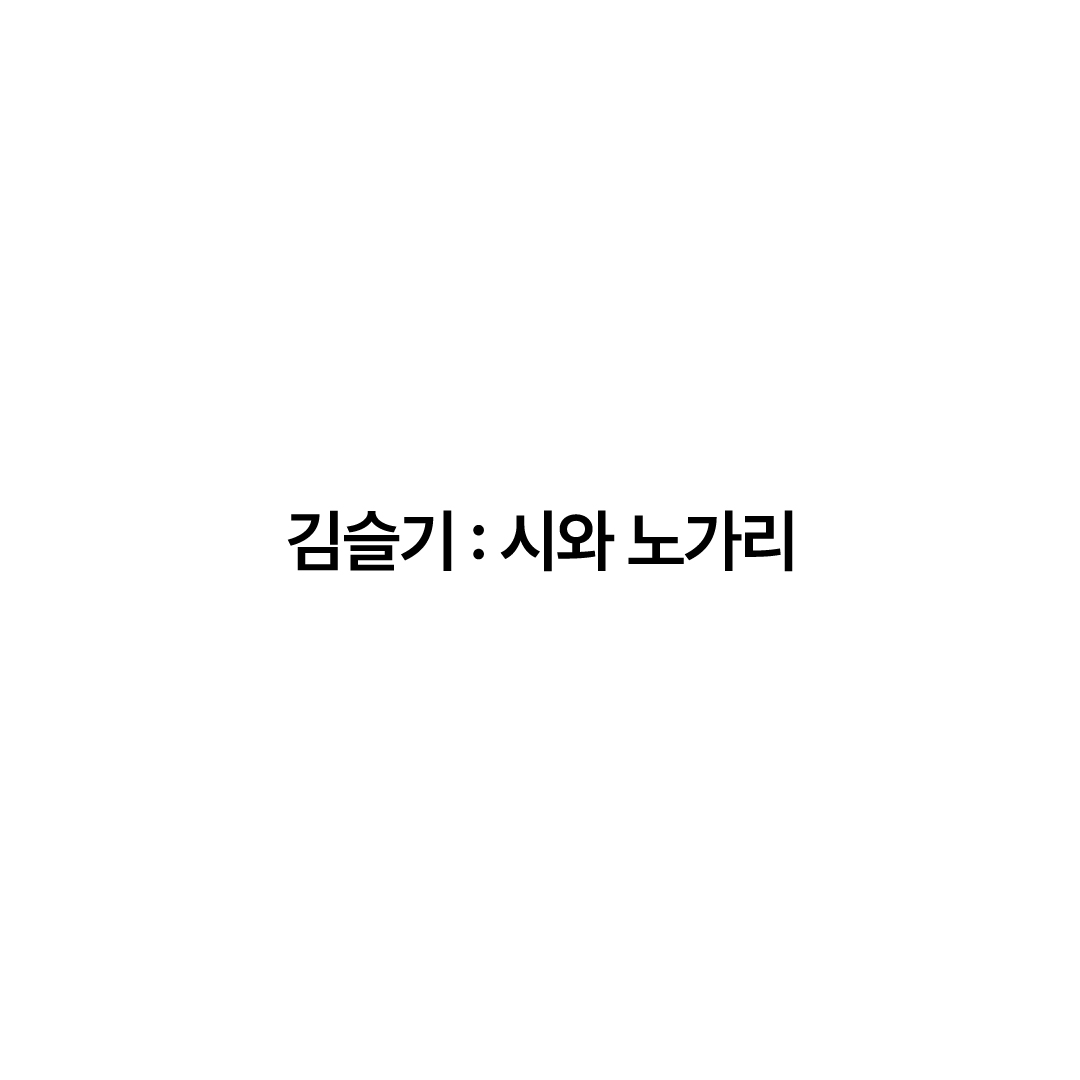
무언가 끝이 나버린 삶으로 시가 스며들어 연명을 설득하리라 믿는다. 설득된 삶이 자꾸만 덧대어져서 그것이 또 다른 선의가 되리라 믿는다.
지난 여름, 강원도 홍천을 다녀온 적이 있다. 첫 책을 출간한지 3개월 정도가 흐른뒤 였고, 친 동생을 떠나보내고 한 해를 넘긴 시점이었다. 부연하자면, 이승희 시인의 시에서 빌려온 한 구절을 제목으로 달고 나온 <수신인이 없는 편지>, 그러니까 나의 첫 책은 썼다기보다 옮겼다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다. 거기에는 동생의 마지막을, 마지막보단 기억을, 기억보다 울먹임을 옮겼다. 그렇게 세상에 나올 수 있던 것이 나의 첫 책이었다. 내게 출간은 일종의 입장이자 태도였다. 무언가 이미 끝나버렸다는 비관적인 선언에 그것을 단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 거짓말 같은 이야기들을 한 번 더 믿어봐야 한다는 태도. 그 해 여름을 그런 막연함으로 지냈다.
홍천의 사회활동가인 사량씨에게 연락이 온 것은 그 무렵이었다. 오랜 이웃인 예솔씨의 블로그를 통해 내 책을 알게 되었다고 전한 사량씨는 길고 간곡한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녀는 지역의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해 내 이야기를 해주지 않겠냐는 부탁을 했고, 나는 조금 망설이다가 그래도 곧 만나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무엇을 이야기하면 좋을까 준비하던 기간에 오랜 친구와 나눈 편지를 모았고, 작가 노트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나의 필사 노트와 이승희 시인의 시집 한 권을 가방 속에 넣었다. 그것이 꼭 필요한 일이리라 예감했다.
홍천에 발을 내 디뎠었던 시점은 긴 장마가 시작될 무렵이었다. 작은 강 하나를 끼고 따라 걷는 길마다 사람의 키만한 옥수수대를 볼 수 있던 그 도시는 날씨와 더불어 어딘가 고요하고 눅진했다. 그곳에서 나를 반겨주던 사량씨와 독자들에게도 그런 기운을 느꼈고, 나는 그 차분하고 부드러우며 조곤조곤한 환대가 좋았다. 우리가 만났던 장소는 산 중턱의 고즈넉한 카페였다. 소박한 삶(Rustic Life)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곳에서 우리는 빙 둘러앉아 서로를 마주했다. 내가 적은 문장들을 낭독하고, 편지를 쓰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잠시 직접 편지를 쓰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그리고 이승희 시인의 시집을 꺼내 한 편의 시를 읽어 주었다. 수신인이 없는 편지라는 말이 적힌 시였다.
홍천에서 나는 그간 살고 싶어서 편지를 썼다고 말했던 것 같다. 먼저 떠난 사람을 애도하는, 그렇게 남겨진 사람의 입장에서 ‘죽을 용기로 살지’라는 말이 가장 큰 상처라고 했던 것 같다. 죽을 용기로 살아야 한다는 말에는 그 용기까지의 고통과 울먹임은 생략되어 있다. 내가 들은 어떤 말들은 한 사람의 삶과 입장을 설명하기에 때론 부주의하고, 세심하지 못하며, 빈약했다. 그래서 말은 때론 거짓에 가깝고, 말로 점철된 삶은 더욱 거짓 같아서 잘 믿기지 않는다. 그럼에도 나는 여름에 피는 맨드라미를 보고 싶다고 그들에게 말했다. 자세히 보면 꽤나 흉측하고 못생긴 꽃인 맨드라미를 올해에도 볼 수 있을까 싶었는데, 거짓말처럼 또 보게 되었다고. 그렇게 막연하게 피어나는 일들을 믿어보고 싶다고.
그날, 홍천의 독자들에게 받은 편지 중 하나를 골라 이곳에 옮겨 놓고 싶다. 다시 말하지만, 무언가 끝이 나버린 삶으로 시가 스며들어 연명을 설득하리라 믿는다. 설득된 삶이 자꾸만 덧대어져서 그것이 또 다른 선의가 되리라 믿는다.
그리고 그 선의가 시의 마음이라, 나는 믿는다.
º 이승희, 『거짓말처럼 맨드라미가』(문학동네,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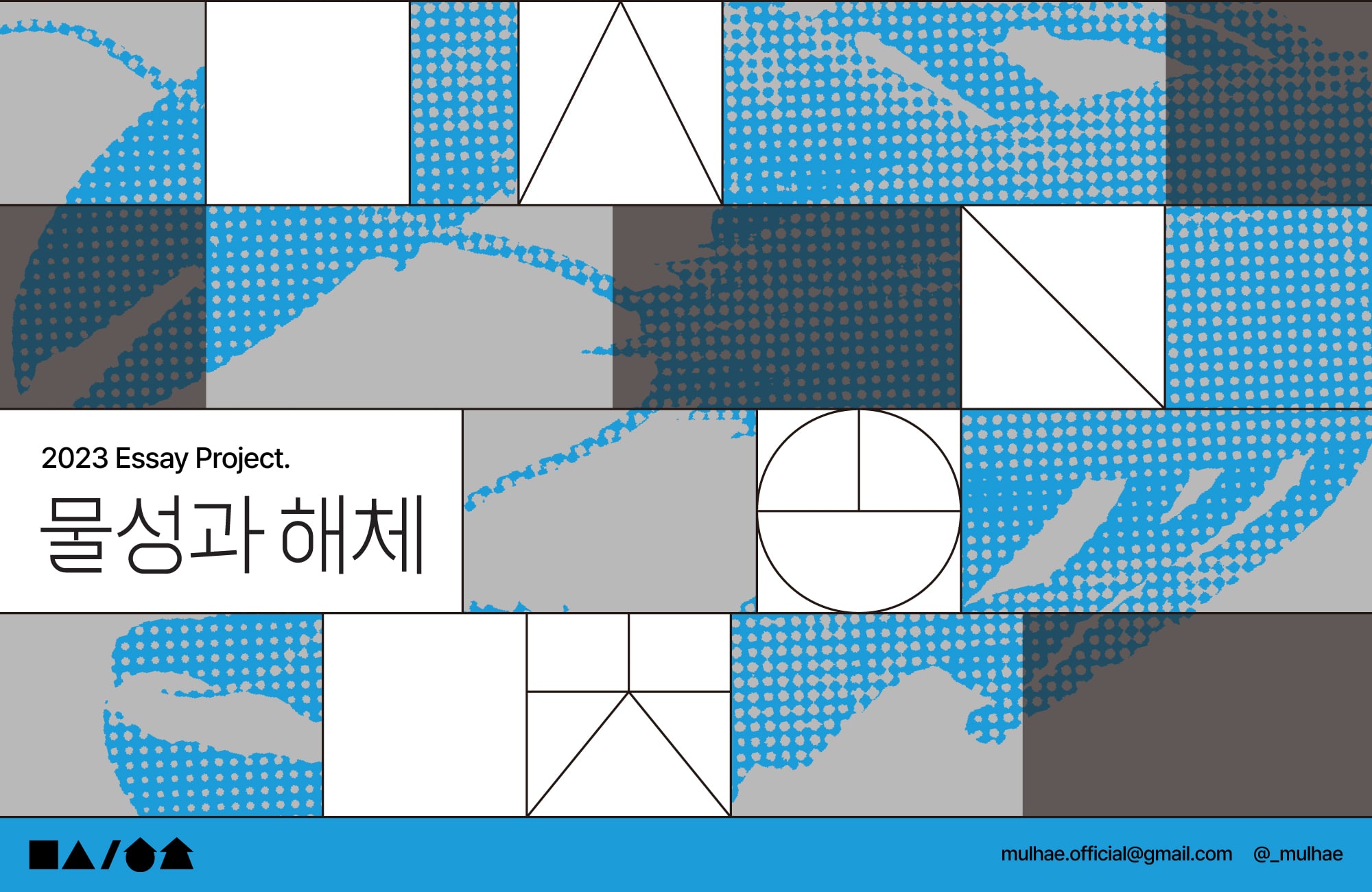
김슬기 작가의 <시와 노가리>는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진 노가리를 앞에 두고 술잔 대신 시집을 듭니다. 술 대신 시를 나눕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시에 취해 보는 건 어떨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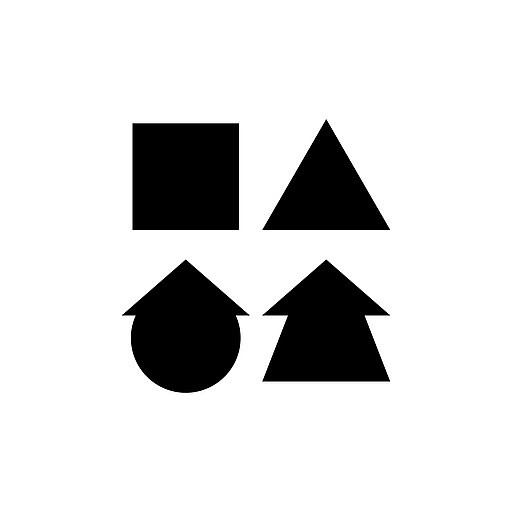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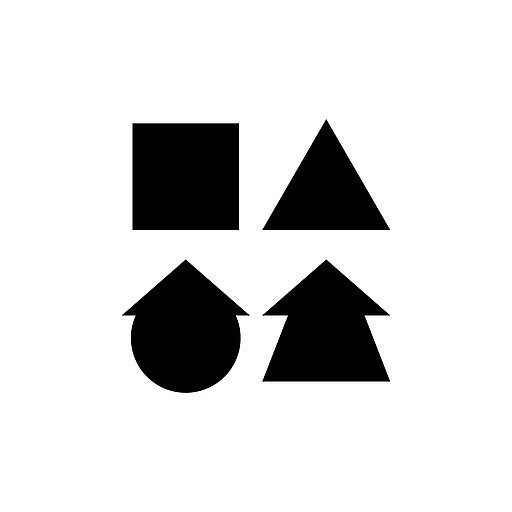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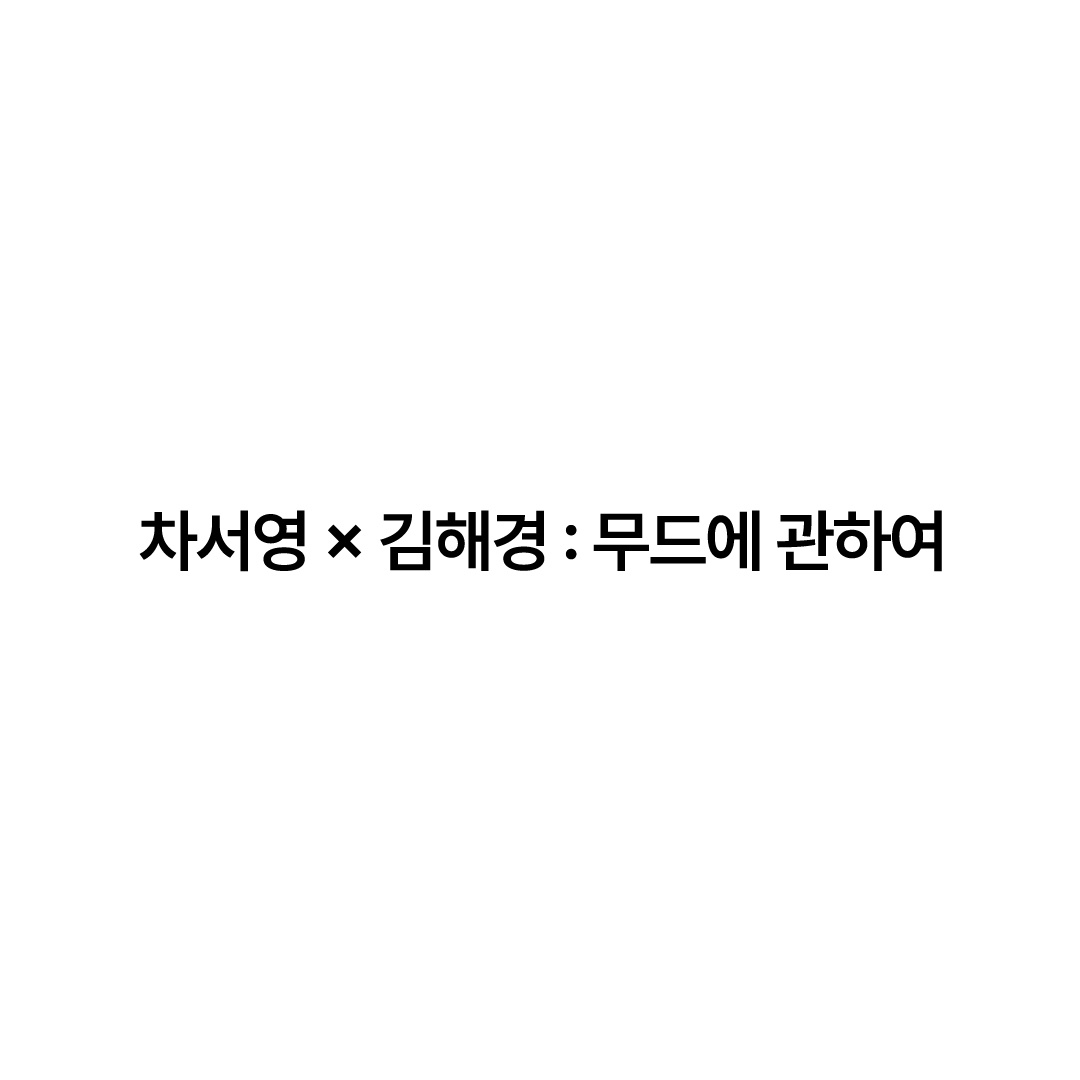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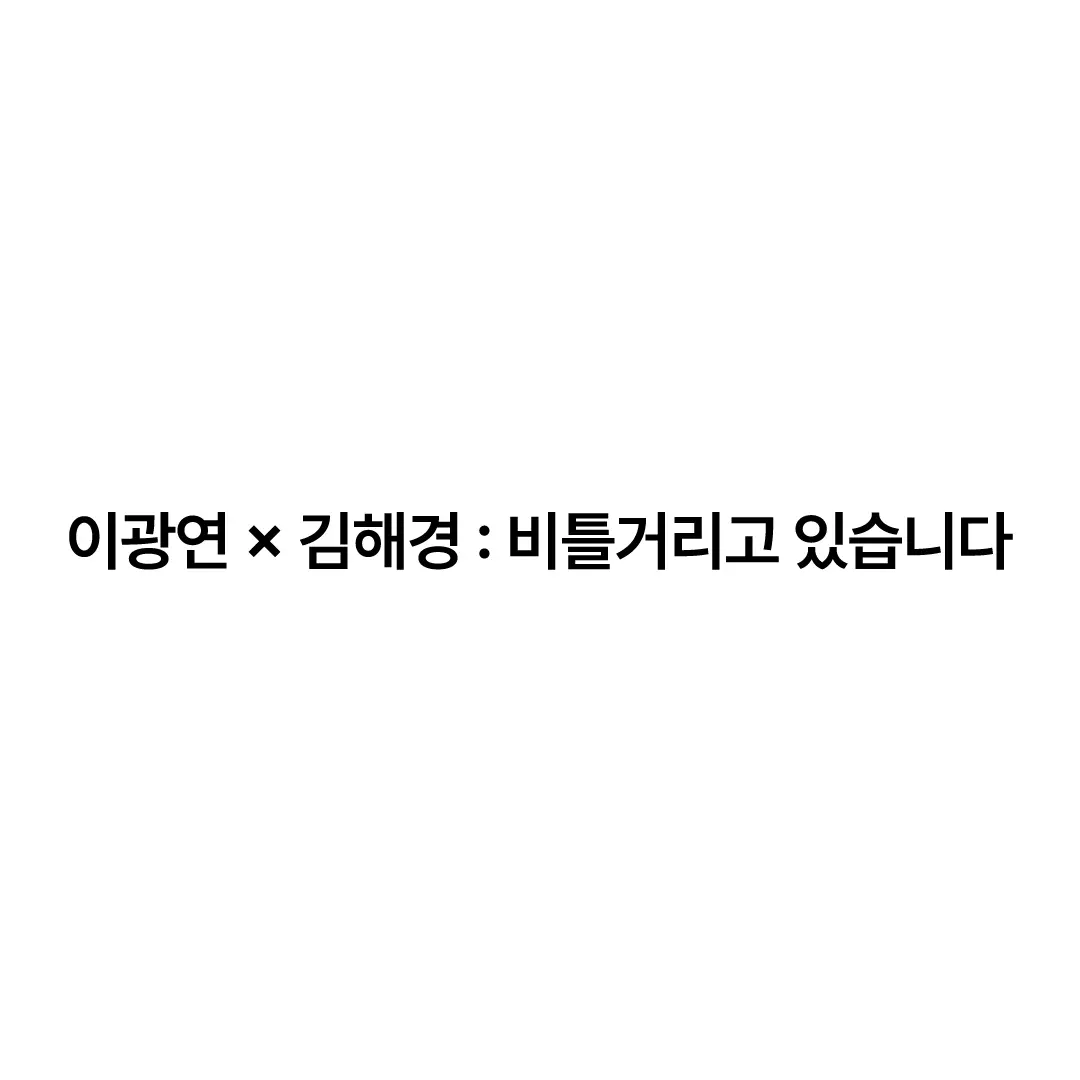

![[김해경] 라이팅룸 101호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r1qyv23ad7ug60982t919d03au22)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