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 read this post in English and keep up with future articles, please check out the author's blog.
나는 최고의 계획을 세웠다.
아버지의 예순여섯 생신 선물을 겸하여 예약 하는 여행.
최상의 컨디션으로 오르게 해드리고 싶었다.
마일리지를 끌어모아, 매일 항공사 사이트를 뒤적거렸다.
그렇게, 가뭄에 풀나듯 있는 비즈니스 항공권을 예약했다.
"됐다!"
모든 예약을 마친 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계획은, 공항에서부터 무너졌다.
갑작스러운 폭설 — 그것도 관측 역사상 최악의 기록적인 폭설 한 번에
나의 완벽해보이던 계획은 한 순간에 가루가 되었다.
공항에서는 여기저기서 고성과 함께, 끝을 알 수 없는 긴 대기 행렬이 이어졌다.

"항공권 취소 안된게 어디야~"
"그쵸, 아빠?"
10시간이 넘는 대기 끝에 웃으며 무사히 비행기에 올랐다.
혹여라도 '가는 편이 취소되지 않을까' 노심초사 했던 걱정들이 긴장감과 함께 녹아내렸다.
이제 갈 일만 남았다며, 희망이 담긴 대화들을 꽃피웠다.
승무원들의 친절한 맞이와 함께 음료를 받아들었는데,
웬걸. 승무원들이 분주한 듯 오간다.
우리는 불안한 듯 두리번거렸고, 다시 주변은 무슨 일이 난게 분명한 듯 웅성거렸다.

항공편이 취소되었단다.
도착 예정 시간에 카트만두 공항이 닫아 뜰 수 없다면서.
다음 항공권에 대한 대응도, 보상책도 없었다.


집에 오는 지하철에서 '처음부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맴돌았다.
(리무진도 폭설로 모두 멈춘 상황이었다. 말그대로 아비규환)

'아 이렇게 일정을 멈추시나보다. 못 가게 하시나보다. 그래, 봄으로 미루자' 라며 위안삼을 때즈음,
아버지의 한 마디
"흥떨어져서 못가~ 환승편이라도 있으면 지금 가자"
다음 날 항공권을 뒤졌다.
중국항공사 10시간 환승, 공항에서 취침...
20 대에나 할 것 같은 말도 안되는 이런 일정을 소화해내면,
그래도 원래 일정에 비해 '하루밖에' 미뤄지지 않고 도착할 수 있는 계획이었다.
"난 괜찮아~ 가자"
아버지의 말에 당황한 나머지 외마디 대답이 나왔다.
"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 정신없는 하루가 지나가고, 눈을 떠보니 공항이었다.
(예약을 어떻게 했었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는 중국동방항공에 올랐고, 광저우 공항 소파에서 10시간을 잤다.

삼십 넘은 아들과 예순 중반의 아버지의 히말라야 정복.
이를 위한 나의 완벽한 계획들
컨디션 최고조를 위한, 비즈니스석. 그렇게 처음 그리던 그림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다른 상황에 놓인 우리들을 보면서 헛웃음이 나왔다
— 그래도 이걸 해내고 있다는 작은 안도감과 함께.

따듯한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다.
사우나를 하는 것 같은 전율을 느끼며, 서로 무슨 일 있었냐는 듯 웃어보이며 말을 뗐다.
"하하. 어떻게 여길 또 와있네요"
"그러게 말이다 (하하)"

무한 긍정은 부전자전인가보다.
우리 부자의 무대뽀 정신은 기록적이라고 하는 폭설도 막을 수 없었다.
씻을 틈도, 눈 붙일 틈도 없었다.
매연으로 눈앞이 뽀얀 카트만두에 내리자마자,
기존에 고지 받았던 가이드 프로그램에는
'숙박비와 식비가 전혀 포함되어있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한 번,
가지고 온 카드는 물론 달러도 통하지 않는다는 말에 두번째 당황
이 때부터는 그냥 그러려니하며, 흘러가는대로 가자 마음먹었다.
— 사실, 그렇게 마음먹지 않으면 중간에 포기할 것만 싶었다.

네팔 돈, 루피를 어찌저찌 환전을 하니,
얼마인지 가늠 되지도 않는 두툼한 돈뭉치가 내 손에 들렸다.
제대로 돈을 바꾸었는지 확인할 틈도 없이
5시간을 덜컹거리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 사실 버스도 아니라 지프 비슷한 그 무엇이다.
뒤쳐진 일정을 메꾸기 위해, 코스 시작지를 향해 내리 달렸다.

거의 40시간을 제대로 못 잔 채였다.
내가 정신이 몽롱할테니, 아버지에겐 극한의 훈련이었을 테다.
등반은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지쳐있었다.

말도 안되는 일정의 연속에 피로가 채 가시기도 전,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들을 "그래도 먹어야 된다"는 가이드의 말에 입에 쑤셔넣고는, 걸었다.

걷고 또 걸었다.
보통 등산은 아름다운 풍광에 지칠 때쯤 다시 힘을 얻어 걷곤하지만,
풍경따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정도로,
가야할 길이 멀어도 너무 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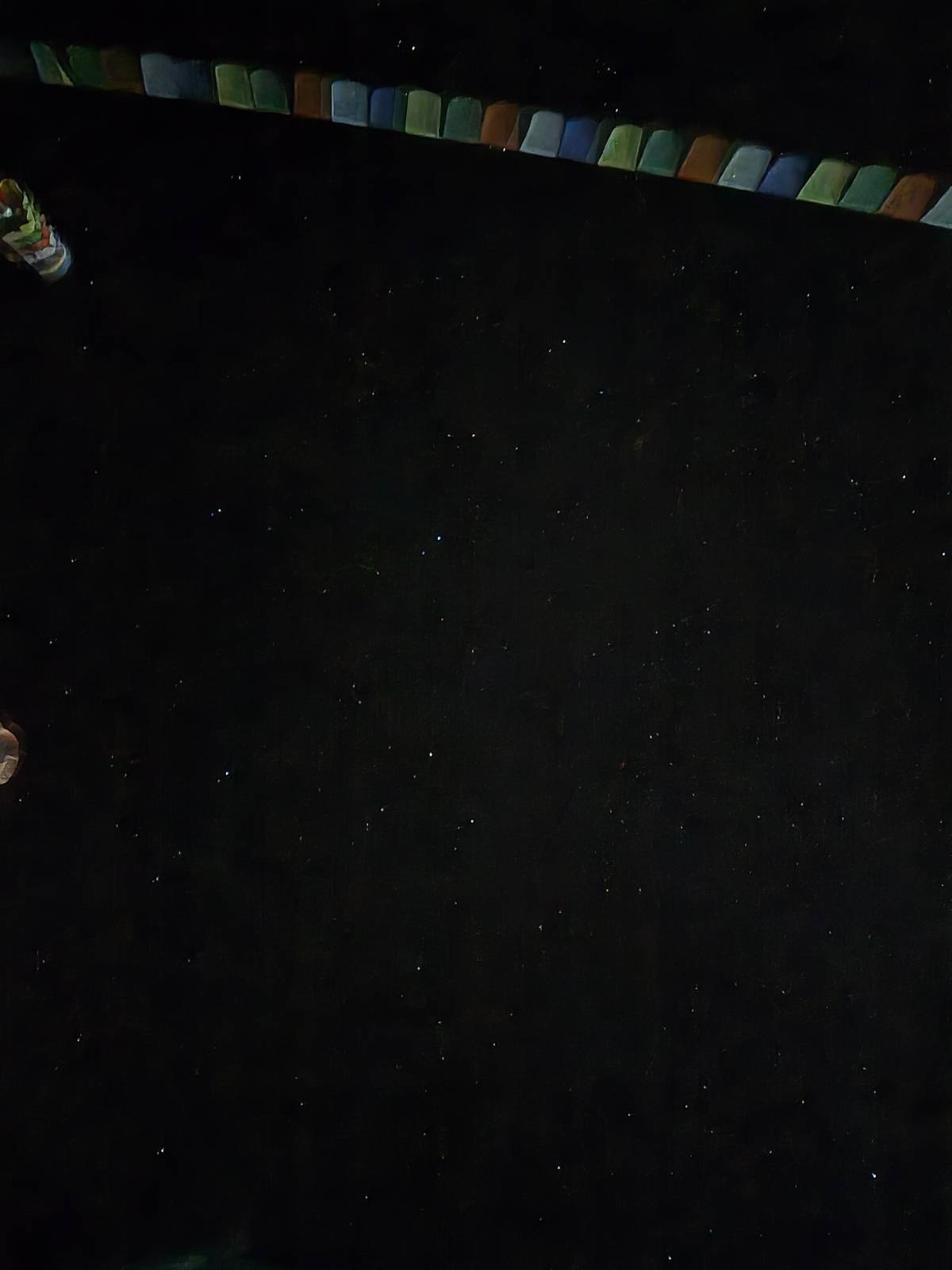
틸리쵸 호수*를 오르는 날이 왔다.
토롱라 패스에서 가장 힘든 두 번 있다고 하는 고비 중 첫 번째였다.
'이미 고비였는데, 이건 고비도 아니었다고?' 라는 생각이 스칠 즈음,
처음 만나보는 고산병이 찾아왔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길
함께 지친 아버지
울렁거리는 속
멍한 머리
어느 것 하나 성한 것이 없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한 걸음 내딛는 것 뿐.

내면에서는 수많은 목소리가 오갔다.
‘우리가 진짜 할 수 있을까?’
‘여기도 이 정도인데… 너무 위험한 건가?’
'내가 아프면? 아니, 아빠가 아프면?'
‘그냥 포기할 거면 일찌감치 포기할까?’

떠나오기 직전, 팀원을 잃고 멈춰 섰던 그 무력한 순간이 떠올랐다.
산이 나에게 묻는 것 같았다.
이 고통 속에서, 너는 계속 걸을 이유가 있느냐고.

(2부 마침. 3부에서 계속)
- 저자 주: 틸리쵸 호수는 4,919m에 위치한 고산 호수다.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