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플루토>는 딱히 흠 잡을 구석이 딱히 없는 애니메이션이다. 그리고 흠을 잡을 수 없다는 게 좋은 작품이라는 말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퀄리티가 높다는 것과 매력적이라는 것은 겹치는 영역이 있을지 몰라도, 꿀과 석탄재만큼이나 다를 수 있는 것이다.
우라사와 나오키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큰 틀에서는 하나의 이야기를 이루면서도 부분적으로 옴니버스의 형식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파인애플 아미>나 <마스터 키튼>은 애초에 옴니버스 작품인데, <플루토>를 비롯해 <몬스터>, <20세기 소년>, <빌리 배트> 등 이후의 장편 대표작
대부분에 이 같은 특징이 반영돼 있다. 그리고 옴니버스의 에피소드는 사실상 전체의 플롯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보편적인 감동을 비틀어 넣는 일종의 장치로 기능한다. 그런 감동의 요소는 조금만 들여다 보면 진부하기 짝이 없다. 그 점에서 그는 좋은 작가라기보다는 영리한 엔터테이너에 가깝다. 판을 거창하게 깔아놓고 수습이 안 되는 특유의 약점도 여기서 비롯된 게 아닐까 생각도 든다.

<플루토>는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지면으로 보는 게 훨씬 좋다는 누군가의 말에 동의한다. 우라사와 나오키는 컷의 크기와 배치, 의성어 등 종이 만화에서만 할 수 있는 연출을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작가다. 그런데 그런 연출의 방식은 일반적으로 만화적이라기보다 영화의 그것에 더 가깝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애니메이션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쇼트의 전환, 포커스의 이동 등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영화에서 흔히 보는 기법이 이렇게 많이 쓰인 애니메이션이 또 있었나 싶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세련됐지만 진부한 이야기와 철학이 이런 영화적 연출과 만나면서, 뒤로 갈수록 참기 힘들 만큼 지루해진다. 원작을 봐서 결말을 아는 이야기라 더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이 작품에 인상적인 부분이 없지는 않다. “완벽한 인공지능이란 50억의 인격을 전부 시뮬레이션한 것” 같은 대사는 AI 이슈에서 아주 요긴하고 흥미로운 힌트를 던져준다.(시간의 흐름을 반영해서인지 애니에서는 99억이라고 나온다) 그렇지만 거기까지다. 화두를 던져놓고도 그 이상의 성찰에 도달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물론 다시 말하면 그는 탁월한 엔터테이너다. 그 지점에서 많은 사람을 만족시키는 건 당연하게도 나름의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도 자주 보니 지겨워진다는 말이다. 피라미드 구조에 비유하면 가장 밑단에는 스타일, 중간에는 감정, 맨 윗단에는 통찰이 있다. 윗단이 모자라면 뻔해지고, 아랫단이 흔들리면 작품으로서 미완이다. <플루토>는 전자에 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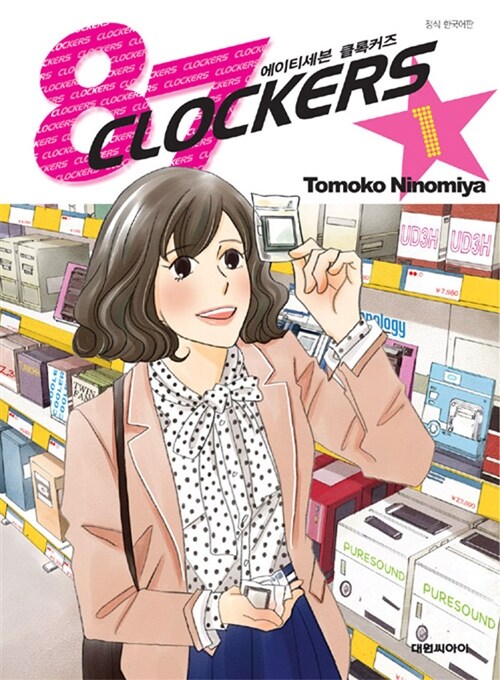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