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설
어제는 주프랑스한국문화원(Centre Culturel Coreen)에 들려 책을 세 권 빌렸다. 이번 일요일 이집트에 가져갈 생각이다. 여행짐이라고는 배낭 하나가 전부인데 책만 두 권을 챙겼으니 욕심을 좀 부린 셈이다. 바다 앞에서 책을 읽다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지. 벌써부터 설렌다.

이전 만큼은 아니지만, 요즘도 틈틈이 책을 읽고 있다. 지난 주말에도 집에서 빈둥거리다가 드라마나 유튜브를 보는 대신 책을 펼쳐 들었다. 한강의 첫 소설, <검은 사슴>.
나는 프라이팬을 들지 않은 손을 뻗어 들창을 열었다. 축축하고 차가운 이월의 바람이 푸석푸석한 눈두덩을 때렸다. 검고 가느다란 전선들이 무수한 칼집을 내놓은 도시의 회청색 하늘은 이날 안에 마지막 눈이나 이른 비를 토해낼 모양이었다. 울부짖기 직전의 무거운 침묵을 앙다문 먹구름장들이 변두리 주택가의 낡은 기와 지붕들과 슬래브 건물들 위로 낮게 엎드려 있었다.
<검은 사슴>, 한강
같은 한국어를 가지고 어떻게 이리 표현할 수 있을까. ‘이른 아침, 주방에 나 있는 조그만 창문을 열어 겨울 바람을 쐰다.’ 내가 쓰면 고작 두 문장으로 끝날 문장을 작가들은 한 문단을 만든다. 그날 아침의 하늘이 어떤 빛을 띄었는지, 공기가 어떻게 피부로 닿았는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주택가가 무슨 모양을 하고 있었는지… 분명 글인데 그림을 감상하는 듯 했다.
부끄러워지는 파리우쟁
스스로 부족한 점이 많다는 걸 알지만 그걸 들킬까 두려워하지 않는 편이다. 그래서 과감하게 파리우쟁을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여기에는 문장의 오류도 있고, 지루하게 반복적인 내용도 있다. 특별한 것 없는 일상이지만 그럴 듯 하게 꾸며내기 위해 미사어구를 남발하기도 했다. 그래서 가끔씩 퇴고를 할 때면 수정을 거듭한 뒤 부끄러워 숨고 싶어 진다.
인영은 사람들이 먼저 전화해주면 반가워하기는 했지만 결코 먼저 연락하는 법은 없었다. 그녀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조그만 섬에서 혼자서 살아가는 가난한 주민과 같았다. 그녀의 에너지는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에게 그에 상응하거나 약간 못한 보답을 하는 것만으로도 녹초가 될 만큼 빈약했다. 더구나 그런 식으로 형성된 인간관계조차, 조금만 더 나아가려 하면 완고한 성벽 같은 그녀의 경계선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었다. 그녀에게 호감을 가졌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 성벽 바깥에서 물러서곤 하였다.
<검은 사슴>, 한강
파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쓴 내용은 더욱 신경이 곤두선다. 소설과 비교해선 안 되는 걸 알지만… 내 친구들도 소설의 인물들처럼 매력적으로 표현하고 싶다. 어느 국적이라서, 어떤 연령대라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서와 같은 뻔한 신상정보 대신 그 사람의 체취가 느껴지는 멋진 문장으로. 현재로선 불가능…
이제 글은 +265. 꽤 쌓였다. 몇 몇 게시글은 조회수가 400을 넘는다. 내 인맥이 이정도로 넓지 않으므로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내 일기를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실감한다. 그나저나 어쩌다 내 일기를 알게 된 거지? 파리우쟁 계속 써도 괜찮은 건가..?
일기
한기연 간사회의가 끝날 무렵 윤기가 말했다. “아, 회의 끝내기 전에 한 가지 말할 게 있어요. 우정 누나 파리우쟁 글 너무 좋아. 잘 챙겨보고 있어. 어디서 베낀 건 아니지?” 정말 내가 베낀 내용은 없을지 다시 읽었을 정도로 의아했다. 내가? 회의에서는 부끄럽게 웃어 넘겼지만, 절친한 친구들이 잘 읽어주고 있어서 진심으로 고마웠다.
일기는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선한 면을 가지고 있다. 누군가의 일기를 읽으면 그 사람을 완전히 미워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문보영 <일기시대>
파리우쟁에 담긴 나의 안일하고 짧은 생각으로 인해 누군가 나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작가로서 소설을 쓰는 게 아니다. 내게 ‘일기’는, 평범한 하루 하루를 기록하다가, 간혹 내게 힘이 되어주는 문장이 있으면 따라 써보고, 일기 말미에 ‘다 잘 풀리겠지’라는 긍정 주문을 외우는 일이다.
글쓰기에 대한 부끄러움이든, 개인적인 게으름이든 언젠가는 어떠한 사유로 파리우쟁을 끝맺게 될 것 같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내 일기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부끄러움을 무릎쓰고 꾸준히 쓰고 싶다. 그때까지 어설픈 내 일기를 꾸준히 지켜봐주실 분들에게 애정을 보낸다.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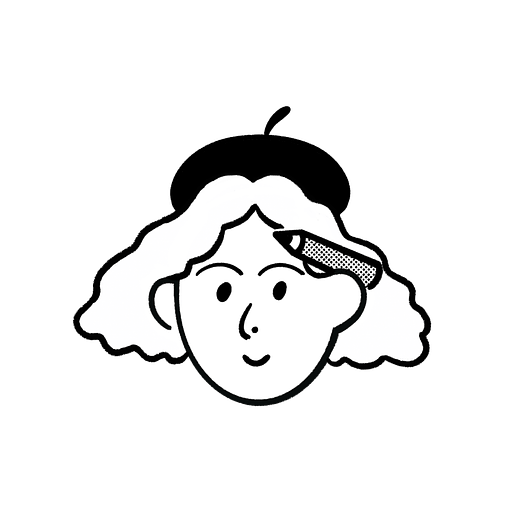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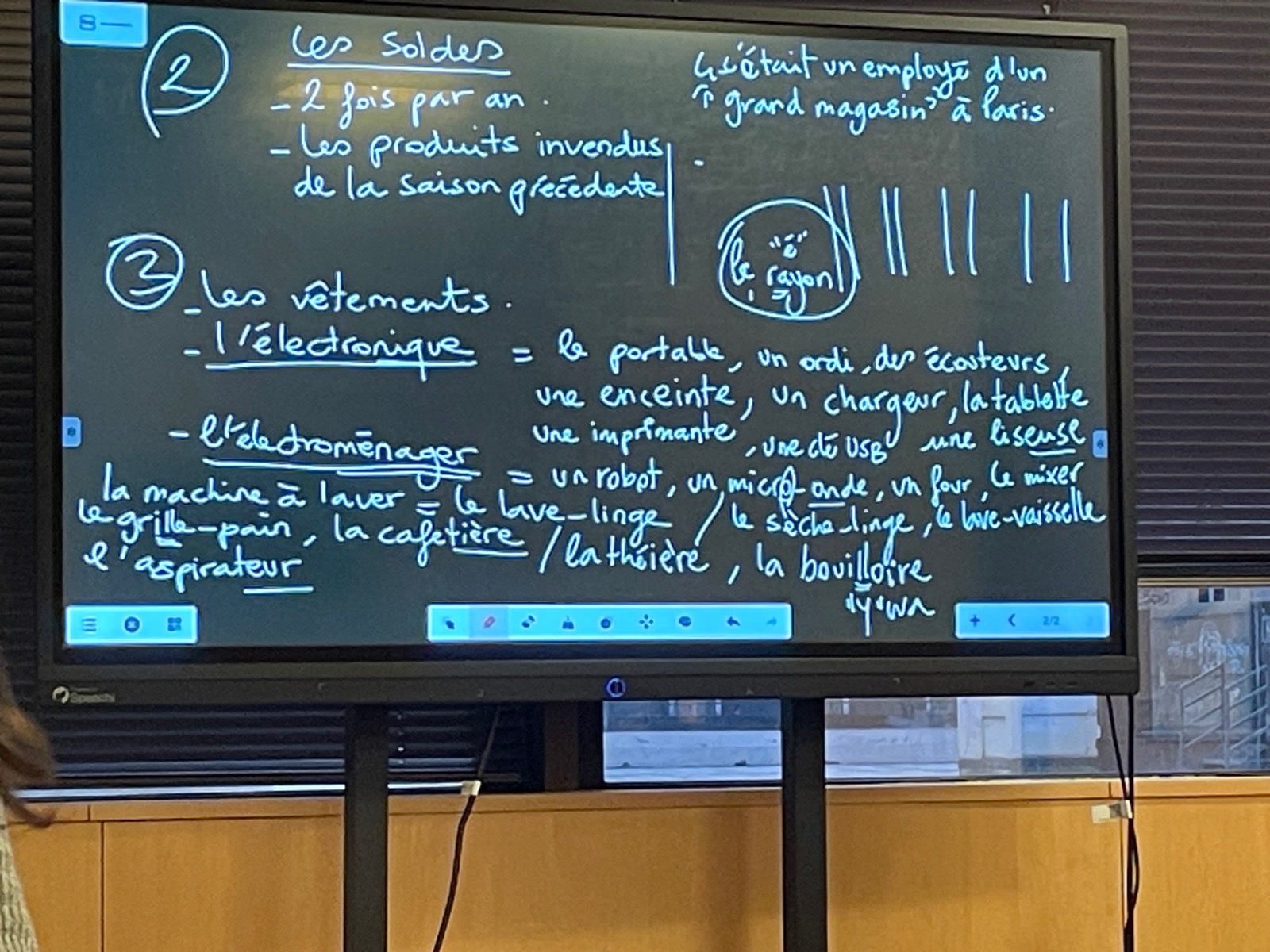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