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증
먼 타지에 살다보니 별 생각이 다 든다. 특히 1년에 단 한 번도 통화하지 않고 지내던 우리 아빠 생각. 심심한 저녁, 간혹 아빠에게 보이스톡을 걸었다. 그럼 아빠는 운전중이었다. 잘 지내고 있는지 안부를 묻고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다보면 금새 삼 십분이 지나 있었다.

우리 아빠는 내게 끊어낼 수 없는 혈육, 미워도 사랑할 수 밖에 없는, 세상에 하나 뿐인 아버지다. 가만 보면 외부인에게는 한없이 착한데, 가족들에게는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나 싶을 정도로 폭력적이다. 그래선가 어린 시절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아버지와 딸이 빼앗긴 6년은 영원히 회복되지 않았다. 일상이 점차 회복되긴 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가기 전과 같은 친밀함은 끝내 회복할 수 없었다. 나는 늘 그 이전의 날들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아버지가 나를 태우고 미친 듯이 패달을 밟던 어느 가을날이, 지각인 줄 알고 엉엉 울며 뛰어 들어간 교실에는 가을 오후의 햇살만 고요히 가라앉아 있었다. 낮잠에서 깨어난 나를 다음 날 아침이라고 원껏 곯린 아버지는 잔뜩 뿔이 난 내 손에 햇살처럼 고운 홍옥 한알을 건네주었다. 이가 시리도록 새콤한 홍옥을 베어 물며 돌아오던 신작로에는 키큰 코스모스가 가을바람에 산들거렸다.
<아버지의 해방일지> 정지아
고집은 또 얼마나 센지 모른다. ‘고씨 고집’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정지아 작가는 <아버지의 해방일지>의 등장인물을 ‘고씨’로 하고 우리 아빠와 나의 모습을 그대로 소설에 옮겨놓았다. 소설의 플롯은 딸의 시점으로 진행된다. 아버지의 장례식장을 찾은 조문객을 통해 딸은 이제 물어볼 수도, 알 수도 없는 아버지의 삶을 유추하는데… 조문객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수록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후회가 짙어진다.
책을 읽는 동안 나는 살아 있는 아빠에게 감사했다. 그리고 아빠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마구 떠올랐다. 아빠와 나 사이의 공백을 이제는 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책을 읽다 말고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잘 지내지? 그런데 있잖아…“
해방
대뜸 전화해서 옛날 얘기를 꺼내긴 쉽지 않았다. 그래서 먼저 책 이야기로 화두를 던졌다. 그리고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다고 슬그머니 속마음을 꺼내놓았다. “어린 시절, 아빠가 나를 보러 초등학교로 찾아왔잖아. 아빠는 몰랐겠지만 그때 나는 아빠가 부끄러워서 외면했어. 아빠 행색을 보고 놀리는 친구들에게 모르는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했거든.” 아빠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상관없다고 답했다. ”아니… 그게 내내 마음에 걸리더라고.“ 원하던 대답이 있던 건 아니었는데 뭔가 이상한 방향으로 대화가 흘러갔다.
그래도 깊은 곳에 묵혀 있던 마음을 좀 털어내니 기분은 한결 나았다. 다음으로 아빠의 생각도 궁금해서 질문을 던졌다. “과거를 돌아보면 아빠와 함께 보낸 추억이 없어. 이제 와서 그게 좀 아쉬워. 아빠는 나와 함께 했던 추억이 있어?“ 아빠는 너무 먼 옛날이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나로 인해 생겼던 형제 싸움이 떠오른다고 했다. “아, 그거.” 워낙 자주 들어서 나도 잘 알고 있었다. 작은 아빠가 10살 밖에 안 된 나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켰다가 엄마가 화가 났던, 그래서 크게 가족 싸움으로 번진 사건이다. “아니 그런 거 말고, 나랑 보냈던 행복했던 기억말이야.“ 제발 하나만이라도 떠올려주기를 은근히 바랐다. 그러나 아빠는 한 건 많았지만 워낙 옛날이라 생각이 안 난다는 말만 반복했다.
전화는 성과없이 끝났다. 파리 시간으로 새벽 1시가 훌쩍 넘어있었다. 과거로 돌아간다 해도 아빠와 나는 영영 추억을 만들지 못 했을 것 같다. 아빠는 늘 그렇듯 ‘일‘을 최우선으로 두는 사람일 것이고, 나는 추억을 기억하지 못 하는 못난이 딸로 컸을 것이다. 책을 읽다 잠깐 감성에 취해 우리 아빠가 어떤 아빠인지 잊었다. 적어도 과거의 관계를 메꾸려 시도했다는 것에 만족한다. 그게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말이다.
부모 자식 사이
스페인 여행을 떠나기 일주일 전, 고래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는 연차를 하루 내고, 부모님과 밤새 통화하며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고래네 가족은 알제리에 산다. 그리고 아직 프랑스 시민권이 없어서 부모님을 보러 고향에 갈 수 없는 상황이다. 알제리로 입국하면 그 즉시 군대로 잡혀간다고 했다. 부모님을 뵈러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터라 더 슬프고 쓸쓸해보였다.
한국 땅을 떠나 프랑스에서 살아보겠다고 파리에 와 있지만, 시차가 8시간이나 하는 먼 타지에서 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가족에게 의지할 수 없는 건 나만 버티면 되는 일이니까 아무래도 괜찮지만, 반대로 가족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 바로 달려갈 수 없다 사실은 차마 견디기 힘들다.
지쳐있는 고래에게 뭔가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 그래서 파리 시내의 알제리 레스토랑을 찾아가 쿠스쿠스를 집 앞으로 배달해주었다. 문밖으로 그가 회의 중임을 알고 문 앞에 살포시 두고 나왔다. 뭐라도 먹으면서 힘내길 바라면서. (‘보나피티’라고 쪽지 하나 남길 걸 하는 후회가 살짝) 그리고 이날 밤, 할머니로 시작해 가족들 한 명 한 명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다.
“요즘 사는 건 어때? 별일 없고?”, “잘 지내지 뭐.” 서로 건강하게 잘 지낸다는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통화를 마치고 잠시 잠깐 아빠한테 과거 투정을 부렸던 것을 반성했다. 지금 편하게 전화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가족이 된 것에 감사하기로 했다. 그러고보면 서른, 마흔을 넘긴 부모 자식 관계는 간단한 안부 전화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가 딱 적당한 듯 하다. 각자의 사정을 말 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사이. 그저 아프지 않고 별 탈 없이 살면 그게 최고다. 우리 가족, 원정, 문규, 막례, 순영, 정옥, 택수, 소선, 우경, 현호, 현성 모두 사랑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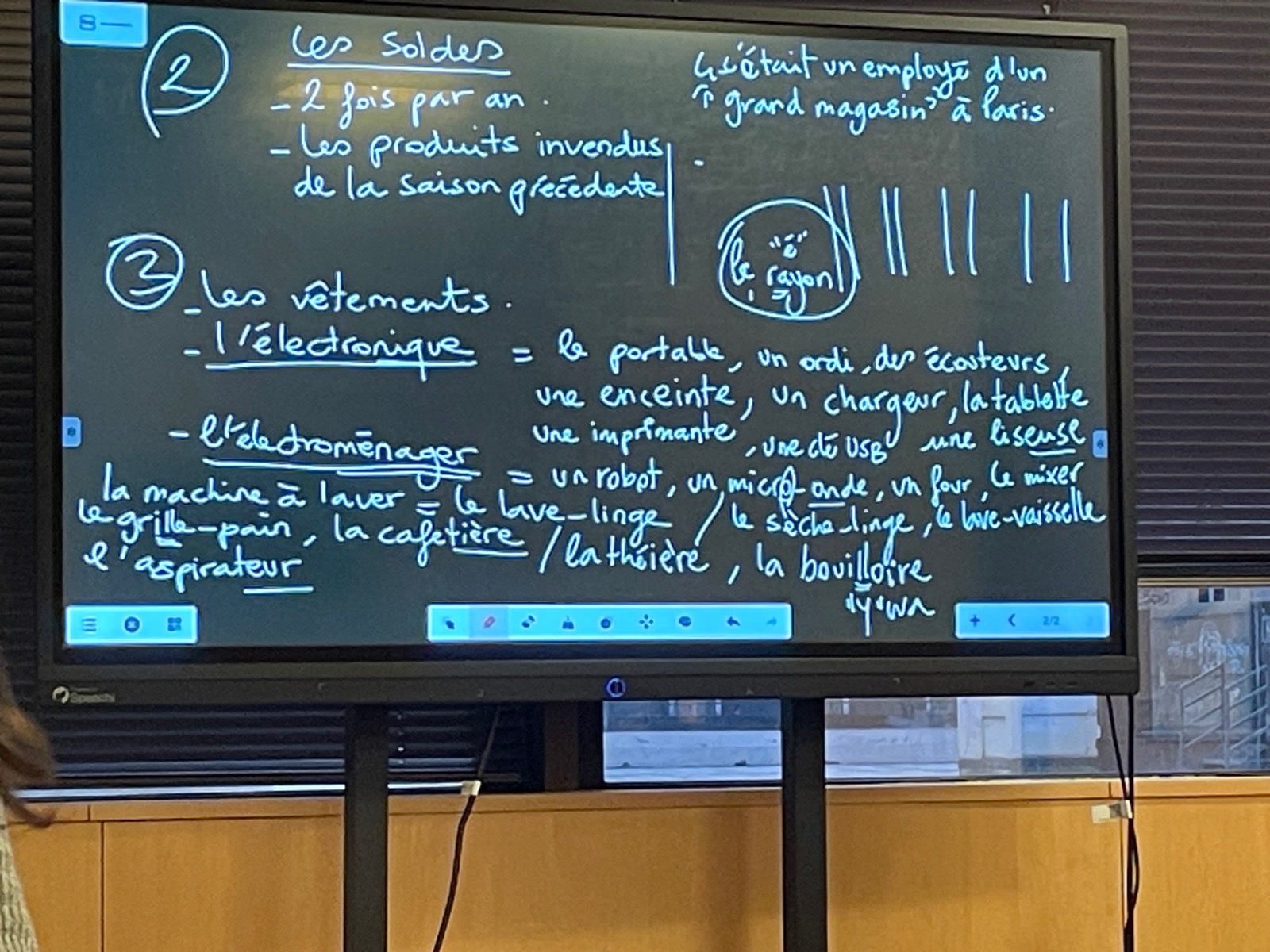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
라니
비공개 댓글 입니다. (메일러와 댓글을 남긴이만 볼 수 있어요)
파리우쟁
미안하긴 뭘 미안혀! 난 오히려 너무 자주 보내는 건 아닌가 싶을 때가 많은디… 아빠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만나서 더 깊게 하기로 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