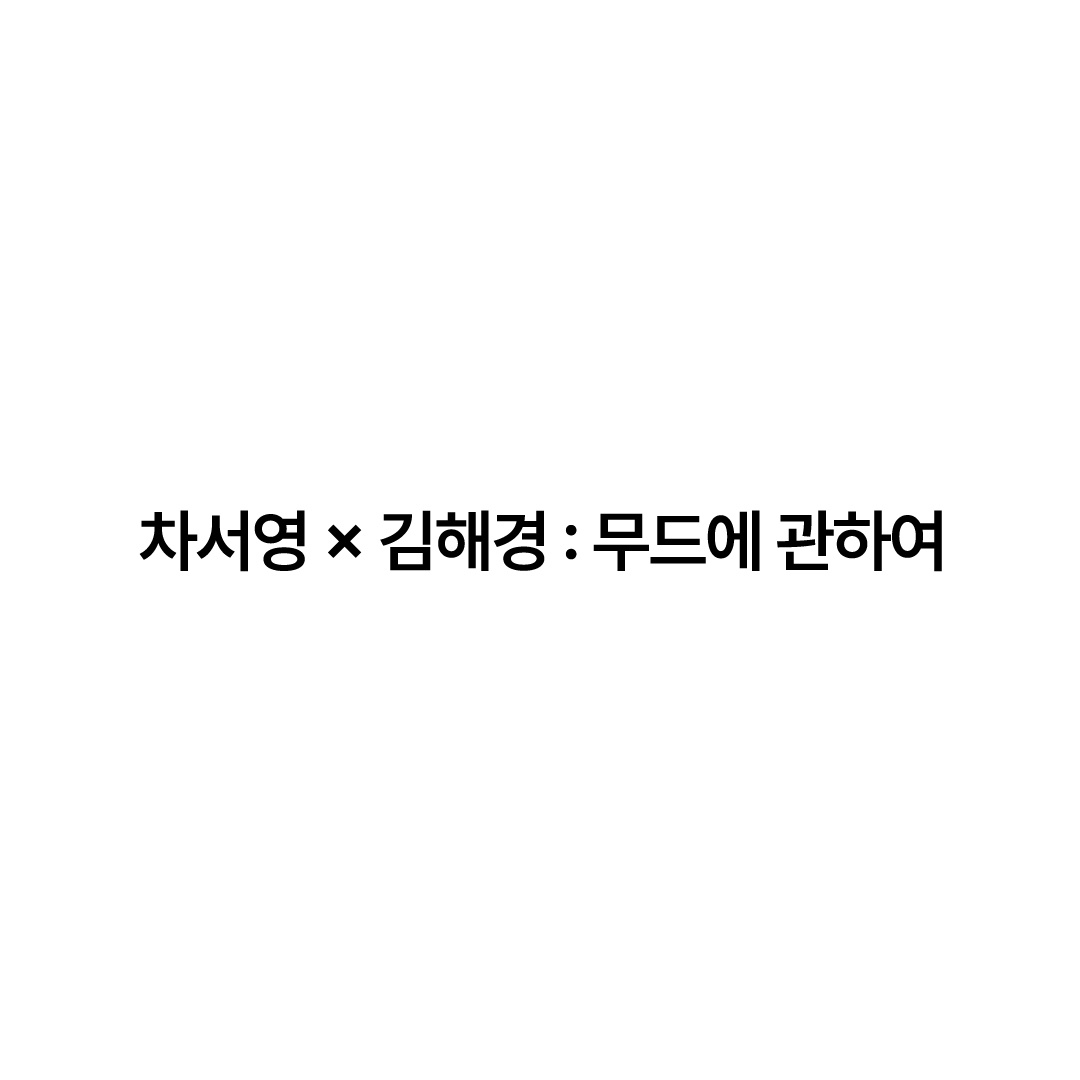
여기와 거기는 우리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다. 어떤 기원에 대한 이야기이고. 죽을 때까지 비밀에 부쳐질 수도 있었던 이야기다. 그러나 나는 발설하기 좋아하는 인간. 당신은 들어야 한다. 나의 슬픔. 나의 오독. 그리고 나의 색에 관하여. 그리하여 울어도 좋다. 나를 지우고 들어선 그 자리에서, 해가 다 지도록 울어도 좋다.

어릴 때부터 호흡기관이 약했다. 고등학생이 됐을 무렵, 체육시간마다 조금 뛰었을 뿐인데 숨이 쉽게 차올랐다. 병원을 갔더니, 의사는 오른쪽 폐가 사라졌다며 큰 병원으로 빨리 옮기라 했다. 엄마는 그 길로 나를 차에 태우고, 울산으로 향했다. 울산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레지던트로 보이는 젊은 의사가 나에게 달려왔다. 처치실에서 간단한 시술을 하고, 곧바로 수술에 들어갈 거라 했다. 말은 간단한 시술이었지만, 오른쪽 늑골 위에 얇은 관을 심어서 폐 바깥으로 차오른 공기와 피를 빼내는 것이었다. 피부 마취를 했지만 아팠다. 두꺼운 살갗을 뚫고 얇은 쇠관이 소리를 내며 내 몸 속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아니 이건 아프기보단, 불쾌해. 몸 속에 있지 말아야 할 것을 처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응급처치가 끝나고 나는 사이보그 인형처럼 기다란 케이블과 산소통을 달고 걸어나왔다.
아버지는 그날을 끝으로 담배를 끊었다. 엄마와 누나가 생활을 버리고 병실을 지켰다. 아침마다 장난감처럼 생긴 폐활량 운동기구를 입에 물고 공기를 불어야 했다. 쪼그라든 폐를 이전처럼 펴놓아야만 수술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짓이 무척 싫었다. 아침마다 육인실의 알람소리보다 시끄럽고 요란스러운 일을 만드는 것도 싫었고, 숨 하나 제대로 못 쉬는 내가 한심해 보여서 싫었다. 그래서 장난감 같은 그 요상한 물건을 손에 쥐는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일이 잦았다. 창밖으로는 대학병원의 새하얀 벽면에 부딪혀 튕긴 햇빛이 과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아프게 되면 저런 게 다 사치래. 아프게 되면 문학이 사치이듯, 아프게 되면 희망 품는 마음이 사치이듯, 과분한 맑음. 과분한 여름. 그런 것들이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들거든. 전화 너머로 친구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주치의 선생님이 회진을 하다가 내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 하루에 얼마나 불고 있지? 이러면 수술을 할 수 없어. 계속 이렇게 살고 싶어? 부모님은 고생하시는데, 부지런히 회복해야지. 네가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
그날 오후, 운동기구를 다시 잡았다. 힘차게 숨을 들이마셨다. 나의 폐활량은 고작 오백씨씨에 불과했다. 한 번 더 들이마셨다. 육백씨씨. 칠백씨씨. 눈 앞에서 살 떨리듯 다그닥거리며 올라가는 공이 보였다. 이게 내 안간힘이라면, 너무 초라하지만 그래서 더 살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생님은 좋은 말로 나를 회유할 수도 있었겠지만, 무언가 비관에 찬 나를 며칠 지켜보며 용기를 냈던 거 같다. 퉁명스러운 그 말투에서 나는 비로소 조금 굴절되었던 것 같다. 이전보다 조금은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다.
일주일을 고생한 끝에 수술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엄마와 누나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잘 할 수 있을 거라 말해줬다. 수술실은 추웠다. 간호사는 얼굴의 절반 정도 되는 마스크를 씌워주면서, 곧 잠에 들 거라고 일러주었다. 뺨과 코가 맵게 느껴졌다. 그리고 다시 깼더니 수술은 끝나 있었다. 나는 눈을 뜨자마자 엄마를 보곤 아이처럼 울었다. 지금도 이유를 모르겠다. 그렇지만 때론 이렇게 생각한다. 살기 위해서 견뎌야 했던 그 무의식의 시간 속에서, 난 어쩌면 외로움의 실체를 본 것인지도 모를 일이라고. 내가 지금 힘주어 말하는 어떤 고독과, 어떤 슬픔의 기원은 차가운 수술대 위에 짐승처럼 혀를 내빼고 잠든 한 아이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엄마는 웃겼다. 왜 그러냐고 묻지 않았다. 괜찮다. 괜찮다. 엄마 여기 있다. 괜찮다고 반복해서 말해줄 뿐이었다.
회복은 빨랐다. 일주일 만에 퇴원을 했다. 집에 돌아와 클립이 박힌 가슴을 만져보았다. 그리고 있는 힘껏 한숨을 쉬었다. 따끔거리는 안도였다. 그날 이후, 나는 종종 시선 끝에 창문이 있다고 상상하며, 먼 곳을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다. 창밖은 여전히 진공 속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풍경들로 가득하다. 숨의 절반은 거기에 있다. 사랑의 절반은 거기에 있다. 오늘 여기가 알록달록한 까닭, 거기가 무채색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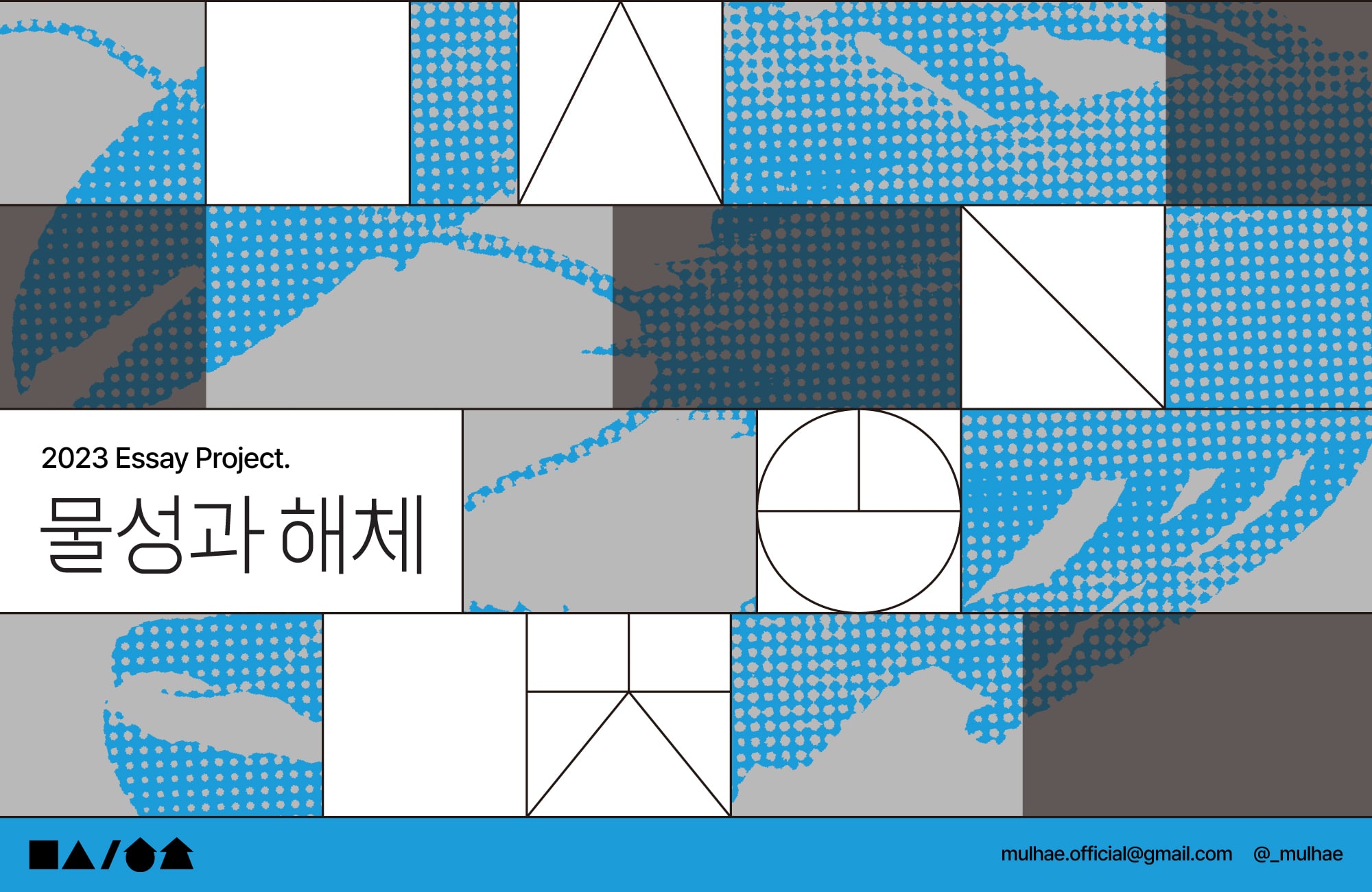
"누나의 사진과 나의 글, 생각만 해도 좋지 않아?" <무드에 관하여>는 차서영 작가의 사진과 김해경 작가의 글로 구성된 사진에세이 단편입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밤에 찾아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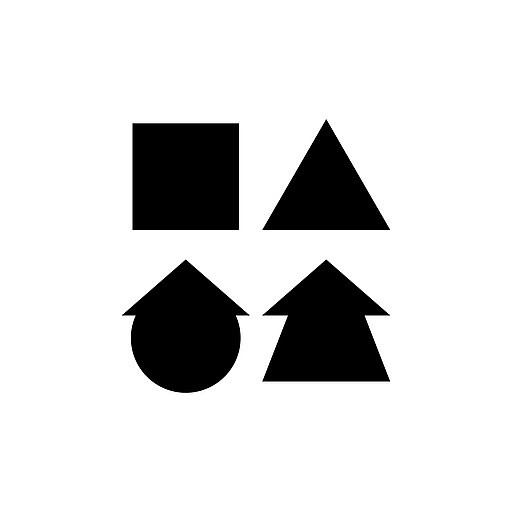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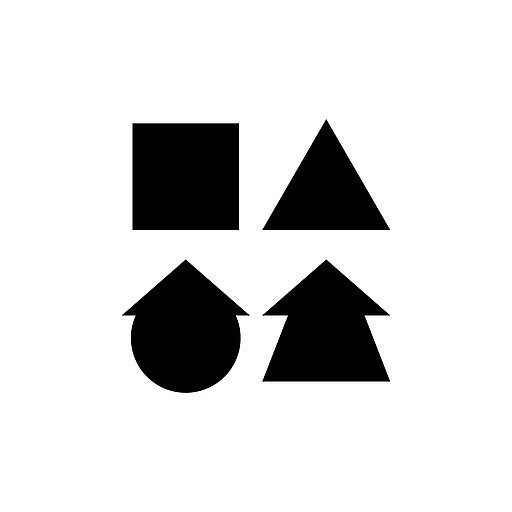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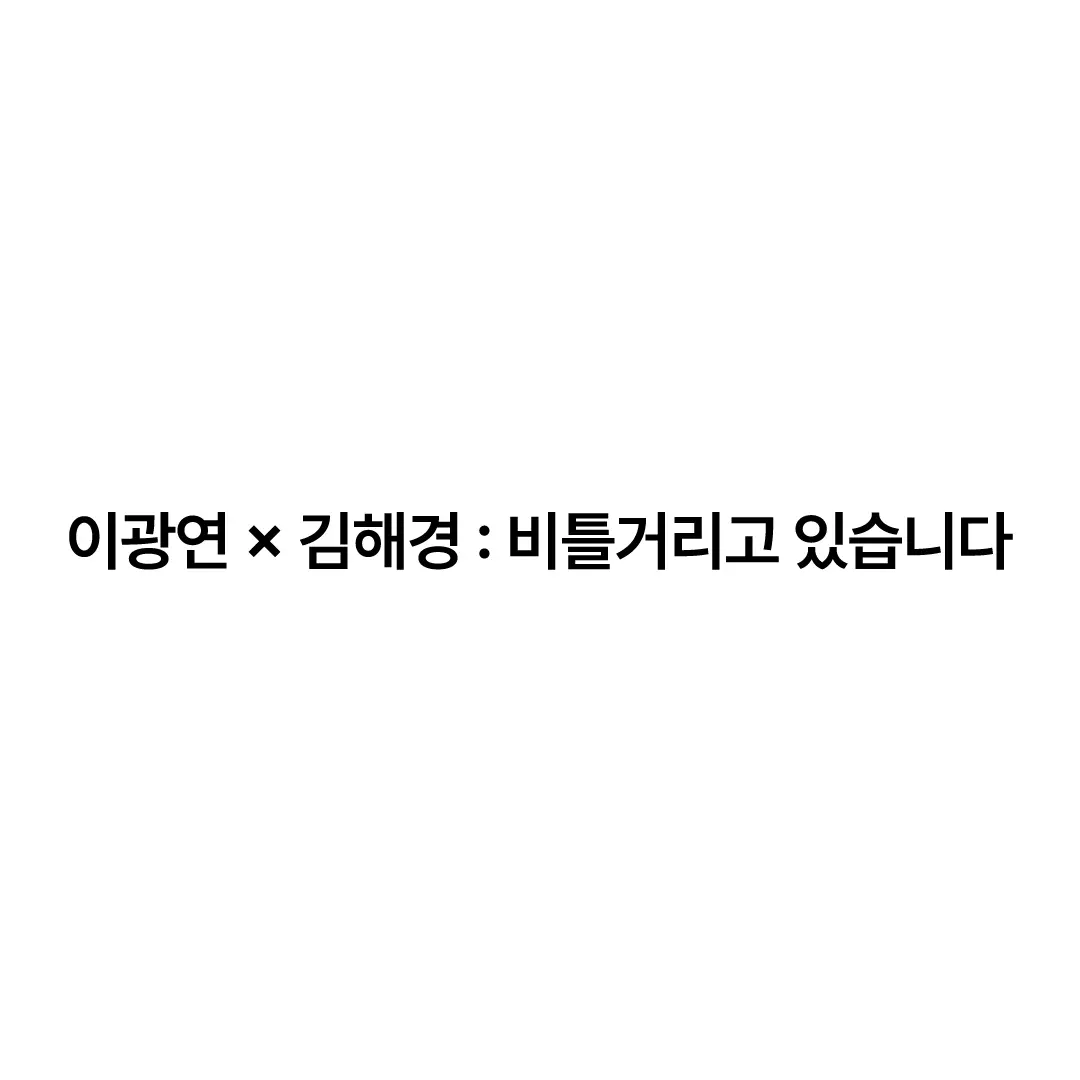


![[김해경] 라이팅룸 101호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r1qyv23ad7ug60982t919d03au22)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