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L 그리고 구독자, 새해 복 많이 받아! 벌써 1월도 반 넘게 흘러갔는데 다들 계획했던 바는 잘 이뤄 나갔는 궁금해. 나도 겨우 2025의 자취를 덮어내고 2026으로 넘어왔어. 말도 일도 끝맺음을 잘 못하는 나에게 마무리는 항상 어려운 일이야. 나이를 더 먹으면 저절로 나아질는? 요것조것 갈무리하며 깨달은 건, 내 모든 기록이 부실하다는 거였어. 뭐 하나 남겨둔 게 없으니, 무엇을 해내었는지도 흐릿하더라고. 하물며 일기 한 꼭지라도! 그래서 어제 급히 버킷리스트를 써보았어. 거창한 템플릿 없이 쭉 적어봤는데 몇 가지 공유해보자면
- 손글씨 교정하기
-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만들기
- 바닷가에 누워 책 읽기
- 하루 한 편, 내가 태어나기 전 영화 보기
- 해외 음악 페스티벌 가서 춤추기!
- 각지의 아트 시네마 도장깨기
쓰다 보니 소소해서 웃음이 나더라. 삶에서 공부나 일을 덜고 나면 어떤 게 남을까 고민하다 써본 것들이야. 올해 종종 진행 상황도 공유해 줄게. 우선 어제는 56년도 영화 <신체 강탈자의 침입>을 봤어. 구독자와 L은 2026년 무엇을 도모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

That's the very reason why they put rubbers on the end of pencils.
포쉬한 연말을 장식해 보자며 준비했던 플리백 이야기, 마침내 꺼내볼까 해. 새해와도 은근히 잘 어울리는 주제인 것 같아. <플리백>은 런던에서 홀로 카페를 운영하는 30대 여성 Fleabag의 이야기로, 그녀의 가족-연인-친구에 대한 사랑 그리고 상실을 다루고 있어. 물론 “This is love story” 라는 말로 시작하지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성애적 사랑만은 아닌 이야기를 해.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가지각색으로 마음을 울릴 이야기라는 건 확신할 수 있지. 이거 웃어도 되나 싶은데 웃음이 새어 나오는 장면도 꽤 많아 장담할 수 있어.
그런데 잠깐! 콘텐츠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없이 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여기서 멈추고 아마존 프라임으로 가줘. 극적인 스포일러는 없지만 주의!

주인공의 이름, 아니 별칭 “Fleabag”은 더럽거나 초라한 몰골을 한 사람 혹은 싸구려 숙박을 의미해. 처음엔 그저 의아했으나 자신을 이렇게 칭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궁금해지더라. 끝까지 다 보고 나니 다소 애칭으로 느껴지기까지.
플리백은 시작부터 인칭 시점의 나레이션을 들려주며 계속 제4의 벽을 넘어 우리에게 말을 걸어. 몇 분마다 한 번씩 나를 보며 집요하게 아는 체를 하고 윙크를 날리는 거 있지. 사람 눈 잘 못 보는 성격이라 조금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어. 곤란할 때마다 왜 나를 보는 거야! 나 좀 그만 봐! 외치고픈 마음. 하지만 계속 나를 보고 쫑알거리는 플리백과 살아가다 보면 모든 감정에 동화되는 나를 발견하기 시작해. 드라마 속의 플리백을 관찰하기보단 같이 살아간다는 표현이 더 맞다 싶어. 살면서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던 순간, 질문들을 플리백이 집요하게 바라보고 환기해.
아직도 내가 처음 플리백을 보고 L에게 소개해 준 날이 생생해. 네가 무슨 내용이냐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 삶 속에서 괴로워하고 망가진, 날 것의 감정을 다 드러내는 30대 여성의 이야기라 좋았다고. 꾸밈없는 플리백의 이야기에서 묘한 해방감까지 느꼈다고! (솔직히 “그냥 꼭 봐”라고 백번 말했던 것 같지만) 여러 친구에게 비밀 쪽지 쓰듯 슬쩍 추천을 찔러 넣었던 기억이 나는데… 다 보고 이야기를 나눠준 건 너뿐이었어. 나는 그 이후로도 세 번 정도 더 돌려봤고, 이 글을 쓰기 위해 한 번 더 본 후 생각해 봤어. 난 플리백을 왜 사랑할까? 스스로조차 인정하기 두렵고 어려웠던 실수와 상실을 회피하지 않고 내놓는다는 플리백이 좋아. 빗장을 풀어버린 것 같아. 풀어버렸어. 가끔 넘치는 감정을 털어내고픈 충동만이 가득할 때 플리백을 봐. 모든 에너지가 상쇄되어 스러져.
이런 일들을 겪고 아무렇지 않을 수 있다고? 싶은 순간이 많지만 나를 쳐다보는 플리백의 눈 너머로 바동거림이 보였어. 극 내내 불쑥 튀어나오는 악기들의 불협화음 범퍼처럼 막 엉망인 거야. 참고로 플리백의 스코어는 클래식 악곡들로 구성되어 있어. 생각보다 현대 런던 도심 씬들과 잘 붙어서 신기해. 내 인생이 꼬인 것 같을 때 들어보며 다음 에피소드로 건너뛰기 해보는 재미가 있지.
플리백의 아빠는 엄마가 돌아가시자마자 대모와 결혼했고, 가장 친한 친구 부의 죽음엔 그녀의 책임이, 유일한 혈육 클레어는 그다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하다못해 신부님을 사랑해. 플리백은 그럭저럭 잘 사는 듯 싶다가도 길을 잃은 마음에 자기 파괴적 관계를 지속하기도 해. 쿨한 척 농담 따먹기 가득한 그녀의 대사 속에 점차 처절한 고백이 묻어나오자 나도 웃음을 뚝 멈추게 되더라고.
아버지 앞에서 봇물 터지듯 외친 이 대사가 기억에 남아.
나는 이기적이고 변태적이고 무감정에 부도덕한…
I have a horrible feeling I'm a greedy, perverted, selfish, apathetic, cynical, depraved, mannish-looking, morally bankrupt woman who can't even call herself a feminist.
Fleabag

그리고 끝내 울며 소리쳐. 모두 조금씩은 이런 감정을 느끼면서, 말만 안 하고 사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나만 완전히 홀로 이러는 것이냐고. 제작자는 명확히 답을 알기에 플리백의 대사를 통해 우리에게 던진 것 같아. 플리백이 안쓰러움과 동시에 반색하게 되는 순간이었어. 나의 취약함을 마주하고 인정하고 우리에게 내어놨으니!
뒤늦게 언급해 보는 이 글의 제목, 왜 연필 끝에 지우개가 달렸는지에 대해… 대충 알겠지?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실수를 하지만 그럼에도 지워내고 변화할 수 있다는 것. 플리백 속 모든 인물이 각기 삶에 있어 과오를 범하지만 끝내 자신을 마주하고 다시 나아가거든. 실수 한 번 안 해본 인간은 없을 테니 누구 하나 감응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생각해. 어디선가 모종의 이유로 괴로워할 여성에게 전하는 위로 같았어.

무엇보다도 폭넓은 여성 화자로 그들의 감정을 맛 볼 수 있게 만들어준 플리백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싶어. 납작하게 넘어가는 인물 하나 없이 내가 후회하던 시절의 여자 - 되고픈 여자 - 곁에 친구로 두고픈 여자 등등 하나씩 대입해 볼 수 있을 거야. 이미 알 수도 있지만 이 시리즈를 쓰고 연출한 사람이 플리백 본인이거든. 앞으로 그녀가 또 어떤 이야기를 쓸 지 기대돼. 본래 1인극으로 시작했던 이 이야기를 언젠가 다시 무대 위에서 볼 수 있기를 바라며. 숙명적 고통을 품고 사는 여성들에게 It will pass...!
여기서부턴 MBTI도 N인 N의 플리백 궁금증들💬 콘텐츠를 다 본 구독자 들의 의견이 궁금해. 어느 창구로든 답해줘 기다릴게!
Q. 클레어와 플리백 자매 둘 중 누가 언니고 동생일까?
누가 윗(?)사람인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나름 언니와 동생에게 주어지는 고정관념에 맞추어 해석하게 되잖아. 나는 당연히 플리백을 천방지축 언니 - 먼저 철 든 듯한, 얌전한 동생으로 봐왔는데 찾아 보니 의견이 분분하더라고. "sister" 정도로만 표현되어 정확한 정답을 알 수 없어.
Q. 부가 남기고 간 기니피그, 음식을 만드는 카페에서 키워도 괜찮을까?
기니피그로 브랜딩 한 카페이니만큼, 꼭 필요한 아이지만 갑자기 궁금하더라고. 제미나이와 이야기를 나누어 봤더니 식품 위생법과 동물 복지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는 해. 소음과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민감한 아이라 자칫 스트레스로 아플 수도 있다고 하네.

Q. 부는 플리백을 용서했을까
어떤 일에도 100퍼센트는 없지만 부라면 플리백을 용서했으리라 생각해. 연필에 지우개가 달린 이유를 알려준 것도 부이니까... 사과할 기회조차 없다는 게 플리백에게 가장 큰 벌이겠지.
Q. 신부와 플리백은 재회했을까?
개인적으로 둘은 다시 안 만났으면 좋겠어. 물론 플리백이 가끔 성경을 들춰볼 것 같긴 해.


P.S. 끝으로 밝히는 나의 버킷리스트 - 할로윈때 플리백 코스튬 입기. 기니피그 인형을 구해봐야겠어🐹
From.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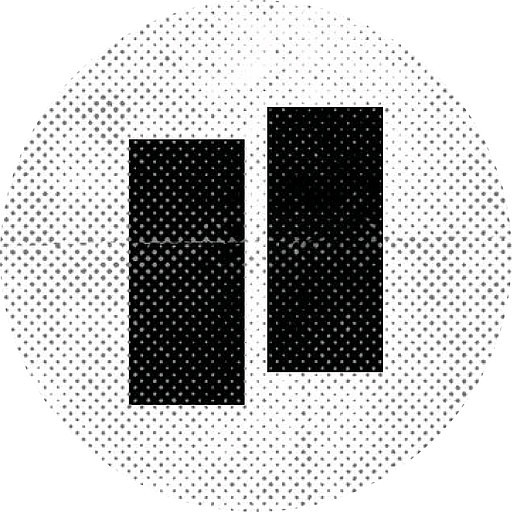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