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심오한 질문 : “오늘 뭐먹지?”. 아침에 일어나서, 일과 중에, 그리고 하루를 마치고 집이나 약속장소에 가면서, 우리는 연신 무엇을 먹고 이 하루를 살아낼 것인지 무수한 선택지 앞에서 고민한다. 동네 백반식당에서 든든하게 속을 채우거나, 미슐랭 스티커가 붙어있는 다이닝 레스토랑에서 한껏 분위기를 잡아보기도 하고, 유기농 식료품 가게에서 재료를 사다가 요리를 해서 먹거나, 스마트폰 배달앱 열고 간단한 클릭 몇 번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당신이 먹는 음식이 곧 당신이다
‘당신이 먹는 음식이 곧 당신이다(You are what you eat)’ 라는 표현을 아는가? 18세기 프랑스 미식가 브리야-사바랭(Brillat-Savarin)이 남긴 이 아포리즘은 음식이 한 사람의 사회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지표임을 명백하게 표현한다. 당시에는 국가와 계층에 따라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종류가 극명하게 나뉘었기 때문에 음식 소비는 단지 생물학적 욕구해소가 아니라 사회 계급, 지역, 국가, 문화, 젠더, 생활 주기 단계, 종교, 직업들 간의 경계를 드러내는 문화지표였다.[1]
![[이미지 1] 주세페 아르침볼도(Giuseppe Arcimboldo) <계절의 신, 베르툼누스> 초상화(1591)](https://cdn.maily.so/202209/publicpublic/1663152686744964.jpg)
![[이미지 2] ‘You are what you eat’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이미지](https://cdn.maily.so/202209/publicpublic/1663152700638903.jpeg)
그렇다면 음식 재료와 레시피 등이 글로벌화된 오늘날 이 문장의 의미는 퇴색되었을까? 아니다. 음식을 통해 문화적 차이와 사회적 신분, 그리고 계급적 요소가 극명히 확인되었던 시대를 지나 이제 음식, 넓은 의미로 ‘먹기’는 오히려 더욱더 복잡한 양상을 띠며 당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낸다. 식재료를 선별하는 과정, 선호하는 조리법, 식사 습관이나 방법이 개인의 기호나 선택에 의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16세기 이탈리아 화가 아르침볼도가 그린 초상화처럼, 그 사람의 모습은 먹는 음식으로 그려볼 수 있다.
유통산업의 발달로 식품 시장의 글로벌화가 진행되었고, 다양한 식재료의 수급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식재료 선택의 물리적인 제한이 사라짐에 따라, 선택적이고 의도적인 ‘먹기’는 개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어떤 사람이 ‘페스코 베지테리안’이기에 육류와 조류 섭취를 거부한다. 건강상의 문제이거나 단순히 취향의 문제일 수 있고, 과시적 육류 소비에 내재 된 환경 문제를 비판하는 의식을 대안적 실천으로 옮긴 것일 수도 있다. 만약 당신이 9월 24일 기후 정의 행진을 준비하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이 사람과 사회적으로 연결된다. 같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끼리는 사회적 몸통을 공유하며 연대감을 갖는다. 이처럼 음식을 (물질적으로 혹은 개념적으로) 공유하는 행위는 “사회적 자아와 사회적 타자 사이의 차이를 만드는 것에 있어 강력한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음식을 나누는 것은 친밀감의 표현과 함께 사회적 관계맺음으로 확장한다.
![[이미지 3] 티라바니자(Rirkrit Tiravanija) <무제 1992/1995 (free/still)>(1992/1995/2007/2011~) © 2022 The Museum of Modern Art](https://cdn.maily.so/202209/publicpublic/1663152749786395.jpg)
소셜 다이닝의 예술, 누구와 먹는가
여기 태국의 한 예술가가 음식을 만드는 퍼포먼스를 하며 관객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있다. 관객들은 전시장 한편에 자리를 잡고 앉아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눈다. 1990년대 ‘관계의 미학(Relational Aesthetics)’이라는 개념을 창발시킨 이 전설적인 작업은 마치 전시 오프닝 리셉션 모습을 재연하는 듯하다. 전시장이라는 물리적인 공간 너머에 존재하는 예술계가 작동하는 역학관계 그 자체를 보여주면서, 그의 작업은 순수함으로 포장된 예술작품 역시도 끊임없이 사회적 교류에서 비롯된 구성물임을 드러낸 것이다. 관객들은 음식을 대접 받으며 아주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의사소통 구조의 생산에 참여하게 된다.
티라바니자의 음식이 일종의 예술로서 전시장에서 관객 간의 일시적 만남을 만들어냈다면 실제 예술가의 삶에서도 ‘소셜’한 활동의 매개로 음식이 활용된 사례가 있다. 1970년대 초 뉴욕 소호에서 예술가들이 공동으로 운영한 레스토랑 ‘푸드(Food)’다. 고든 마타-클락은 예술과 음식을 통해 예술가들의 대안적인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했다.
![[이미지 4] 고든 마타-클락, '푸드'(1971-1973) (MMCA 미각의 미감) ©국립현대미술관](https://cdn.maily.so/202209/publicpublic/1663152871982405.jpg)
음식을 통한 관계맺기는 코로나 대유행 이전까지 SNS를 통해 ‘소셜 다이닝(social dining)’으로 진화했다. 가족과 친구, 동료 단위에서 행해지던 식탁에서의 관계맺음이 낯선 이들과의 만남과 네트워킹의 자리로 변모하게 되었다. 소셜 다이닝의 부상은 소셜 미디어의 발달과 1인 가구의 증가, 그리고 도시적 삶에서의 생산성 극대화라는 문화적 토대에서 성장했다. 그들은 온라인 상에서 공통의 관심사를 확인하고 식사 모임을 통해 일시적 공동체를 이루었다가 사라진다. 인스타그래머블한 음식 사진에는 자리를 함께한 사람들이 태그되어 오늘의 소통을 박제한다.
영국의 사회-문화인류학자 해리 웨스트(Harry G. West)는 오늘날 무엇을 먹느냐를 넘어서 누구와 먹는지의 중요성을 “We are what we eat with!”라는 문장에 담아냈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밥을 먹을 때마다, 로컬에서부터 전지구적 범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정체성은 만들어지고 관계들이 드러나며 공동체는 형성된다고 한다.[2]
![[이미지 5] 코에르트 반 멘스부르트 ‘이 다음의 음식, 이 다음의 자연’ (ACC 해킹푸드, 2019) ©ACC](https://cdn.maily.so/202209/publicpublic/1663152896239951.png)
갈등과 공론의 장, 음식
예술 현장에서는 음식을 통한 관계 맺기를 넘어서 자신이 속한 사회와 미래를 비판적으로 그려보는 다양한 실험이 지속적으로 시도 되었다. 국내에서는 음식의 미래와 대안적 시도들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엮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해킹푸드(Foodhack)>(2019), 음식과 관련된 다학제적 관점을 풀어놓은 두산인문극장 <FOOD>(2020) 등이 있었다. 또한, 영국 델피나 재단에서는 12년간 다학제적인 워크숍과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진행한 후 <음식의 정치학(Politics of Food)>(2019)을 출간한 바 있다.
![[이미지 6] 얀반에이크 아카데미 ‘푸드 아트 필름 페스티벌’ 2022년 공식 포스터](https://cdn.maily.so/202209/publicpublic/1663152938874824.jpg)
한편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 위치한 얀반에이크 아카데미(Jan van Eyck Academie) 주최로 매년 개최되는 ‘푸드 아트 필름 페스티벌(Food Art Film Festival)’도 있다. 2018년 시작된 이 페스티벌은 지역 농부, 양봉업자, 요리사와 과학자, 그리고 예술 현장의 창작자들이 음식을 매개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창조적으로 그려보고자하는 다학제적인 취지로 기획되었다.
2018년 <오가닉 극장(Organic Theatre)>, 2019년 <소화하면서(On Digestion)>, 2020년 <디스토피아로부터 유토피아(Utopia from Dystopia)>, 2022년 <맛을 되찾기(Reclaiming Taste)>까지 매해 다른 주제를 가지고, 워크숍, 맛보기, 퍼포먼스, 식사, 읽기, 걷기와 스크리닝 등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이미지 7] 아스마 엘바다위 와의 대담 영상 갈무리 (얀반에이크 아카데미 ‘푸드 아트 필름 페스티벌’)](https://cdn.maily.so/202209/publicpublic/1663153024099507.png)
올해 페스티벌의 토크 프로그램 <A Scale of... Social media, Visual culture and Food>에서는 소셜 미디어와 시각문화, 음식과 여성의 뷰티에 관한 대담이 진행되었다. 시인이자 농구선수라는 특이한 이력을 가진 아스마 엘바다위(Asma Elbadawi)[3]는 섭식장애(eating disorder)을 앓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문학작품과 더불어 사회적 이슈를 담담하게 드러냈다. 아스마는 여성의 신체와 유색 인종에 대한 뷰티산업과의 관계, 여성, 신체, 인종, 소셜 미디어, 자본주의가 어떻게 음식을 통해 작동하는지 다각적으로 짚어내고 있었다.
음식은 쉽게 부패하고, 섭취 후 분해되어 배설물이 되며, 생물학적인 만족을 제공한다. 먹는다는 것은 음식이 신체로 침투하는 과정이며 몸의 외부와 내부의 경계를 허무는 역동적인 작용을 의미한다. 이로써 문명화와는 반대되는 동물적인 속성임과 동시에 자연적인 지점으로도 인식되었다. 따라서 ‘먹기’는 일반적으로 ‘동물적인’ 속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사회적 규범을 따르기 위해 반복적으로 자기 규율을 행사할 것이 요구되는, 고도로 육체화된 경험으로 진화했다.[4] 이런 현상은 날씬하고 이상화된 ‘문명화 된’ 몸이 '자기 통제'라는 인간의 주체성을 시험하며, 심리학적으로는 '자아' 개념과도 연결된다.[5] 또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 ‘바디 프로필’은 ‘먹스타그램’, ‘먹방’과 공존하며, 신자유주의 시대에 고도로 발달된 자기 계발과 자기 관리의 망령이 '먹기'라는 행위가 가진 아이러니를 드러낸다.
음식이 연결하는 것들
오늘날 ‘먹기’는 개인의 기호와 사회, 시대적인 역학 관계 안에서 더욱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개인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SNS와 1인 미디어를 통해 무엇을 먹고 누구와 또 어떻게 먹는지 공개하고 노출하며 개인이 도처에 드러나는 문화의 한가운데에 지금, 우리가 존재한다.
![[이미지 8] EBS 지식채널e 햄버거 커넥션(Hamburger Connection) 영상 갈무리 (2011.10.26)](https://cdn.maily.so/202209/publicpublic/1663153080228943.png)
그러나 궁극적으로 음식은 연결을 만들어낸다. ‘햄버거 커넥션(Hamburger Connection)’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햄버거 패티를 생산하고자 조성되는 소 목장으로 열대림이 파괴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미국에서만 매초 200명이 1개 이상의 햄버거를 소비한다고 하며, 소고기 100g을 위해 약 1.5평의 숲이 사라지고 소의 방귀와 트림에서 배출되는 메탄가스는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꼽히기도 한다. 소들에게 먹일 사료인 대두의 경작으로 아마존의 탈밀림화 및 공장식 가축산업의 동물권 문제 등은 과다한 육식문화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지금-여기’에서의 사적 행위가 다른 사회와 환경, 지구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과 ‘연결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음식에 담긴 다양한 의미를 고찰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사회, 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니 이제부터 당신의 식탁을 예술가들처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를, Bon appétit!
※ 본고는 이경미, 「당신이 먹은 음식이 바로 당신이다」(<계란후라이, 선홍빛, 나, 골드베르크> 전시 도록, 2021) 에서 편집·보완되어 실렸음을 밝힙니다.
이경미 / 독립기획자, PUBLIC PUBLIC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mia.oneredbag@gmail.com
[1] 음식은 또한 의례, 전통, 축제, 계절, 하루의 시간들을 구분하는 작용을 한다. 데버러 럽턴(박형신 옮김), 『음식과 먹기의 사회학: 음식, 몸, 자아』, 한울, 2015(1996), p.8.
[2] Harry G. West, ‘We are who we eat with: Food, distinction, and commensality’, Politics of Food (eds. Aaron Cezar, Dani Burrows), Delfina Foundation, 2019, p.137.
[3] 프로 스포츠에서 여성 선수들이 히잡과 종교적 모자 착용을 허용하도록 국제 농구 협회를 설득하고 청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페미니스트 이론가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우유 위의 엷은 막’에 대한 혐오감은 음식에 관한 이분법적인 속성을 둘러싼 문화적 범주를 잘 보여준다. 데버러 럽턴, ibid., p.219.
[5] 데버러 럽턴, ibid., p.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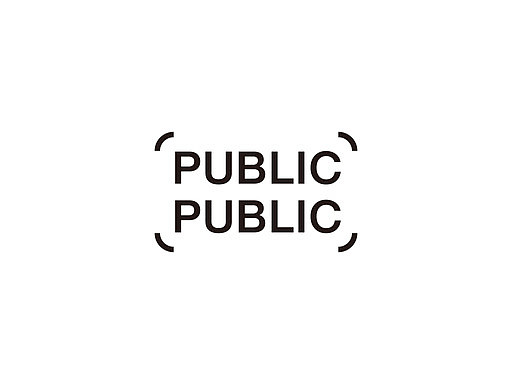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