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느 주말 오후, 부산 시립 미술관 전시실 앞, “당일 퍼포먼스 참여 집합장소”라는 표지앞에 삼삼오오 모여든 시민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하다. 무대에 오르기 전의 무용수처럼 혹은 런웨이에 오르기 직전의 모델들 처럼 조용히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기획 전시 《나는 미술관에 OO하러 간다》(부산시립미술관, 2022)에 출품한 조영주 작가의 퍼포먼스 <진실한 관객의 제스처>(A Sincere gesture of Audience)에 신청한 관객들이었다. 정시가 되자 작가가 울리는 짧은 벨소리와 함께 퍼포머와 시민들이 전시실의 한 작품 앞에서 다양한 동작을 이뤄내며 공간을 채워나가기 시작했다. 전시실마다 전시 된 작품들을 해석한 후 미리 구성해낸 몸짓들을 퍼포머들과 함께 시민 관객들이 전시장에서 45분간 펼쳐보였다. 작품의 수평선처럼 바닥에 나란히 누워보기도 하고, 설치된 작품을 타고 놀기도 한다. 영상 작업 앞에서는 동시에 작품의 핵심메시지를 소리쳐보기도 하고 관객석에 앉은 누군가의 귀에 속삭이며 질문을 하기도 해본다. 전시에 출품된 모든 작품이 작가와 안무가를 통해 또 현장에서는 관객의 몸짓을 통해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이 하나의 작업이 된다. 이 작업에서 작가, 작품, 관객의 경계는 과연 어디일까?

2022년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관객에게는 이제 ‘참여 예술(Participatory Art)’이라는 장르 자체에 대한 낯섬은 상대적으로 적을지도 모른다. 참여예술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공동체예술(Community Art), 행동주의 예술(Activist Art), 사회참여예술(Socially engaged art), 협업예술(Collaborative art), 대화 예술(Dialogical Art), 공공예술(Public Art) 등으로 불려왔다.[1] 예술가와 작품으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예술사에서는 다소 애매모호한 단어의 조합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 예술 형식은 지난 30여년 간 존재를 강력하게 드러냈고 입지를 굳히며 주류예술로 자리잡았다. 동시대 미술에서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급부상 한 것은 1990년대로 볼 수 있다. 소위 경험경제가 대두되면서 예술작품을 구현하거나 수용하는 과정에 있어 관객의 역할이 강조된 것이다. 관객이 그저 감상에만 머물지 않고 예술작품의 창조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작품을 창조해나가는 과정상의 경험, 그 자체를 하나의 사회적 실천으로 본다. 이를 미술 이론가 클레어비숍(Clair Bishop)은 '생산자로서의 관객(Viewers as Producers)'이라고 개념화 했다.[2]
관객의 참여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20세기 초 아방가르드에서 그 뿌리를 찾아볼 수 있다. 미래주의, 다다, 구축주의, 초현실주의 등 에서는 관습적으로 여겨진 관람자의 수동적 역할에 도전하며 작품의 원본성과 저자성에 대한 질문들을 던졌고, 예술가의 권위를 지워내기 위해 관객들을 개입시켰다. 이들은 예술과 삶을 통합 시키고자 했으며 자율적 예술제도에 도전하고자 했다.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개념예술, 플럭서스 등과 같은 사회 참여적인 성격을 가진 새로운 예술 형태들이 등장했으며 일상적인 삶도 예술적 사건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예술을 물질적 오브제가 아닌 하나의 경험이자 사건으로 보고, 협업을 통한 예술형식의 변화가능성을 실험했다. 이에 예술가들은 매개자가 되어 참여자들의 집단적 개입으로 발생되는 다양한 형식들, 미팅, 공적시위, 해프닝도 실험했다. 정치적 행동주의의 양식이 예술과 삶의 경계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오늘날 참여예술 실천에 반영된 것이다.[3]
참여예술은 참여의 유형에 따라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관계적(relational) 양상, 행동주의적(activistic) 양상, 적대적(antagonistic) 양상이다. 참여예술을 논할 때 자주 등장하는 ‘관계 미학(Relational Aesthetics)’은 프랑스 출신의 큐레이터이자 이론가 니콜라 부리오(Nicolas Bourriaud)가 1996년 기획한 전시 <트래픽(traffic)>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소규모의 일시적 상생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예술 형식을 지칭하게 되었다. 함께 언급되는 작업으로는 태국 출신의 예술가 리크리트 티자바니자(Rirkrit Tiravnija)가 갤러리 관객들에게 팟타이를 대접하는 퍼포먼스로, 음식을 나눠먹는다는 행위 그 자체가 작품이었으며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생산했다. (PP Pick ‘식탁위의 예술’ 참조) 관계 미학은 그 예술적 실천의 주제로서 상호작용성, 상생성, 관계성을 기반으로 한다. 부리오는 관계예술이 오늘날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시간과는 상반된 리듬의 자유로운 공간과 지속적 경험의 시간을 창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커뮤니케이션 영역’과는 다른 상호 인간적인 교류를 고취”시킨다고 주장했다.[4] 관계의 미학을 드러내며 미술관에서 색다른 대화형식을 이끌어낸 작업으로는 2010년 뉴욕현대미술관에서 이루어진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의 “여기 예술가가 있다”라는 퍼포먼스다. 3개월 동안 총 700시간 진행된 이 작업은 작가가 매일 미술관 의자에 앉아 관객과 마주보며 아무말 없이 서로를 응시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주고받는 시선을 통해서만 의사소통을 했고 관람객과 에너지를 공유했다. 하지만, 이 작업은 그녀의 입지로 보건대, 퍼포먼스라는 장르에서의 관객의 참여를 도입한 경우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행동주의적 양상은 “이상주의적이고, 도구적이며, 행동주의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삶에서 긍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입주의자" 또는 "행동주의적 참여예술”로도 불리우는 이러한 사회참여예술(socially engaged art)은 사회적인 영역에서 사회적 행위를 수행함에 집중한다. 대다수의 사회참여예술 프로젝트는 개방적이고 이성적인 담론이 보장되는 공론장 구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항상 ‘공동체’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예술은 공동체 형성의 기제이며 예술가는 매개자가 된다. 전형적인 공동체 기반 예술 프로젝트는 해당 공동체와의 유대를 구축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를 고취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강화한다. 대화의 형식을 구성하는 예술가는 단지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며 “주어진 주제에 대해 공동의 이해에 도달하고, 특정 주제나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특정한 쟁점을 논의하거나 최종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협업" 한다.

마지막으로 적대적 양상은 대립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적대적 사회행동을 통해 자기 성찰적인 인식을 끌어내고자 하는 방법이다. 주로 예술의 제도적 틀에 초점을 맞추고 아이러니와 유머, 도발을 이용하거나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 접근법에는 “어떤 진술들은 일반 대중과 공개적으로 직접적으로 협상될 수 없기에 예술가가 통제를 거쳐 사람들이 강제로라도 특정 경험을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깔려있다. 협업을 중시하는 대화적 예술에 속하는 자신들의 실천이 사회적 서비스와 구분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비판적인 태도를 구성하기 위해 예술가가 통제한 환경에서 관객이 특정 경험을 해야한다고 믿는다. 이를 통해 사회적 참여와 구분되는 자기성찰적이고 비판적인 예술적 참여를 주장한다.[5]
때로는 사회사업과 사회참여예술 간의 혼란이 오기도 하는데 이 둘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사회사업은 가치를 중시하면서 사람들의 보다 나은 행복을 목표로 하며, 사회정의나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옹호, 인간관계의 강화같은 개념을 지지하는 등의 신념체계에 기초한다. 하지만 예술가는 동일한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성찰을 유도하며, 문제를 야기하거나 사람들 사이에 긴장을 조성하기도 한다. 상당 수의 예술가들은 자신들의 아이디어에 더욱 관심이 있으며 예술사의 맥락 안에 존재하는 논쟁의 장으로 들어가면서 인정투쟁에 개입하는 것이다. 사회사업가와 예술가는 서로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 예술가가 커뮤니티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그들의 상호존중과 협력적 개입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정보수집능력과 기록에 기대어 자신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도 있는 것이다.[6]
최근의 경험경제는 더욱더 비물질화 되어가고 있다. 디지털 디바이스가 일상에 그 역량을 발휘하면서 예술 또한 그 방향타를 기술이 가진 권위에 자주 넘겨주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 기술의 발전으로 비물질적인 몰입적 경험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 세계에서 협업과 참여는 주요한 마케팅 전략이 된지 오래다. 전시형식과 관객 참여 및 미학과 같은 현대미술의 전략들은 오히려 경영전략의 레퍼런스로 기능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언젠가부터 끊임없이 참여를 통한 경험을 인증해야하는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내적 피로도는 이미 임계점을 지난지 오래다. 경험 그 자체가 집단간의 구별짓기 요소가 되어 사회의 불화의 도화선이 되기도 한다. 사회가 고도화 될 수록 소속감은 옅어지고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와 재난은 매년 그 부피가 광대해져간다. 공유경제라는 명목으로 공유오피스, 공용공간, 공유 자전거 등 우리는 재화를 공유하는 하나의 커뮤니티에는 익숙해져가고 있지만, 공동의 가치를 나누는 대화는 쳇바퀴 돌 듯 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해본다.
예술가는 그 누구보다 예민한 감수성으로 세계의 변화를 감지하고 현상의 근원을 포착하고, 다시 역으로 사회에 말을 걸어온다. 그러기에 그들의 몫은 어둠에 가리워진 사회의 이면에 조명탄을 쏘아올리는 것인지도 모른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반짝임이라 할지라도, 같은 시대에 존재하며 사회의 양식을 공유하며 일생을 살아내야하는 구성원인 우리가 주의깊게 바라보아야할 불꽃이 아닐까.
All artists are alike. They dream of doing something that’s more social, more collaborative, and more real than art. -Dan Graham
모든 예술가들은 비슷하다. 그들은 예술 그 자체보다 더 사회적이고, 더 협력적이고, 더 현실적인 것을 꿈꾼다.
- 댄 그레이엄
강은미 / PUBLIC PUBLIC 콘텐츠 디렉터
virginiakang@gmail.com
1.파블로 엘게라, 『사회 참여 예술이란 무엇인가』, 열린책들, 2011, p.19.
2. Clair Bishop(ed.), Participation, White Chapel Art Gallery, 2006, pp.10-13.
3. 조주현, 「포스트-미디어 시대 참여예술의 담론과 양상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6, pp.15-19.
4. Nicolas Bourriaud, Relational Aesthetics, trans. Simon Pleasance & Fronza Wood, (Dijon:Les Presses du réel, 2002), p.42.
5. 위의 논문, pp.21-26.
6. 위의 책, 파블로 엘게라, pp.64-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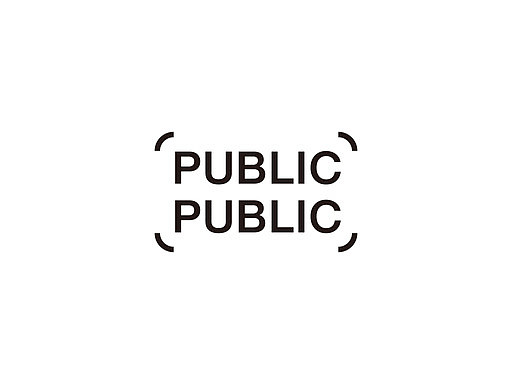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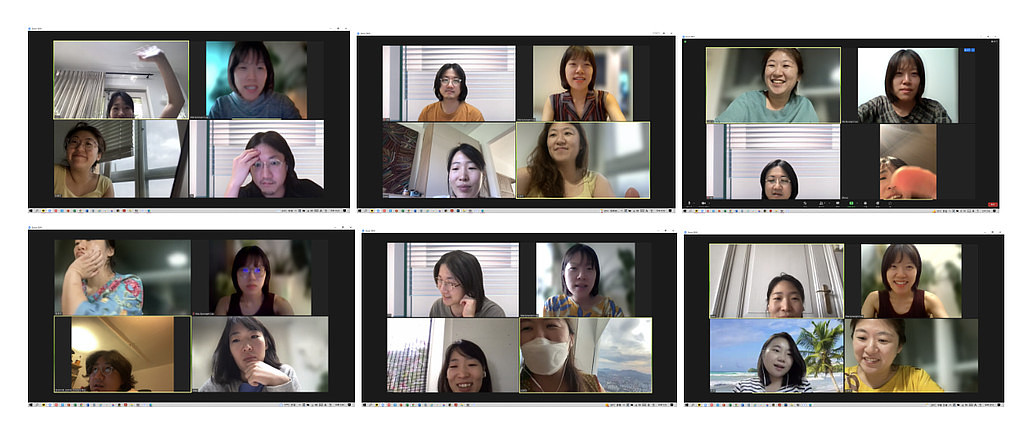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