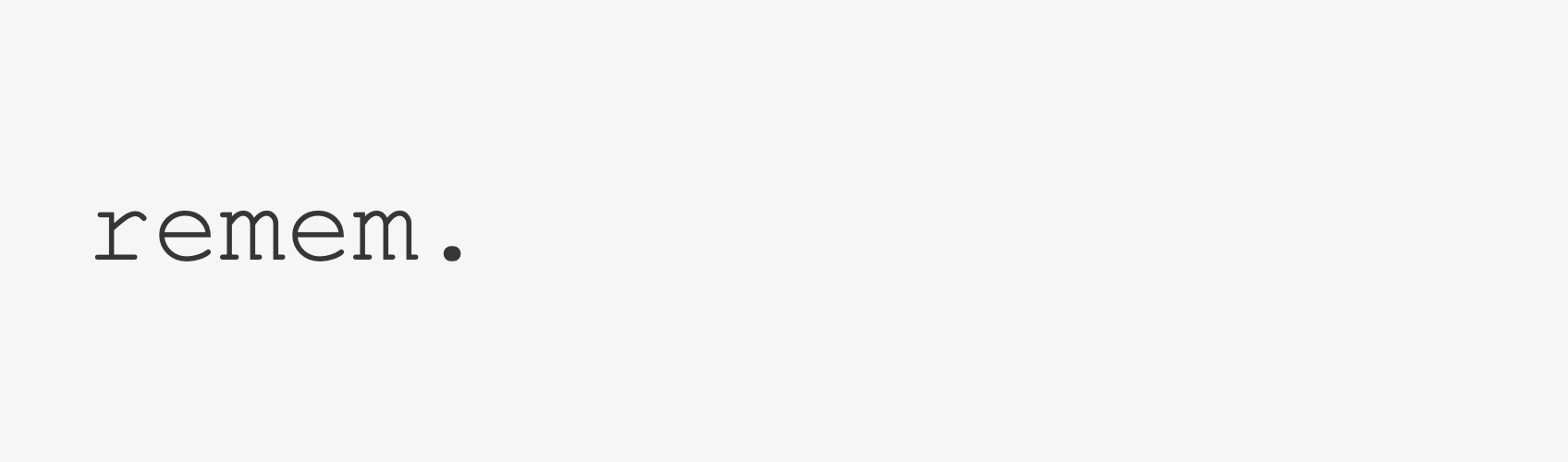
#
어휘에도 확실히 유행이 있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 사랑을 많이 받는 표현은 ‘무해하다’가 아닐까.
‘무해하다’는 평가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듯 한 용어를 가져와 쓰고 있지만, 실은 아주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다. 무해함은 적극적으로 쟁취하는 옳음이나 선량함이라기보다 ‘내가 보기에 바람직하고 온순하며 나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음’에 가깝게 쓰이면서 평가받는 상대를 납작하게 단순화한다.
무해함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으로 그것을 궁극적 목표로 설정하지는 않고 싶다. 진짜 무해해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다. 삶의 모습은 무해와 유해로 단순하게 나눌 수 없다. 서로의 이해관계 충돌로 다투기도 하고, 깜빡 실수도 하고 그에 대한 사과도 하고, 다른 의견을 말하면서 그럼에도 존중하면서 나아가는 복잡성에 가깝다. 그 가운데 스스로 어떤 면으로는 얼마든지 유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자각하고 경계하면 되지 않을까?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에 무해하다는 이름표를 붙여주며 아끼는 풍경은 평화롭다. 무해한 것들을 사랑할 수는 있다. 그러나 무해한 존재가 되겠다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위해 2022년 버전의 또 다른 완벽주의에 스스로 가두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모두 화면 밖에 실재하는 인간이니까.
#
비닐봉투는 역설적인 발명품이다. 스웨덴 출신 엔지니어 스텐 구스타프 툴린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비닐봉투를 만들었다. 종이봉투 제작을 위해 수많은 나무가 베어지는 모습을 보고,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비닐재질 쇼핑백을 고안한 것이 시작이다. 플라스틱의 발명 배경도 비슷하다. 미국의 화학자 리오 베이클랜드는 상아 재질 당구공 제작을 위해 희생되는 코끼리 숫자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플라스틱을 발명했다. 하지만 현재, 비닐봉투는 나무를 죽이고 있고 플라스틱은 야생동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환경보전을 위해 만들어진 물건이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의견을 남겨주세요